목차
1. 머리말
2. 여성에 대한 인식
3. 여성관의 성격과 함의
4. 맺음말
*한글97
2. 여성에 대한 인식
3. 여성관의 성격과 함의
4. 맺음말
*한글97
본문내용
가문의 흥성에 있을 뿐이며, 이것이 실현된 뒤에는 재혼을 해도 개의치 않겠다는 그녀의 발언이 바로 그것이다. 그녀의 의식 속에는 남편과 가문의 삶만 있을 뿐 자기 자신의 개인적 삶은 없다. 그녀는 남편의 입신과 가문의 번영을 위해 자기를 버린 채 오로지 헌신하고 인종할 뿐이다. 박씨는 자신을 하나의 주체적 존재로 보기보다 남편과 가문에 종속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추한 외모 때문에 모진 박대를 받으면서도 \'남편의 입신을 위해 미모를 감추고 있었다\'는 그녀의 발언에서도 이는 뒷받침된다.
이처럼 이 작품은 외형상 여성에 대해 상당히 새로운 시각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가부장제 이념에 기반한 남성 중심의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을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인식한 작품\'(강유경, 앞의 글), 혹은 \'남성 중심의 성별 정체성에 대한 해체의식을 보여주는 작품\'(곽정식, 앞의 글)으로 보는 것은 반성의 여지가 있다.
외모로 여성을 평가하는 것을 비판하며 부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모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성의 능력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 현실성이 결여된 관념적 인식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부덕의 실체는 남편과 가문을 위한 여성들의 일방적 헌신과 인고에 다름 아니다. 표층에서 \'주장되는\' 관념적 인식과 심층에서 \'드러나는\' 실제적 태도가 서로 어긋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중성 속에 이 작품이 기반하고 있는 여성관의 실체와 거기 내포되어 있는 시대적 함의
) 시대적 함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작품의 향유 시기가 특정화되어야 하는데, <박씨전>의 창작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17세기 후반 이전\"(장효현, 앞의 글)부터 \"19세기, 때에 따라서는 20세기\"(성현경, 앞의 글)에 이르기까지 논자들의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고, 필자 역시 아직 확신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간략한 개괄적 논의에 그치고, 보다 구체화된 논의는 창작 시기에 대한 본격적 검토와 함께 후속 작업으로 미루어 둔다.
가 담겨 있다.
표층의식과 심층의식, 인식과 실제의 불일치라는 이러한 현상은 바로 전통적 여성관이 여전히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고 있던 조선후기의 시대적 추이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성의 외모와 능력, 남성과 여성의 관계 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아직 기존의 인식을 대체할 정도로까지 내면화되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이는 또한 전통적 여성관과 새로운 여성관 사이에서 작자 자신의 의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도 된다. 작자는 여성의 인격과 능력,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의 모순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 각주 22) 참조.
그의 심층의식은 여전히 전통적 여성관에 지배되고 있었기에, 새로운 인식은 관념적으로만 제시되고 실제는 전통적 여성관이 재확인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 과정 속에서 당대 사회나 작자 자신이 의식의 혼란을 빚고 있었다는 뜻이다.
4. 맺음말
<박씨전>은 \'탁월한 능력의 못 생긴 여자\'를 내세워 외모보다 부덕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지만, 그러한 언표적 진술과는 달리 여성에게 있어 외모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부덕의 중시가 규범적 관념이라면 외모의 중시는 실제 현실인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여성들의 삶을 일차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대 사회가 여성을 하나의 주체적 인격체로 보기보다 비주체적인 정물적 존재로 보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박씨전>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당대의 일반적 통념과 달리 오히려 여성을 남성보다 우월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국사나 전쟁은 외형상 남성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지만, 실질적 결정과 지휘는 배후의 여성들이 하고 있다. 남성들은 여성들의 조종에 따라 움직일 뿐이며, 전쟁의 승패 역시 여성들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성이고, 남성을 지배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논리와도 통한다. 여성의 사회적 능력을 이처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상당히 진보적 시각을 보이며, 이는 당대 여성 독자들의 호응을 얻는 데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진보성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바라보는 작자의 기본 시각은 전통적 그것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 여성의 능력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그들의 능력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결여되어 그것은 관념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추한 외모\'를 액운으로 설정하여 외모로 인한 고통을 운명적인 것으로 돌림으로써, 외모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이를 체념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들에게 외모와 덕행을 겸비한 완벽한 인간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한 무리한 기대 위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던 부당한 대우까지도 그들이 감수할 것을 요구하는 남성 중심적 시각을 보여 준다.
박씨는 외모로 여성을 평가하는 태도를 신랄히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여성으로서의 자아 각성이나 주체성의 성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관념적 윤리규범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씨는 순종적이고 충실한 내조자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그가 보이는 부덕이란 것은 당대 사회가 여성들에게 강요하고 있던 남성 중심의 행위 규범에 충실한 것, 그 이상이 아니다. 박씨는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남편과 가문의 삶에 종속시키고 있으며, 이는 이 작품의 여성관이 유교 가문주의와 가부장제 이념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작품 표면에서 주장되는 관념적 인식과 심층에서 드러나는 실제적 태도가 서로 어긋나는 것은, 전통적 여성관이 아직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고 있던 조선후기의 시대적 추이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아직 기존 인식을 대체할 정도로 내면화되지는 못했고, 이 때문에 표층과 심층의 인식이 어긋나면서 당대 사회나 작자 자신이 의식의 혼란을 빚고 있었다는 뜻이다. (「어문학」, 제71집, 한국어문학회, 2000. 10)
이처럼 이 작품은 외형상 여성에 대해 상당히 새로운 시각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가부장제 이념에 기반한 남성 중심의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을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인식한 작품\'(강유경, 앞의 글), 혹은 \'남성 중심의 성별 정체성에 대한 해체의식을 보여주는 작품\'(곽정식, 앞의 글)으로 보는 것은 반성의 여지가 있다.
외모로 여성을 평가하는 것을 비판하며 부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모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성의 능력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 현실성이 결여된 관념적 인식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부덕의 실체는 남편과 가문을 위한 여성들의 일방적 헌신과 인고에 다름 아니다. 표층에서 \'주장되는\' 관념적 인식과 심층에서 \'드러나는\' 실제적 태도가 서로 어긋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중성 속에 이 작품이 기반하고 있는 여성관의 실체와 거기 내포되어 있는 시대적 함의
) 시대적 함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작품의 향유 시기가 특정화되어야 하는데, <박씨전>의 창작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17세기 후반 이전\"(장효현, 앞의 글)부터 \"19세기, 때에 따라서는 20세기\"(성현경, 앞의 글)에 이르기까지 논자들의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고, 필자 역시 아직 확신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간략한 개괄적 논의에 그치고, 보다 구체화된 논의는 창작 시기에 대한 본격적 검토와 함께 후속 작업으로 미루어 둔다.
가 담겨 있다.
표층의식과 심층의식, 인식과 실제의 불일치라는 이러한 현상은 바로 전통적 여성관이 여전히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고 있던 조선후기의 시대적 추이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성의 외모와 능력, 남성과 여성의 관계 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아직 기존의 인식을 대체할 정도로까지 내면화되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이는 또한 전통적 여성관과 새로운 여성관 사이에서 작자 자신의 의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도 된다. 작자는 여성의 인격과 능력,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의 모순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 각주 22) 참조.
그의 심층의식은 여전히 전통적 여성관에 지배되고 있었기에, 새로운 인식은 관념적으로만 제시되고 실제는 전통적 여성관이 재확인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 과정 속에서 당대 사회나 작자 자신이 의식의 혼란을 빚고 있었다는 뜻이다.
4. 맺음말
<박씨전>은 \'탁월한 능력의 못 생긴 여자\'를 내세워 외모보다 부덕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지만, 그러한 언표적 진술과는 달리 여성에게 있어 외모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부덕의 중시가 규범적 관념이라면 외모의 중시는 실제 현실인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여성들의 삶을 일차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대 사회가 여성을 하나의 주체적 인격체로 보기보다 비주체적인 정물적 존재로 보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박씨전>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당대의 일반적 통념과 달리 오히려 여성을 남성보다 우월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국사나 전쟁은 외형상 남성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지만, 실질적 결정과 지휘는 배후의 여성들이 하고 있다. 남성들은 여성들의 조종에 따라 움직일 뿐이며, 전쟁의 승패 역시 여성들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성이고, 남성을 지배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논리와도 통한다. 여성의 사회적 능력을 이처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상당히 진보적 시각을 보이며, 이는 당대 여성 독자들의 호응을 얻는 데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진보성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바라보는 작자의 기본 시각은 전통적 그것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 여성의 능력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그들의 능력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결여되어 그것은 관념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추한 외모\'를 액운으로 설정하여 외모로 인한 고통을 운명적인 것으로 돌림으로써, 외모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이를 체념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들에게 외모와 덕행을 겸비한 완벽한 인간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한 무리한 기대 위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던 부당한 대우까지도 그들이 감수할 것을 요구하는 남성 중심적 시각을 보여 준다.
박씨는 외모로 여성을 평가하는 태도를 신랄히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여성으로서의 자아 각성이나 주체성의 성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관념적 윤리규범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씨는 순종적이고 충실한 내조자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그가 보이는 부덕이란 것은 당대 사회가 여성들에게 강요하고 있던 남성 중심의 행위 규범에 충실한 것, 그 이상이 아니다. 박씨는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남편과 가문의 삶에 종속시키고 있으며, 이는 이 작품의 여성관이 유교 가문주의와 가부장제 이념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작품 표면에서 주장되는 관념적 인식과 심층에서 드러나는 실제적 태도가 서로 어긋나는 것은, 전통적 여성관이 아직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고 있던 조선후기의 시대적 추이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아직 기존 인식을 대체할 정도로 내면화되지는 못했고, 이 때문에 표층과 심층의 인식이 어긋나면서 당대 사회나 작자 자신이 의식의 혼란을 빚고 있었다는 뜻이다. (「어문학」, 제71집, 한국어문학회, 200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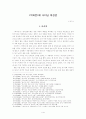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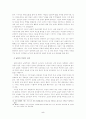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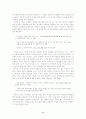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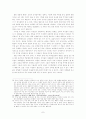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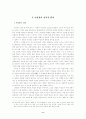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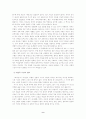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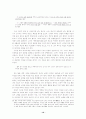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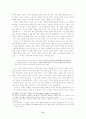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