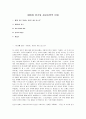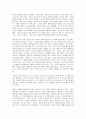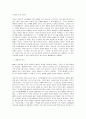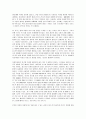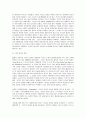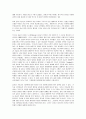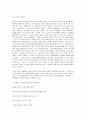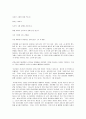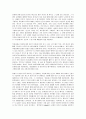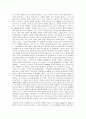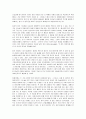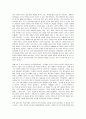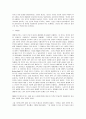목차
Ⅰ. 제3의 물음 `아담아, 자연은 어디 있느냐?`
Ⅱ. 생태학적 위기
Ⅲ. 자연 파괴의 원인
Ⅳ. 성서의 자연관
Ⅴ. 맺음말
Ⅱ. 생태학적 위기
Ⅲ. 자연 파괴의 원인
Ⅳ. 성서의 자연관
Ⅴ. 맺음말
본문내용
해진 대로 살아갈 따름이다. 이와 달리 인간은 환경에 순응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노동을 가하여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노동의 결과로 가 공되어 생겨난 것이 문화이다.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변화시켜서 문화를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와 같이 창조 이야기에는 자연과 인간의 이분법,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이 극 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의 생태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 연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거나 자연 파괴를 정당화하려는 논증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인간이 자연의 적대적 위협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생존하려는 몸부림의 반영이다. 인간이 자연을 숭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인간이 단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에 귀속되어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특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문화를 창조함으로 써 자연을 초월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성서의 창조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Ⅴ. 맺음말
생태계 위기는 오늘의 인류가 화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이 위기는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고 착취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다. 지금까지 인간은 자연의 본유적 가치(intrinsic value)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인간을 위한 효용적 가치만을 인정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아무런 가책 없이 자연을 무제약적으로 이 용 착취 파괴하게 되었다. 생태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종래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연은 인간의 소용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재 목적이 있다고 보는 새로운 자연관이 요청되는 것은 물론이다. 또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 될 때 인간의 생존도 위험에 빠진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변화된 새로운 자연관은 문제 해결 의 한 가닥 실마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열쇠는 되지 못한다. 범신론적인 동양 의 종교들에서 자연친화적인 요소가 많이 있음은 사실이다. 이러한 종교적 가치 가 지배하는 곳에서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따름이지 자연 파괴가 전무하지 않은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연 사랑 또는 자연 파괴는 자연에 대 한 올바른 이해 또는 그릇된 이해에 근본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느냐 이즈러져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토인비(A. Toynbee)처럼 기독교적인 유일신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동양적인 범신론으 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처럼 지구를 생명의 모신(母神, Mother-God)으로 모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 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무지 때문만은 아니다. 남을 억업하거나 죽이는 사람은 비록 그가 사람의 귀중함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자기 의 이기적 욕심을 충족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자연 파괴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 그것은 인간이 대량 생산과 대량 소 비의 악순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자연 파괴와 생태계 위기는 인간이 구축 해 놓은 이러한 삶의 형태가 낳은 필연적 산물이다. 자연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요청되지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삶의 태도의 변화이다. 그러므로 생 태계 위기 해결의 열쇠는 인간의 삶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에서 찾아 야 한다. 자연과 생태계 보호는 결국 윤리적 문제와 종교적 문제로 다시 귀착된 다.
2000년 전 예수와 어느 율법 교사 사이에 벌어진 대화 한 토막은 21세기의 생태론자의 성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 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 을 네 몸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셋째로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는데 그것 은 '자연을 네 몸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세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 언자들의 본 뜻이 달려 있다" (마 22:35-40).
각주
[1] Rene Dubos, A God Within, New York: Charles Charles Scribner's Sons, 1972, p. 166.
[2] 이 논문은 Science, March 1967에 게재됨.
[3] L. Feuerbach, The Esssence of Christianity, 287.
[4] W. Berry, "A Secular Pilgrimage", in: Western Man and Environment Ethics: Attitudes Toward Nature and Technology, ed. Ian Barbour. Reading, MA: Addison-Wesley, 1973, 135.
[5] A. Toynbee, "The Religious Background of the Present Environmental Crisis", in: Ecology and Religion in History, ed. by David and Eileen Spring. New York: Harper and Row, 1974, 146f.
[6] '피조물'(ktisis)의 의미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황현숙, "구원의 희망 속에서 탄 식하는 피조물"(롬 8:19-22)", [창조보전과 한국신학], 한국기독교 신학총론 9. 서울: 한 국기독교서회, 1992, 141-42 쪽 참조.
[7] 다음의 진술에 대해서는 Georges Casalis, Die richtigen Ideen fallen nicht vom Himmel, Stuttgart et a. 1980, S. 91-110 참조.
이와 같이 창조 이야기에는 자연과 인간의 이분법,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이 극 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의 생태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 연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거나 자연 파괴를 정당화하려는 논증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인간이 자연의 적대적 위협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생존하려는 몸부림의 반영이다. 인간이 자연을 숭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인간이 단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에 귀속되어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특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문화를 창조함으로 써 자연을 초월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성서의 창조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Ⅴ. 맺음말
생태계 위기는 오늘의 인류가 화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이 위기는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고 착취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다. 지금까지 인간은 자연의 본유적 가치(intrinsic value)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인간을 위한 효용적 가치만을 인정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아무런 가책 없이 자연을 무제약적으로 이 용 착취 파괴하게 되었다. 생태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종래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연은 인간의 소용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재 목적이 있다고 보는 새로운 자연관이 요청되는 것은 물론이다. 또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 될 때 인간의 생존도 위험에 빠진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변화된 새로운 자연관은 문제 해결 의 한 가닥 실마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열쇠는 되지 못한다. 범신론적인 동양 의 종교들에서 자연친화적인 요소가 많이 있음은 사실이다. 이러한 종교적 가치 가 지배하는 곳에서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따름이지 자연 파괴가 전무하지 않은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연 사랑 또는 자연 파괴는 자연에 대 한 올바른 이해 또는 그릇된 이해에 근본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느냐 이즈러져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토인비(A. Toynbee)처럼 기독교적인 유일신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동양적인 범신론으 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처럼 지구를 생명의 모신(母神, Mother-God)으로 모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 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무지 때문만은 아니다. 남을 억업하거나 죽이는 사람은 비록 그가 사람의 귀중함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자기 의 이기적 욕심을 충족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자연 파괴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 그것은 인간이 대량 생산과 대량 소 비의 악순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자연 파괴와 생태계 위기는 인간이 구축 해 놓은 이러한 삶의 형태가 낳은 필연적 산물이다. 자연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요청되지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삶의 태도의 변화이다. 그러므로 생 태계 위기 해결의 열쇠는 인간의 삶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에서 찾아 야 한다. 자연과 생태계 보호는 결국 윤리적 문제와 종교적 문제로 다시 귀착된 다.
2000년 전 예수와 어느 율법 교사 사이에 벌어진 대화 한 토막은 21세기의 생태론자의 성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 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 을 네 몸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셋째로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는데 그것 은 '자연을 네 몸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세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 언자들의 본 뜻이 달려 있다" (마 22:35-40).
각주
[1] Rene Dubos, A God Within, New York: Charles Charles Scribner's Sons, 1972, p. 166.
[2] 이 논문은 Science, March 1967에 게재됨.
[3] L. Feuerbach, The Esssence of Christianity, 287.
[4] W. Berry, "A Secular Pilgrimage", in: Western Man and Environment Ethics: Attitudes Toward Nature and Technology, ed. Ian Barbour. Reading, MA: Addison-Wesley, 1973, 135.
[5] A. Toynbee, "The Religious Background of the Present Environmental Crisis", in: Ecology and Religion in History, ed. by David and Eileen Spring. New York: Harper and Row, 1974, 146f.
[6] '피조물'(ktisis)의 의미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황현숙, "구원의 희망 속에서 탄 식하는 피조물"(롬 8:19-22)", [창조보전과 한국신학], 한국기독교 신학총론 9. 서울: 한 국기독교서회, 1992, 141-42 쪽 참조.
[7] 다음의 진술에 대해서는 Georges Casalis, Die richtigen Ideen fallen nicht vom Himmel, Stuttgart et a. 1980, S. 91-11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