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 자기이해를 매개한다. 이 텍스트의 이해 매개행위는 \'친숙화\'( Aneignung )의 경험이다. 이 친숙화는 슐라이에르마허나 딜타이에게서 처럼 주관의 심리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텍스트 앞에서 텍스트가 전개하고,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매개의 주체는 가다머가 말하는 텍스트 사실 ( Sache des Textes ) 이고, 리꾀르의 용어로 작품세계 ( Welt des Werkes )이다. 친숙화는 텍스트에 대해 이해의 제한된 가능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로 나아가고, 그것으로부터 넓어진 자기 ( ein erweitertes Selbst )를 얻는것, 다시말하면 실존기획을 세계기획의 현실적으로 친숙화된 상응(einen Existenentwurf als wirklich angeeignete Entsprechung des Weltentwurfs ) 으로서 얻는 것을 말한다. 주관이 이해를 산출하지 않는다. 자기( das Selbst )는 텍스트의 사실을 통해서 산출된다.
이 친숙화 범주의 특별히 주목할 점은 리꾀르가 이 \'친숙화\'라는 해석학적 경험의 계기속에서 마르크스와 프로이드가 제창하는 이데올로기 비판을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이 친숙화는 독자의 선입견이 아니라 텍스트의 사실에 의한 자아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친숙화는 동시에 탈피 (Enteignung ) 즉 자아의 환상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게 된다. 따라서 해석학은 텍스트 사실에 의해 가능해지는 자기 이해가 수행되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우회로가 되는 이데올로기 비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비판의 수용은 리꾀르가 가다머에 대한 하머마스의 비판을 받아들여 양자를 상호보완 하려한 결과이다. 리꾀르는 해석학과 이데올로기 비판의 논쟁에 대하여 각각 전통해석학은 비판적 간격을 해석학적 과정의 중요한 계기로서 수용할 때만 그것의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고 또한 이데올로기 비판은 전통의 재해석을 수용하게 할때만 그것의 기획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양자의 상호보완을 주장한다. 그는 해석학에서의 이데올로기 비판의 수용장소를 바로 친숙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관의 환상에 대한 비판에서 찾음으로 자신의 텍스트 해석학속에 이데올로기 비판을 수용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리꾀르는 자신의 텍스트 해석학에서 이해-방법-이해의 모델과 이데올로기 비판을 수용함으로써 가다머 해석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 친숙화 범주의 특별히 주목할 점은 리꾀르가 이 \'친숙화\'라는 해석학적 경험의 계기속에서 마르크스와 프로이드가 제창하는 이데올로기 비판을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이 친숙화는 독자의 선입견이 아니라 텍스트의 사실에 의한 자아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친숙화는 동시에 탈피 (Enteignung ) 즉 자아의 환상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게 된다. 따라서 해석학은 텍스트 사실에 의해 가능해지는 자기 이해가 수행되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우회로가 되는 이데올로기 비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비판의 수용은 리꾀르가 가다머에 대한 하머마스의 비판을 받아들여 양자를 상호보완 하려한 결과이다. 리꾀르는 해석학과 이데올로기 비판의 논쟁에 대하여 각각 전통해석학은 비판적 간격을 해석학적 과정의 중요한 계기로서 수용할 때만 그것의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고 또한 이데올로기 비판은 전통의 재해석을 수용하게 할때만 그것의 기획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양자의 상호보완을 주장한다. 그는 해석학에서의 이데올로기 비판의 수용장소를 바로 친숙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관의 환상에 대한 비판에서 찾음으로 자신의 텍스트 해석학속에 이데올로기 비판을 수용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리꾀르는 자신의 텍스트 해석학에서 이해-방법-이해의 모델과 이데올로기 비판을 수용함으로써 가다머 해석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키워드
추천자료
 [사범/법학] 교육사회학 이론 정리
[사범/법학] 교육사회학 이론 정리 성경비평방법론연구
성경비평방법론연구 구약성서 해석의 원리와 실제-서평
구약성서 해석의 원리와 실제-서평 19세기 수학자
19세기 수학자 수용미학의 특징, 비평가, 실제 적용
수용미학의 특징, 비평가, 실제 적용 대학원 박사과정 구약성서해석 방법에서 구조주의 비평에 대한 이해를 소논문으로 작성
대학원 박사과정 구약성서해석 방법에서 구조주의 비평에 대한 이해를 소논문으로 작성 다빈치 코드 안에 나타난 언어적 해석에 대한 고찰
다빈치 코드 안에 나타난 언어적 해석에 대한 고찰 [하이데거][삶의 여정][시간과 존재][세계에 대한 의미][시와 언어][현존재]하이데거의 삶의 ...
[하이데거][삶의 여정][시간과 존재][세계에 대한 의미][시와 언어][현존재]하이데거의 삶의 ... [교육 사회학] 간호학과에서 교직이수 교육학 과제
[교육 사회학] 간호학과에서 교직이수 교육학 과제 교육사회 요약정리입니다.
교육사회 요약정리입니다. 교육과 사회
교육과 사회  하버마스(Habermas)의 비판이론과 이상적 담화
하버마스(Habermas)의 비판이론과 이상적 담화 [사회복지조사론]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해석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 해석주의
[사회복지조사론]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해석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 해석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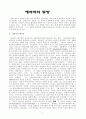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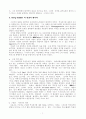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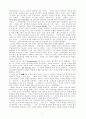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