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성률 제삼십삼
본문내용
經의 작자들이 운율을 사용함에 대개 맑고 분명했던 것에 반해, 초사는 초나라 방언이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조화롭지 못한 音韻이 실로 많았다. 장화가 운율을 논하면서 이르기를, \"육기는 초나라 방언을 많이 사용했다\"고 했는데, 육기 자신도 ≪문부≫에서 말하길, \"초나라 방언임을 알고 있으나 고치지 않는다(혹은 周振甫가 번역한 것 처럼 \'用韻을 함이 쉽지 않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未知孰是이다. 그러나 周振甫의 견해처럼 ≪문부≫에 정말 그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이 해석을 따라야 할 것이다)\"고 했으니, 가히 굴원의 用韻을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詩經의 표준음인 黃鍾의 바른 음을 잃은 것이다. 무릇 적절한 운이 움직임에 그 기세는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처럼 자연스럽지만, 부적절한 음(운)이 일어나면 마치 둥근모양의 구멍에 사각형의 막대를 집어넣으려는 것보다 훨씬 부자연스러움이 있게 된다. 만일 둥근모양의 구멍에 사각형의 막대를 집어넣으려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결함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문장을 지음에 큰 잘못이 없게 될 것이다. 재능과 식견이 정밀하고 깊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단어와 운율의 선택에 있어서 치밀하다. 그러나 재능과 식견이 세심하지 못한 사람은 그저 아무렇게나 운율을 선택하려고 한다. 전자의 경우는 힘찬 바람이 구멍에 불어와 소리를 내는 것처럼 자연스럽지만, 후자의 경우는 남곽선생이 를 연주하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서로 마주치면 소리가 나는 옥을 차고 다녔는데, 왼쪽에는 宮음이 나는 옥을 찼고, 오른쪽에는 徵음이 나는 옥을 찼다. 그 목적은 그것들이 내는 소리를 통하여 발걸음을 조절하고, (목)소리에서 순서를 잃지 않게 하려는 데 있었다. 하물며 음조로써 문장에 운율을 가할 때는, 어찌 이러한 사실을 소홀히 대할 수 있겠는가!
贊하길:
사상과 감정을 표출함에 반드시 심원한 것에 힘을 써야 하나,
음률을 배합하는 것은 바로 곁에서도 가능한 일이도다.
피리를 부는 것과 같은 운율은 우리의 가슴에서 나오고,
종을 울리는 것과 같은 선율은 우리의 입술과 입에서 나오기 때문일세.
문장에서 그 성률의 역할은,
마치 요리를 할 때 사용되는 짠맛의 소금과 신맛의 매실이나,
부드러운 맛을 내는 楡.槿처럼,
그 문장을 감미롭고 부드럽게 한다네.
운율을 고름에 있어 조화롭지 못한 것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은
문장에서 그 성률의 조화와 부조화가 감추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네.
옛날 사람들은, 서로 마주치면 소리가 나는 옥을 차고 다녔는데, 왼쪽에는 宮음이 나는 옥을 찼고, 오른쪽에는 徵음이 나는 옥을 찼다. 그 목적은 그것들이 내는 소리를 통하여 발걸음을 조절하고, (목)소리에서 순서를 잃지 않게 하려는 데 있었다. 하물며 음조로써 문장에 운율을 가할 때는, 어찌 이러한 사실을 소홀히 대할 수 있겠는가!
贊하길:
사상과 감정을 표출함에 반드시 심원한 것에 힘을 써야 하나,
음률을 배합하는 것은 바로 곁에서도 가능한 일이도다.
피리를 부는 것과 같은 운율은 우리의 가슴에서 나오고,
종을 울리는 것과 같은 선율은 우리의 입술과 입에서 나오기 때문일세.
문장에서 그 성률의 역할은,
마치 요리를 할 때 사용되는 짠맛의 소금과 신맛의 매실이나,
부드러운 맛을 내는 楡.槿처럼,
그 문장을 감미롭고 부드럽게 한다네.
운율을 고름에 있어 조화롭지 못한 것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은
문장에서 그 성률의 조화와 부조화가 감추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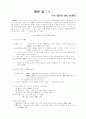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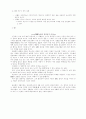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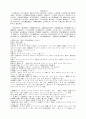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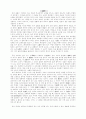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