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시평의 양상
Ⅰ. 본질론
Ⅱ. 작시론
1. 작시 정신
2. 표현
3. 신의와 용사
4. 환골탈태
5.성률
6. 연탁
7. 언외의
제3절 시평의 양상
Ⅰ. 본질론
Ⅱ. 작시론
1. 작시 정신
2. 표현
3. 신의와 용사
4. 환골탈태
5.성률
6. 연탁
7. 언외의
제3절 시평의 양상
본문내용
기보다는 온후(溫厚)·연담(淵潭)함이 어렵고 갱장( )ㆍ향량(響亮)하기보다는 화평(和平)·유원(悠遠)하기가 어렵다.
로 분류하기도 했다.
이상에서 보면 시 비평에 있어서 형식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들의 평어가 주로 그들 개인의 주관적 감상에 의한 것이어서, 자연히 전달된 내용의 비평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근체시는 엄격한 정형시였으며, 그 중에서도 성률의 문제는 특히 까다로운 것이어서, 그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고서는 함부로 비평하지 못하였던 것도 그 이유의 하나라고 하겠다.
내용의 비평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기상을 중시하였고, 그 외에 격조, 정경, 이치, 해득 등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감상의 결과로 음미되는 시의 여운과 여의(餘意)도 문제가 되었다. 형식면에 있어서는 체제·성률·법도 등이 그 비평의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의 뒷받침이나 자세한 설명도 없이 다만 추상적인 용어들로 비평에 대신하고 있기에 결국 조선 후기 문인들은 주관적 감상에 의거하여 시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소위 감상 비평에 주력하였다고 하겠으며, 그것이 당시 시평의 주류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작가론
당시 문인들의 작가론의 경향을 분류해 보면 크게 세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① 학시의 원류를 찾거나, 동일한 미의식의 근원을 찾아 작가의 작품 경향을 평가하는 소위 원류비평: 중국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한시 전통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고도 하겠으며, 당시 시평의 주조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시의 원류를 찾는 데만 급급하여, 시도를 잃어감을 경계하여 시평의 기준이라 할수 있는 시의 의(意)·사(辭)·기(氣)·격(格)등의 품평을 통하여 시를 평가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따라서 지나친 원류비평에의 집착은 비평의 방법으로서도 적당하지 못하다는 생각
② 작품은 곧 작가 자신을 나타낸다는 생각에서 작가의 성품이나 행동과 작품을 동일시하여 평가하는 방법.: 시는 작가의 인격과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준다는 생각으로 작가의 심성의 수양이 시를 통해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대개 시나 문집의 서 발을 통해 나타나는 작가론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타난다. 서·발에는 시나 문집의 성격, 배경, 동기, 경위, 사상, 문학비평 등이 나타나 있는데, 특히 작가의 약력이나 인격을 소개하면서 이를 작품에 연결하여 비평하는 예가 많다..
③ 작품의 감상을 통해 나타난 한 작가의 대표적인 시의 풍격을 그대로 작가론에 연결시키는 방법.: 시의 풍격을 설정하여 시를 품평하는 감상 비평을 통한 미의식의 추구에 주력하였던 당시에 있어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볼 수 있다.
cf. 시로써 시를 평한 신위의 비평 방법:「동인논시절구(東人論詩絶句)」 삼십오수에다 자주(自注)를 더하여 최치원에서부터 김상헌(金尙憲)에 이르기까지 47명의 시인을 칠언절구로써 비평하고 있다.
Ⅲ. 작품론
조선 후기 시평에서의 작품론의 경향은
① 기교론에 의한 시평
이아계의 시는 지나치게 연미해서 \"죽은 양귀비가 꽃 밑에 누웠다\"는 말로 기자하는데, 그의 절구인즉 묘하다. \"흰 비 배에 가득 차 돌아가는 길 노 젓기 급하고, 여러 마을의 문 닫히고 팥꽃 피어난 가을\"과 같은 구절은 진정 시중에 그림이 들어 있는 것이라 하겠다. 南龍翼 // 이상의 시는 다 옛 작품을 모방한 것인데 그렇게 한 흔적이 전연 없어서, 정말 환골탈태의 법을 얻었다고 하겠다. 시 짓는 사람들은 마땅히 경계해야 하고 또 본받아야 할 것이다 洪萬宗
② 내용면, 특히 감상과 품평을 통한 시평
[고려 김극기(金克己)의 황룡사(黃龍寺)시] 이 시는 월 만하고 명의 또한 기교하니, 대개 세속을 분개하고 미워하는 작품이다. 부귀와 권세는 높고 높아서 사람이 감히 어찌하지 못하거니와, 빈천으로서 곤궁을 편히 여긴 자도 도리어 그 해독을 받는다는 것이며, 범골이 길을 잃었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하늘에 부르짖어도 통하기 어렵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으니, 아는 자라야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李翼 // [홍유손(洪裕孫)의 시] 일찍이 시를 짓기를 \"마냥 솟는 샘물에 머리를 감노라니, 눈 같은 머리칼이 바다를 향해 동으로 흐르네. 봉래산 신선께서 만약 보게 된다면, 인간에 백두가 있다 비웃게 되리\"라 하였다. 이 시는 말이 매우 준상하여 욀 만하다.- 洪裕孫
③ 형식면에서의 시평.
오언배율은 초당에 처음 나왔는데, 두자미는 일백운을 지었고 고려의 상국 이규보는 삼백운을 지었다. 조선에 이르러 소암 임숙영은 칠백운을 지어 동악 이안눌에게 보내었다. 그 시는 광박·기벽하여 진정 천재의 걸작이다. 노두 같은 대시인으로서도 백운에 그쳤고 후세의 시인들 중에도 이와 같은 대작은 없다. 소암이 처음으로 이와 같은 것을 창작했으니 그의 지식이 풍부함을 알 수 있다. -金得臣 // [심약(沈約)의 팔영시(八詠詩)] 그 평측이 고르지 못하여 격률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 [유안기(兪安期)의 『당류함(唐類函)』에 실린 망추월(望秋月)] 글귀에 나타난 말들이 더러 중첩된 데가 많으며, 오언·칠언의 장단 역시 몹시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마도 가무의 절주를 위하여 한 편의 가운데서 각기 일첩을 이룬 듯한데, 마침내 깊이 상고할 수가 없다. 李翼
cf. 우리 말로 된 시가에 대한 작품론
김만중이 『서포만필(西浦漫筆)』에서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관동별곡(關東別曲)」· 「사미인곡(思美人曲)」·「속미인곡(續美人曲)」등을 우리나라의 「이소(離騷)」라고 극찬한 바 있지만, 홍만종(洪萬宗)은 그의 『순오지(旬五志)』에서 당시에 유행되던 우리의 시가 14곡에 대한 평어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한시의 평에서 사용되던 평어와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의 말로 이루어진 시가의 작품론이 나타나고 있음은 당시 많은 시조와 민요가 한역되고, 『청구영언(靑丘永言)』. 『해동가요(海東歌謠)』와 같은 시조집이 편찬되는 등의 사실과 더불어 생각해볼 때, 민족 문학에 대한 인식의 변천 과정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로 분류하기도 했다.
이상에서 보면 시 비평에 있어서 형식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들의 평어가 주로 그들 개인의 주관적 감상에 의한 것이어서, 자연히 전달된 내용의 비평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근체시는 엄격한 정형시였으며, 그 중에서도 성률의 문제는 특히 까다로운 것이어서, 그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고서는 함부로 비평하지 못하였던 것도 그 이유의 하나라고 하겠다.
내용의 비평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기상을 중시하였고, 그 외에 격조, 정경, 이치, 해득 등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감상의 결과로 음미되는 시의 여운과 여의(餘意)도 문제가 되었다. 형식면에 있어서는 체제·성률·법도 등이 그 비평의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의 뒷받침이나 자세한 설명도 없이 다만 추상적인 용어들로 비평에 대신하고 있기에 결국 조선 후기 문인들은 주관적 감상에 의거하여 시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소위 감상 비평에 주력하였다고 하겠으며, 그것이 당시 시평의 주류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작가론
당시 문인들의 작가론의 경향을 분류해 보면 크게 세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① 학시의 원류를 찾거나, 동일한 미의식의 근원을 찾아 작가의 작품 경향을 평가하는 소위 원류비평: 중국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한시 전통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고도 하겠으며, 당시 시평의 주조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시의 원류를 찾는 데만 급급하여, 시도를 잃어감을 경계하여 시평의 기준이라 할수 있는 시의 의(意)·사(辭)·기(氣)·격(格)등의 품평을 통하여 시를 평가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따라서 지나친 원류비평에의 집착은 비평의 방법으로서도 적당하지 못하다는 생각
② 작품은 곧 작가 자신을 나타낸다는 생각에서 작가의 성품이나 행동과 작품을 동일시하여 평가하는 방법.: 시는 작가의 인격과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준다는 생각으로 작가의 심성의 수양이 시를 통해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대개 시나 문집의 서 발을 통해 나타나는 작가론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타난다. 서·발에는 시나 문집의 성격, 배경, 동기, 경위, 사상, 문학비평 등이 나타나 있는데, 특히 작가의 약력이나 인격을 소개하면서 이를 작품에 연결하여 비평하는 예가 많다..
③ 작품의 감상을 통해 나타난 한 작가의 대표적인 시의 풍격을 그대로 작가론에 연결시키는 방법.: 시의 풍격을 설정하여 시를 품평하는 감상 비평을 통한 미의식의 추구에 주력하였던 당시에 있어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볼 수 있다.
cf. 시로써 시를 평한 신위의 비평 방법:「동인논시절구(東人論詩絶句)」 삼십오수에다 자주(自注)를 더하여 최치원에서부터 김상헌(金尙憲)에 이르기까지 47명의 시인을 칠언절구로써 비평하고 있다.
Ⅲ. 작품론
조선 후기 시평에서의 작품론의 경향은
① 기교론에 의한 시평
이아계의 시는 지나치게 연미해서 \"죽은 양귀비가 꽃 밑에 누웠다\"는 말로 기자하는데, 그의 절구인즉 묘하다. \"흰 비 배에 가득 차 돌아가는 길 노 젓기 급하고, 여러 마을의 문 닫히고 팥꽃 피어난 가을\"과 같은 구절은 진정 시중에 그림이 들어 있는 것이라 하겠다. 南龍翼 // 이상의 시는 다 옛 작품을 모방한 것인데 그렇게 한 흔적이 전연 없어서, 정말 환골탈태의 법을 얻었다고 하겠다. 시 짓는 사람들은 마땅히 경계해야 하고 또 본받아야 할 것이다 洪萬宗
② 내용면, 특히 감상과 품평을 통한 시평
[고려 김극기(金克己)의 황룡사(黃龍寺)시] 이 시는 월 만하고 명의 또한 기교하니, 대개 세속을 분개하고 미워하는 작품이다. 부귀와 권세는 높고 높아서 사람이 감히 어찌하지 못하거니와, 빈천으로서 곤궁을 편히 여긴 자도 도리어 그 해독을 받는다는 것이며, 범골이 길을 잃었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하늘에 부르짖어도 통하기 어렵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으니, 아는 자라야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李翼 // [홍유손(洪裕孫)의 시] 일찍이 시를 짓기를 \"마냥 솟는 샘물에 머리를 감노라니, 눈 같은 머리칼이 바다를 향해 동으로 흐르네. 봉래산 신선께서 만약 보게 된다면, 인간에 백두가 있다 비웃게 되리\"라 하였다. 이 시는 말이 매우 준상하여 욀 만하다.- 洪裕孫
③ 형식면에서의 시평.
오언배율은 초당에 처음 나왔는데, 두자미는 일백운을 지었고 고려의 상국 이규보는 삼백운을 지었다. 조선에 이르러 소암 임숙영은 칠백운을 지어 동악 이안눌에게 보내었다. 그 시는 광박·기벽하여 진정 천재의 걸작이다. 노두 같은 대시인으로서도 백운에 그쳤고 후세의 시인들 중에도 이와 같은 대작은 없다. 소암이 처음으로 이와 같은 것을 창작했으니 그의 지식이 풍부함을 알 수 있다. -金得臣 // [심약(沈約)의 팔영시(八詠詩)] 그 평측이 고르지 못하여 격률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 [유안기(兪安期)의 『당류함(唐類函)』에 실린 망추월(望秋月)] 글귀에 나타난 말들이 더러 중첩된 데가 많으며, 오언·칠언의 장단 역시 몹시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마도 가무의 절주를 위하여 한 편의 가운데서 각기 일첩을 이룬 듯한데, 마침내 깊이 상고할 수가 없다. 李翼
cf. 우리 말로 된 시가에 대한 작품론
김만중이 『서포만필(西浦漫筆)』에서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관동별곡(關東別曲)」· 「사미인곡(思美人曲)」·「속미인곡(續美人曲)」등을 우리나라의 「이소(離騷)」라고 극찬한 바 있지만, 홍만종(洪萬宗)은 그의 『순오지(旬五志)』에서 당시에 유행되던 우리의 시가 14곡에 대한 평어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한시의 평에서 사용되던 평어와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의 말로 이루어진 시가의 작품론이 나타나고 있음은 당시 많은 시조와 민요가 한역되고, 『청구영언(靑丘永言)』. 『해동가요(海東歌謠)』와 같은 시조집이 편찬되는 등의 사실과 더불어 생각해볼 때, 민족 문학에 대한 인식의 변천 과정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추천자료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문학과 종교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문학과 종교 [민주주의][정당][한국 민주주의][한국 민주화이론]민주주의의 개념, 민주주의의 본질, 민주...
[민주주의][정당][한국 민주주의][한국 민주화이론]민주주의의 개념, 민주주의의 본질, 민주... 기업가(경영자)의 개념, 기업가(경영자)의 유형, 기업가정신의 개념, 기업가정신의 중요성, ...
기업가(경영자)의 개념, 기업가(경영자)의 유형, 기업가정신의 개념, 기업가정신의 중요성, ... [한국사회][한국]한국사회의 언론, 한국사회의 주요 갈등과 방송, 한국사회의 교육운동, 한국...
[한국사회][한국]한국사회의 언론, 한국사회의 주요 갈등과 방송, 한국사회의 교육운동, 한국... [홍익인간사상][한민족][통일교육][통일한국][세계화][남북통일][홍익인간]홍익인간사상과 한...
[홍익인간사상][한민족][통일교육][통일한국][세계화][남북통일][홍익인간]홍익인간사상과 한... [한국 근대교육][교육기관][교육사상가][근대교육]한국 근대교육의 의의, 한국 근대교육의 교...
[한국 근대교육][교육기관][교육사상가][근대교육]한국 근대교육의 의의, 한국 근대교육의 교... [민요교육][한국민요]민요교육(민요지도, 한국민요교육)의 의의, 민요교육(민요지도, 한국민...
[민요교육][한국민요]민요교육(민요지도, 한국민요교육)의 의의, 민요교육(민요지도, 한국민... 국악교육(한국전통음악지도)의 현실과 필요성, 국악교육(한국전통음악지도)의 민요지도, 장단...
국악교육(한국전통음악지도)의 현실과 필요성, 국악교육(한국전통음악지도)의 민요지도, 장단... [음악산업][대중음악][한국음악][미국음악][일본음악][음악][한국의 음악][미국의 음악][일본...
[음악산업][대중음악][한국음악][미국음악][일본음악][음악][한국의 음악][미국의 음악][일본... 정신건강(프로이드 정신분석이론과 방어기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신건강(프로이드 정신분석이론과 방어기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신장애]정신장애와 DSM-4(진단 및 통계편람), 정신장애와 약물중독, 정신장애와 건강교육,...
[정신장애]정신장애와 DSM-4(진단 및 통계편람), 정신장애와 약물중독, 정신장애와 건강교육,... [식민지역사, 한국 식민지역사, 인도 식민지역사, 아프리카 식민지역사, 말레이시아 식민지역...
[식민지역사, 한국 식민지역사, 인도 식민지역사, 아프리카 식민지역사, 말레이시아 식민지역... 정신위생운동과 지역사회정신건강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정신위생운동과 지역사회정신건강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한국사회문제4C)한국전쟁이나 냉전, 분단이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사회에서 일어나...
한국사회문제4C)한국전쟁이나 냉전, 분단이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사회에서 일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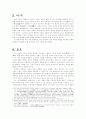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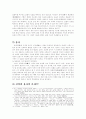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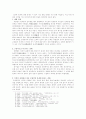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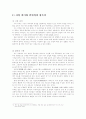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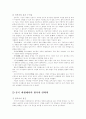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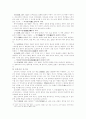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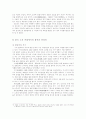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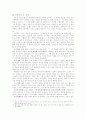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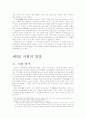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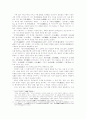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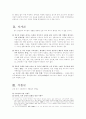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