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남명의 행장
2. 16세기 유학사상
3. 남명의 학풍
4. 남명의 학문의 출
5.남명정신과 의병활동
6. 남명의 출처관(出處觀)
2. 16세기 유학사상
3. 남명의 학풍
4. 남명의 학문의 출
5.남명정신과 의병활동
6. 남명의 출처관(出處觀)
본문내용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명도 선비가 비록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출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세상의 군자들이 출사하는 것은 큰 일을 해보려는 것이지만, 결국 실패하여 자신은 죽음을 당하고 그 화가 사람에까지 미치더라는 것은 바로 기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남명집} 정인홍찬 [행장])이라고 하여 앞서 정계에 진출하여 사화를 당한 사림들을 비판적인 눈으로 보았다. 기묘사화에는 사림의 종조로 추앙받는 조광조가 죽고 을사사화에는 남명과 친분이 깊던 이림 성우 곽순 송인수 등이 처형되었다. 이들이 적절치 못한 때에 출사함으로써 그들 개인의 재앙뿐만 아니라 사림의 위축을 가져왔다는 것이 남명의 평가였다.
남명이 출사를 기피하여 13번의 소명(召命) 가운데 단지 한번 응하여(명종 20년)에 명종을 배알하고 그것도 8일만에 물러난 것은 결코 남명이 도가적 은둔 사상을 가졌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그는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君子哉 遽伯玉 邦有道則仕 邦無道則可卷而懷也라는 공자의 말에 의거하였을 뿐이다. 당시의 상황을 출사하여서는 안되는 방무도의 시기로 인식하였을 뿐이며 때가 오면 언제든지 출사할 수 있도록 자신을 닦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이다.
남명이 이러한 판단에서 출사를 여러번 거부함으로써 조선의 선비들에게 출사에 있어 하나의 사표가 되었다. 나아가 산림의 처사들(遺逸)을 발탁해 씀에 있어 이들의 뜻을 펼 수 있도록 적절히 높은 지위를 주게 되었다. 산림처사로 臺官을 거쳐 相公에 이르는 자들이 이로 인해 생겨났다. 그 대표적 예가 來菴 鄭仁弘 송시열 허목 등이다.
note
남명학파가 지속되지 못하였던 이유는 남명의 문도였던 來庵 鄭仁弘이 인조반정때 정치적으로 패배하게 됨으로써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상우도의 경우도 17세기 이후에는 거의 퇴계학파 일색이 되었다.
학문내적인 원인을 찾자면 남명이 하학위주의 실천적 학풍을 확립하였으나 이후의 학문이 이론지향적으로 흘렀으며 한편으로는 남명의 학풍을 이단시하는 경향이 대두되었다. 퇴계는 \"曺楗仲의 사람됨에 대해서 평한 것은 실상에 부합되나 의리에 대해 논한 부분은 확실하지 않은 점이 있는 듯하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노장에 평이 들어서 우리 유학에 대해서는 힘써 배우는 것이 으레 깊지 않으니 그들이 우리 유학에 배해 밝고 확실치 못한 것을 어찌 이상하게 여길 것이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장점만을 마땅히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퇴계집} 권19 [答黃仲擧(戊午)])\"라고 하여 일찍이 남명의 학문적 성향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낸 바 있다. 정인홍은 이 글을 빌미로 광해군 3년 3월에 [晦退辯斥疏]를 올려 \"신이 젊어 조식을 섬겨 열어주고 이끌어주는 은혜를 중하게 입었으니 그를 섬김에 군사부일체의의리가 있고, 늦게 성운의 인정을 받아 마음을 열고 허여하여 후배로 보지 않았는데, 의리는 비록 경중이 있으나 두 분 모두가 스승이라 하겠습니다. 신이 일찍이 故贊成 李滉이 조식을 비방한 것을 보았는데 하나는 상대에게 오만하고 세상을 경멸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높고 뻗뻗한 선비는 中道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장을 숭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성운에 대해서는 淸隱이라 지목하여 한 조각의 작은 절개를 지키는 사람으로 인식하였습니다.\"라고 하고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여야 한다는 소를 올리게 된다.
그러나 광해군이 물러나고 북인정권의 영수였던 정인홍이 역적으로 몰리자 남명학파의 후원 세력이 없어졌다. 이후 이황과 율곡 중심의 학계의 편성이 이루어지자 남명의 학문적 경향은 理學的 깊이에 대한 의심, 老莊에 몰두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웠다.
남명도 선비가 비록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출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세상의 군자들이 출사하는 것은 큰 일을 해보려는 것이지만, 결국 실패하여 자신은 죽음을 당하고 그 화가 사람에까지 미치더라는 것은 바로 기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남명집} 정인홍찬 [행장])이라고 하여 앞서 정계에 진출하여 사화를 당한 사림들을 비판적인 눈으로 보았다. 기묘사화에는 사림의 종조로 추앙받는 조광조가 죽고 을사사화에는 남명과 친분이 깊던 이림 성우 곽순 송인수 등이 처형되었다. 이들이 적절치 못한 때에 출사함으로써 그들 개인의 재앙뿐만 아니라 사림의 위축을 가져왔다는 것이 남명의 평가였다.
남명이 출사를 기피하여 13번의 소명(召命) 가운데 단지 한번 응하여(명종 20년)에 명종을 배알하고 그것도 8일만에 물러난 것은 결코 남명이 도가적 은둔 사상을 가졌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그는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君子哉 遽伯玉 邦有道則仕 邦無道則可卷而懷也라는 공자의 말에 의거하였을 뿐이다. 당시의 상황을 출사하여서는 안되는 방무도의 시기로 인식하였을 뿐이며 때가 오면 언제든지 출사할 수 있도록 자신을 닦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이다.
남명이 이러한 판단에서 출사를 여러번 거부함으로써 조선의 선비들에게 출사에 있어 하나의 사표가 되었다. 나아가 산림의 처사들(遺逸)을 발탁해 씀에 있어 이들의 뜻을 펼 수 있도록 적절히 높은 지위를 주게 되었다. 산림처사로 臺官을 거쳐 相公에 이르는 자들이 이로 인해 생겨났다. 그 대표적 예가 來菴 鄭仁弘 송시열 허목 등이다.
note
남명학파가 지속되지 못하였던 이유는 남명의 문도였던 來庵 鄭仁弘이 인조반정때 정치적으로 패배하게 됨으로써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상우도의 경우도 17세기 이후에는 거의 퇴계학파 일색이 되었다.
학문내적인 원인을 찾자면 남명이 하학위주의 실천적 학풍을 확립하였으나 이후의 학문이 이론지향적으로 흘렀으며 한편으로는 남명의 학풍을 이단시하는 경향이 대두되었다. 퇴계는 \"曺楗仲의 사람됨에 대해서 평한 것은 실상에 부합되나 의리에 대해 논한 부분은 확실하지 않은 점이 있는 듯하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노장에 평이 들어서 우리 유학에 대해서는 힘써 배우는 것이 으레 깊지 않으니 그들이 우리 유학에 배해 밝고 확실치 못한 것을 어찌 이상하게 여길 것이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장점만을 마땅히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퇴계집} 권19 [答黃仲擧(戊午)])\"라고 하여 일찍이 남명의 학문적 성향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낸 바 있다. 정인홍은 이 글을 빌미로 광해군 3년 3월에 [晦退辯斥疏]를 올려 \"신이 젊어 조식을 섬겨 열어주고 이끌어주는 은혜를 중하게 입었으니 그를 섬김에 군사부일체의의리가 있고, 늦게 성운의 인정을 받아 마음을 열고 허여하여 후배로 보지 않았는데, 의리는 비록 경중이 있으나 두 분 모두가 스승이라 하겠습니다. 신이 일찍이 故贊成 李滉이 조식을 비방한 것을 보았는데 하나는 상대에게 오만하고 세상을 경멸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높고 뻗뻗한 선비는 中道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장을 숭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성운에 대해서는 淸隱이라 지목하여 한 조각의 작은 절개를 지키는 사람으로 인식하였습니다.\"라고 하고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여야 한다는 소를 올리게 된다.
그러나 광해군이 물러나고 북인정권의 영수였던 정인홍이 역적으로 몰리자 남명학파의 후원 세력이 없어졌다. 이후 이황과 율곡 중심의 학계의 편성이 이루어지자 남명의 학문적 경향은 理學的 깊이에 대한 의심, 老莊에 몰두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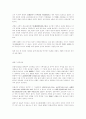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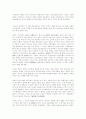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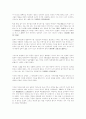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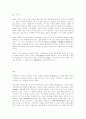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