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말
2. 니체 형이상학 비판의 이해를 위한 고찰
1)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2) 딜타이의 형이상학
3. 니체의 형이상학 비판
1) 전통적 가치규범으로서의 형이상학
2) 형이상학비판은 과학비판이라는 등식
4. 맺음말
*한글 97입니다.
2. 니체 형이상학 비판의 이해를 위한 고찰
1)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2) 딜타이의 형이상학
3. 니체의 형이상학 비판
1) 전통적 가치규범으로서의 형이상학
2) 형이상학비판은 과학비판이라는 등식
4. 맺음말
*한글 97입니다.
본문내용
인식자, 우리들 배후 신을 헛되이Gottlosen 하는 반형이상학자들도, 일천년에 걸친 오랜 신앙이, 즉 신은 진리이며 진리는 신적이다라고 하는 플라톤의 신앙이기도 했던 저 기독교의 신앙으로 인해 타올랐던 횃불Brande로부터, 우리들의 불Feuer을 획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니체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과학의 입장에서 볼 때 배후의 신을 경멸하고자 하는 반형이상학자들의 의도조차도 늘 형이상학적 잔재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이상학적 잔재는, 형이상학비판이 동시에 과학비판이기도 하다는 관점으로부터 비로소 이해되는 것이다.
4. 맺음말
형이상학에 대한 니체의 비판을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서 고찰해보았다. 이하에서는 이때까지의 고찰을 근본으로 삼아 그의 형이상학비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봄으로써 이상의 논의를 맺고자 한다. 과학이 형이상학으로 대체되는 사태는, 신·일자·절대자 등으로 상정되는 형이상학의 가치규범을 붕괴하고서 그것을 과학의 논리성, 엄밀성이 규범으로 대체하는 사태로 이해된다. 그러나 니체는 과학의 입장에 서있는 것처럼 형이상학의 가치규범의 상실을 인정하면서도, 가치규범에 대한 과학의 대체현상을 부정한다. 이러한 형이상학의 규범성을 부정하고, 동시에 그것과 대체되는 과학의 규범성을 주장하는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과연 니체는 가치규범의 상실을 수긍하는 것일까?
이런 점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형이상학과 과학이 궁극적 근거의 영역에서 지평을 구획하고자 한 사실을 니체가 강력하게 비판한 점을 생각해내지 않을 수 없다. 앞선 고찰로부터 명확해진 바와 같이, 그는 궁극적 근거의 영역을 문제삼을 필요가 없는 영역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통찰해야하는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즉 형이상학이나 과학과 같이, 궁극적 근거의 영역에서 확실성을 찾아내는 것을 스스로의 전제로 삼았던 방식은, 단지 이 영역에서 눈을 떼버렸던 것이지, 진실로 통찰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궁극적 근거의 영역을 세계관의 영역이라고 말한다면, 형이상학에서 과학으로 대체된다고 하는 사태는, 형이상학으로부터 과학이라는 세계관의 교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니체는 이 형이상학으로부터 과학이라는 세계관의 교체를, 세계관의 진정한 교체와 전환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형이상학으로부터 과학에의 교체는, 그것들이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지적으로부터 명확한 바와 같이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교체에 다름 아니다. 즉 이것은 형이상학과 과학이, 서로 우위성을 따질 수 없는 상대적인 세계관임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형이상학 비판을 통해서 밝혀졌던 것은, 형이상학과 과학의 근본에서 전개되는 세계관의 상대적인 교체에 대한 비판이며, 여타의 어떠한 세계관도, 그것이 단지 형이상학과 과학으로서 대체된 것인 한 세계관의 상대적 교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의 상대적 교체에 있는 한, 궁극적 근거의 영역이라고 하는 심연에 빠져, 그 심연을 제대로 통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과연 니체 자신은 이 세계관의 상대적인 교체라는 굴레를 면하게 되는 새로운 세계관―궁극적 근거의 영역을 제대로 통찰하려는―을 세웠던 것일까? 또한 상실된 가치규범을 새로이 상정한 것일까? 확실히 여기서 우리의 논의는 이 문제에 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것은 그의 중심사상―초인과 힘에의 의지, 운명애(Amor fati), 영원회귀―에로까지 나아감으로써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니체의 형이상학비판을 고찰함으로써 얻어진 이 관점이 장차 전개될 우리의 논의에 하나의 교두보가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서 니체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과학의 입장에서 볼 때 배후의 신을 경멸하고자 하는 반형이상학자들의 의도조차도 늘 형이상학적 잔재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이상학적 잔재는, 형이상학비판이 동시에 과학비판이기도 하다는 관점으로부터 비로소 이해되는 것이다.
4. 맺음말
형이상학에 대한 니체의 비판을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서 고찰해보았다. 이하에서는 이때까지의 고찰을 근본으로 삼아 그의 형이상학비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봄으로써 이상의 논의를 맺고자 한다. 과학이 형이상학으로 대체되는 사태는, 신·일자·절대자 등으로 상정되는 형이상학의 가치규범을 붕괴하고서 그것을 과학의 논리성, 엄밀성이 규범으로 대체하는 사태로 이해된다. 그러나 니체는 과학의 입장에 서있는 것처럼 형이상학의 가치규범의 상실을 인정하면서도, 가치규범에 대한 과학의 대체현상을 부정한다. 이러한 형이상학의 규범성을 부정하고, 동시에 그것과 대체되는 과학의 규범성을 주장하는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과연 니체는 가치규범의 상실을 수긍하는 것일까?
이런 점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형이상학과 과학이 궁극적 근거의 영역에서 지평을 구획하고자 한 사실을 니체가 강력하게 비판한 점을 생각해내지 않을 수 없다. 앞선 고찰로부터 명확해진 바와 같이, 그는 궁극적 근거의 영역을 문제삼을 필요가 없는 영역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통찰해야하는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즉 형이상학이나 과학과 같이, 궁극적 근거의 영역에서 확실성을 찾아내는 것을 스스로의 전제로 삼았던 방식은, 단지 이 영역에서 눈을 떼버렸던 것이지, 진실로 통찰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궁극적 근거의 영역을 세계관의 영역이라고 말한다면, 형이상학에서 과학으로 대체된다고 하는 사태는, 형이상학으로부터 과학이라는 세계관의 교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니체는 이 형이상학으로부터 과학이라는 세계관의 교체를, 세계관의 진정한 교체와 전환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형이상학으로부터 과학에의 교체는, 그것들이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지적으로부터 명확한 바와 같이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교체에 다름 아니다. 즉 이것은 형이상학과 과학이, 서로 우위성을 따질 수 없는 상대적인 세계관임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형이상학 비판을 통해서 밝혀졌던 것은, 형이상학과 과학의 근본에서 전개되는 세계관의 상대적인 교체에 대한 비판이며, 여타의 어떠한 세계관도, 그것이 단지 형이상학과 과학으로서 대체된 것인 한 세계관의 상대적 교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의 상대적 교체에 있는 한, 궁극적 근거의 영역이라고 하는 심연에 빠져, 그 심연을 제대로 통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과연 니체 자신은 이 세계관의 상대적인 교체라는 굴레를 면하게 되는 새로운 세계관―궁극적 근거의 영역을 제대로 통찰하려는―을 세웠던 것일까? 또한 상실된 가치규범을 새로이 상정한 것일까? 확실히 여기서 우리의 논의는 이 문제에 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것은 그의 중심사상―초인과 힘에의 의지, 운명애(Amor fati), 영원회귀―에로까지 나아감으로써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니체의 형이상학비판을 고찰함으로써 얻어진 이 관점이 장차 전개될 우리의 논의에 하나의 교두보가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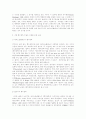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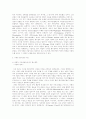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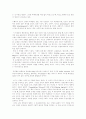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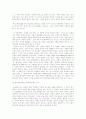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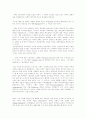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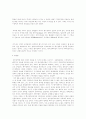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