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마산포의 개항과 각국 공동조계 설정
1. 강화도 조약과 조선의 개항
2. 개항 이전의 마산포
3. 마산포의 개항
4. 각국 공동조계(租界)의 설치
Ⅱ. 노일 양국의 단독조계 설정과 조계의 추이
1. 러시아의 단독조계 추진
2. 일본 단독조계의 설정
3. 노일전쟁 이후 조계의 변질
4. 식민시 마산의 등장
Ⅲ. 마산지역의 반외세 투쟁
1. 곡물의 대일유출과 반외세 투쟁
2. 마산포 구강장 수호운동
3. 해안매축권 확보투쟁
4. 마산민의소의 설립과 항일민족운동
Ⅰ. 마산포의 개항과 각국 공동조계 설정
1. 강화도 조약과 조선의 개항
2. 개항 이전의 마산포
3. 마산포의 개항
4. 각국 공동조계(租界)의 설치
Ⅱ. 노일 양국의 단독조계 설정과 조계의 추이
1. 러시아의 단독조계 추진
2. 일본 단독조계의 설정
3. 노일전쟁 이후 조계의 변질
4. 식민시 마산의 등장
Ⅲ. 마산지역의 반외세 투쟁
1. 곡물의 대일유출과 반외세 투쟁
2. 마산포 구강장 수호운동
3. 해안매축권 확보투쟁
4. 마산민의소의 설립과 항일민족운동
본문내용
민중들의 일본제국주의 침탈에 대한 항쟁으로 구마산의 매축권 확보운동을 들 수 있다.
개항 당시만 하여도 마산포는 급경사의 산록 아래에 있는 네 군데의 선창을 중심으로 민가가 밀집되어 있었다. 더욱이 선창은 모두 자연적 조건을 이용해 만든 곳이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하고 바다 수심도 얕아 하역하거나 선적하는데에 많은 불편이 따랐다. 이같은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東城里 주민 金敬悳이 창원감리 앞으로 \"西城里에서 午山里에 이르는 漲灘(물이 들면 바다가 되고 물이 나면 육지가 되는 해안)의 50把(1파는 양팔을 벌린 한발의 거리)앞에 방죽을 쌓아 선박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 선창에 늘어서 있는 노점상들의 혼란을 줄여 본항의 상업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는 취지의 청원서를 제출하여 1899년 10월 매립허가를 받았다. 오직 농사나 어로 · 수렵 또는 상업 등 주어진 조건 이외에 다른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던 당시에 일반 백성으로 근대적 항만건설의 기틀이 되는 해안매축사업을 착안했다는 것은 진일보한 안목이었다.
그러나 일본상인 弘淸三에게 차용한 매판성 자금으로 매축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그 뒤 김경덕이 사망하자 매축권을 놓고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었다. 매축자금으로 1만 5천냥을 대부하였던 弘淸은 차용증서를 증거로 창원감리로부터 매축허가권을 얻어 냈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게 중앙정부가 창원감리에게 매축허가권 취소지시를 내려 허가가 취소되었다. 이에 弘淸은 계속 매축권 이전을 위해 통감부로 하여금 조선정부에 압력을 가하게 하고 1906년 4월 마산일본영사관의 이사관을 통하여 재차 창원서를 제출하여 감리의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10월 경 중앙정부는 재차 취소 지령을 내려 양국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다. 그런데 매축의 대상의 되었던 西城선창에서 午山선창에 이르는 일대는 당시 마산포의 수천 가구 주민의 생업과 관련된 지역이었으므로 일본인의 매축허가권 청원을 알게 된 항민들은 생존권 수호라는 차원에서 격렬히 항거하게 되었다. 이미 구마산 배후 일대의 토지가 모두 철도와 군용지로 일제에 의해 강제수용을 당해 생업을 이을 수 있는 곳은 이 일대 밖에 없었다. 따라서 지역민들은 힘을 모아 자금을 출자하고 구마산포의 매축을 자신들의 힘으로 하기로 하고 공동매축을 위한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끝내 일제에 의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구마산포 매축권 소유를 둘러싼 대립은 단순한 매립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산포 선창의 상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 제국주의 침탈에 대항한 반제운동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미 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을 보호국화시킨 일제가 조선인의 매축운동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후 매축권은 청원서를 제출한지 1년 4개월만에 끝내 국권이 일제에 의해 강탈당함으로써 일본인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러나 해안매축권 확보투쟁이 계기가 되어 구마산 어시장에는 일본 상인들이 오래도록 발을 붙이지 못하였다.
4. 마산민의소의 설립과 항일민족운동
해안매축권 확보투쟁에서 결집된 항민들의 역량은 1908년 설립한 馬山民議所 설립으로 이어졌다. 마산민의소는 港民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주적 이권옹호기관으로 당시 서울의 靑年會館에 버금가는 마산 유일의 公會堂 건물7)을 소유한 항민자치단체였다. 민의소는 마산항민의 외세에 대한 투쟁의 과정에서 자생적 단체로 한일합방 이후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민의소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金明奎 ·金鍾信 · 彭三辰 ·李廷讚 등 많은 인사들은 이후 마산지역의 항일민족운동에 앞장서서 투쟁하였으며, 민의소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공회당은 주민의 이해관계와 대소의 사회문제 · 민족문제 등을 논의하는 청년들의 토론장으로 또는 외래 인사들의 강연장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밖에 의미있는 반일 저항으로 1904년 2월에 발생한 마산포 주재 일본영사관 소속 경찰 境益太郞(합방 이후 초대 마산경찰서장) 습격사건이 있었다. 일인 경찰 境益太郞이 낙동강 하류로 수렵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창원군 內西面 근처의 조선인 민가에 투숙했다가 밤중에 10여 명의 조선인의 기습을 받아 갖고 있던 엽총·탄환·행장 등을 빼앗기고 칼로 난자당해 빈사상태에 빠진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당시 전국적인 반일감정의 팽배 및 의병항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9명이 체포되어 전원 강도모살죄로 사형판결을 받고 야만적인 죽음을 당하였다.
이외에도 외국인에 대한 토지불매동맹결성(1899) · 마산사립일어학교 설립에 대한 반대와 폐쇄(1899년) · 일본인의 광산이권 침탈에 대한 항거(1901년) · 조선인 학대에 대한 집단적 봉기와 대일본인 투쟁(1902년) ·紳商會社(상인에 대한 중간착취기관) 혁파를 위한 구마산 상인들의 투쟁(1904) · 일본군의 병참수송 부역거부운동(1904) ·거제도 송진에서의 일본군 방비공사 인부들의 항거(1904) · 일본 율구미 노국조차지매수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1909)등 외세의 침략에 대한 민중들의 반침략투쟁은 합방 이전부터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산지역은 조선후기 이래 발전하고 있던 상품화폐경제를 배경으로 성장한 지역으로서 개항 이전부터 반봉건항쟁이 고양되었던 곳이다. 이같은 항쟁은 개항 이후 마산의 경제적 군사적 중요성으로 외세의 침략이 강화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개항 초기 일제가 부산항을 중시하여 마산의 전국 상권에서의 중심적 역할이 점차 부산으로 이동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산은 서부경남의 각종 물산의 집산지로서의 역할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또한 노일간의 군사적 대립의 요충지로서 이권확보투쟁이 격렬히 전개되었다. 따라서 한일합방 이전부터 이미 마산은 제국주의 침략의 마수가 강하게 뻗친 지역이었다. 이에 마산지역 민중 항쟁은 반봉건항쟁과 더불어 반제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항일투쟁·민주화투쟁 등 마산지역의 근대변혁운동의 토대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7) 1908년에 건립된 이 건물은 현재 마산시 시민극장 위치에 자리하였었다.
개항 당시만 하여도 마산포는 급경사의 산록 아래에 있는 네 군데의 선창을 중심으로 민가가 밀집되어 있었다. 더욱이 선창은 모두 자연적 조건을 이용해 만든 곳이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하고 바다 수심도 얕아 하역하거나 선적하는데에 많은 불편이 따랐다. 이같은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東城里 주민 金敬悳이 창원감리 앞으로 \"西城里에서 午山里에 이르는 漲灘(물이 들면 바다가 되고 물이 나면 육지가 되는 해안)의 50把(1파는 양팔을 벌린 한발의 거리)앞에 방죽을 쌓아 선박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 선창에 늘어서 있는 노점상들의 혼란을 줄여 본항의 상업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는 취지의 청원서를 제출하여 1899년 10월 매립허가를 받았다. 오직 농사나 어로 · 수렵 또는 상업 등 주어진 조건 이외에 다른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던 당시에 일반 백성으로 근대적 항만건설의 기틀이 되는 해안매축사업을 착안했다는 것은 진일보한 안목이었다.
그러나 일본상인 弘淸三에게 차용한 매판성 자금으로 매축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그 뒤 김경덕이 사망하자 매축권을 놓고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었다. 매축자금으로 1만 5천냥을 대부하였던 弘淸은 차용증서를 증거로 창원감리로부터 매축허가권을 얻어 냈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게 중앙정부가 창원감리에게 매축허가권 취소지시를 내려 허가가 취소되었다. 이에 弘淸은 계속 매축권 이전을 위해 통감부로 하여금 조선정부에 압력을 가하게 하고 1906년 4월 마산일본영사관의 이사관을 통하여 재차 창원서를 제출하여 감리의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10월 경 중앙정부는 재차 취소 지령을 내려 양국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다. 그런데 매축의 대상의 되었던 西城선창에서 午山선창에 이르는 일대는 당시 마산포의 수천 가구 주민의 생업과 관련된 지역이었으므로 일본인의 매축허가권 청원을 알게 된 항민들은 생존권 수호라는 차원에서 격렬히 항거하게 되었다. 이미 구마산 배후 일대의 토지가 모두 철도와 군용지로 일제에 의해 강제수용을 당해 생업을 이을 수 있는 곳은 이 일대 밖에 없었다. 따라서 지역민들은 힘을 모아 자금을 출자하고 구마산포의 매축을 자신들의 힘으로 하기로 하고 공동매축을 위한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끝내 일제에 의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구마산포 매축권 소유를 둘러싼 대립은 단순한 매립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산포 선창의 상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 제국주의 침탈에 대항한 반제운동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미 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을 보호국화시킨 일제가 조선인의 매축운동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후 매축권은 청원서를 제출한지 1년 4개월만에 끝내 국권이 일제에 의해 강탈당함으로써 일본인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러나 해안매축권 확보투쟁이 계기가 되어 구마산 어시장에는 일본 상인들이 오래도록 발을 붙이지 못하였다.
4. 마산민의소의 설립과 항일민족운동
해안매축권 확보투쟁에서 결집된 항민들의 역량은 1908년 설립한 馬山民議所 설립으로 이어졌다. 마산민의소는 港民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주적 이권옹호기관으로 당시 서울의 靑年會館에 버금가는 마산 유일의 公會堂 건물7)을 소유한 항민자치단체였다. 민의소는 마산항민의 외세에 대한 투쟁의 과정에서 자생적 단체로 한일합방 이후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민의소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金明奎 ·金鍾信 · 彭三辰 ·李廷讚 등 많은 인사들은 이후 마산지역의 항일민족운동에 앞장서서 투쟁하였으며, 민의소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공회당은 주민의 이해관계와 대소의 사회문제 · 민족문제 등을 논의하는 청년들의 토론장으로 또는 외래 인사들의 강연장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밖에 의미있는 반일 저항으로 1904년 2월에 발생한 마산포 주재 일본영사관 소속 경찰 境益太郞(합방 이후 초대 마산경찰서장) 습격사건이 있었다. 일인 경찰 境益太郞이 낙동강 하류로 수렵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창원군 內西面 근처의 조선인 민가에 투숙했다가 밤중에 10여 명의 조선인의 기습을 받아 갖고 있던 엽총·탄환·행장 등을 빼앗기고 칼로 난자당해 빈사상태에 빠진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당시 전국적인 반일감정의 팽배 및 의병항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9명이 체포되어 전원 강도모살죄로 사형판결을 받고 야만적인 죽음을 당하였다.
이외에도 외국인에 대한 토지불매동맹결성(1899) · 마산사립일어학교 설립에 대한 반대와 폐쇄(1899년) · 일본인의 광산이권 침탈에 대한 항거(1901년) · 조선인 학대에 대한 집단적 봉기와 대일본인 투쟁(1902년) ·紳商會社(상인에 대한 중간착취기관) 혁파를 위한 구마산 상인들의 투쟁(1904) · 일본군의 병참수송 부역거부운동(1904) ·거제도 송진에서의 일본군 방비공사 인부들의 항거(1904) · 일본 율구미 노국조차지매수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1909)등 외세의 침략에 대한 민중들의 반침략투쟁은 합방 이전부터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산지역은 조선후기 이래 발전하고 있던 상품화폐경제를 배경으로 성장한 지역으로서 개항 이전부터 반봉건항쟁이 고양되었던 곳이다. 이같은 항쟁은 개항 이후 마산의 경제적 군사적 중요성으로 외세의 침략이 강화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개항 초기 일제가 부산항을 중시하여 마산의 전국 상권에서의 중심적 역할이 점차 부산으로 이동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산은 서부경남의 각종 물산의 집산지로서의 역할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또한 노일간의 군사적 대립의 요충지로서 이권확보투쟁이 격렬히 전개되었다. 따라서 한일합방 이전부터 이미 마산은 제국주의 침략의 마수가 강하게 뻗친 지역이었다. 이에 마산지역 민중 항쟁은 반봉건항쟁과 더불어 반제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항일투쟁·민주화투쟁 등 마산지역의 근대변혁운동의 토대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7) 1908년에 건립된 이 건물은 현재 마산시 시민극장 위치에 자리하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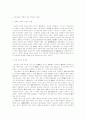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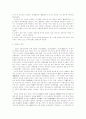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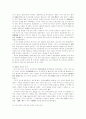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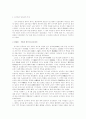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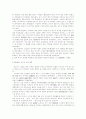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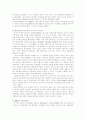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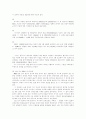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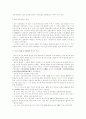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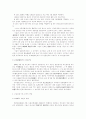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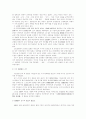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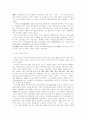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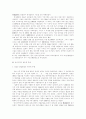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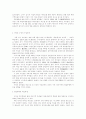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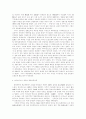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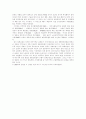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