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담의 사적 연구
2. 시가와 설화
2. 시가와 설화
본문내용
퍼뜨리는 시가이다. 따라서 시가의 원작자는 예언적 성격에 의탁하여 민심의 동요를 노리게 되고, 그 의미 해독에는 흔히 수수께끼 풀기와 같은 지혜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 참요의 후대적인 전승에는 그것을 있게 한 배경적인 설화가 병행하기 마련이다. 참요 역시 백제 무왕의 「서동요」, 신라 元曉의 「沒柯斧歌」를 비롯하여, 조선조말의 \'파랑새謠\'에 이르기까지 매우 면면한 전통을 지녔다.
『고려사』 악지 및 고려말의 益齋 및 及庵의 「小樂府」를 종합해 보면 「長岩」 . 「居士戀」 . 「濟危寶」 . 「沙里花」 . 「處容」 . 「五冠山」 . 「水精寺」 . 「北風船」 . 「月精花」 . 「安東紫靑」 . 「三藏」(雙花店) 따위의 설화-시가적 작품들을 끄집어 낼 수가 있다. 이들 諸시가가 \'중국\'의 \'악부\'처럼 \'해동\'의 \'소악부\'로서 채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민요로서의 성격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이들 작품 속에는 민중들의 감정이나 생활 모습이 솔직하게 담겨져 있을 터이다. 그러나 원래의 시가는 지배자 혹은 지식인에 의한 굴절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변개가 이루어진 듯하니, 「濟危寶」나 「安東紫靑」의 경우처럼, 『고려사』 악지의 기록과 「소악부」에 실려 있는 한역 시가의 내용이 상반된 듯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고려사』 악지의 기록에는 다분히 儒者들의 도덕적 관점에서 시가가 해석되고 있는 데 비하여 「소악부」의 작품 내용에는 인간의 자유스런 감정의 流露가 비교적 솔직히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 李佑成, \"고려 말기의 「小樂府」,\" 『韓國古典文學의 原典批評』 (새문社, 1990), pp. 88-89 참조.
설화-시가의 맥락에서 보면 악지의 그러한 해석 태도가 얼마나 작위적인가 함은 금방 감지될 수 있는 것이다.
문학사의 발달에 있어서 후대에 이를수록 장르의 세분화 혹은 산문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설화-시가의 분리 양상이 현저해짐은 자연스런 추세였다. 조선조에 들어 이런 현상은 두드러졌는데, 그렇다고 하여 설화-시가 양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우선 시조 장르에 있어 그러한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설화-시가의 틀을 지닌 시조들에서 설화를 제외한 시가만이 따로 전승되었을 경우와 설화와 시가가 함께 전승되었을 경우를 가상해 본다면, 그 생명력의 차이는 자명한 것이 아닐까 한다. 가령 王邦衍이나 洪娘의 시조들은 각각 그들의 군주에 대한 충정이나 연인에 대한 열정 등과 관련된 설화의 뜻을 알고 있을 때 더욱 감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시조장르에서는 이같은 설화-시가의 형식이 적용될 수 있는 작품들의 수가 前代에 비하여는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시조 장르가 전성기에 달하게 되는 조선조 중반기에는 이미 산문과 운문의 분리현상이 뚜렷해진 때문이겠다.
가사 장르에 있어서 설화-시가 형식의 이용은 대충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첫째는 일부의 내방가사처럼 설화적 내용이 가사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형식은 시가 형식을 빌되 내용은 설화를 넘어 소설적인 것으로 발전하기까지 한다. 「괴똥어미전」이나 「고독각씨전」은 그러한 예일 것이다. 다음 둘째는 이른바 삽입가사라 일컫는 것을 들 수 있겠는데, 이것은 설화적 내용 속에 가사가 삽입되는 것이다. 이 경우 \'설화적 내용\'이란 단순한 \'민간설화\'의 차원을 넘어서, 협의의 설화뿐만 아니라 소설 같은 광의의 \'이야기문학\' 전반을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춘향전」이나 「조웅전」 등에서의 삽입가사를 예거할 수 있겠다. 셋째는 둘째와는 대조적으로 가사 속에 일부의 설화가 개재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대체로 故事 차용시에 흔히 나타나는 예들이다.
구비문학 속의 설화-시가 양식도 위의 기록문학상의 제반 양상과 별 큰 차는 없다. 민요에서는 서사민요나 \'이야기謠\'라는 것이 있었고, 무가에도 서사무가 같은 것이 있어서, 기록문학에 비하여 오히려 설화-시가의 틀을 잘 유지하여 왔다. 일찍이 孫晉泰선생은 嚴弼鎭의 『朝鮮童謠集』에서 「三年啞婦」 설화가 민요화한 예를 인용한 바 있거니와
) 손진태, 『朝鮮民族說話의 硏究』 (乙酉文化社, 1947), pp. 150-154.
, 필자의 경험에도 충북지방의 현지조사시에 「쥐설화」를 노래로 불러준 이야기꾼을 만났던 일이 있다. 또한 임석재선생의 『옛날이야기선집』에는 「녹두영감」 . 「빈대와 이와 벼룩과 모기」 . 「장자못과 며느리 바위」 (이상 권 1) . 「우렁이 속에서 나온 색시」 . 「구렁덩덩 신선비」 (권 2) . 「꼬마신랑」 . 「꼭둑각시와 요술병」 . 「수양버들잎과 연엽이」 . 「문도령과 자청비」 (권 3) 등을 보면,
) 임석재엮음, 『옛날이야기선집 (우리나라)』, 전 5책 (교학사, 1971).
설화 속에 시가가 삽입되어 예들을 풍부히 볼 수 있다. 물론 同書는 동화집이라는 성격상 흥미를 提高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편자 임의로 설화 속에 시가를 창작 삽입시켰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간행된 다른 설화집에도 이런 예들은 더러 눈에 띄고, 이런 예를 매우 풍부히 보여주고 있는 『그림설화집』의 경우까지를 참작하면, 운문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의 설화에는 오히려 이같은 형식이 더 보편적이었으리라고도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가-시가의 형태는 오랜 세월을 걸쳐 다양한 장르들에서 이용되어져 온 문학적 형식이다. 이제까지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화-시가 형식의 기원은 근본적으로 과거의 구비문학적 전통 및 詩.歌의 미분리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설화-시가의 해석시에는 양자를 분리시켜 논의하기보다는 설화적 문맥 속에서 시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설화-시가의 형식은 서사와 시가가 반복되는 형태, 서사적 내용은 시가로 읊어내는 형태, 서사의 틀 속에 시가가 내포되든가, 혹은 시가에 설명적 설화가 부가되는 형태 등으로 나타나며; 셋째, 문학사의 주류가 구비문학에서 기록문학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설화-시가의 형식이 약화되어 갔고, 나아가 국문학의 각 장르에 걸쳐 나타나는 설화-시가의 면모 및 문제점들에 대하여 약술하여 보았다.
『고려사』 악지 및 고려말의 益齋 및 及庵의 「小樂府」를 종합해 보면 「長岩」 . 「居士戀」 . 「濟危寶」 . 「沙里花」 . 「處容」 . 「五冠山」 . 「水精寺」 . 「北風船」 . 「月精花」 . 「安東紫靑」 . 「三藏」(雙花店) 따위의 설화-시가적 작품들을 끄집어 낼 수가 있다. 이들 諸시가가 \'중국\'의 \'악부\'처럼 \'해동\'의 \'소악부\'로서 채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민요로서의 성격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이들 작품 속에는 민중들의 감정이나 생활 모습이 솔직하게 담겨져 있을 터이다. 그러나 원래의 시가는 지배자 혹은 지식인에 의한 굴절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변개가 이루어진 듯하니, 「濟危寶」나 「安東紫靑」의 경우처럼, 『고려사』 악지의 기록과 「소악부」에 실려 있는 한역 시가의 내용이 상반된 듯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고려사』 악지의 기록에는 다분히 儒者들의 도덕적 관점에서 시가가 해석되고 있는 데 비하여 「소악부」의 작품 내용에는 인간의 자유스런 감정의 流露가 비교적 솔직히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 李佑成, \"고려 말기의 「小樂府」,\" 『韓國古典文學의 原典批評』 (새문社, 1990), pp. 88-89 참조.
설화-시가의 맥락에서 보면 악지의 그러한 해석 태도가 얼마나 작위적인가 함은 금방 감지될 수 있는 것이다.
문학사의 발달에 있어서 후대에 이를수록 장르의 세분화 혹은 산문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설화-시가의 분리 양상이 현저해짐은 자연스런 추세였다. 조선조에 들어 이런 현상은 두드러졌는데, 그렇다고 하여 설화-시가 양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우선 시조 장르에 있어 그러한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설화-시가의 틀을 지닌 시조들에서 설화를 제외한 시가만이 따로 전승되었을 경우와 설화와 시가가 함께 전승되었을 경우를 가상해 본다면, 그 생명력의 차이는 자명한 것이 아닐까 한다. 가령 王邦衍이나 洪娘의 시조들은 각각 그들의 군주에 대한 충정이나 연인에 대한 열정 등과 관련된 설화의 뜻을 알고 있을 때 더욱 감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시조장르에서는 이같은 설화-시가의 형식이 적용될 수 있는 작품들의 수가 前代에 비하여는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시조 장르가 전성기에 달하게 되는 조선조 중반기에는 이미 산문과 운문의 분리현상이 뚜렷해진 때문이겠다.
가사 장르에 있어서 설화-시가 형식의 이용은 대충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첫째는 일부의 내방가사처럼 설화적 내용이 가사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형식은 시가 형식을 빌되 내용은 설화를 넘어 소설적인 것으로 발전하기까지 한다. 「괴똥어미전」이나 「고독각씨전」은 그러한 예일 것이다. 다음 둘째는 이른바 삽입가사라 일컫는 것을 들 수 있겠는데, 이것은 설화적 내용 속에 가사가 삽입되는 것이다. 이 경우 \'설화적 내용\'이란 단순한 \'민간설화\'의 차원을 넘어서, 협의의 설화뿐만 아니라 소설 같은 광의의 \'이야기문학\' 전반을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춘향전」이나 「조웅전」 등에서의 삽입가사를 예거할 수 있겠다. 셋째는 둘째와는 대조적으로 가사 속에 일부의 설화가 개재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대체로 故事 차용시에 흔히 나타나는 예들이다.
구비문학 속의 설화-시가 양식도 위의 기록문학상의 제반 양상과 별 큰 차는 없다. 민요에서는 서사민요나 \'이야기謠\'라는 것이 있었고, 무가에도 서사무가 같은 것이 있어서, 기록문학에 비하여 오히려 설화-시가의 틀을 잘 유지하여 왔다. 일찍이 孫晉泰선생은 嚴弼鎭의 『朝鮮童謠集』에서 「三年啞婦」 설화가 민요화한 예를 인용한 바 있거니와
) 손진태, 『朝鮮民族說話의 硏究』 (乙酉文化社, 1947), pp. 150-154.
, 필자의 경험에도 충북지방의 현지조사시에 「쥐설화」를 노래로 불러준 이야기꾼을 만났던 일이 있다. 또한 임석재선생의 『옛날이야기선집』에는 「녹두영감」 . 「빈대와 이와 벼룩과 모기」 . 「장자못과 며느리 바위」 (이상 권 1) . 「우렁이 속에서 나온 색시」 . 「구렁덩덩 신선비」 (권 2) . 「꼬마신랑」 . 「꼭둑각시와 요술병」 . 「수양버들잎과 연엽이」 . 「문도령과 자청비」 (권 3) 등을 보면,
) 임석재엮음, 『옛날이야기선집 (우리나라)』, 전 5책 (교학사, 1971).
설화 속에 시가가 삽입되어 예들을 풍부히 볼 수 있다. 물론 同書는 동화집이라는 성격상 흥미를 提高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편자 임의로 설화 속에 시가를 창작 삽입시켰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간행된 다른 설화집에도 이런 예들은 더러 눈에 띄고, 이런 예를 매우 풍부히 보여주고 있는 『그림설화집』의 경우까지를 참작하면, 운문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의 설화에는 오히려 이같은 형식이 더 보편적이었으리라고도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가-시가의 형태는 오랜 세월을 걸쳐 다양한 장르들에서 이용되어져 온 문학적 형식이다. 이제까지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화-시가 형식의 기원은 근본적으로 과거의 구비문학적 전통 및 詩.歌의 미분리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설화-시가의 해석시에는 양자를 분리시켜 논의하기보다는 설화적 문맥 속에서 시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설화-시가의 형식은 서사와 시가가 반복되는 형태, 서사적 내용은 시가로 읊어내는 형태, 서사의 틀 속에 시가가 내포되든가, 혹은 시가에 설명적 설화가 부가되는 형태 등으로 나타나며; 셋째, 문학사의 주류가 구비문학에서 기록문학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설화-시가의 형식이 약화되어 갔고, 나아가 국문학의 각 장르에 걸쳐 나타나는 설화-시가의 면모 및 문제점들에 대하여 약술하여 보았다.
추천자료
 [인문과학] 호질연구
[인문과학] 호질연구 친일문학 연구의 태도와 의미
친일문학 연구의 태도와 의미 정치경제학 연구
정치경제학 연구 프랑스혁명사 연구와 현대 역사학
프랑스혁명사 연구와 현대 역사학 [중세사연구]조선전기 신진사대부의 등장배경과 활동 및 성격
[중세사연구]조선전기 신진사대부의 등장배경과 활동 및 성격 일반사회 연구수업 지도안(시장가격의 결정)
일반사회 연구수업 지도안(시장가격의 결정) 연구수업 학습지도안(사무자동화)
연구수업 학습지도안(사무자동화) 여성연구의 관점 요약
여성연구의 관점 요약 [사회복지사상 연구] 사회복지 사상 연구의 방법과 전제 및 의의
[사회복지사상 연구] 사회복지 사상 연구의 방법과 전제 및 의의 임상심리학 연구방법 중 임상적 면접법
임상심리학 연구방법 중 임상적 면접법 [사회교재연구법]발표 보고서
[사회교재연구법]발표 보고서 디즈니랜드의 해외진출 사례 - 도쿄디즈니의 성공, 유로디즈니의 실패 사례연구와 서울디즈니...
디즈니랜드의 해외진출 사례 - 도쿄디즈니의 성공, 유로디즈니의 실패 사례연구와 서울디즈니... [노인복지 문제점과 사례연구] 노인복지 개념,필요성,등장배경분석및 노인복지 해외사례연구...
[노인복지 문제점과 사례연구] 노인복지 개념,필요성,등장배경분석및 노인복지 해외사례연구... 북한연구 - 공산주의
북한연구 - 공산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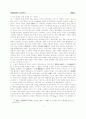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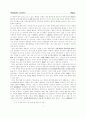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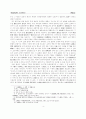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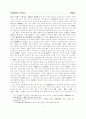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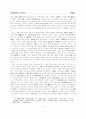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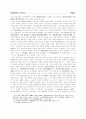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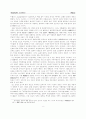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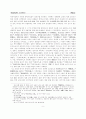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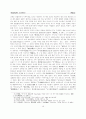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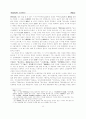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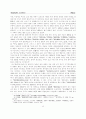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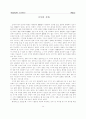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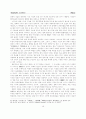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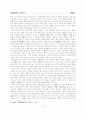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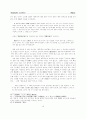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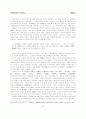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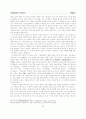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