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무신정권기의 사회변동의 원인과 배경
Ⅲ.무신정권기에 발생한 민란
1.천민의 난
2.농민의 난-김사미·효심의 난
Ⅳ. 나오는 말-사회변동의 의의와 결과
Ⅱ. 무신정권기의 사회변동의 원인과 배경
Ⅲ.무신정권기에 발생한 민란
1.천민의 난
2.농민의 난-김사미·효심의 난
Ⅳ. 나오는 말-사회변동의 의의와 결과
본문내용
은 봉건영주와 농민과의 계급적 대립구조를 기본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고려 사회의 경우는 중앙집권적 사회구조의 틀 속에서 군현제를 통한 국가-재지세력(향리층)을 축으로 하는 대농민 지배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항쟁은 국가 對 민의 모순관계가 기본적인 틀이었다. 고려시대의 군현제는 국가-재지세력(향리층)을 축으로 하는 대농민 지배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국가 및 재지세력의 민에 대한 불법적 수탈이 용이한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었다. 그 결과 농민항쟁의 타도대상은 일차적으로 지방관과 그에 기생하는 향리층을 위시한 재재토호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에 대한 반체제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시기의 농민항쟁은 삼국부흥운동과 같이 왕조질서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변혁적인 성격을 지닌 항쟁에서부터 지방관과 향리 및 재지토호들의 과도한 수탈의 완화를 도리어 국가에 호소하는 타협적인 성격의 것에 이르기까지 항쟁의 지향성에 있어서 질적인 편차가 심했다. 또한 재지세력간의 갈등, 재경세력과 재지세력의 갈등 및 鄕·所·部曲 등의 부곡제 지역과 노비층의 저항, 호족인과 잡족인과의 대립을 비롯한 영역내 제 계층간의 갈등, 그리고 영역간의 갈등과 같은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체로 국가적인 수취의 실현을 위한 제도장치였던 군현제도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 이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할수 있다.
채웅석, 〈12·13세기 향촌사회의 변동과 \'民\'의 대응〉,《역사와 현실》3, 한국역사연구회, 1990
朴宗基, 〈무인집권기 농민항쟁 연구론〉,《韓國學論叢》12,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89
무력항쟁의 농민봉기는 지향성과 지취부가 비록 다양하다 할지라도 주로 부세수취와 力役동원의 모순 및 지주와 전호관계의 모순이 첨예해지는 수확기를 전후한 시기에서부터 이듬해의 춘궁기에 이르는 시기에 걸쳐 폭발하였기 때문에 자연 국가의 수취질서, 나아가 왕조질서를 부정하는 변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대읍 중심의 郡縣制하에서의 영역동원은 一邑을 단위로 한 것은 물론 주읍단위, 혹은 대읍을 단위로 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 力役의 장을 통해 광범위한 민의 불만이 결집되어 표출됨으로써 일읍을 뛰어넘어 여러 郡·縣을 포괄하는 농민항쟁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무신정권은 이들 민란의 평정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농민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는 난민을 위무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권농을 하고 빼앗긴 토지를 돌려주며 조부를 감면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민과 천민의 반란이 신분사회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다.
즉, 무신집권기의 민란은 귀족중심의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사회체제로 넘어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으므로 고려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자연발생적이고 一回的·分散的으로 일어난 民亂이 지속되면서 지휘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민중이 독자적으로 항쟁을 전개하고, 또 자연경제에 의한 조건과 군현제에 규정된 지역권을 극복하여 지역이 다르고 투쟁목적이 다른 세력끼리도 힘을 합쳐 활동하게 된 것은 주요한 발전이었다. 이에 더해 이후 발생하는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한 민족적 모순에 직면하여 외세에 편승한 왜곡된 항쟁의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이 대내적 모순의 누중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모순의 제거를 위한 抗蒙대열에 나섬으로써 고려가 制限的이나마 주권을 지킬 수 있게 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民亂은 이후 사회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영역간의 階序的 지배질서로 이루어진 大邑 중심의 군현제가 해체되어가고, 본관제적 질서에 기반한 屬人主義의 수취방식에서 貢戶制의 실시 등을 통한 屬地主義의 수취방식으로의 전환 등은 민의 저항에 따른 중앙정부의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 광범한 아래로부터의 민의 저항이 있음으로써 武臣政變과 같은 정치체제의 변동도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李義旼·崔忠獻과 같은 武臣政權의 일각이 허위적 이나마 大民改革安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들의 투쟁의 결과에서 나온 지배층의 양보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전근대 고려사회에서 이들 민들이 지배체제 속에 매몰되어 독자적 계급의식을 지니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저항의 성과물은 항상 국가 및 지배층에 귀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은 국가나 지배층에 의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만 왜곡, 변형되어 인식되었었기 때문이다.
일반 백성들의 항거운동인 民亂은 崔氏 武斷政權의 확립과 더불어 그의 강력한 탄압을 받고 熙宗年間에 들어서 면서는 거의 가라앉게 된다. 아직 農民과 賤民들은 그들의 항거운동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만큼 성장되어 있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의 봉기가 지니는 의미를 그렇게 낮추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貪官汚吏의 제거나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그것이 이후의 사회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民亂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도 바로 이런 점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사료
1.《高麗史》
2.《高麗史節要》
33※※
※단행본
3.韓國史編纂委員會《韓國史》20-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1994
4.《韓國史》6-중세사회의 성립, 한길사, 1994
5.《韓國史》7-무신정권과 대몽항쟁, 한길사, 1994
6.朴龍雲《高麗時代史》下, 일지사, 1985
※논문
7.이정신《高麗 武臣政權期 農民, 賤民抗爭의 硏究》고려대 민족문화 연구소, 1991
8.유정아〈高麗 高宗·元宗 時代의 民亂의 性格〉《이대사원》22, 23, 1988
9.朴宗基〈12·13世紀 農民抗爭의 原因에 대한 考察〉《동방학지》69, 1990
10.김주일〈高麗 武臣執權期 金沙彌·孝心亂의 性格〉, 홍익대 교육대학원, 1999
11.김용춘〈高麗 武臣執權期 農民抗爭에 대한 일고찰〉, 원광대 교육대학원, 2000
12.차영란〈武臣執權期의 奴婢지위의 變化〉, 인하대학교, 1989
13.김철수〈高麗 明宗祖의 民亂 硏究〉, 계명대학교, 1983
14.윤정원〈高麗 明宗·神宗代의 民亂〉, 고려대학교, 1988
) 이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할수 있다.
채웅석, 〈12·13세기 향촌사회의 변동과 \'民\'의 대응〉,《역사와 현실》3, 한국역사연구회, 1990
朴宗基, 〈무인집권기 농민항쟁 연구론〉,《韓國學論叢》12,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89
무력항쟁의 농민봉기는 지향성과 지취부가 비록 다양하다 할지라도 주로 부세수취와 力役동원의 모순 및 지주와 전호관계의 모순이 첨예해지는 수확기를 전후한 시기에서부터 이듬해의 춘궁기에 이르는 시기에 걸쳐 폭발하였기 때문에 자연 국가의 수취질서, 나아가 왕조질서를 부정하는 변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대읍 중심의 郡縣制하에서의 영역동원은 一邑을 단위로 한 것은 물론 주읍단위, 혹은 대읍을 단위로 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 力役의 장을 통해 광범위한 민의 불만이 결집되어 표출됨으로써 일읍을 뛰어넘어 여러 郡·縣을 포괄하는 농민항쟁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무신정권은 이들 민란의 평정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농민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는 난민을 위무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권농을 하고 빼앗긴 토지를 돌려주며 조부를 감면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민과 천민의 반란이 신분사회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다.
즉, 무신집권기의 민란은 귀족중심의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사회체제로 넘어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으므로 고려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자연발생적이고 一回的·分散的으로 일어난 民亂이 지속되면서 지휘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민중이 독자적으로 항쟁을 전개하고, 또 자연경제에 의한 조건과 군현제에 규정된 지역권을 극복하여 지역이 다르고 투쟁목적이 다른 세력끼리도 힘을 합쳐 활동하게 된 것은 주요한 발전이었다. 이에 더해 이후 발생하는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한 민족적 모순에 직면하여 외세에 편승한 왜곡된 항쟁의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이 대내적 모순의 누중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모순의 제거를 위한 抗蒙대열에 나섬으로써 고려가 制限的이나마 주권을 지킬 수 있게 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民亂은 이후 사회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영역간의 階序的 지배질서로 이루어진 大邑 중심의 군현제가 해체되어가고, 본관제적 질서에 기반한 屬人主義의 수취방식에서 貢戶制의 실시 등을 통한 屬地主義의 수취방식으로의 전환 등은 민의 저항에 따른 중앙정부의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 광범한 아래로부터의 민의 저항이 있음으로써 武臣政變과 같은 정치체제의 변동도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李義旼·崔忠獻과 같은 武臣政權의 일각이 허위적 이나마 大民改革安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들의 투쟁의 결과에서 나온 지배층의 양보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전근대 고려사회에서 이들 민들이 지배체제 속에 매몰되어 독자적 계급의식을 지니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저항의 성과물은 항상 국가 및 지배층에 귀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은 국가나 지배층에 의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만 왜곡, 변형되어 인식되었었기 때문이다.
일반 백성들의 항거운동인 民亂은 崔氏 武斷政權의 확립과 더불어 그의 강력한 탄압을 받고 熙宗年間에 들어서 면서는 거의 가라앉게 된다. 아직 農民과 賤民들은 그들의 항거운동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만큼 성장되어 있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의 봉기가 지니는 의미를 그렇게 낮추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貪官汚吏의 제거나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그것이 이후의 사회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民亂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도 바로 이런 점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사료
1.《高麗史》
2.《高麗史節要》
33※※
※단행본
3.韓國史編纂委員會《韓國史》20-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1994
4.《韓國史》6-중세사회의 성립, 한길사, 1994
5.《韓國史》7-무신정권과 대몽항쟁, 한길사, 1994
6.朴龍雲《高麗時代史》下, 일지사, 1985
※논문
7.이정신《高麗 武臣政權期 農民, 賤民抗爭의 硏究》고려대 민족문화 연구소, 1991
8.유정아〈高麗 高宗·元宗 時代의 民亂의 性格〉《이대사원》22, 23, 1988
9.朴宗基〈12·13世紀 農民抗爭의 原因에 대한 考察〉《동방학지》69, 1990
10.김주일〈高麗 武臣執權期 金沙彌·孝心亂의 性格〉, 홍익대 교육대학원, 1999
11.김용춘〈高麗 武臣執權期 農民抗爭에 대한 일고찰〉, 원광대 교육대학원, 2000
12.차영란〈武臣執權期의 奴婢지위의 變化〉, 인하대학교, 1989
13.김철수〈高麗 明宗祖의 民亂 硏究〉, 계명대학교, 1983
14.윤정원〈高麗 明宗·神宗代의 民亂〉, 고려대학교, 1988
추천자료
 청조정권의 성립과 발전
청조정권의 성립과 발전 태평천국의 난 (1850 - 64)
태평천국의 난 (1850 - 64) 영화 `이재수의 난`을 보고 - 변혁과 도전의 근대화 물결
영화 `이재수의 난`을 보고 - 변혁과 도전의 근대화 물결 오시오 헤이하치로의 난
오시오 헤이하치로의 난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난 느낌과 감상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난 느낌과 감상 세계는 평평하다를 읽고난 느낌과 감상
세계는 평평하다를 읽고난 느낌과 감상 (기말) 라이벌 관계속의 수사학적 분석 (묘청의 난 - 묘청과 김부식)
(기말) 라이벌 관계속의 수사학적 분석 (묘청의 난 - 묘청과 김부식) 한국 근현대사 역사, 근대의 시작, 3.1운동, 항일 투쟁, 일본 제국주의, 해방, 좌우 갈등, 한...
한국 근현대사 역사, 근대의 시작, 3.1운동, 항일 투쟁, 일본 제국주의, 해방, 좌우 갈등, 한... 러시아 혁명, 1월 혁명의 발단, 의의, 2월 혁명, 로마노프왕조 몰락, 10월 혁명, 소비에트 정...
러시아 혁명, 1월 혁명의 발단, 의의, 2월 혁명, 로마노프왕조 몰락, 10월 혁명, 소비에트 정... 게릴라(유격대)와 의병전쟁, 게릴라(유격대)와 알제리전투, 게릴라(유격대)와 한국전쟁, 게릴...
게릴라(유격대)와 의병전쟁, 게릴라(유격대)와 알제리전투, 게릴라(유격대)와 한국전쟁, 게릴... 한대의 생활과 문화 (황건적의 난, 훈고학, 역사서)
한대의 생활과 문화 (황건적의 난, 훈고학, 역사서) 삼번의 난에 대하여
삼번의 난에 대하여 집의 역사 (개항이후, 일제, 해방후, 한국전쟁, 박정희 정권)
집의 역사 (개항이후, 일제, 해방후, 한국전쟁, 박정희 정권) [A+]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배경 - 중국의 자연조건과 인구, 국민당, 공산당 정책, 국공간 세력...
[A+]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배경 - 중국의 자연조건과 인구, 국민당, 공산당 정책, 국공간 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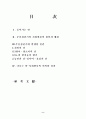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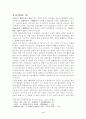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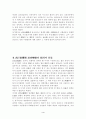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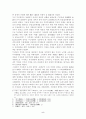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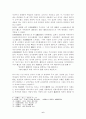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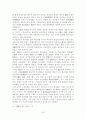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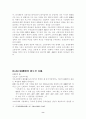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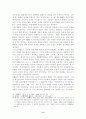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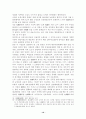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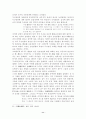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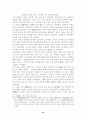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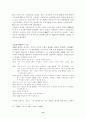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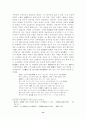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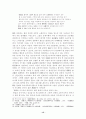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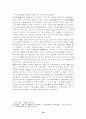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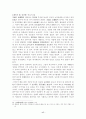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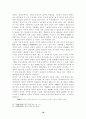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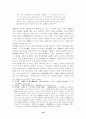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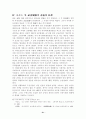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