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면서
1) 이규보의 생애와 시대상황
2. 이규보의 시문학
1) 역사시
2) 군사시
3) 사회시
4) 생활시
5) 도덕시
6) 사유시
7) 자연시
3. 마치면서
1) 이규보의 생애와 시대상황
2. 이규보의 시문학
1) 역사시
2) 군사시
3) 사회시
4) 생활시
5) 도덕시
6) 사유시
7) 자연시
3. 마치면서
본문내용
결국 음란한 무당에 의탁하기에 쫓겨나게 된 것이니 이는 스스로가 불러일으킨 것인데 또 누구를 허물하랴. 그리고 남의 신하된 자도 마찬가지다. 충성으로 임금을 섬긴다면 종신토록 잘못이 없을 것이나, 요괴한 짓으로 민중을 미혹시킨다면 곧 그 자리에서 실패를 당하리니, 이치가 본래 그런 것이다.
라고 하여 「노무편」시를 짓게 된 연유뿐만 아니라, 무당들의 요괴한 짓에 대한 그의 비판적 태도 및 단죄(斷罪)상황, 또 그로부터 미루어 본 신하의 도리(道理) 등에 걸쳐서 주도면밀하게 논(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규보는 서·발 양식을 통해서 사건의 상세한 경위와 그 성격을 밝히기를 좋아하였고, 아울러 그것을 비평적 시각으로 해석·평가하는 일을 즐겼으며, 그것이 문인이 해야 할 소임임을 자각하고 중시하였던 것이다.
(2) 명(銘)·잠(箴)
명과 잠의 양식은 간결한 표현 속에 기억할 만한 것을 새겨 두고, 경구(警句)로 삼고자 한 데서 출발한 문체이다.「속절족궤명(續折足 銘)」을 보면,
나의 고달픈 것을 붙들어 준 자는 너요 너의 절름발이 된 것을 고쳐준 자는 나다. 같이 병들어서 서로 구제하였으니 누가 공을 차지할 것인가.
라고 하여 다리가 부러진 궤( )를 고치면서, 어렵고 고달픈 신세에 부축하여 주는 뜻을 새겨 두고자 했다. 「소연명(小硯銘)」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록 작은 벼루지만, 무궁한 그의 뜻을 펴게 하는 공효를 기억하고자 하였다.
벼루야 벼루야 네가 작다 하여 너의 수치가 아니다. 네 비록 한 치쯤 되는 웅덩이지만 나의 무궁한 뜻을 쓰게 한다. 나는 비록 육척 장신인데도 사업(事業)이 너를 빌어 이루어진다. 벼루야 너는 나와 일체가 되어 생사를 함께 하자꾸나.
이와 같이, 이규보는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가까이하는 기물(器物)들의 구실과 그 덕성(德性)을 밝혀서 처세(處世)의 경계로 삼고자 하였으며, 기물이 아닌 자신의 언동(言動)에 대해서도 경계 삼을 만한 일을 새겨 두고자 작품을 썼다.
(3) 설(說)·논(論)·문답(問答)
조리를 따져 가는 문체로, 설은 논의(論議)가 중심이 되는 글이고, 논은 해설(解說)이 중심이 되는 글이다. 문답 역시 대화방식(對話方式)을 채택한 설이요 논이다.
설(說)작품 중에서 「경설(鏡說)」은 다음과 같다.
거사에게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먼지가 끼어서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흐릿했다. 그러나 마치 얼굴을 단장하는 사람처럼 아침저녁으로 들여다보고 하였더니 어떤 손님이 보고 묻기를, \" 거울이란 얼굴을 비춰보는 것인데, 군자는 거울을 보고 그 맑은 것을 쓸 수 있어야 하네. 지금 그대의 거울은 마치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하니 얼굴은 비춰볼 수가 없고 또한 그 맑은 것도 쓸 수가 없는데 그대는 오히려 얼굴을 비춰보고 있으니 그것을 무슨 까닭인가?\"하였다. 거사가 말하기를,
\"거울이 맑으면 잘난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못난 사람들은 꺼려합니다. 그런데 잘난 사람의 수효는 적고 못난 사람의 수효는 많습니다. 만약 못난 사람이 한번 비춰보게 된다면 반드시 깨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먼지가 끼어서 흐릿한 것만 못하지요. 먼지가 낀 것은 그 겉은 흐리게 할지언정 그 맑은 것은 잃게 하지 않으니 잘난 사람을 만난 뒤에 닦여져도 역시 때는 늦지 않을 것입니다. 아,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맑은 것을 쓰기 위한 것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대하는 것은 그 흐릿한 것을 쓰기 위함인데, 당신은 무엇이 이상하다고 여깁니까?\" 하였더니 손님은 대답이 없었다.
경설(鏡說)에서는 자신이 거울을 대함에 있어 맑은 것을 취하기보다, 오히려 그 희미한 것을 취하는 뜻을 말하였다. 그 까닭은 세상에는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 많아, 그 못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야 마는 맑은 거울은 용납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규보는 그의 설(說)에서 득실(得實)의 지혜와 곧은 의리를 정감적, 논리적 차원에서 논함으로써 그 속에 설득의 의도와 설화적 흥미까지를 배려하고 있다.
그는 여러 편의 논(論)을 썼는데 「반유자후수도론 (反柳子厚守道論)」에서는 유 자후가 그의 수도론에서
\"도(道)를 지키는 것이 관직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함은 근본을 잃은 것\"
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망령되이 도의 소재(所在)만을 찾아 스스로 도를 지킨다 생각하고 관직을 지키는데 소홀하며 따라서,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세를 망칠 것이다.\"
라고 하여 직무의 충실한 수행에서 도도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한편, 이규보는 문답(問答) 양식을 통하여 자신의 논리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사물과 조물주에 대한 그의 이해를 표명하고 있다. 문답의 형식에는 자문자답(自問自答), 주문객답(主問客答), 객문주답(客問主答)등이 동원되고 있다.「답석문 答石問」에서는 돌의 물음에 대하여 답하는 형식으로
물(物)로 인하여 움직이는 돌, 그리하여 본성을 상하고 마는 돌이 어찌 나를 비웃을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이어,
\"나는 안으로는 실상(實相)을 온전히 하고, 밖으로는 연경(緣境)을 끊었기에, 사물에게 부림을 받더라도 사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사람에게 밀침을 받더라도 사람에게 불만을 갖지 않으며,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박절한 형편이 닥친 뒤에야 움직이고, 부른 뒤에야 가며, 행할 만하면 행하고, 그칠 만하면 그치니, 옳은 것도 옳지 않은 것도 없다. 자네는 빈 배를 보지 않았는가? 나는 그 빈 배와 같은데, 자네는 어찌 나를 책망하는가?\"하니 돌은 부끄러워하며 대답이 없었다.
라고 하였다. 그의 구애받지 않는 본성(本性)과 실상(實相)을 지켜나가려는 처세관(處世觀)과 세계인식(世界認識)을 보여 주는 것이다.
마치면서...
이 외에도 부(賦), 서(書), 기(記), 의(議) 등의 많은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많은 장르의 문(文)에 뛰어나다는 것이 정말 놀랍기도 하고, 생각보다는 내용이 재미있기도 해서 고전이라고 부담감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글의 대상이 우리의 일상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친근함이 들기도 한다.
《참고 문헌》
이규보, 『이규보 시문선』, 솔출판사, 1997.
김진영, 『이규보문학연구』, 집문당, 1988.
라고 하여 「노무편」시를 짓게 된 연유뿐만 아니라, 무당들의 요괴한 짓에 대한 그의 비판적 태도 및 단죄(斷罪)상황, 또 그로부터 미루어 본 신하의 도리(道理) 등에 걸쳐서 주도면밀하게 논(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규보는 서·발 양식을 통해서 사건의 상세한 경위와 그 성격을 밝히기를 좋아하였고, 아울러 그것을 비평적 시각으로 해석·평가하는 일을 즐겼으며, 그것이 문인이 해야 할 소임임을 자각하고 중시하였던 것이다.
(2) 명(銘)·잠(箴)
명과 잠의 양식은 간결한 표현 속에 기억할 만한 것을 새겨 두고, 경구(警句)로 삼고자 한 데서 출발한 문체이다.「속절족궤명(續折足 銘)」을 보면,
나의 고달픈 것을 붙들어 준 자는 너요 너의 절름발이 된 것을 고쳐준 자는 나다. 같이 병들어서 서로 구제하였으니 누가 공을 차지할 것인가.
라고 하여 다리가 부러진 궤( )를 고치면서, 어렵고 고달픈 신세에 부축하여 주는 뜻을 새겨 두고자 했다. 「소연명(小硯銘)」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록 작은 벼루지만, 무궁한 그의 뜻을 펴게 하는 공효를 기억하고자 하였다.
벼루야 벼루야 네가 작다 하여 너의 수치가 아니다. 네 비록 한 치쯤 되는 웅덩이지만 나의 무궁한 뜻을 쓰게 한다. 나는 비록 육척 장신인데도 사업(事業)이 너를 빌어 이루어진다. 벼루야 너는 나와 일체가 되어 생사를 함께 하자꾸나.
이와 같이, 이규보는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가까이하는 기물(器物)들의 구실과 그 덕성(德性)을 밝혀서 처세(處世)의 경계로 삼고자 하였으며, 기물이 아닌 자신의 언동(言動)에 대해서도 경계 삼을 만한 일을 새겨 두고자 작품을 썼다.
(3) 설(說)·논(論)·문답(問答)
조리를 따져 가는 문체로, 설은 논의(論議)가 중심이 되는 글이고, 논은 해설(解說)이 중심이 되는 글이다. 문답 역시 대화방식(對話方式)을 채택한 설이요 논이다.
설(說)작품 중에서 「경설(鏡說)」은 다음과 같다.
거사에게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먼지가 끼어서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흐릿했다. 그러나 마치 얼굴을 단장하는 사람처럼 아침저녁으로 들여다보고 하였더니 어떤 손님이 보고 묻기를, \" 거울이란 얼굴을 비춰보는 것인데, 군자는 거울을 보고 그 맑은 것을 쓸 수 있어야 하네. 지금 그대의 거울은 마치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하니 얼굴은 비춰볼 수가 없고 또한 그 맑은 것도 쓸 수가 없는데 그대는 오히려 얼굴을 비춰보고 있으니 그것을 무슨 까닭인가?\"하였다. 거사가 말하기를,
\"거울이 맑으면 잘난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못난 사람들은 꺼려합니다. 그런데 잘난 사람의 수효는 적고 못난 사람의 수효는 많습니다. 만약 못난 사람이 한번 비춰보게 된다면 반드시 깨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먼지가 끼어서 흐릿한 것만 못하지요. 먼지가 낀 것은 그 겉은 흐리게 할지언정 그 맑은 것은 잃게 하지 않으니 잘난 사람을 만난 뒤에 닦여져도 역시 때는 늦지 않을 것입니다. 아,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맑은 것을 쓰기 위한 것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대하는 것은 그 흐릿한 것을 쓰기 위함인데, 당신은 무엇이 이상하다고 여깁니까?\" 하였더니 손님은 대답이 없었다.
경설(鏡說)에서는 자신이 거울을 대함에 있어 맑은 것을 취하기보다, 오히려 그 희미한 것을 취하는 뜻을 말하였다. 그 까닭은 세상에는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 많아, 그 못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야 마는 맑은 거울은 용납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규보는 그의 설(說)에서 득실(得實)의 지혜와 곧은 의리를 정감적, 논리적 차원에서 논함으로써 그 속에 설득의 의도와 설화적 흥미까지를 배려하고 있다.
그는 여러 편의 논(論)을 썼는데 「반유자후수도론 (反柳子厚守道論)」에서는 유 자후가 그의 수도론에서
\"도(道)를 지키는 것이 관직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함은 근본을 잃은 것\"
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망령되이 도의 소재(所在)만을 찾아 스스로 도를 지킨다 생각하고 관직을 지키는데 소홀하며 따라서,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세를 망칠 것이다.\"
라고 하여 직무의 충실한 수행에서 도도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한편, 이규보는 문답(問答) 양식을 통하여 자신의 논리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사물과 조물주에 대한 그의 이해를 표명하고 있다. 문답의 형식에는 자문자답(自問自答), 주문객답(主問客答), 객문주답(客問主答)등이 동원되고 있다.「답석문 答石問」에서는 돌의 물음에 대하여 답하는 형식으로
물(物)로 인하여 움직이는 돌, 그리하여 본성을 상하고 마는 돌이 어찌 나를 비웃을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이어,
\"나는 안으로는 실상(實相)을 온전히 하고, 밖으로는 연경(緣境)을 끊었기에, 사물에게 부림을 받더라도 사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사람에게 밀침을 받더라도 사람에게 불만을 갖지 않으며,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박절한 형편이 닥친 뒤에야 움직이고, 부른 뒤에야 가며, 행할 만하면 행하고, 그칠 만하면 그치니, 옳은 것도 옳지 않은 것도 없다. 자네는 빈 배를 보지 않았는가? 나는 그 빈 배와 같은데, 자네는 어찌 나를 책망하는가?\"하니 돌은 부끄러워하며 대답이 없었다.
라고 하였다. 그의 구애받지 않는 본성(本性)과 실상(實相)을 지켜나가려는 처세관(處世觀)과 세계인식(世界認識)을 보여 주는 것이다.
마치면서...
이 외에도 부(賦), 서(書), 기(記), 의(議) 등의 많은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많은 장르의 문(文)에 뛰어나다는 것이 정말 놀랍기도 하고, 생각보다는 내용이 재미있기도 해서 고전이라고 부담감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글의 대상이 우리의 일상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친근함이 들기도 한다.
《참고 문헌》
이규보, 『이규보 시문선』, 솔출판사, 1997.
김진영, 『이규보문학연구』, 집문당, 1988.
추천자료
 거주지 별 소동파 시문학의 고찰
거주지 별 소동파 시문학의 고찰 1970년대 시문학사
1970년대 시문학사 [인문과학] 조선시대 주세붕, 이황, 이이의 시조연구
[인문과학] 조선시대 주세붕, 이황, 이이의 시조연구 조선시대 여항(위항)인문학론
조선시대 여항(위항)인문학론  [최치원][최치원사상][최치원의 생애][최치원의 업적][최치원 관련 자료 검토][최치원 관련 ...
[최치원][최치원사상][최치원의 생애][최치원의 업적][최치원 관련 자료 검토][최치원 관련 ... 이백과 두보의 시문학 비교 - 이백과 두보 시 비교, 중국문학의 범주를 멋어난 시작의 본보기...
이백과 두보의 시문학 비교 - 이백과 두보 시 비교, 중국문학의 범주를 멋어난 시작의 본보기... [연암 박지원][박지원][문체반정][박지원의 문학관][호질][양반전][실학사상][실학파]연암 박...
[연암 박지원][박지원][문체반정][박지원의 문학관][호질][양반전][실학사상][실학파]연암 박... 고려시대의 역사인식과 역사서편찬
고려시대의 역사인식과 역사서편찬 [윌리엄 블레이크][윌리엄 블레이크 작품][순수의 시][부정의 윤리]윌리엄 블레이크의 생애, ...
[윌리엄 블레이크][윌리엄 블레이크 작품][순수의 시][부정의 윤리]윌리엄 블레이크의 생애, ... [시인 김기림][시인 김기림 생애][시인 김기림 작품연구][시인 김기림 작품 기상도][작품 바...
[시인 김기림][시인 김기림 생애][시인 김기림 작품연구][시인 김기림 작품 기상도][작품 바... 현대건축의 흐름, 건축가의 흐름, 근대사회의 흐름, 근현대사상의 흐름, 현대철학의 흐름, 그...
현대건축의 흐름, 건축가의 흐름, 근대사회의 흐름, 근현대사상의 흐름, 현대철학의 흐름, 그... 스콜라철학(스콜라학파)의 성격, 내용, 스콜라철학(스콜라학파)의 전개, 스콜라철학(스콜라학...
스콜라철학(스콜라학파)의 성격, 내용, 스콜라철학(스콜라학파)의 전개, 스콜라철학(스콜라학... [대한민국 시문학] 시인 고은의 인물분석, 시세계, 문학적 특징, 의미 분석
[대한민국 시문학] 시인 고은의 인물분석, 시세계, 문학적 특징, 의미 분석 [이효석][이효석 에로티시즘][이효석 애로티시즘][메밀꽃 필 무렵 작품분석]이효석의 생애, ...
[이효석][이효석 에로티시즘][이효석 애로티시즘][메밀꽃 필 무렵 작품분석]이효석의 생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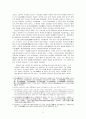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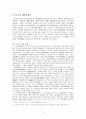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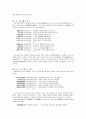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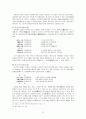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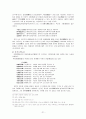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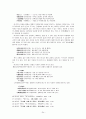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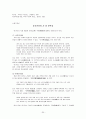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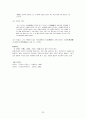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