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論
Ⅱ목 차
. 本論
1. 毛澤東의 어린시절
2. 毛澤東의 활동
(1)신문화운동
(2)호남농촌운동 시찰보고
(3)대장정
(4)인민민주전정시대
(5)대약진운동
(6)문화대혁명
3. 毛澤東思想(Maoism)
♠新民主主義論
♠持久戰論
Ⅲ. 結論
Ⅱ목 차
. 本論
1. 毛澤東의 어린시절
2. 毛澤東의 활동
(1)신문화운동
(2)호남농촌운동 시찰보고
(3)대장정
(4)인민민주전정시대
(5)대약진운동
(6)문화대혁명
3. 毛澤東思想(Maoism)
♠新民主主義論
♠持久戰論
Ⅲ. 結論
본문내용
澤東思想은 中華人民共和國 건국이후에도 사회주의 중국의 통치이념으로 적용되어 왔다. 다만 만년에 社會主義 사회에서도 階級矛盾은 여전히 존재하며 따라서 階級矛盾이 사라질때
까지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는 계속혁명론을 주장하면서 발동한 文化大革命은 중국의 발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바로 이 점때문에 鄧小平이 등장한 후 毛澤東과 毛澤東思想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실용주의 노선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毛澤東思想은 中國共産黨과 중국혁명의 지도이념이었고, 中華人民共和國 건국 후 최소한 毛澤東이 사망한 1976년까지 중국을 지도한 사상이었다. 따라서 毛澤東思想을 부정한다는 것은 中國共産黨과 中華人民共和國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鄧小平시대와 그 이후의 중국에서 毛澤東思想과 이론은 완전히 부정될 수 없었으며 표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을 뿐 권위의 정통성의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Ⅲ. 結論
K. Marx 이후 많은 추종자들은 階級的 矛盾을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관점, 따라서 資本主義 경제를 勞動者와 資本家간의 矛盾으로 보는 관점을 고수하였고, 그 실천방안으로 도시 공장지대에서 勞動者들의 운동을 중요시하였다. 중국에서도 李大釗, 陳獨秀등 초기 중국 共産黨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였다. 그러나 毛澤東은 중국의 농민에 주목하였다. 그는 후난성의 농민 속에 들어가 직접 겪으면서 분석해 1926년 3월과 27년 3월 차례로 <중국 사회 각 계급 분석>, <호남 농민운동 조사보고>로 정리하였다. 無産階級(무산계급)이 주도하되 농민과 연합하는 노선을 세우고, `도시로부터 농촌으로`가 아닌 `농촌에 근거지를 세워 도시를 포위·장악`하는 방책을 제시하였다.
또 중국과 같은 약소민족의 경우 社會的 矛盾은 이전의 사회와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변증법의 矛盾을 기본 矛盾과 주요 矛盾으로 해석하고 당시 중국사회에서는 階級矛盾과 民族矛盾이 각각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의 <矛盾論>에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견해 위에 소수 親日派를 제외한 民族資産階級을 포함, 민족 대 단결을 주장하고 일제 침략 아래 抗日보다는 중국 共産黨의 토벌로 일관하던 蔣介石의 국민당에 항일을 위해 國共合作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孫文의 미망인 宋慶齡(송경령) 혹은 군벌
) 張學良, 1901.6.3 ~ 2001.10.14. 서북초비(西北剿匪:공산당을 무너뜨림) 부사령관으로 시안[西安]에 있으면서 중공 근거지를 포위했으나, 1936년 12월 때마침 독전(督戰)차 온 장제스를 감금(시안사건)하고 내전정지(內戰停止)·일치항일(一致抗日)을 간청하여 항일민족통일전선 결성(제2차 국공합작)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 사건으로 지휘권이 박탈되고 10년의 금고형에 처해졌다
張學良(장학량)을 비롯한 중국 인민의 지지를 받아 抗日戰爭을 승리로, 마침내 國共內戰에서도 승리하여 1949년 中華人民共和國을 수립할 수 있었다.
中華人民共和國 수립 후 1952년까지 3년 동안 그는 黨을 이끌어 국민경제를 회복시켰고, 토지개혁, 반혁명 진압, 3反 5反운동을 이끌었고, 1952년 이후 社會主義 공업화와 농업·수공업·상업을 社會主義로 개조시켜 갔다. 1958년에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생활 모든 측면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人民公社로 전 농촌을 재편하는 大躍進 운동에 들어갔다. 또 1966년부터는 사회제도를 社會主義화한 데서 더 나아가 인간 자체를 社會主義화하기 위한 文化大革命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에 볼 때 큰 실패였다고 평가된다. 우선 공업과 농업분야에서 기계제 대 경영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 경영을 무리하게 합작체제로 전환한 것은 오히려 작업의 의욕과 능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규모 소매분야까지 국영체제로 전환한 상업분야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더구나 그것은 생산담당자들의 자발적 판단보다는 黨의 지도에 의한, 위로부터 강행된 것이었다. 그리고 大躍進 운동은 毛澤東의 무모함의 결정판이었다. 2년 만에 농업생산이 급격히 하락, 수 천만명의 餓死者(아사자)를 낳은 뒤 스는 黨의 정책을 劉少奇등에게 넘기고 한 발 물러나야 했다.
文化大革命도 무모함에서는 마찬가지였고, `10년대란(大亂)`이라는 평가를 들어야 했다. 文化大革命은 10년 동안 中共을 혼란에 몰아넣었고, 장기간 대학을 폐쇄하여 교육 과학 기술 등 전문분야의 지도를 黨性이 강한 비전문가가 장악하여 전문성보다 黨性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전문분야의 지식 수준이 저하되었고 전문가의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하여 사회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하였다. 그 뿐아니라 文化大革命으로 피해를 본 부류와 이를 통해 부상한 그룹의 대립문제, 구 간부의 복직으로 인한 관료포화 상태 등은 中共의 당면문제로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듯이 그의 전 생애를 살펴볼 때, 중국의 독립과 주권을 회복하고, 중국을 통일하여 외세에 의해 국토를 유린당한 중국민들의 굴욕감을 씻어주며, 관료제도를 견제하고 대중의 정치참여를 유지하여, 중국의 자립을 강조한 중국인민의 영원한 아버지이자 영웅인 모택동과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중국인민 개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측면에서 역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독재자 모택동의 양면적, 모순적 두 얼굴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역사속에서 계속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며, 중국 현대사의 격동 속에서 혁명의 지도자로 자라난 모택동이기에 그의 생애는 바로 중국의 현대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참고문헌-
김기연. 1993.『모택동』. 서울: 대현출판사
이중. 2002. 『모택동과 중국을 이야기하다』 . 서울: 김영사
한수인외. 1986~1988. 『모택동 전기』 .서울: 일월서각
이등연(역). 1989. 『지구전론, 신민주주의론』. 서울: 두레
엄가기외. 1988. 『다큐멘터리 文化大革命』.서울: 삼우당
박영호. 2000. \"모택동의 체육을 통한 국민의식 개혁\". 『한국체육학회지』.39.
시각/영상자료. 1997. 모택동의 공헌과 과실.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시각/영상자료. 1997. 모택동 시대. 서울:CTN
까지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는 계속혁명론을 주장하면서 발동한 文化大革命은 중국의 발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바로 이 점때문에 鄧小平이 등장한 후 毛澤東과 毛澤東思想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실용주의 노선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毛澤東思想은 中國共産黨과 중국혁명의 지도이념이었고, 中華人民共和國 건국 후 최소한 毛澤東이 사망한 1976년까지 중국을 지도한 사상이었다. 따라서 毛澤東思想을 부정한다는 것은 中國共産黨과 中華人民共和國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鄧小平시대와 그 이후의 중국에서 毛澤東思想과 이론은 완전히 부정될 수 없었으며 표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을 뿐 권위의 정통성의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Ⅲ. 結論
K. Marx 이후 많은 추종자들은 階級的 矛盾을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관점, 따라서 資本主義 경제를 勞動者와 資本家간의 矛盾으로 보는 관점을 고수하였고, 그 실천방안으로 도시 공장지대에서 勞動者들의 운동을 중요시하였다. 중국에서도 李大釗, 陳獨秀등 초기 중국 共産黨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였다. 그러나 毛澤東은 중국의 농민에 주목하였다. 그는 후난성의 농민 속에 들어가 직접 겪으면서 분석해 1926년 3월과 27년 3월 차례로 <중국 사회 각 계급 분석>, <호남 농민운동 조사보고>로 정리하였다. 無産階級(무산계급)이 주도하되 농민과 연합하는 노선을 세우고, `도시로부터 농촌으로`가 아닌 `농촌에 근거지를 세워 도시를 포위·장악`하는 방책을 제시하였다.
또 중국과 같은 약소민족의 경우 社會的 矛盾은 이전의 사회와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변증법의 矛盾을 기본 矛盾과 주요 矛盾으로 해석하고 당시 중국사회에서는 階級矛盾과 民族矛盾이 각각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의 <矛盾論>에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견해 위에 소수 親日派를 제외한 民族資産階級을 포함, 민족 대 단결을 주장하고 일제 침략 아래 抗日보다는 중국 共産黨의 토벌로 일관하던 蔣介石의 국민당에 항일을 위해 國共合作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孫文의 미망인 宋慶齡(송경령) 혹은 군벌
) 張學良, 1901.6.3 ~ 2001.10.14. 서북초비(西北剿匪:공산당을 무너뜨림) 부사령관으로 시안[西安]에 있으면서 중공 근거지를 포위했으나, 1936년 12월 때마침 독전(督戰)차 온 장제스를 감금(시안사건)하고 내전정지(內戰停止)·일치항일(一致抗日)을 간청하여 항일민족통일전선 결성(제2차 국공합작)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 사건으로 지휘권이 박탈되고 10년의 금고형에 처해졌다
張學良(장학량)을 비롯한 중국 인민의 지지를 받아 抗日戰爭을 승리로, 마침내 國共內戰에서도 승리하여 1949년 中華人民共和國을 수립할 수 있었다.
中華人民共和國 수립 후 1952년까지 3년 동안 그는 黨을 이끌어 국민경제를 회복시켰고, 토지개혁, 반혁명 진압, 3反 5反운동을 이끌었고, 1952년 이후 社會主義 공업화와 농업·수공업·상업을 社會主義로 개조시켜 갔다. 1958년에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생활 모든 측면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人民公社로 전 농촌을 재편하는 大躍進 운동에 들어갔다. 또 1966년부터는 사회제도를 社會主義화한 데서 더 나아가 인간 자체를 社會主義화하기 위한 文化大革命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에 볼 때 큰 실패였다고 평가된다. 우선 공업과 농업분야에서 기계제 대 경영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 경영을 무리하게 합작체제로 전환한 것은 오히려 작업의 의욕과 능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규모 소매분야까지 국영체제로 전환한 상업분야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더구나 그것은 생산담당자들의 자발적 판단보다는 黨의 지도에 의한, 위로부터 강행된 것이었다. 그리고 大躍進 운동은 毛澤東의 무모함의 결정판이었다. 2년 만에 농업생산이 급격히 하락, 수 천만명의 餓死者(아사자)를 낳은 뒤 스는 黨의 정책을 劉少奇등에게 넘기고 한 발 물러나야 했다.
文化大革命도 무모함에서는 마찬가지였고, `10년대란(大亂)`이라는 평가를 들어야 했다. 文化大革命은 10년 동안 中共을 혼란에 몰아넣었고, 장기간 대학을 폐쇄하여 교육 과학 기술 등 전문분야의 지도를 黨性이 강한 비전문가가 장악하여 전문성보다 黨性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전문분야의 지식 수준이 저하되었고 전문가의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하여 사회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하였다. 그 뿐아니라 文化大革命으로 피해를 본 부류와 이를 통해 부상한 그룹의 대립문제, 구 간부의 복직으로 인한 관료포화 상태 등은 中共의 당면문제로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듯이 그의 전 생애를 살펴볼 때, 중국의 독립과 주권을 회복하고, 중국을 통일하여 외세에 의해 국토를 유린당한 중국민들의 굴욕감을 씻어주며, 관료제도를 견제하고 대중의 정치참여를 유지하여, 중국의 자립을 강조한 중국인민의 영원한 아버지이자 영웅인 모택동과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중국인민 개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측면에서 역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독재자 모택동의 양면적, 모순적 두 얼굴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역사속에서 계속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며, 중국 현대사의 격동 속에서 혁명의 지도자로 자라난 모택동이기에 그의 생애는 바로 중국의 현대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참고문헌-
김기연. 1993.『모택동』. 서울: 대현출판사
이중. 2002. 『모택동과 중국을 이야기하다』 . 서울: 김영사
한수인외. 1986~1988. 『모택동 전기』 .서울: 일월서각
이등연(역). 1989. 『지구전론, 신민주주의론』. 서울: 두레
엄가기외. 1988. 『다큐멘터리 文化大革命』.서울: 삼우당
박영호. 2000. \"모택동의 체육을 통한 국민의식 개혁\". 『한국체육학회지』.39.
시각/영상자료. 1997. 모택동의 공헌과 과실.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시각/영상자료. 1997. 모택동 시대. 서울:CT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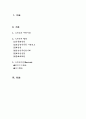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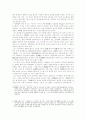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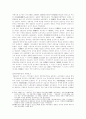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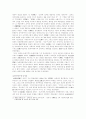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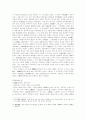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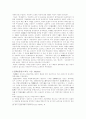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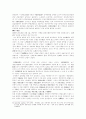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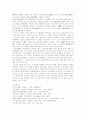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