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항일전쟁 발발 이후 논쟁의 상황
3. 민족형식 논쟁의 발단
4. 홍콩 지역 논자의 주장
(1) 민족형식 문제제기의 이유에 관하여
(2) 민족형식이란 용어와 관련하여
(3) 민족형식과 내용문제와 관련하여
(4)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민족성과 세계성에 관하여
(5) 신문예에 대한 평가와 그 수용 문제에 관하여
(6) 구문예에 대한 평가와 수용문제에 관하여
(7) 민족형식 창조의 제 방안 및 기타 문제
5. 논쟁에 관한 득실
6. 맺음말
2. 항일전쟁 발발 이후 논쟁의 상황
3. 민족형식 논쟁의 발단
4. 홍콩 지역 논자의 주장
(1) 민족형식 문제제기의 이유에 관하여
(2) 민족형식이란 용어와 관련하여
(3) 민족형식과 내용문제와 관련하여
(4)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민족성과 세계성에 관하여
(5) 신문예에 대한 평가와 그 수용 문제에 관하여
(6) 구문예에 대한 평가와 수용문제에 관하여
(7) 민족형식 창조의 제 방안 및 기타 문제
5. 논쟁에 관한 득실
6. 맺음말
본문내용
표현 양식ㆍ표현 기교 등이 그 중요한 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가 어떻게 강변하든 당시 문학을 직접적 선전 수단으로만 간주하여 타당하고도 세련된 수단을 포기한 것은 어쨌든 예술성의 저하였던 것은 틀림없었던 것이다.
또다른 예로는 문예의 형식과 내용의 불가분성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형식면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술한 것 처럼 黃繩이나 巴人의 경우 문예민족화를 위해서는 문예의 형식과 내용을 분리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형식만을 강조하거나 내용과 형식의 결합을 기계적으로 처리했던 것이다.
그들은 또 자신들의 논지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소홀히 하는 편향을 범하기도 했다. 黃藥眠의 경우 민족형식 문제의 제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黃繩과 마찬가지로 신문학을 혹평하고 있는데, 그는 신문학이 대중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오로지 신문학 자체의 외래적 영향만을 거론할 뿐, 어떤 의미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중국사회의 교육과 문화의 낙후성과 같은 사회적 원인은 언급치 않았던 것이다.
6. 맺음말
黃繩의 〈현시기 문예운동에 대한 일 고찰〉 이래 점차 열기를 띠기 시작한 香港 지역의 논쟁은 39년 12월 《大公報·文藝》에 수일간 매일 여러 편의 글이 발표되면서 고조에 달하였다. 그러나 그 열기는 도중에 갑자기 냉각되어 버렸다. 현재로서는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낼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이는 이 지역의 정치 사회 상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香港의 영국식민지정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의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 수록 그 압력은 강화되어 갔다. 거기에다가 香港에 대해서는 영국 자체가 제국주의 국가였던 관계로 다방면에서 제한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文藝陣地》의 편집과 인쇄가 上海로 이동한 데서도 알 수 있듯 그중 한 가지가 문예에 대한 일정한 통제였다. 아마도 바로 이러한 통제가 민족형식 논쟁에서도 그대로 가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관해서는 우선 《大公報·文藝》의 편집자의 말을 유의해 볼 만하다. 12월 10일 처음으로 《大公報·文藝》에 黃藥眠의 〈중국화와 대중화〉가 실린 이틀 뒤인 12월 12일 그는 〈알림啓事〉이라는 난에서 문예 민족형식의 창조는 현재 및 미래의 중국문예의 중대한 과제이다. 집중 토론을 위해 금일 학생계는 1기를 휴간하며… 운운하고 있다. 이는 《大公報·文藝》측이 이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로 부터 불과 사흘 후인 12월 15일에는 다시 문예형식에 관하여 각 방면의 많은 원고를 받았으며 독자 또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다만 본난의 편폭이 좁아 수용할 수 없으므로 하는 수 없이 일시적으로 매듭을 짓는 바이니… 하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으나 그간의 추이로 보아 갑자기 그 열기가 냉각됨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특히 12월 11일자 杜埃의 〈민족형식 창조의 제 문제〉와 13일자 妥適의 〈문예하향과 민족형식〉에는 일부 문귀가 삭제된 채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를 언급한 것과 같은 「민감한」 부분이었다. 그렇다면 이를 상기한 편집자의 말과 연관지어 볼 때, 아무래도 이 지역의 민족형식 논쟁이 갑자기 저조해진 것은 이 지역의 정치 사회적 특수 상황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뒤 민족형식과 관련한 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40년 초까지 巴人을 비롯한 한 두 사람의 글이 계속 발표되었다. 특히 40년 4월 1일 발표된 孟辛(馮雪峰)의 〈형식문제 잡기〉는 몇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한 글이었다. 예컨대 그의 글은 당시 여러 논자들이 혼란을 보이고 있던 형식과 내용의 문제에 관해 치밀하고도 독특한 분석을 가하고 있다. 다만 그 당시 孟辛은 重慶에 거주하고 있었던 데다가 40년 2월 이후 重慶쪽에서 민족형식 논쟁이 점차 가열하기 시작하여 3월 말 이후로는 거의 매일 한두 편의 글이 발표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孟辛의 글이 香港 지역 독자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임은 인정하되 그 견해 자체는 巴人의 경우와는 달리 아무래도 重慶 지역의 민족형식 논쟁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香港 지역의 민족형식 논쟁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논쟁」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아 특정 견해의 제시와 그에 대한 반박이라는 형식으로 진행되지도 않았고 또 치열하다고 할 만큼 많은 글이 발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지역의 민족형식 문제에 대한 탐구는, 당시 전 중국적으로 이루어졌던 「문예의 민족형식 논쟁」의 한 구성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이미 앞에서 살펴 본대로 논점에 따라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논쟁」이라는 말로 표현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香港 지역의 민족형식 논쟁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더많은 자료의 발굴과 좀더 깊이있는 연구가 기대된다. 그것은 먼저, 이 지역의 민족형식에 관한 검토가 시기적으로 延安 지역에 잇달아 고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延安 지역의 민족형식 논쟁이 어떠한 형태로 타 지역에 전파되었는가를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 본 바 延安 지역의 논쟁의 진전을 수용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그 독자성을 갖추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각지의 민족형식 논쟁에 특히 그중 가장 치열했던 重慶 지역의 논쟁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 重慶에 대한 영향은 向林氷이 黃繩의 글을 인용한 것을 그 한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전체 민족형식 논쟁 연구에 있어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언급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宗珏의 민족형식 문제의 제기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이 그러하다.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체로 민중 동원ㆍ민중 접근이라는 실제 과제로 부터 제기된 것이다. 그후 毛澤東 선생의 〈신단계론〉에 「중국화」에 관한 계시가 있었다. 이 제기는 마침 항전문예운동 실천상의 구형식 이용 문제와 상응하였고, 이리하여 문제가 확정 형성되었다.
또다른 예로는 문예의 형식과 내용의 불가분성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형식면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술한 것 처럼 黃繩이나 巴人의 경우 문예민족화를 위해서는 문예의 형식과 내용을 분리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형식만을 강조하거나 내용과 형식의 결합을 기계적으로 처리했던 것이다.
그들은 또 자신들의 논지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소홀히 하는 편향을 범하기도 했다. 黃藥眠의 경우 민족형식 문제의 제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黃繩과 마찬가지로 신문학을 혹평하고 있는데, 그는 신문학이 대중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오로지 신문학 자체의 외래적 영향만을 거론할 뿐, 어떤 의미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중국사회의 교육과 문화의 낙후성과 같은 사회적 원인은 언급치 않았던 것이다.
6. 맺음말
黃繩의 〈현시기 문예운동에 대한 일 고찰〉 이래 점차 열기를 띠기 시작한 香港 지역의 논쟁은 39년 12월 《大公報·文藝》에 수일간 매일 여러 편의 글이 발표되면서 고조에 달하였다. 그러나 그 열기는 도중에 갑자기 냉각되어 버렸다. 현재로서는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낼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이는 이 지역의 정치 사회 상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香港의 영국식민지정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의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 수록 그 압력은 강화되어 갔다. 거기에다가 香港에 대해서는 영국 자체가 제국주의 국가였던 관계로 다방면에서 제한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文藝陣地》의 편집과 인쇄가 上海로 이동한 데서도 알 수 있듯 그중 한 가지가 문예에 대한 일정한 통제였다. 아마도 바로 이러한 통제가 민족형식 논쟁에서도 그대로 가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관해서는 우선 《大公報·文藝》의 편집자의 말을 유의해 볼 만하다. 12월 10일 처음으로 《大公報·文藝》에 黃藥眠의 〈중국화와 대중화〉가 실린 이틀 뒤인 12월 12일 그는 〈알림啓事〉이라는 난에서 문예 민족형식의 창조는 현재 및 미래의 중국문예의 중대한 과제이다. 집중 토론을 위해 금일 학생계는 1기를 휴간하며… 운운하고 있다. 이는 《大公報·文藝》측이 이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로 부터 불과 사흘 후인 12월 15일에는 다시 문예형식에 관하여 각 방면의 많은 원고를 받았으며 독자 또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다만 본난의 편폭이 좁아 수용할 수 없으므로 하는 수 없이 일시적으로 매듭을 짓는 바이니… 하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으나 그간의 추이로 보아 갑자기 그 열기가 냉각됨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특히 12월 11일자 杜埃의 〈민족형식 창조의 제 문제〉와 13일자 妥適의 〈문예하향과 민족형식〉에는 일부 문귀가 삭제된 채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를 언급한 것과 같은 「민감한」 부분이었다. 그렇다면 이를 상기한 편집자의 말과 연관지어 볼 때, 아무래도 이 지역의 민족형식 논쟁이 갑자기 저조해진 것은 이 지역의 정치 사회적 특수 상황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뒤 민족형식과 관련한 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40년 초까지 巴人을 비롯한 한 두 사람의 글이 계속 발표되었다. 특히 40년 4월 1일 발표된 孟辛(馮雪峰)의 〈형식문제 잡기〉는 몇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한 글이었다. 예컨대 그의 글은 당시 여러 논자들이 혼란을 보이고 있던 형식과 내용의 문제에 관해 치밀하고도 독특한 분석을 가하고 있다. 다만 그 당시 孟辛은 重慶에 거주하고 있었던 데다가 40년 2월 이후 重慶쪽에서 민족형식 논쟁이 점차 가열하기 시작하여 3월 말 이후로는 거의 매일 한두 편의 글이 발표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孟辛의 글이 香港 지역 독자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임은 인정하되 그 견해 자체는 巴人의 경우와는 달리 아무래도 重慶 지역의 민족형식 논쟁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香港 지역의 민족형식 논쟁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논쟁」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아 특정 견해의 제시와 그에 대한 반박이라는 형식으로 진행되지도 않았고 또 치열하다고 할 만큼 많은 글이 발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지역의 민족형식 문제에 대한 탐구는, 당시 전 중국적으로 이루어졌던 「문예의 민족형식 논쟁」의 한 구성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이미 앞에서 살펴 본대로 논점에 따라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논쟁」이라는 말로 표현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香港 지역의 민족형식 논쟁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더많은 자료의 발굴과 좀더 깊이있는 연구가 기대된다. 그것은 먼저, 이 지역의 민족형식에 관한 검토가 시기적으로 延安 지역에 잇달아 고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延安 지역의 민족형식 논쟁이 어떠한 형태로 타 지역에 전파되었는가를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 본 바 延安 지역의 논쟁의 진전을 수용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그 독자성을 갖추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각지의 민족형식 논쟁에 특히 그중 가장 치열했던 重慶 지역의 논쟁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 重慶에 대한 영향은 向林氷이 黃繩의 글을 인용한 것을 그 한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전체 민족형식 논쟁 연구에 있어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언급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宗珏의 민족형식 문제의 제기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이 그러하다.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체로 민중 동원ㆍ민중 접근이라는 실제 과제로 부터 제기된 것이다. 그후 毛澤東 선생의 〈신단계론〉에 「중국화」에 관한 계시가 있었다. 이 제기는 마침 항전문예운동 실천상의 구형식 이용 문제와 상응하였고, 이리하여 문제가 확정 형성되었다.
추천자료
 6. 25전쟁의 기원과 교훈
6. 25전쟁의 기원과 교훈 20세기의 전쟁 및 그에 따른 경제의 변화
20세기의 전쟁 및 그에 따른 경제의 변화 20세기의전쟁과 경제의변화
20세기의전쟁과 경제의변화 한국전쟁 내전인가 국제전인가
한국전쟁 내전인가 국제전인가 일제하 항일독립운동으로서의 복벽(復辟)주의 연구
일제하 항일독립운동으로서의 복벽(復辟)주의 연구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 [전쟁][평화론][전쟁론][자연환경][의학발전][현대전쟁]전쟁의 개념, 전쟁의 개념 해석, 평화...
[전쟁][평화론][전쟁론][자연환경][의학발전][현대전쟁]전쟁의 개념, 전쟁의 개념 해석, 평화... [전쟁과 정치사] 한국전쟁 전반의 정리
[전쟁과 정치사] 한국전쟁 전반의 정리 [위정척사운동][3.1운동][민족실력양성운동]위정척사운동, 3.1운동, 민족실력양성운동, 5.18...
[위정척사운동][3.1운동][민족실력양성운동]위정척사운동, 3.1운동, 민족실력양성운동, 5.18... [고고학, 고대사연구, 민족기원, 왕정시대, 성경, 성경 고고학, 고대사, 한국고고학, 구석기 ...
[고고학, 고대사연구, 민족기원, 왕정시대, 성경, 성경 고고학, 고대사, 한국고고학, 구석기 ... 재일조선인(재일유학생, 재일한국인, 재일한인)의 현황, 도일사, 재일조선인(재일유학생, 재...
재일조선인(재일유학생, 재일한국인, 재일한인)의 현황, 도일사, 재일조선인(재일유학생, 재... [단재 신채호]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의 역사,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의 사상, 독립운동가 ...
[단재 신채호]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의 역사,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의 사상, 독립운동가 ... 일제시기(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시대구분, 법제정비, 일제시기(일제시대, 일...
일제시기(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시대구분, 법제정비, 일제시기(일제시대, 일... [세계의정치와경제]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세계의정치와경제]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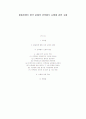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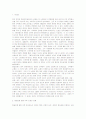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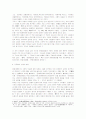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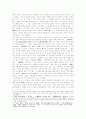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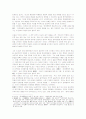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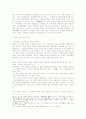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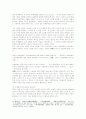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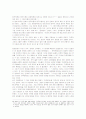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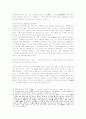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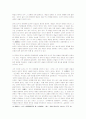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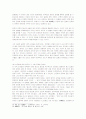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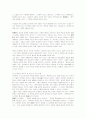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