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1.우리말에 관한 하나의 가설
2.한 호흡 말과 몸에 관련된 가설
본론
1.말은 몸의 떨림
2.몸말은 입말의 원천
3.말의 의미―몸의 떨림 ? 상황의 요구 ? 몸의 기능
4.근거를 놓치고 있는 기호학적 의미론
5.예술은 원초적인 말
결론
1.몸과 말
1.우리말에 관한 하나의 가설
2.한 호흡 말과 몸에 관련된 가설
본론
1.말은 몸의 떨림
2.몸말은 입말의 원천
3.말의 의미―몸의 떨림 ? 상황의 요구 ? 몸의 기능
4.근거를 놓치고 있는 기호학적 의미론
5.예술은 원초적인 말
결론
1.몸과 말
본문내용
축적 언어, 공간적 언어 등의 말을 쓴다. 이런 경향에는 물론 기호학에 의거해서 뭇 사건들을 일종의 텍스트로 보고,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지평을 컨텍스트, 즉 맥락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기호로 되어 있다는 전제가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밑바탕에는 예술적 표현들을 하나의 텍스트적인 기호로 보려는 의중이 깔려 있지만, 진정 어떤 의미에서 언어라는 말을 쓰는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예술 장르의 구성 요소들을 나누어 그 고유한 특징들을 지칭하기 위한 것 같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술적 표현과 이해라는 의사 소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앞서 기호학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지적한 것처럼, 이런 맥락에서 사용하는 넓은 의미의 ‘언어’라는 표현은 그 밑바탕에 몸 전체의 원초적인 떨림과 몸의 떨림을 야기하고 주고받는 상황 전체의 떨림 그리고 몸의 기능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그다지 튼튼한 뿌리를 갖춘 것은 아니다. 예술 장르에서 ‘말’이라 하지 않고 대부분 굳이 한자말을 끌어들여 ‘언어’라고 말하는 것은 기호학적인 추상성을 전제하고 있다 해야 한다.
따라서 진정 각 예술 장르에서 요구되는 바 ‘언어’라는 말로 지칭하는 것은 몸 전체의 원초적인 떨림을 전제로 한 ‘말’이어야 한다. 예술이야말로 뭇 사물들과 사건들이 몸을 둘러싼 상황이 되어 떨면서 리듬을 발하고, 몸이 그 떨림 내지는 리듬에 공명하듯 조응하여 함께 이루어지고, 그래서 몸과 상황이 하나가 되어 크게 진동함으로써 즉 전율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원초적인 떨림이 몸 전체에 퍼져 나타나면 춤이 되고, 순수한 박자와 선율이 되어 나타나면 음악이 되고, 말이 되어 나타나면 시가 되고, 색채와 선의 율동이 되어 나타나면 회화가 되고, 물질적인 양감으로 되어 나타나면 조각이 되고, 벽과 공간 또는 열림과 닫힘으로 나타나면 건축이 된다.
다만, 우주의 떨림이 몸의 떨림으로 나타난 것이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먹고 싸고 자고 하는 등의 일상적인 몸의 욕구와 기능과는 독립되어야 한다. 몸의 떨림 자체가 순수하게 표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술이 일상적인 몸의 떨림과 뒤섞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예술적인 몸의 떨림과 일상적인 몸의 떨림 모두가 근원적으로 원초적인 몸의 떨림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이든 공예품이든 그것에서 예술적인 측면을 운위할 때에는 일상적인 몸의 떨림에 관련해서가 아니라 몸의 떨림 자체를 표현하고 또 불러일으키는 것에 관련해서이다.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저 보고, 듣고, 만지기만 해도 생겨나는 몸의 떨림을 포착해서 표현할 때 예술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데서 예술은 원초적인 말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원초적인 말이란 바로 원초적인 몸의 떨림이기 때문이다.
결론
1.몸과 말
말은 근원적으로 떨림에 근거해 있다. 물론 표층적으로는 목청과 혀의 떨림이다. 그러나 심층적으로는 몸 전체의 떨림이고, 더 확대해서 보면 상황 전체의 떨림이다. ‘떨림’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그래서 ‘떨림’이란 말을 들어도 별달리 떨림이 없을 정도로 식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러나 어떤가? ‘떨림’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이 떨리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물론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정작 그 까닭은 말이 글로 전화되어 나타나고, 글이 소위 떨림이 없는 개념으로만 작동하는 듯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철학이나 과학에서 쓰는 개념들은 몸의 원초적인 떨림이 의사 소통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추상화해 버린 뒤 생겨난 것들이다. 개념적인 말들이 몸의 떨림으로서의 원초적인 말을 지배하고 배척하는 것은 인간이 전 우주적인 떨림으로부터 퉁겨나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는 짓이다.
진화의 과정에서 최후로 나타난 것이 근원적인 것은 아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바탕이 된 것은 여전히 바탕으로 작용하고 있고, 발달하여 자신에게서 새롭게 생겨난 것들과 계속 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전반적으로 그 힘을 달리할 뿐이다. 의식과 정신이 생겨났다고 해서 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의식과 정신의 떨림을 운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몸의 떨림과 완전히 독립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여전히 몸의 떨림은 말의 떨림을 일구어내고 있고, 또 독자적으로 몸말이 되어 그 나름대로 발달하고, 심지어 예술이라는 승화된 몸의 떨림이 되어 그 나름대로 발달하는 것이다.
의식과 정신을 일종의 떨림으로 이해하게 될 때, 실상 그 의식과 정신은 체화된 몸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데카르트 식의 정신 철학에서 말하는 정신이란 떨릴 수 있는 몸체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만약 몸체를 갖는다면 그것은 바로 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말을 듣고서 흥분하고 심각해 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는 등의 정신 내지는 영혼 또는 얼의 일들은 바로 몸의 떨림이지 않고서는 달리 어떤 것일 수가 없는 노릇이다.
말을 정신 특히 이성적인 정신의 도구로 보는 것은, 말이란 바로 몸의 떨림이기 때문에 몸을 도구로 보는 것이다. 실상은 거꾸로다. 몸의 떨림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말의 떨림이고, 말의 떨림을 오로지 핵심만을 뽑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정신적인 개념이고, 정신적인 개념을 담지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필요에 따라 습관적으로 설정하게 된 것이 정신 특히 이성적이고 반성적인 정신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정신을 떨림으로 이해하게 되면 정신은 대체로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그럴 경우 정신 내지는 영혼은 바로 몸의 떨림을 그 자체로 간추려서 부르는 이름임을 알게 된다. 말하자면, 순수한 영혼이니 순수한 정신이니 특히 순수한 반성적인 정신이니 하는 것은 애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말의 원천은 순수한 반성적인 정신에 의거한 것이 아니다. 말은 근원적으로 몸에 의거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몸 전체의 원초적인 떨림이 목청과 혀로 집중되어 나타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바로 그 사람의 몸 전체가 나의 몸에서 출발해서 나의 몸을 향해 떨어 울리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예술 장르의 구성 요소들을 나누어 그 고유한 특징들을 지칭하기 위한 것 같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술적 표현과 이해라는 의사 소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앞서 기호학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지적한 것처럼, 이런 맥락에서 사용하는 넓은 의미의 ‘언어’라는 표현은 그 밑바탕에 몸 전체의 원초적인 떨림과 몸의 떨림을 야기하고 주고받는 상황 전체의 떨림 그리고 몸의 기능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그다지 튼튼한 뿌리를 갖춘 것은 아니다. 예술 장르에서 ‘말’이라 하지 않고 대부분 굳이 한자말을 끌어들여 ‘언어’라고 말하는 것은 기호학적인 추상성을 전제하고 있다 해야 한다.
따라서 진정 각 예술 장르에서 요구되는 바 ‘언어’라는 말로 지칭하는 것은 몸 전체의 원초적인 떨림을 전제로 한 ‘말’이어야 한다. 예술이야말로 뭇 사물들과 사건들이 몸을 둘러싼 상황이 되어 떨면서 리듬을 발하고, 몸이 그 떨림 내지는 리듬에 공명하듯 조응하여 함께 이루어지고, 그래서 몸과 상황이 하나가 되어 크게 진동함으로써 즉 전율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원초적인 떨림이 몸 전체에 퍼져 나타나면 춤이 되고, 순수한 박자와 선율이 되어 나타나면 음악이 되고, 말이 되어 나타나면 시가 되고, 색채와 선의 율동이 되어 나타나면 회화가 되고, 물질적인 양감으로 되어 나타나면 조각이 되고, 벽과 공간 또는 열림과 닫힘으로 나타나면 건축이 된다.
다만, 우주의 떨림이 몸의 떨림으로 나타난 것이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먹고 싸고 자고 하는 등의 일상적인 몸의 욕구와 기능과는 독립되어야 한다. 몸의 떨림 자체가 순수하게 표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술이 일상적인 몸의 떨림과 뒤섞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예술적인 몸의 떨림과 일상적인 몸의 떨림 모두가 근원적으로 원초적인 몸의 떨림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이든 공예품이든 그것에서 예술적인 측면을 운위할 때에는 일상적인 몸의 떨림에 관련해서가 아니라 몸의 떨림 자체를 표현하고 또 불러일으키는 것에 관련해서이다.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저 보고, 듣고, 만지기만 해도 생겨나는 몸의 떨림을 포착해서 표현할 때 예술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데서 예술은 원초적인 말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원초적인 말이란 바로 원초적인 몸의 떨림이기 때문이다.
결론
1.몸과 말
말은 근원적으로 떨림에 근거해 있다. 물론 표층적으로는 목청과 혀의 떨림이다. 그러나 심층적으로는 몸 전체의 떨림이고, 더 확대해서 보면 상황 전체의 떨림이다. ‘떨림’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그래서 ‘떨림’이란 말을 들어도 별달리 떨림이 없을 정도로 식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러나 어떤가? ‘떨림’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이 떨리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물론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정작 그 까닭은 말이 글로 전화되어 나타나고, 글이 소위 떨림이 없는 개념으로만 작동하는 듯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철학이나 과학에서 쓰는 개념들은 몸의 원초적인 떨림이 의사 소통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추상화해 버린 뒤 생겨난 것들이다. 개념적인 말들이 몸의 떨림으로서의 원초적인 말을 지배하고 배척하는 것은 인간이 전 우주적인 떨림으로부터 퉁겨나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는 짓이다.
진화의 과정에서 최후로 나타난 것이 근원적인 것은 아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바탕이 된 것은 여전히 바탕으로 작용하고 있고, 발달하여 자신에게서 새롭게 생겨난 것들과 계속 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전반적으로 그 힘을 달리할 뿐이다. 의식과 정신이 생겨났다고 해서 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의식과 정신의 떨림을 운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몸의 떨림과 완전히 독립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여전히 몸의 떨림은 말의 떨림을 일구어내고 있고, 또 독자적으로 몸말이 되어 그 나름대로 발달하고, 심지어 예술이라는 승화된 몸의 떨림이 되어 그 나름대로 발달하는 것이다.
의식과 정신을 일종의 떨림으로 이해하게 될 때, 실상 그 의식과 정신은 체화된 몸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데카르트 식의 정신 철학에서 말하는 정신이란 떨릴 수 있는 몸체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만약 몸체를 갖는다면 그것은 바로 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말을 듣고서 흥분하고 심각해 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는 등의 정신 내지는 영혼 또는 얼의 일들은 바로 몸의 떨림이지 않고서는 달리 어떤 것일 수가 없는 노릇이다.
말을 정신 특히 이성적인 정신의 도구로 보는 것은, 말이란 바로 몸의 떨림이기 때문에 몸을 도구로 보는 것이다. 실상은 거꾸로다. 몸의 떨림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말의 떨림이고, 말의 떨림을 오로지 핵심만을 뽑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정신적인 개념이고, 정신적인 개념을 담지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필요에 따라 습관적으로 설정하게 된 것이 정신 특히 이성적이고 반성적인 정신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정신을 떨림으로 이해하게 되면 정신은 대체로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그럴 경우 정신 내지는 영혼은 바로 몸의 떨림을 그 자체로 간추려서 부르는 이름임을 알게 된다. 말하자면, 순수한 영혼이니 순수한 정신이니 특히 순수한 반성적인 정신이니 하는 것은 애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말의 원천은 순수한 반성적인 정신에 의거한 것이 아니다. 말은 근원적으로 몸에 의거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몸 전체의 원초적인 떨림이 목청과 혀로 집중되어 나타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바로 그 사람의 몸 전체가 나의 몸에서 출발해서 나의 몸을 향해 떨어 울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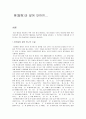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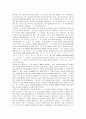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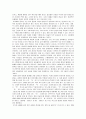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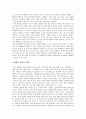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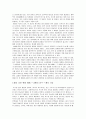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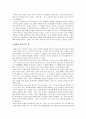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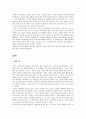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