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김경방 설
-괄말약 설에 대한 비판과 그의 대책
2. 왕사치 설
-고시대 구분의 논점과 그의 주장
-괄말약 설에 대한 비판과 그의 대책
2. 왕사치 설
-고시대 구분의 논점과 그의 주장
본문내용
존재한 것처럼 묘사한다면 이는 실제의 사회의 역사라고 할 수 없다.
노예사회에는 노예노동 이외에 고용노동과 조전제, 대량의 공동체 구성원 그리고 자영농이 존재하였다.
고용노동이 가장 일찍 나타난 것은 노예사회였지만 고공단적 고용제의 착취하의 그리스 · 로마의 노동자는 날품팔이층에 속하게 되었으며 자유민 중에서 최하층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고용제도가 전체 봉건사회에 걸쳐 존재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와서 충분히 발달하게 되었다.
조전제는 봉건사회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노예사회에 이미 나타나 있었다. 이때의 조전제는 자영농민이 고리대의 압박하에서 영락하여 채무노예로 되는 과도형태로 나타났다. 조전제는 노예제가 쇠퇴 · 와해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사회의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로 봉건화 과정의 중요한 지표이다.
한 사회의 성격은 주도적 생산양식에 의해 결정되며 그것의 존재는 다른 일체의 생산양식을 제약하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 생산양식의 존재와 발전은 해당 사회 속의 계급관계의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대해 결정적 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만약 생산양식의 한 측면 즉 생산관계의 소유의 성격이나 생산력중의 노동자의 신분과 지위 등에만 의거하여 시대구분을 하려 한다면 이는 균형을 상실한 위험성을 지닌 것이다.
자영농의 보편적 존재와 노예사회의 계급투쟁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농업은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결정적 의의를 지니고 있었으며 주민의 절대다수는 농촌인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생산력 발달의 수준과 생산도구의 성격이 단지 개인 수공업노동에 적합했던 조건하에서는 자영농의 보편적 존재는 역사적 필연이라 할 수 있다. 자영농은 노예사회나 봉건사회 모두에 걸쳐 동일하게 대량으로 존재하였다.
노예사회에서 자영농은 노예가 아니었으며 평민 혹은 자유민이었다. 자영농은 노예는 아니었으나 압박받으며 착취당하는 계급이었다. 노예사회의 이와 같은 계급 구성과 구분이 노예사회의 계급투쟁을 노예와 노예주 사이에서만 전개되지 않고 귀족과 평민의 귀족노예주에 대한 투쟁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자유민이 노예로 전락되는 것을 반대하는 투쟁이었다. 그러므로 이는 본질적으로 노예사회의 계급투쟁이다.
한 사회가 노예제 사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노예의 수량의 많고 적음뿐만 아니라 노예제의 발생과 발전이 계급관계의 발전과 변화에 대해 야기한 작용이야 말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예사회에는 노예노동 이외에 고용노동과 조전제, 대량의 공동체 구성원 그리고 자영농이 존재하였다.
고용노동이 가장 일찍 나타난 것은 노예사회였지만 고공단적 고용제의 착취하의 그리스 · 로마의 노동자는 날품팔이층에 속하게 되었으며 자유민 중에서 최하층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고용제도가 전체 봉건사회에 걸쳐 존재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와서 충분히 발달하게 되었다.
조전제는 봉건사회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노예사회에 이미 나타나 있었다. 이때의 조전제는 자영농민이 고리대의 압박하에서 영락하여 채무노예로 되는 과도형태로 나타났다. 조전제는 노예제가 쇠퇴 · 와해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사회의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로 봉건화 과정의 중요한 지표이다.
한 사회의 성격은 주도적 생산양식에 의해 결정되며 그것의 존재는 다른 일체의 생산양식을 제약하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 생산양식의 존재와 발전은 해당 사회 속의 계급관계의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대해 결정적 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만약 생산양식의 한 측면 즉 생산관계의 소유의 성격이나 생산력중의 노동자의 신분과 지위 등에만 의거하여 시대구분을 하려 한다면 이는 균형을 상실한 위험성을 지닌 것이다.
자영농의 보편적 존재와 노예사회의 계급투쟁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농업은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결정적 의의를 지니고 있었으며 주민의 절대다수는 농촌인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생산력 발달의 수준과 생산도구의 성격이 단지 개인 수공업노동에 적합했던 조건하에서는 자영농의 보편적 존재는 역사적 필연이라 할 수 있다. 자영농은 노예사회나 봉건사회 모두에 걸쳐 동일하게 대량으로 존재하였다.
노예사회에서 자영농은 노예가 아니었으며 평민 혹은 자유민이었다. 자영농은 노예는 아니었으나 압박받으며 착취당하는 계급이었다. 노예사회의 이와 같은 계급 구성과 구분이 노예사회의 계급투쟁을 노예와 노예주 사이에서만 전개되지 않고 귀족과 평민의 귀족노예주에 대한 투쟁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자유민이 노예로 전락되는 것을 반대하는 투쟁이었다. 그러므로 이는 본질적으로 노예사회의 계급투쟁이다.
한 사회가 노예제 사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노예의 수량의 많고 적음뿐만 아니라 노예제의 발생과 발전이 계급관계의 발전과 변화에 대해 야기한 작용이야 말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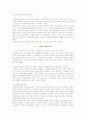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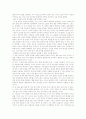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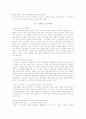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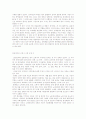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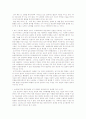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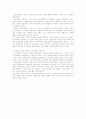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