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악의 정의
Ⅱ. 국악의 이해
1. 국악의 분류
1) 아악
2) 정악
3) 민속악
2. 국악의 형식
1) 한배에 따른 형식
2) 확대형식
3) 메기고 받는 형식
4) 환두형식과 도드리형식
3. 국악에서의 율명
4. 국악의 농현
5. 국악의 선법
1) 평조
2) 계면조
6. 국악의 장단
Ⅲ. 국악의 시대별 역사
1. 상고시대의 국악
2. 삼국 시대의 국악
1) 고구려의 국악
2) 백제의 국악
3) 신라의 국악
3. 통일 신라시대의 국악
1) 당악의 도입
2) 3현 3죽과 음악
3) 춤과 연희
4) 불교음악 범패
5) 삼국의 무속
4. 고려시대의 국악
1) 향악(鄕樂)
2) 당악(唐樂)
3) 아악(雅樂)
5. 조선시대의 국악
1) 세종대왕 시기의 국악
2) 세조의 국악
3) 성종의 국악
4) 영조 시대의 국악
5) 조선시대 말기의 국악
6. 근대의 국악
7. 현대의 국악
Ⅲ. 국악 교육기관
1. 국악 교육기관의 역사
1) 광복 이전
2) 광복 이후
2. 국립국악원
3. 한국정악원
4. 경성아악대
※ ≪ 참 고 문 헌 ≫
Ⅱ. 국악의 이해
1. 국악의 분류
1) 아악
2) 정악
3) 민속악
2. 국악의 형식
1) 한배에 따른 형식
2) 확대형식
3) 메기고 받는 형식
4) 환두형식과 도드리형식
3. 국악에서의 율명
4. 국악의 농현
5. 국악의 선법
1) 평조
2) 계면조
6. 국악의 장단
Ⅲ. 국악의 시대별 역사
1. 상고시대의 국악
2. 삼국 시대의 국악
1) 고구려의 국악
2) 백제의 국악
3) 신라의 국악
3. 통일 신라시대의 국악
1) 당악의 도입
2) 3현 3죽과 음악
3) 춤과 연희
4) 불교음악 범패
5) 삼국의 무속
4. 고려시대의 국악
1) 향악(鄕樂)
2) 당악(唐樂)
3) 아악(雅樂)
5. 조선시대의 국악
1) 세종대왕 시기의 국악
2) 세조의 국악
3) 성종의 국악
4) 영조 시대의 국악
5) 조선시대 말기의 국악
6. 근대의 국악
7. 현대의 국악
Ⅲ. 국악 교육기관
1. 국악 교육기관의 역사
1) 광복 이전
2) 광복 이후
2. 국립국악원
3. 한국정악원
4. 경성아악대
※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악대학과 추계예술대학에 국악과가 각각 설립되었다. 1972년에는 문교부의 교육제도 개편에 따라 국악사양성소는 3년제의 국립국악고등학교로, 국악예술학교는 3년제의 사립국악예술학교로 각각 개편되었다. 1998년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이 개원되었다.
2. 국립국악원
1951년 4월 10일 부산에서 개원하였다. 1955년 4월 1일 부설기관으로 국악사양성소를 신설하고, 1967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으로 이전하였다. 1972년 7월 1일 국악사양성소를 국악고등학교로 승격하고, 1987년 11월 19일 직제개편으로 관리과·장악과·국악진흥과·국악연구실을 두었다. 1987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700번지의 현 건물로 이전하고, 1991년 12월 17일 소속하에 민속국악원을 신설하였다. 1997년 5월 9일 직제개정으로 무대과를 신설하고, 1998년 2월 28일 문화관광부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관리과·장악과·무대과·국악진흥과·국악연구실·국악연주단으로 구성되었다. 전라북도 남원시에 분원인 민속국악원과 전문자료관인 국악연구실 등이 있다. 국악 연주단에는 정악연주단·민속연주단·무용단이 있다. 정통국악의 총본산으로 각종 국악교육을 비롯하여 국내외 연주, 보급활동, 자료제작과 연구·창작 활동 등을 하고 있다. 화요일·목요일·토요일에 상설공연을 개최하며, 전통공연·창작공연·제례 및 의식 연주·송년음악회·판소리 완창발표회 등의 정기공연을 갖는다.
한국의 전통음악과 무용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964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60여개 국, 750여회의 해외공연을 개최하였으며, 1991년부터 해외주재 한국문화원, 교육원 및 민간 국악단체에 강사파견 및 악기, 국악관련 자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악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국악원, 전국국악경연대회, 국악동요제, 국악문화학교, 청소년국악문화탐방, 교사연수, 국악동요작곡 워크샵, 외국인국악강좌, 청소년국악문화강좌 등을 개최하며, 국악자료의 조사, 발굴 및 이론의 체계화 작업을 위하여 국악학술연구, 국악자료실 및 국악박물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초대 원장 이주환을 비롯해 2대 성경린, 3대 김기수, 7대 이승렬 등 국악인들이 역대 원장을 맡았다. 건물에는 예악당·우면당·야외놀이마당인 별맞이터가 있다.
3. 한국정악원
최초의 사립 음악교육기관이며, 조양구락부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뒤, 조선정악전습소·수요회 등의 이름으로 이어져오다가 1947년 조선정악전습소가 사단법인 한국정악원으로 다시 출범하였다. 그 뒤 1951년 국립국악원을 세우고, 1955년 국립국악원 부설로 국악사 양성소를 두었다. 1972년 국악사 양성소가 국악고등학교로 승격되었으며, 1975년에는 사단법인한국국악교육연구회를 만들었다. 1981년 제1회 대한민국 국악제를 열었고, 1990년에는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음악제를 열기도 하였다.
초기에 국악과 양악을 가르치던 조양구락부는 1911년 재정후원회인 정악유지회가 생김에 따라 이름이 조선정악전습소로 바뀌었고 1914년까지 3회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러나 후원회의 도움이 끊기면서 11년 동안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다가, 1935년 수요회의 후원을 받아 수요회라는 이름으로 연극활동만을 계속하던 중 1944년 문을 닫았다. 광복과 함께 1945년 8월 다시 문을 열었고 1947년 11월 지금의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설립 당시는 가요부·음악부·악구제조부 등 3부를 두었으며, 음악부 아래 조선악과 서양악과를 두고 조선악과에는 가곡·거문고·가야금·양금·단소·생황·취악 등의 과목을, 서양악과에는 성악 ·악리 ·창가곡조 ·풍금 ·4현금(바이올린) 등의 과목을 두었다. 초기 지도교사로는 조선악과의 하규일·백용진·김경남·명완벽·함화진·이춘우·하순일 등과, 서양악과의 김인식·이상준 등이 활약하였다. 제3회까지의 졸업생은 조선악과 34명, 서양악과 53명 등 총 87명으로, 이들 졸업생은 정악전승과 서양음악의 기틀 마련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중에는 난파 홍영후도 들어 있다. 한편 연구에도 힘을 기울여 《악학궤범》 《거문고보》 《양금보》 등을 정리하고 《영산회상》 《여민락》 등을 서양악보로 옮겼으며, 《조선속곡집》 《신구속곡집》 《조선신구잡가》 《보통악전대요》 등을 출판했다. 1989년 개원 80돌을 맞아 한국정악원 연주단을 창단하고, 같은 해 4월 첫 연주회를 갖는 등 국악인구의 저변확대와 국악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4. 경성아악대
일제강점기에 전통음악의 연주·보존에 관한 일을 맡았던 음악기관으로 아악부, 이왕직아악부라고도 한다. 조선 개국 이래의 전통적인 음악관서인 장악원은 1897년(광무 1) 대한제국이 되면서 교방사로 개칭되었으나, 사실상 조선총독부의 지배를 받던 1907년(순종 1)에는 장악과로 격하되어 소속 악인도 770여 명에서 300여 명으로 줄었다. 인원은 1913년부터 차츰 줄어 1915년에는 57명만 남았다.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1911년 장악과를 폐지하고 악인도 80여 명으로 감축하여 전통음악의 명맥만 유지하였다. 1915년 당시 아악사장은 1명, 아악사 2명, 아악수장 8명, 아악수 4명 등이었다. 종묘·문묘제례 때 정기적으로 음악을 담당하였고,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하였다. 악보·악서를 편찬하였고 아악생의 음악교육을 담당했으며, 오늘날 국립국악원으로 전승되었다. 1925년 이왕직아악부로 고쳐 1945년까지 존속하였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국악원 터에 있었다.
※ ≪ 참 고 문 헌 ≫
1. 국악과 교육(12-14) - 한국국악 교육학회 / 민속원 / 2003년
2. 국악원논문집(1-3) - 국립국악원 / 2002년
3. 국악원논문집(4-6) - 국립국악원 / 2002년
4. 국악원논문집(7-9) - 국립국악원 / 2002년
5. 국악원논문집 11 - 국립국악원 / 1999년
6.국악명상음악 3(CD) - 명상기획 / 2002년
7. 한국음악연구 제31집 - 한국국악학회 / 한국국악학회 / 2002년
8. 국악과 교육 제20집 - 한국국악학회 / 2002년
9. 국악의 역사(교양국사총서 25) - 장사훈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2000년
2. 국립국악원
1951년 4월 10일 부산에서 개원하였다. 1955년 4월 1일 부설기관으로 국악사양성소를 신설하고, 1967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으로 이전하였다. 1972년 7월 1일 국악사양성소를 국악고등학교로 승격하고, 1987년 11월 19일 직제개편으로 관리과·장악과·국악진흥과·국악연구실을 두었다. 1987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700번지의 현 건물로 이전하고, 1991년 12월 17일 소속하에 민속국악원을 신설하였다. 1997년 5월 9일 직제개정으로 무대과를 신설하고, 1998년 2월 28일 문화관광부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관리과·장악과·무대과·국악진흥과·국악연구실·국악연주단으로 구성되었다. 전라북도 남원시에 분원인 민속국악원과 전문자료관인 국악연구실 등이 있다. 국악 연주단에는 정악연주단·민속연주단·무용단이 있다. 정통국악의 총본산으로 각종 국악교육을 비롯하여 국내외 연주, 보급활동, 자료제작과 연구·창작 활동 등을 하고 있다. 화요일·목요일·토요일에 상설공연을 개최하며, 전통공연·창작공연·제례 및 의식 연주·송년음악회·판소리 완창발표회 등의 정기공연을 갖는다.
한국의 전통음악과 무용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964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60여개 국, 750여회의 해외공연을 개최하였으며, 1991년부터 해외주재 한국문화원, 교육원 및 민간 국악단체에 강사파견 및 악기, 국악관련 자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악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국악원, 전국국악경연대회, 국악동요제, 국악문화학교, 청소년국악문화탐방, 교사연수, 국악동요작곡 워크샵, 외국인국악강좌, 청소년국악문화강좌 등을 개최하며, 국악자료의 조사, 발굴 및 이론의 체계화 작업을 위하여 국악학술연구, 국악자료실 및 국악박물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초대 원장 이주환을 비롯해 2대 성경린, 3대 김기수, 7대 이승렬 등 국악인들이 역대 원장을 맡았다. 건물에는 예악당·우면당·야외놀이마당인 별맞이터가 있다.
3. 한국정악원
최초의 사립 음악교육기관이며, 조양구락부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뒤, 조선정악전습소·수요회 등의 이름으로 이어져오다가 1947년 조선정악전습소가 사단법인 한국정악원으로 다시 출범하였다. 그 뒤 1951년 국립국악원을 세우고, 1955년 국립국악원 부설로 국악사 양성소를 두었다. 1972년 국악사 양성소가 국악고등학교로 승격되었으며, 1975년에는 사단법인한국국악교육연구회를 만들었다. 1981년 제1회 대한민국 국악제를 열었고, 1990년에는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음악제를 열기도 하였다.
초기에 국악과 양악을 가르치던 조양구락부는 1911년 재정후원회인 정악유지회가 생김에 따라 이름이 조선정악전습소로 바뀌었고 1914년까지 3회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러나 후원회의 도움이 끊기면서 11년 동안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다가, 1935년 수요회의 후원을 받아 수요회라는 이름으로 연극활동만을 계속하던 중 1944년 문을 닫았다. 광복과 함께 1945년 8월 다시 문을 열었고 1947년 11월 지금의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설립 당시는 가요부·음악부·악구제조부 등 3부를 두었으며, 음악부 아래 조선악과 서양악과를 두고 조선악과에는 가곡·거문고·가야금·양금·단소·생황·취악 등의 과목을, 서양악과에는 성악 ·악리 ·창가곡조 ·풍금 ·4현금(바이올린) 등의 과목을 두었다. 초기 지도교사로는 조선악과의 하규일·백용진·김경남·명완벽·함화진·이춘우·하순일 등과, 서양악과의 김인식·이상준 등이 활약하였다. 제3회까지의 졸업생은 조선악과 34명, 서양악과 53명 등 총 87명으로, 이들 졸업생은 정악전승과 서양음악의 기틀 마련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중에는 난파 홍영후도 들어 있다. 한편 연구에도 힘을 기울여 《악학궤범》 《거문고보》 《양금보》 등을 정리하고 《영산회상》 《여민락》 등을 서양악보로 옮겼으며, 《조선속곡집》 《신구속곡집》 《조선신구잡가》 《보통악전대요》 등을 출판했다. 1989년 개원 80돌을 맞아 한국정악원 연주단을 창단하고, 같은 해 4월 첫 연주회를 갖는 등 국악인구의 저변확대와 국악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4. 경성아악대
일제강점기에 전통음악의 연주·보존에 관한 일을 맡았던 음악기관으로 아악부, 이왕직아악부라고도 한다. 조선 개국 이래의 전통적인 음악관서인 장악원은 1897년(광무 1) 대한제국이 되면서 교방사로 개칭되었으나, 사실상 조선총독부의 지배를 받던 1907년(순종 1)에는 장악과로 격하되어 소속 악인도 770여 명에서 300여 명으로 줄었다. 인원은 1913년부터 차츰 줄어 1915년에는 57명만 남았다.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1911년 장악과를 폐지하고 악인도 80여 명으로 감축하여 전통음악의 명맥만 유지하였다. 1915년 당시 아악사장은 1명, 아악사 2명, 아악수장 8명, 아악수 4명 등이었다. 종묘·문묘제례 때 정기적으로 음악을 담당하였고,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하였다. 악보·악서를 편찬하였고 아악생의 음악교육을 담당했으며, 오늘날 국립국악원으로 전승되었다. 1925년 이왕직아악부로 고쳐 1945년까지 존속하였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국악원 터에 있었다.
※ ≪ 참 고 문 헌 ≫
1. 국악과 교육(12-14) - 한국국악 교육학회 / 민속원 / 2003년
2. 국악원논문집(1-3) - 국립국악원 / 2002년
3. 국악원논문집(4-6) - 국립국악원 / 2002년
4. 국악원논문집(7-9) - 국립국악원 / 2002년
5. 국악원논문집 11 - 국립국악원 / 1999년
6.국악명상음악 3(CD) - 명상기획 / 2002년
7. 한국음악연구 제31집 - 한국국악학회 / 한국국악학회 / 2002년
8. 국악과 교육 제20집 - 한국국악학회 / 2002년
9. 국악의 역사(교양국사총서 25) - 장사훈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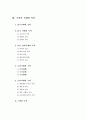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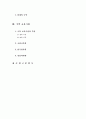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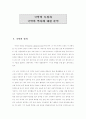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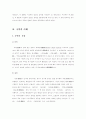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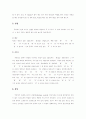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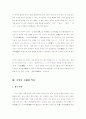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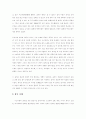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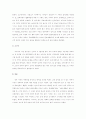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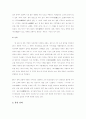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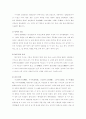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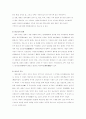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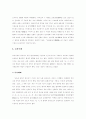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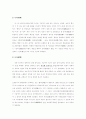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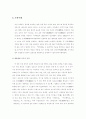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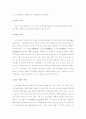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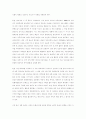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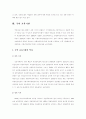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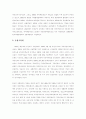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