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석상신궁 칠지도
1) 출선기관설(出先機關設)
2) 가야(伽倻)의 왜설(倭設)
3) 분국설(分國設)
4) 백제군사령부설(百濟軍司令部設)
5) 외교사절설(外交使節設)
2. 석상신궁 칠지도
1) 출선기관설(出先機關設)
2) 가야(伽倻)의 왜설(倭設)
3) 분국설(分國設)
4) 백제군사령부설(百濟軍司令部設)
5) 외교사절설(外交使節設)
본문내용
민주국가라는 곳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꿈여대어 국민들에게 쇠뇌 시키고 있다. 항상 말도 않되는 일을 우겨서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것 같다. 언제나 독도가 자기들의 땅이라고 우기고 실제로 그렇게 말도 않되는 이야기를 정석으로 믿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이러한 일본의 행태가 하루 빨리 고쳐져서 한·일 관계가 하루빨리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이고, 아무리 봐도 독도는 우리땅이고 임나일본부설은 거짓인거 같다.
또한 임나일본부의 다른 학설들 또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출선기관설(出先機關設)
‘출선기관’이란 일본어적 표현으로서‘출장소’내지는‘출장기관’과 같은 뜻이다. 이 학설은 얼마전까지의 일본학계의 통설을 대변하는 용어로서 그 연구동향을 특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는 고대의 일본이 4∼6세기의 2백년간에 걸쳐 한반도 남부를 근대의 식민지와 같이 경영하였으며, 그 중심적 통치기관이 임나일본부였다고 해석하며, 이른바‘남선경영론’의 골자를 이루었던 견해이다. 이러한 해석의 시작은 일본서기가 편찬되던 8세기경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전형은 1720년에 완성되어진 대일본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o
그러나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붐을 이루었던 동아시아사에 대한 관심은 한국사연구의 재검토로 이어졌으며, 출선기관설이 이용되었던 일본서기에 대한 비판 및 재검토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하여 출선기관설은 더 이상 통설적인 위치를 가질 수 없게 되었으며, 중등학교 일본사교과서의 기술은 별도로 하더라도 현재 이러한 학설을 주장하거나 여기에 근거하는 전문 연구자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2) 가야(伽倻)의 왜설(倭設)
일본내의‘출선기관설’에 대한 재검토의 분위기와 뒤에 소개할 북한의 연구에 자극을 받아 일본연구자의 입장에서 수정되어진 수정론의 하나가‘가야의 왜인설’이다. 이는 선사시대부터 가야지역과 일본열도의 교류가 활발하였으며, 그 결과 일본열도에 한반도의 주민이 이주하였던 것과 같이 가야지역에도 일부의 왜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됐다.‘임나일본부’는 그러한 왜인들 내지는 왜인과 한인과의 혼혈인들을 통제하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근대의 영사관과 비슷한 성격으로 이해하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가야 지역에 있어서 왜인들의 집단적 거주가 문헌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의 발굴조사에서 왜계통의 문몰로 보이는 유물이 가야 지역에서 확인되고는 있으나 그 수량이 매우 적으며, 출토상황을 볼 때 전체적인 가야계통의 유물 속에 극히 일부로서 확인될 뿐이다.
3) 분국설(分國設)
1963년에 북한의 김석형에 의하여 제기된 설로 임나일본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대한일관계사에 관련된 일본학계의 발상을 완전히 뒤엎는 혁명적인 연구였다. 선사시대 이래 삼한 삼국의 주민들은 일본열도에 이주하여 각기 자신들의 출신지와 같은 나라를 건국하여 모국에 대하여 분국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전제하고, 이들 분국들 중에는 가야인들이 현재의 히로시마 동부와 오카야마에 걸치는 지역에 건국한 임나국이 있다고 하였다.‘임나일본부’는 한반도의 가야 지역과는 전혀 무관하며 일본열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서 규정지었다.
그러나 임나 자체를 한반도가 아닌 일본열도로 비정하였던 점은 분국설의 치명적인 약점이라 할 수 있다. 임나라는 용어는 일본서기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료에서도 사용된 예를 확인할 수가 있다. <한원>에 인용된 중국의 인문지리지에 의하면 한반도 남부의 가야 지역을 총괄하여 임나라고 하고, <삼국사기>열전에 의하면 강수가 임나가량 출신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임나는 한반도의 가야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며 일본열도의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백제군사령부설(百濟軍司令部設)
과거 일본의‘출선기관설’에 대한 북한 학계의 비판이‘분국설’이라 한다면 한
국학계의 본격적인 비판 및 대안 제시는‘백제군사령부설’이다. 이는 일본서기에 보이는 임나(가야) 관련사료 중에 일본의 주체로 묘사되어 있는 기사들 가운데에는
백제를 주체로 바꾸어 놓아보면 사리에 맞게 되는 것들이 적지 않다고 전제하였다. 즉 4세기 말경 왜가 가라칠국을 점령하였다는 기수에 보이는 역사적 사실이란 백제의 가야제국 정복이라고 해석하였으며, 6세기 중반에 보이는‘임나일본부’란 다름아닌‘임나백제부’와 같은 것이라고 해석했고 백제가 군사적 목적으로 가야지역에 설치하였던 군사사령부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4세기 말에 가야 지역의 일부를 평정하였던 백제가 6세기 중반에 와서야 백제군사령부를 설치하였다는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백제가 가야 지역에 관여하게 되는 것은 점령이라든지 군정과 같은 것이 아니라 동쪽의 대신라방어선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외교사절설(外交使節設)
이상의 연구들은 임나일본부의 실체에 대해서 각기 다른 해석을 전개하고 있으면서도‘임나일본부’를 해외 통치기관이나, 백제의 군정기관과 같은 관청이나 기관의 성격으로 이해하였던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서기의 임나일본부 관련사료를 보면 통치나 군사적 역할을 찾아 볼 만한 기술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에 주목하면서 보다 객관적인 실체규명의 연구가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즉 부(府)라는 표기는 기관이나 관청이 아닌 사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임나일본부를 임나에 파견되어진 왜의 사실들로 이해한 것이다. 이는 1970년대부터 근년에 한일 고고 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해석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임나일본부’의 문제는 한반도 남부의 가야 지역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나일본보의 실체에 대한 종래의 연구에서는 일본학계의 왜국에 의한‘출선기관설’이나 한국학계의‘백제군사령부설’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야 제국의 이해관계가 고려되었던 바는 전혀없다. 이를테면 임나(가야)부재의 임나일본부설이 되었던 것이며, 가야 제국의 이해관계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임나일본부의 다른 학설들 또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출선기관설(出先機關設)
‘출선기관’이란 일본어적 표현으로서‘출장소’내지는‘출장기관’과 같은 뜻이다. 이 학설은 얼마전까지의 일본학계의 통설을 대변하는 용어로서 그 연구동향을 특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는 고대의 일본이 4∼6세기의 2백년간에 걸쳐 한반도 남부를 근대의 식민지와 같이 경영하였으며, 그 중심적 통치기관이 임나일본부였다고 해석하며, 이른바‘남선경영론’의 골자를 이루었던 견해이다. 이러한 해석의 시작은 일본서기가 편찬되던 8세기경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전형은 1720년에 완성되어진 대일본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o
그러나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붐을 이루었던 동아시아사에 대한 관심은 한국사연구의 재검토로 이어졌으며, 출선기관설이 이용되었던 일본서기에 대한 비판 및 재검토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하여 출선기관설은 더 이상 통설적인 위치를 가질 수 없게 되었으며, 중등학교 일본사교과서의 기술은 별도로 하더라도 현재 이러한 학설을 주장하거나 여기에 근거하는 전문 연구자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2) 가야(伽倻)의 왜설(倭設)
일본내의‘출선기관설’에 대한 재검토의 분위기와 뒤에 소개할 북한의 연구에 자극을 받아 일본연구자의 입장에서 수정되어진 수정론의 하나가‘가야의 왜인설’이다. 이는 선사시대부터 가야지역과 일본열도의 교류가 활발하였으며, 그 결과 일본열도에 한반도의 주민이 이주하였던 것과 같이 가야지역에도 일부의 왜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됐다.‘임나일본부’는 그러한 왜인들 내지는 왜인과 한인과의 혼혈인들을 통제하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근대의 영사관과 비슷한 성격으로 이해하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가야 지역에 있어서 왜인들의 집단적 거주가 문헌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의 발굴조사에서 왜계통의 문몰로 보이는 유물이 가야 지역에서 확인되고는 있으나 그 수량이 매우 적으며, 출토상황을 볼 때 전체적인 가야계통의 유물 속에 극히 일부로서 확인될 뿐이다.
3) 분국설(分國設)
1963년에 북한의 김석형에 의하여 제기된 설로 임나일본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대한일관계사에 관련된 일본학계의 발상을 완전히 뒤엎는 혁명적인 연구였다. 선사시대 이래 삼한 삼국의 주민들은 일본열도에 이주하여 각기 자신들의 출신지와 같은 나라를 건국하여 모국에 대하여 분국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전제하고, 이들 분국들 중에는 가야인들이 현재의 히로시마 동부와 오카야마에 걸치는 지역에 건국한 임나국이 있다고 하였다.‘임나일본부’는 한반도의 가야 지역과는 전혀 무관하며 일본열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서 규정지었다.
그러나 임나 자체를 한반도가 아닌 일본열도로 비정하였던 점은 분국설의 치명적인 약점이라 할 수 있다. 임나라는 용어는 일본서기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료에서도 사용된 예를 확인할 수가 있다. <한원>에 인용된 중국의 인문지리지에 의하면 한반도 남부의 가야 지역을 총괄하여 임나라고 하고, <삼국사기>열전에 의하면 강수가 임나가량 출신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임나는 한반도의 가야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며 일본열도의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백제군사령부설(百濟軍司令部設)
과거 일본의‘출선기관설’에 대한 북한 학계의 비판이‘분국설’이라 한다면 한
국학계의 본격적인 비판 및 대안 제시는‘백제군사령부설’이다. 이는 일본서기에 보이는 임나(가야) 관련사료 중에 일본의 주체로 묘사되어 있는 기사들 가운데에는
백제를 주체로 바꾸어 놓아보면 사리에 맞게 되는 것들이 적지 않다고 전제하였다. 즉 4세기 말경 왜가 가라칠국을 점령하였다는 기수에 보이는 역사적 사실이란 백제의 가야제국 정복이라고 해석하였으며, 6세기 중반에 보이는‘임나일본부’란 다름아닌‘임나백제부’와 같은 것이라고 해석했고 백제가 군사적 목적으로 가야지역에 설치하였던 군사사령부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4세기 말에 가야 지역의 일부를 평정하였던 백제가 6세기 중반에 와서야 백제군사령부를 설치하였다는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백제가 가야 지역에 관여하게 되는 것은 점령이라든지 군정과 같은 것이 아니라 동쪽의 대신라방어선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외교사절설(外交使節設)
이상의 연구들은 임나일본부의 실체에 대해서 각기 다른 해석을 전개하고 있으면서도‘임나일본부’를 해외 통치기관이나, 백제의 군정기관과 같은 관청이나 기관의 성격으로 이해하였던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서기의 임나일본부 관련사료를 보면 통치나 군사적 역할을 찾아 볼 만한 기술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에 주목하면서 보다 객관적인 실체규명의 연구가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즉 부(府)라는 표기는 기관이나 관청이 아닌 사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임나일본부를 임나에 파견되어진 왜의 사실들로 이해한 것이다. 이는 1970년대부터 근년에 한일 고고 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해석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임나일본부’의 문제는 한반도 남부의 가야 지역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나일본보의 실체에 대한 종래의 연구에서는 일본학계의 왜국에 의한‘출선기관설’이나 한국학계의‘백제군사령부설’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야 제국의 이해관계가 고려되었던 바는 전혀없다. 이를테면 임나(가야)부재의 임나일본부설이 되었던 것이며, 가야 제국의 이해관계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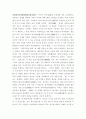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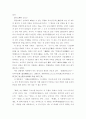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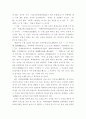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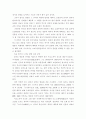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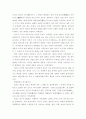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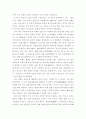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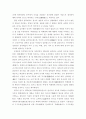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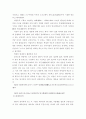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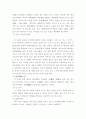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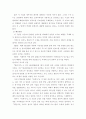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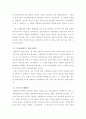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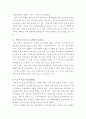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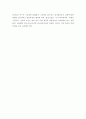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