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수도사들은 학문에 몸을 바친 사람들이고 장서관과 그 곳의 규칙과 금기에 완전히 매료당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장서관과 더불어, 장서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아이마로 수도사는, 학문에 전념하는 수도사라면 장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모두 열람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도 좋은 책을 만들 줄 압니다. 그러니 마땅히 좋은 책을 만들어 대학에 배포하고 세간에서 일어나는 일에 귀를 기울여 수도원의 문화를 살찌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탈리아와 프로방스를 오가는 순례자 및 상인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서관을 이런 사람들에게 개방하여 반드시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올라와서 자유로이 이용하게 했어야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원장은 죽자고 이 장서관을 틀어쥐고 있으니 이 아니 한심한 일입니까? 이 곳 수도원장의 안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 속에는 서책 상자만 가득 들어앉아 있지요. 케케묵었다는 것입니다.”
장서관은 속세와 담을 쌓음으로써 신비스러움과 위대함을 높이며 일체의 논란과 탐구를 거부한다. 이것이 지식을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사악한 손길이 장서관을 거쳐 가도 책은 손상될지언정 학문은 손상되지 않는다.
복잡한 미로들로 뒤엉킨 장서관
수도사들이 필사를 하는 문서 사자실은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다. 문서 사자실이 주방 위에 있어서 주방의 열기를 덤으로 누리기도 하지만 주방의 빵가마 굴뚝이 서쪽 및 남쪽 탑루를 오르는 두 개의 계단층 기둥을 통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서 사자실 반대쪽인 북쪽 탑루로 오르는 곳에는 계단이 없는 대신 벽난로가 있어서 공기를 덥혀 주지만 장서관으로 통하는 유일한 곳인 동쪽 탑루쪽은 난방이 가장 허술하다. 그럼에도 동쪽 탑루쪽은 수도사들이 항상 자리를 꽉 메운다. 즉 가장 중요한 통로 근방의 난방을 허술하게 함으로써 거기에 앉는 수도사들의 기를 꺾어 장서관 접근을 저지하자는 수도원 측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장서관은 미궁이다. 납골당에 들어서서 해골의 눈에다 손가락을 넣고 누르면 제단이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 시커먼 공동(空洞)이 나타난다. 유골이 수북이 쌓인 곳을 지나 동쪽 계단을 통하면 장서관이다. 장서관은 창이 하나도 없는 커다란 7면 벽실인데 네 벽에는 문이 있고 문이 없는 벽 앞에는 서책을 채운 궤짝이 놓여 있다. 문 하나를 들어가면 다른 방으로 이어지는데, 방 중에는 문이 두 개인 방도 있고 세 개인 방도 있다.
방에 놓인 궤짝과 탁자, 그 위에 정리된 책은 모두 똑같아서 그것들로 방을 구분할 수는 없다. 또 요술 거울로 모습을 확대시키거나 찌그러뜨려 귀신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고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약초로 연기를 내어 초자연적인 존재가 장서관을 지킨다는 인식을 수도사들에게 심어준다.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스스로를 지켜내는 장서관은 손쉽게 접근할 수 없는 세계이다.
인간의 웃음에 대한 기독교적 의미
소설의 주요 흐름인 수도사들의 죽음은 책과 관련있다. 아델모, 베난티오, 베렝가리오, 세베리노 수도사는 웃음의 문제 - 웃음은 예술이며 식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세상의 문이다 - 를 다룬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 2권의 유일한 필사본이 장서관에 보관되어 있음을 알고 읽으려 하다가 호르헤 수도사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 당시 기독교에서 인간의 웃음은 하느님의 신성한 진리를 조롱하고 왜곡하는 주된 요인이므로 이 책은 이단 취급 되었던 것이다. ‘공허한 말, 웃음을 유발하는 언사를 입에 올리지 말지어다’라는 베네딕트회 회칙은 이를 잘 나타내 준다. 호르헤는 웃음이란 허약함, 부패, 육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진심을 얼버무리는 것으로 농부의 여흥, 주정뱅이에게나 가당하다고 말한다.
진리에 다가가는 책
아드소는 사건 4일째, 장서관과 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 간다.
“그 때까지 내가 안 바로 서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든 하느님이든 서책의 외적인 것만 다루는 물건이었다. 그러나 사부님 말씀에 따르면 서책은 서책 자체의 내용도 다루고 있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서책끼리 대화를 주고 받는다는 것을 나는 사부님 말씀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문득 장서관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그렇다면 장서관이란 수세기에 걸쳐 서책끼리의 음울한 속삭임이 계속되는 곳,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는 정복되지 않는 살아 있는 막강한 권력자, 만든 자, 옮겨 쓴 자가 죽어도 고스란히 살아 남을 무한한 비밀의 보고인 셈이었다.” - 아드소의 말 中에서
수도원을 세운 이들은 하느님의 뜻에 갇혀 의미도 모른 채 그저 베끼고 기도하듯이 쓰고, 쓰는 듯이 기도하는 필사사(筆寫士) 수도사들을 원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수도원이 축적한 지식의 부는 지식 그 자체로 이용되지 못하고 상품의 교환 수단으로, 자만을 위한 사치품으로 이용되었다. 또 수도원장은 자신만이 소장하고 있는 새로운 학문이 수도원 밖에서 자유로이 나돈다면 신성한 수도원은 교구의 부속학교나 도시의 대학과 다를 바가 없어지고 수도원의 신성은 허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속세와 담을 쌓은 채로 그 권위와 권력을 고집했다.
그러나 책과 책은 대화를 한다. 한 권의 책을 읽다 보면 다른 책의 내용을 알 수 있고 다른 책에 대한 흥미가 생기기도 하여 진리에 한 발자국 다가간다. 책은 생각의 씨앗으로 지식의 싹을 틔우고 진리의 꽃을 피운다.
중세 수도원의 쇠퇴
중세 시대에는 오직 기독교 기관만이 학문 연구가 가능한 장소였으며 성직자들이 사용하던 라틴어는 모든 학문의 전용어였다. 그런데 중세 말기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읽고 쓰기가 널리 보급된 도시의 중류 계급은 일상 용어를 사용하며 대중 문학과 반 학술적인 도서에 만족하였고, 교회 감독에서 해방된 일반 계급은 궁정풍의 운문과 경쾌한 독서를 즐기게 되었다. 곧 교구의 부속 학교, 도시의 조합, 각지의 대학은 앞을 다투어 서책의 필사본을 만들고 새 서책을 발간하여 학문과 교육의 중심이 되었지만, 보존하느라 진리의 생성 장소가 되지못한 수도원은 쇠퇴하게 되었다.
때문에 아이마로 수도사는, 학문에 전념하는 수도사라면 장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모두 열람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도 좋은 책을 만들 줄 압니다. 그러니 마땅히 좋은 책을 만들어 대학에 배포하고 세간에서 일어나는 일에 귀를 기울여 수도원의 문화를 살찌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탈리아와 프로방스를 오가는 순례자 및 상인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서관을 이런 사람들에게 개방하여 반드시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올라와서 자유로이 이용하게 했어야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원장은 죽자고 이 장서관을 틀어쥐고 있으니 이 아니 한심한 일입니까? 이 곳 수도원장의 안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 속에는 서책 상자만 가득 들어앉아 있지요. 케케묵었다는 것입니다.”
장서관은 속세와 담을 쌓음으로써 신비스러움과 위대함을 높이며 일체의 논란과 탐구를 거부한다. 이것이 지식을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사악한 손길이 장서관을 거쳐 가도 책은 손상될지언정 학문은 손상되지 않는다.
복잡한 미로들로 뒤엉킨 장서관
수도사들이 필사를 하는 문서 사자실은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다. 문서 사자실이 주방 위에 있어서 주방의 열기를 덤으로 누리기도 하지만 주방의 빵가마 굴뚝이 서쪽 및 남쪽 탑루를 오르는 두 개의 계단층 기둥을 통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서 사자실 반대쪽인 북쪽 탑루로 오르는 곳에는 계단이 없는 대신 벽난로가 있어서 공기를 덥혀 주지만 장서관으로 통하는 유일한 곳인 동쪽 탑루쪽은 난방이 가장 허술하다. 그럼에도 동쪽 탑루쪽은 수도사들이 항상 자리를 꽉 메운다. 즉 가장 중요한 통로 근방의 난방을 허술하게 함으로써 거기에 앉는 수도사들의 기를 꺾어 장서관 접근을 저지하자는 수도원 측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장서관은 미궁이다. 납골당에 들어서서 해골의 눈에다 손가락을 넣고 누르면 제단이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 시커먼 공동(空洞)이 나타난다. 유골이 수북이 쌓인 곳을 지나 동쪽 계단을 통하면 장서관이다. 장서관은 창이 하나도 없는 커다란 7면 벽실인데 네 벽에는 문이 있고 문이 없는 벽 앞에는 서책을 채운 궤짝이 놓여 있다. 문 하나를 들어가면 다른 방으로 이어지는데, 방 중에는 문이 두 개인 방도 있고 세 개인 방도 있다.
방에 놓인 궤짝과 탁자, 그 위에 정리된 책은 모두 똑같아서 그것들로 방을 구분할 수는 없다. 또 요술 거울로 모습을 확대시키거나 찌그러뜨려 귀신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고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약초로 연기를 내어 초자연적인 존재가 장서관을 지킨다는 인식을 수도사들에게 심어준다.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스스로를 지켜내는 장서관은 손쉽게 접근할 수 없는 세계이다.
인간의 웃음에 대한 기독교적 의미
소설의 주요 흐름인 수도사들의 죽음은 책과 관련있다. 아델모, 베난티오, 베렝가리오, 세베리노 수도사는 웃음의 문제 - 웃음은 예술이며 식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세상의 문이다 - 를 다룬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 2권의 유일한 필사본이 장서관에 보관되어 있음을 알고 읽으려 하다가 호르헤 수도사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 당시 기독교에서 인간의 웃음은 하느님의 신성한 진리를 조롱하고 왜곡하는 주된 요인이므로 이 책은 이단 취급 되었던 것이다. ‘공허한 말, 웃음을 유발하는 언사를 입에 올리지 말지어다’라는 베네딕트회 회칙은 이를 잘 나타내 준다. 호르헤는 웃음이란 허약함, 부패, 육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진심을 얼버무리는 것으로 농부의 여흥, 주정뱅이에게나 가당하다고 말한다.
진리에 다가가는 책
아드소는 사건 4일째, 장서관과 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 간다.
“그 때까지 내가 안 바로 서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든 하느님이든 서책의 외적인 것만 다루는 물건이었다. 그러나 사부님 말씀에 따르면 서책은 서책 자체의 내용도 다루고 있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서책끼리 대화를 주고 받는다는 것을 나는 사부님 말씀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문득 장서관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그렇다면 장서관이란 수세기에 걸쳐 서책끼리의 음울한 속삭임이 계속되는 곳,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는 정복되지 않는 살아 있는 막강한 권력자, 만든 자, 옮겨 쓴 자가 죽어도 고스란히 살아 남을 무한한 비밀의 보고인 셈이었다.” - 아드소의 말 中에서
수도원을 세운 이들은 하느님의 뜻에 갇혀 의미도 모른 채 그저 베끼고 기도하듯이 쓰고, 쓰는 듯이 기도하는 필사사(筆寫士) 수도사들을 원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수도원이 축적한 지식의 부는 지식 그 자체로 이용되지 못하고 상품의 교환 수단으로, 자만을 위한 사치품으로 이용되었다. 또 수도원장은 자신만이 소장하고 있는 새로운 학문이 수도원 밖에서 자유로이 나돈다면 신성한 수도원은 교구의 부속학교나 도시의 대학과 다를 바가 없어지고 수도원의 신성은 허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속세와 담을 쌓은 채로 그 권위와 권력을 고집했다.
그러나 책과 책은 대화를 한다. 한 권의 책을 읽다 보면 다른 책의 내용을 알 수 있고 다른 책에 대한 흥미가 생기기도 하여 진리에 한 발자국 다가간다. 책은 생각의 씨앗으로 지식의 싹을 틔우고 진리의 꽃을 피운다.
중세 수도원의 쇠퇴
중세 시대에는 오직 기독교 기관만이 학문 연구가 가능한 장소였으며 성직자들이 사용하던 라틴어는 모든 학문의 전용어였다. 그런데 중세 말기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읽고 쓰기가 널리 보급된 도시의 중류 계급은 일상 용어를 사용하며 대중 문학과 반 학술적인 도서에 만족하였고, 교회 감독에서 해방된 일반 계급은 궁정풍의 운문과 경쾌한 독서를 즐기게 되었다. 곧 교구의 부속 학교, 도시의 조합, 각지의 대학은 앞을 다투어 서책의 필사본을 만들고 새 서책을 발간하여 학문과 교육의 중심이 되었지만, 보존하느라 진리의 생성 장소가 되지못한 수도원은 쇠퇴하게 되었다.
추천자료
 [음악감상문][음악감상][교향곡][베토벤](베토벤의 교향곡 제 5번 작품 62 C단조)음악감상문,...
[음악감상문][음악감상][교향곡][베토벤](베토벤의 교향곡 제 5번 작품 62 C단조)음악감상문,... 음악회감상문,음악회 공연관람 감상문,음악감상문,음악회를다녀와서
음악회감상문,음악회 공연관람 감상문,음악감상문,음악회를다녀와서  독립영화감상문,영화 감상문,송환 독립영화 감상문
독립영화감상문,영화 감상문,송환 독립영화 감상문 냉정과 열정사이[냉정과 열정사이 감상문][냉정과 열정사이 영화감상문][냉정과열정사이 감상...
냉정과 열정사이[냉정과 열정사이 감상문][냉정과 열정사이 영화감상문][냉정과열정사이 감상... 맨오브오너영화감상문[맨오브오너영화감상][맨오브오너감상문][맨오브오너 영화감상문][맨오...
맨오브오너영화감상문[맨오브오너영화감상][맨오브오너감상문][맨오브오너 영화감상문][맨오... 오세암영화감상문[오세암영화감상][오세암감상문][오세암 영화감상문][오세암]
오세암영화감상문[오세암영화감상][오세암감상문][오세암 영화감상문][오세암]  레인맨영화감상문[레인맨감상문][레인맨][영화레인맨감상문]
레인맨영화감상문[레인맨감상문][레인맨][영화레인맨감상문] 레옹영화감상문[레옹감상문][레옹의인물분석적감상문][영화레옹][레옹]
레옹영화감상문[레옹감상문][레옹의인물분석적감상문][영화레옹][레옹] 인셉션영화감상문[크리스토퍼놀란의 인셉션 분석적영화감상문][SF영화감상문][SF인셉션]
인셉션영화감상문[크리스토퍼놀란의 인셉션 분석적영화감상문][SF영화감상문][SF인셉션] 패밀리맨영화감상문[가족영화감상문 패밀리맨][패밀리맨감상문][가족영화]
패밀리맨영화감상문[가족영화감상문 패밀리맨][패밀리맨감상문][가족영화] 아마데우스 [아마데우스 감상문]아마데우스 영화감상문][영화아마데우스감상문][아마데우스감...
아마데우스 [아마데우스 감상문]아마데우스 영화감상문][영화아마데우스감상문][아마데우스감... [독서][자연의 종말][서평][독서감상문]독서의 개념, 독서의 목적, 독서의 의의, 자연의 종말...
[독서][자연의 종말][서평][독서감상문]독서의 개념, 독서의 목적, 독서의 의의, 자연의 종말... 글러브 영화감상문, 우수 영화감상문 : 글러브 우수 영화감상문
글러브 영화감상문, 우수 영화감상문 : 글러브 우수 영화감상문 감상문][영화감상문][감상평]위험한 관계, 위험한 관계 감상문
감상문][영화감상문][감상평]위험한 관계, 위험한 관계 감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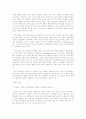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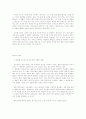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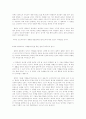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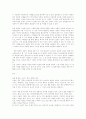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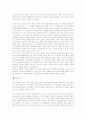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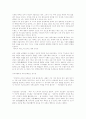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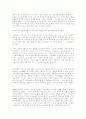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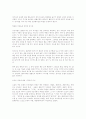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