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이상
1.현대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1) 민주주의(Democracy)의 이념
2.민주주의 정치의 역사적 의미 변천
(1) 근대 민주주의
제2장 현실
(1) 자유와 평등
(1)자유와 평등의 가치 충돌.
(2) 민주주의와 기본권
3. 입헌주의
(1).프랑스 인권 선언 (1789년)
4. 기본권의 변천
(1)자유권적 기본권
(2)참정권적 기본권
(3)사회권적 기본권
5. 민주주의 운영 원리
제3장 딜레마
부록: 기본권의 역사
1.현대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1) 민주주의(Democracy)의 이념
2.민주주의 정치의 역사적 의미 변천
(1) 근대 민주주의
제2장 현실
(1) 자유와 평등
(1)자유와 평등의 가치 충돌.
(2) 민주주의와 기본권
3. 입헌주의
(1).프랑스 인권 선언 (1789년)
4. 기본권의 변천
(1)자유권적 기본권
(2)참정권적 기본권
(3)사회권적 기본권
5. 민주주의 운영 원리
제3장 딜레마
부록: 기본권의 역사
본문내용
아니라 그 일부분이 부불노동(不拂勞動)으로 착취되어 부르주아 자본의 잉여가치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착취의 개념은 각자의 생산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라는 분배적 정의의 자본주의적 개념에도 어긋나는 것이기에 비판되는 것처럼 보인다. 착취는 고대 노예경제나 중세 봉건제도에도 있어 왔으나 자본주의적 착취의 특이성은 그것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약이 마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인 것처럼 위장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맑스는 {고타강령비판}에서 공산주의의 초기 단계에서는 생산수단의 공유와 공동관리에 의거해서 생산의 기여도에 따른 분배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초기단계의 이러한 분배적 정의의 기준은 아직도 부르주아적 한계(bourgeois limitation)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준은 개인적 자질과 생산능력을 자연적 특혜로 인정하여 필요에 따른 고려사항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맑스에 의하면 고차적인 공산사회에서는 노동이 개인적 경제유인에 따른 보수만을 요구하는 고통이 아니라 삶의 기본적 요구가 되고 개인의 다방면에 걸친 발전은 그들의 생산능력을 증진시켜 풍요로운 협동적 부가 산출된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에서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s!)\"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생산수단과 소비형태의 합리적인 조정계획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를 괴롭혀온 과생산 또는 저생산, 실업, 경기침체, 불경기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맑스의 이러한 인간해방의 거대한 청사진은 현실적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에서 결코 실현된 적이 없다.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는 공산당 독재에 의한 국가소유로 되어 노동자들의 착취와 소외를 영속화하는 또 다른 계급지배와 자본의 비효율적 운용이라는 비극을 낳고 말았다.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기규제 대신에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적 정부를 본다. 그러나 이러한 맑스에 대한 배반은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근대 초기에 부르주아들이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것이 유토피아가 아니였듯이 오늘날의 노동자들이 경제적 자유를 통한 인간해방에의 투쟁도 결코 유토피아는 아닐 것이다.
소유물의 원초적 취득에 대한 노직의 입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로크적 단서, 즉 \"충분한 양의 그리고 똑같은 양질의 것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충분한계의 조건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로크의 자연권적 사유 재산권을 옹호하는 것이다 (N,175쪽). 노직은 이러한 단서가 보다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무소유 대상의 노동을 통한 취득이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 그것의 사유화는 정당화된다는 약한 단서로 재해석한다. 이러한 약한 단서는 소유물의 원초적 취득뿐만 아니라 그 이후 소유물의 이전에서도 적용되어 사유 재산권의 일반적인 제약으로 된다 (N,179쪽). 그러나 이러한 노직의 약한 단서도 사유 재산권의 철학적 정당화로서는 몇가지 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우선 무소유의 대상(an unowned object)을 로크에서처럼 (2권 25절) 인류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아무에게도 소유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유재산제를 미리 가정하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fallacy of begging the question)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인류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것(given to mankind in common)을 사유재산제에 의한 무소유가 아니라 인류의 공동소유(common ownership)로 가정한다고 해도 논리적인 하자는 없다. 특히 증명의 부담(the burden of proof)은 사유화 쪽에 더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단서는 어떻게 해석된다고 해도 결국 인간의 복지에 사유 재산권을 종속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불의의 교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더욱 선명해진다. 노직은 소유물의 취득과 이전에 있어서 과거의 부정의에 대한 누적적 결과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부정의를 교정할 수있는 개략적인 원칙은 롤즈의 차등의 원칙--최소수혜자의 기대치의 극대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최소수혜자는 불의의 희생자일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밀고 나간다면 노직은 결국 자본의 원초적 축적에 있어서의 부정의에 대한 맑스의 인식을 수용하는 셈이다. \"우리의 죄에 대한 벌로서 사회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너무나 과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인류역사에서 저질러진) 과거의 불의들은 너무나 심각하여 우리는 이를 교정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볼 때는 보다 포괄적인 국가를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러한 보다 포괄적인 국가는 롤즈의 복지국가 이외에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불의의 교정이라는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고려(human considerations)와 연대적인 협동 활동(joint cooperative activities)이라는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관점에서도 자유지상주의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시인한 노직 자신의 최근의 입장 변경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附錄:基本權의 歷史
1215년 : 영국의 대헌장 63개조
1628년 : 권리청원 12개조 (과세의 의회 승인, 신체의 자유)
1679년 : 인신 보호율 (인신 보호 영장제, 구속 적부 심사제)
1689년 : 권리 장전 (의회 중심주의)
1776년 : 버어지니아 권리 장전 (천부인권, 생명, 자유, 재산권 보장, 저항권 규정)
1789년 : 프랑스 인권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1919년 : 바이마르 헌법 (사회권 규정)
1941년 : 루우즈벨트의 4개 자유 (표현, 종교의 자유,빈곤과 공포로부터의 자유)
1948년 : 세계 인권 선언
1967년 : UN 부녀자에 대한 차별 철폐 선언.
1976년 :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1976년 :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그러나 불행하게도 맑스의 이러한 인간해방의 거대한 청사진은 현실적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에서 결코 실현된 적이 없다.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는 공산당 독재에 의한 국가소유로 되어 노동자들의 착취와 소외를 영속화하는 또 다른 계급지배와 자본의 비효율적 운용이라는 비극을 낳고 말았다.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기규제 대신에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적 정부를 본다. 그러나 이러한 맑스에 대한 배반은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근대 초기에 부르주아들이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것이 유토피아가 아니였듯이 오늘날의 노동자들이 경제적 자유를 통한 인간해방에의 투쟁도 결코 유토피아는 아닐 것이다.
소유물의 원초적 취득에 대한 노직의 입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로크적 단서, 즉 \"충분한 양의 그리고 똑같은 양질의 것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충분한계의 조건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로크의 자연권적 사유 재산권을 옹호하는 것이다 (N,175쪽). 노직은 이러한 단서가 보다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무소유 대상의 노동을 통한 취득이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 그것의 사유화는 정당화된다는 약한 단서로 재해석한다. 이러한 약한 단서는 소유물의 원초적 취득뿐만 아니라 그 이후 소유물의 이전에서도 적용되어 사유 재산권의 일반적인 제약으로 된다 (N,179쪽). 그러나 이러한 노직의 약한 단서도 사유 재산권의 철학적 정당화로서는 몇가지 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우선 무소유의 대상(an unowned object)을 로크에서처럼 (2권 25절) 인류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아무에게도 소유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유재산제를 미리 가정하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fallacy of begging the question)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인류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것(given to mankind in common)을 사유재산제에 의한 무소유가 아니라 인류의 공동소유(common ownership)로 가정한다고 해도 논리적인 하자는 없다. 특히 증명의 부담(the burden of proof)은 사유화 쪽에 더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단서는 어떻게 해석된다고 해도 결국 인간의 복지에 사유 재산권을 종속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불의의 교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더욱 선명해진다. 노직은 소유물의 취득과 이전에 있어서 과거의 부정의에 대한 누적적 결과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부정의를 교정할 수있는 개략적인 원칙은 롤즈의 차등의 원칙--최소수혜자의 기대치의 극대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최소수혜자는 불의의 희생자일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밀고 나간다면 노직은 결국 자본의 원초적 축적에 있어서의 부정의에 대한 맑스의 인식을 수용하는 셈이다. \"우리의 죄에 대한 벌로서 사회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너무나 과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인류역사에서 저질러진) 과거의 불의들은 너무나 심각하여 우리는 이를 교정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볼 때는 보다 포괄적인 국가를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러한 보다 포괄적인 국가는 롤즈의 복지국가 이외에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불의의 교정이라는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고려(human considerations)와 연대적인 협동 활동(joint cooperative activities)이라는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관점에서도 자유지상주의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시인한 노직 자신의 최근의 입장 변경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附錄:基本權의 歷史
1215년 : 영국의 대헌장 63개조
1628년 : 권리청원 12개조 (과세의 의회 승인, 신체의 자유)
1679년 : 인신 보호율 (인신 보호 영장제, 구속 적부 심사제)
1689년 : 권리 장전 (의회 중심주의)
1776년 : 버어지니아 권리 장전 (천부인권, 생명, 자유, 재산권 보장, 저항권 규정)
1789년 : 프랑스 인권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1919년 : 바이마르 헌법 (사회권 규정)
1941년 : 루우즈벨트의 4개 자유 (표현, 종교의 자유,빈곤과 공포로부터의 자유)
1948년 : 세계 인권 선언
1967년 : UN 부녀자에 대한 차별 철폐 선언.
1976년 :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1976년 :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추천자료
 격동의 한국 현대사
격동의 한국 현대사 [Best Report] 현대과학기술의 특징과 사회적 영향(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
[Best Report] 현대과학기술의 특징과 사회적 영향(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 근대헌법과 현대헌법
근대헌법과 현대헌법 노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현대자동차사례를 중심으로
노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현대자동차사례를 중심으로 [법학]현대형 대의제에 있어서 자유위임의 한계
[법학]현대형 대의제에 있어서 자유위임의 한계 월드사이언스 - 현대생물학개론(~5장 효소까지)
월드사이언스 - 현대생물학개론(~5장 효소까지) 정치적인 것의 이념에 대한 현대 정치학 논쟁사 보론에 대해 설명.
정치적인 것의 이념에 대한 현대 정치학 논쟁사 보론에 대해 설명. 유교전통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현대사회 한국유교의 실상과 우리에게 미치는...
유교전통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현대사회 한국유교의 실상과 우리에게 미치는... [사회과학] 김대중의 정치사로 본 한국현대사의 ‘쟁(爭)’
[사회과학] 김대중의 정치사로 본 한국현대사의 ‘쟁(爭)’ 프랑스 고등학교 현대사 교육 [교육내용 구성과 조직을 중심으로]
프랑스 고등학교 현대사 교육 [교육내용 구성과 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관] 현대 사회 인간의 존엄성, 라스웰의 정책학, 국가혁신의 주체 분류, 국가혁...
[다양한 국가관] 현대 사회 인간의 존엄성, 라스웰의 정책학, 국가혁신의 주체 분류, 국가혁... 시민사회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대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 시민사회
시민사회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대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 시민사회 시민사회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대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시민사회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대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인간과교육3공통) 후기 현대철학적 인간이해의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간관의 특징을 설명...
인간과교육3공통) 후기 현대철학적 인간이해의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간관의 특징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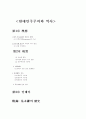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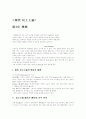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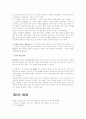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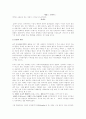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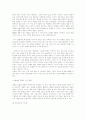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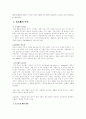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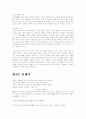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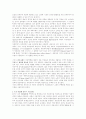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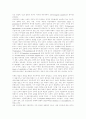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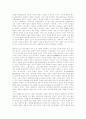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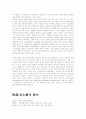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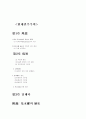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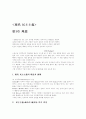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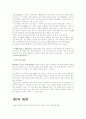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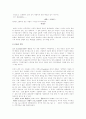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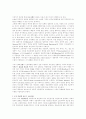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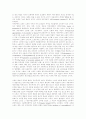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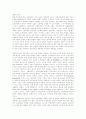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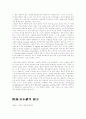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