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컬트영화의 도입과 오해
2. [컬트]의 시작과 정의
3. 한국의 영화상황에서의 진정한 컬트영화란?
2. [컬트]의 시작과 정의
3. 한국의 영화상황에서의 진정한 컬트영화란?
본문내용
시네마떼끄의 영화상영공간과 독립적인 제작방식과 배급/상영방
식을 취하고 있는 소형영화운동의 결과가 될 것이다.
씨네마떼끄운동의 영화보기는 컬트영화의 기본적인 바탕중의
하나인 관객의 영화상영중의 참여는 미약하지만, 어떤 영화에 대
해 자유롭게 열광할 수 있고, 열띤 토론이나 비슷한 감상을 가진
사람의 모임을 통해 자신들의 신화적 영화를 도출시켜내며 지탱
시킨다는 점에서 영화보기의 집단적 관람이 불완전하게나마 이루
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영화운동으로서의 소형영화의 영화제작/상영/관람의
형태는 한국의 정치상황이 가지는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컬트적인
기본 바탕에 훨씬 근접해 있다. 이를 <파업전야>라는 장산곶매의
영화를 예로 삼아 생각해보자. 이 영화가 영화운동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이후의 의식있는 소형영화 운동에 있어서 형
태의 전형을 이룬다는 면에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파업전야는 영화자체가 가지는 금기적인 요소(이것은 분명 한
국의 정치상황이 만들어낸 오류이다)로 인해 영화는 표면적이고
일반적인 상업적 배급망을 지나지 못하고 암묵적으로 소외되어
자체의 나름대로의 배급망을 따라 각개 필요 대중들(학생, 노동
자 등)의 소규모 모임에 초청/상영/관람되어진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관객들은 <파업전야>의 주제가를 부르고
의도적인 일체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영화속에서도 파업장이나
노동작업장의 장면등에서 관람하는 대중들에게 영화속에서 보여
준 가상적인 현실에 참여할 것을 의식적으로 되풀이하며 강요하
며 관객또한 영화속의 상황을 현실자체로 인식하며 참여한다.
영화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금 영화의 주제가를 되씹으며 이러
한 비밀스러운 의식에 대한 의미를 정리한다. 그들은 이 영화를
계속적으로 관람하며 서로의 의지를 확신하고 그러한 집단들은
다시금 소규모로 분화되어 열광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반응한
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영화보기형태에서 진정한 컬트영화(미국적
인 컬트개념을 사용한 영화)를 찾는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
다. 즉 미국의 관람문화가 만들어낸 관객이 참여하는 집단적 영
화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한국영화의 특수성 속에서 컬트적인 요
소를 가지고 있는 영화를 찾는다면 시네마떼끄의 영화보기운동과
소형영화운동의 결과물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덧붙여 청소년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홍콩영화의
일부(영웅본색, 천녀유혼 등)또한 영화속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환성과 한숨을 짖는 다른 세대가 이해할
수 없는 독립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름의 특별한 형식의 영화보
기(영화보러갈때 괜히 바바리를 입는다는지 , 한때 모형총싸움이
극장안에서도 유행이었다는 것, 영화를 사진기로 찍어 가지고 다
는다든지, 계속적인 관람을 시도한다는지 하는 것 등)를 수행했
다는 면에서 컬트영화의 하나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컬트영화에 대한 오류
들을 다시금 나름대로 재정립하게 된다면 진정한 우리나라의 컬
트영화의 탄생도 기대되리라 생각된다.
식을 취하고 있는 소형영화운동의 결과가 될 것이다.
씨네마떼끄운동의 영화보기는 컬트영화의 기본적인 바탕중의
하나인 관객의 영화상영중의 참여는 미약하지만, 어떤 영화에 대
해 자유롭게 열광할 수 있고, 열띤 토론이나 비슷한 감상을 가진
사람의 모임을 통해 자신들의 신화적 영화를 도출시켜내며 지탱
시킨다는 점에서 영화보기의 집단적 관람이 불완전하게나마 이루
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영화운동으로서의 소형영화의 영화제작/상영/관람의
형태는 한국의 정치상황이 가지는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컬트적인
기본 바탕에 훨씬 근접해 있다. 이를 <파업전야>라는 장산곶매의
영화를 예로 삼아 생각해보자. 이 영화가 영화운동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이후의 의식있는 소형영화 운동에 있어서 형
태의 전형을 이룬다는 면에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파업전야는 영화자체가 가지는 금기적인 요소(이것은 분명 한
국의 정치상황이 만들어낸 오류이다)로 인해 영화는 표면적이고
일반적인 상업적 배급망을 지나지 못하고 암묵적으로 소외되어
자체의 나름대로의 배급망을 따라 각개 필요 대중들(학생, 노동
자 등)의 소규모 모임에 초청/상영/관람되어진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관객들은 <파업전야>의 주제가를 부르고
의도적인 일체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영화속에서도 파업장이나
노동작업장의 장면등에서 관람하는 대중들에게 영화속에서 보여
준 가상적인 현실에 참여할 것을 의식적으로 되풀이하며 강요하
며 관객또한 영화속의 상황을 현실자체로 인식하며 참여한다.
영화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금 영화의 주제가를 되씹으며 이러
한 비밀스러운 의식에 대한 의미를 정리한다. 그들은 이 영화를
계속적으로 관람하며 서로의 의지를 확신하고 그러한 집단들은
다시금 소규모로 분화되어 열광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반응한
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영화보기형태에서 진정한 컬트영화(미국적
인 컬트개념을 사용한 영화)를 찾는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
다. 즉 미국의 관람문화가 만들어낸 관객이 참여하는 집단적 영
화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한국영화의 특수성 속에서 컬트적인 요
소를 가지고 있는 영화를 찾는다면 시네마떼끄의 영화보기운동과
소형영화운동의 결과물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덧붙여 청소년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홍콩영화의
일부(영웅본색, 천녀유혼 등)또한 영화속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환성과 한숨을 짖는 다른 세대가 이해할
수 없는 독립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름의 특별한 형식의 영화보
기(영화보러갈때 괜히 바바리를 입는다는지 , 한때 모형총싸움이
극장안에서도 유행이었다는 것, 영화를 사진기로 찍어 가지고 다
는다든지, 계속적인 관람을 시도한다는지 하는 것 등)를 수행했
다는 면에서 컬트영화의 하나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컬트영화에 대한 오류
들을 다시금 나름대로 재정립하게 된다면 진정한 우리나라의 컬
트영화의 탄생도 기대되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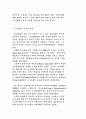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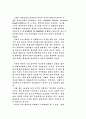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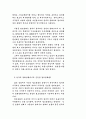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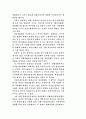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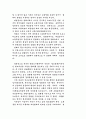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