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삼국사기 본기에 나타난 화랑
3.삼국사기 열전에 나타난 화랑
4.삼국유사에 나타난 화랑
5.결론
2.삼국사기 본기에 나타난 화랑
3.삼국사기 열전에 나타난 화랑
4.삼국유사에 나타난 화랑
5.결론
본문내용
수업시간에 말씀하신 바데로 일연이 불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싣다보니 향가도 덤으로 실리게 되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어쨌든 이같이 『삼국유사』에 실린 화랑과 관련된 향가들은 화랑도가 상열가악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겠다.
『삼국유사』에는 화랑의 유오산수도 보다 강조되고 있다. 진평왕 때의 세 화랑이 융천의 혜성가 덕에 풍악으로 놀러갔다는 이야기(주석 8번 참고)나 효소왕 때의 국선 부례랑이 무리들을 거느리고 금란에 가서 놀았으며
) 삼국유사, 일연 지음, 리가원·허경진 옮김, 한양출판, 1999, pp225~228
효종랑이 남산 포석정에서 놀려하는
) 삼국유사, 일연 지음, 리가원·허경진 옮김, 한양출판, 1999, p398, 399
등의 기록들은 모두 화랑의 유오산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5. 결론
신라시대에 풍류도의 기원을 자세히 밝힌 『선사』와 화랑의 전기로 여겨지는 『화랑세기』등의 사서가 있었던 듯 하지만
) 『三國史記』卷4 新羅本記 眞興王 37年條 에 『仙史』와 『花郞世記』의 기록이 있다. (이 글 본문2에 전문이 실려있음)
지금은 전하지 않고 극히 적은 자료가 고려시대에 편찬한 사서(삼국유사, 삼국사기 등)에 부분적으로 인용되어 전할뿐이기에 당시의 화랑도에 대해 아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나타난 화랑도에 관한 자료는 적은 것은 아니나 이들 화랑과 관련 있는 기사의 내용과 성격이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그리고 이들이 그때까지 전한 역사서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보장도 없기에 어느 한쪽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도 없는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불교와 관련된 화랑 관계 기록이나 화랑의 가악과 유오 등 풍류적 성격의 이야기가 많은데 비해 『삼국사기』에는 불교나 풍류 등의 이야기는 빼고 유교적 사관에 의해 선택된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신라 하대 사람인 최치원은 난랑비서문에서 풍류도를 유불선의 삼교에 입각하여 설명했다. 최치원이 보기에 풍류도는 삼교의 내용과 가르침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화랑들에겐 확실히 가악이나 유오 등 풍류적 요소가 강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이르러 화랑에 대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치우쳐서 바라보고 기록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비단 화랑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이들 사료의 전체적인 특징이기도 할 것이다. 한편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자료인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토대로 생각해볼 때 『삼국사기』에 나타나있는 조국을 위해 몸을 던지는 호국정신에 입각한 무사의 이미지와 『삼국유사』에 나타나있는 불교적 요소, 풍류적 요소 등 이들 모두를 합쳤을 때 비로소 진정한 화랑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참고자료
·삼국유사, 일연 지음, 리가원·허경진 옮김, 한양출판, 1999
·삼국유사연구, 신형식, 일조각, 1981
·일연과 삼국유사 - 삼국유사와 화랑연구, 중앙승가대학불교사학연구소
·http://www.koreandb.net/ 삼국사기 자료 구함
『삼국유사』에는 화랑의 유오산수도 보다 강조되고 있다. 진평왕 때의 세 화랑이 융천의 혜성가 덕에 풍악으로 놀러갔다는 이야기(주석 8번 참고)나 효소왕 때의 국선 부례랑이 무리들을 거느리고 금란에 가서 놀았으며
) 삼국유사, 일연 지음, 리가원·허경진 옮김, 한양출판, 1999, pp225~228
효종랑이 남산 포석정에서 놀려하는
) 삼국유사, 일연 지음, 리가원·허경진 옮김, 한양출판, 1999, p398, 399
등의 기록들은 모두 화랑의 유오산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5. 결론
신라시대에 풍류도의 기원을 자세히 밝힌 『선사』와 화랑의 전기로 여겨지는 『화랑세기』등의 사서가 있었던 듯 하지만
) 『三國史記』卷4 新羅本記 眞興王 37年條 에 『仙史』와 『花郞世記』의 기록이 있다. (이 글 본문2에 전문이 실려있음)
지금은 전하지 않고 극히 적은 자료가 고려시대에 편찬한 사서(삼국유사, 삼국사기 등)에 부분적으로 인용되어 전할뿐이기에 당시의 화랑도에 대해 아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나타난 화랑도에 관한 자료는 적은 것은 아니나 이들 화랑과 관련 있는 기사의 내용과 성격이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그리고 이들이 그때까지 전한 역사서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보장도 없기에 어느 한쪽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도 없는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불교와 관련된 화랑 관계 기록이나 화랑의 가악과 유오 등 풍류적 성격의 이야기가 많은데 비해 『삼국사기』에는 불교나 풍류 등의 이야기는 빼고 유교적 사관에 의해 선택된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신라 하대 사람인 최치원은 난랑비서문에서 풍류도를 유불선의 삼교에 입각하여 설명했다. 최치원이 보기에 풍류도는 삼교의 내용과 가르침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화랑들에겐 확실히 가악이나 유오 등 풍류적 요소가 강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이르러 화랑에 대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치우쳐서 바라보고 기록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비단 화랑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이들 사료의 전체적인 특징이기도 할 것이다. 한편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자료인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토대로 생각해볼 때 『삼국사기』에 나타나있는 조국을 위해 몸을 던지는 호국정신에 입각한 무사의 이미지와 『삼국유사』에 나타나있는 불교적 요소, 풍류적 요소 등 이들 모두를 합쳤을 때 비로소 진정한 화랑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참고자료
·삼국유사, 일연 지음, 리가원·허경진 옮김, 한양출판, 1999
·삼국유사연구, 신형식, 일조각, 1981
·일연과 삼국유사 - 삼국유사와 화랑연구, 중앙승가대학불교사학연구소
·http://www.koreandb.net/ 삼국사기 자료 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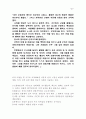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