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칭 화자 이인화의 회고라는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요컨대 「만세전」이 서사적 육체를 확보함에 있어 이인화의 시선과 관점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세전」이 성취해낸 저 탁월한 묘사의 힘은 결국 이인화로 표상되는 냉소주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즉 자신과 세계가 지니고 있는 이중성에 관한 한 냉철무비한 인식을 보여주는 이인화의 시선이 있음으로써 「만세전」에 등장하는 저 식민지 조선의 현실이 비로소 포착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단언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일이다. 그러나 「만세전」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위상과 성격에 대해 상기해보자. 「만세전」은 염상섭 소설의 전개 과정에서 초기 소설의 낭만주의가 끝나고 새로운 리얼리즘 소설이 시작되는 지점에 놓여 있으며, 냉소주의라는 틀 속에서 낭만주의적인 속성과 리얼리즘적인 속성이 교묘하게 교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염상섭의 소설세계를 두고, 낭만주의와 냉소주의, 리얼리즘, 이 셋 사이의 본질적인 친연성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그리 큰 비약은 아닐 것이다.
「만세전」은 일본 유학생인 주인공이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하는 이야기다. 동경에서 고베, 시모노세키, 부산, 김천 등을 거쳐 서울로 돌아왔다가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떠나는 여로가 소설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짓궂게 따라붙는 일본인 형사, 곤궁에 허덕이는 조선인 노동자, 어린 처녀를 첩으로 들여 아들 낳기를 바라는 형, 친척집을 뜯어먹으려는 일가붙이들,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아내의 유종을 재래식 의술에 맡겨 죽게 만드는 가족들의 무지 등을 목격한다. 주인공은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조선 사회를 [구더기들이 들끓는 묘지]라 말하며 무덤을 탈출하듯 다시 동경으로 떠난다. 이처럼 [만세전]은 전형적인 지식인소설의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다.
전통과 풍속에 좌우되는 사회 관계와 가족 관계는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 비논리적인 사회와 가족을 향해 논리로 자기를 관철하려는 비장함과 유치함이 지식인 소설의 본질을 이룬다.
그러나 「만세전」은 이 같은 지식인소설의 한계를 뛰어넘어 3·1운동직전의 조선 사회가 가진 삶의 총체적 표현을 지향한다. 「만세전」은 당대 조선 사회의 모든 모순과 추악함이 그것에 대한 모든 미적지근한 저항감과 더불어 총체적으로 묘사된, 작지만 거대한 시대의 벽화이다
「만세전」의 이러한 도약은 <이인화>라는 주인공의 독특한 성격에서 시작된다.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은 주인공은 옷을 사고 이발을 한 후, 술집으로 애인 시즈코(정자)부터 찾아간다. 그는 아내가 죽거나말거나 사실은 무관심하면서 허겁지겁 달려간다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시즈코를 안는다. \'나의 행위는 나의 자율적인 선택에 달려있으며 어떠한 선험적인 도덕도 여기에 간섭할 수 없다\'는 근대적 자아의 각성이 주인공의 위악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주인공의 위악이 「만세전」을 평범한 지식인 소설과 분리시킨다. 세계는 악하지만 나 역시 악하다고 인정할 때 세계와 사물은 좀더 객관적이고 좀더 공평하게 보이게 된다. 근대화되는 세계의 사물은 좀더 객관적이고 좀더 공평하게 보이게 된다. 근대화되는 세계의 비인간성을 감상적으로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보와 타락의 양면성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난다. 「만세전」에서 나타난 이 \'위악의 눈\'은 이후 염상섭 문학의 가장 큰 강점을 이루었고, 그로 인해 염상섭 소설은 오늘날 모더니티의 의미가 다시 운위되는 한국 사회와 문학에서 선구자적 업적으로 재평가 받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단언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일이다. 그러나 「만세전」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위상과 성격에 대해 상기해보자. 「만세전」은 염상섭 소설의 전개 과정에서 초기 소설의 낭만주의가 끝나고 새로운 리얼리즘 소설이 시작되는 지점에 놓여 있으며, 냉소주의라는 틀 속에서 낭만주의적인 속성과 리얼리즘적인 속성이 교묘하게 교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염상섭의 소설세계를 두고, 낭만주의와 냉소주의, 리얼리즘, 이 셋 사이의 본질적인 친연성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그리 큰 비약은 아닐 것이다.
「만세전」은 일본 유학생인 주인공이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하는 이야기다. 동경에서 고베, 시모노세키, 부산, 김천 등을 거쳐 서울로 돌아왔다가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떠나는 여로가 소설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짓궂게 따라붙는 일본인 형사, 곤궁에 허덕이는 조선인 노동자, 어린 처녀를 첩으로 들여 아들 낳기를 바라는 형, 친척집을 뜯어먹으려는 일가붙이들,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아내의 유종을 재래식 의술에 맡겨 죽게 만드는 가족들의 무지 등을 목격한다. 주인공은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조선 사회를 [구더기들이 들끓는 묘지]라 말하며 무덤을 탈출하듯 다시 동경으로 떠난다. 이처럼 [만세전]은 전형적인 지식인소설의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다.
전통과 풍속에 좌우되는 사회 관계와 가족 관계는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 비논리적인 사회와 가족을 향해 논리로 자기를 관철하려는 비장함과 유치함이 지식인 소설의 본질을 이룬다.
그러나 「만세전」은 이 같은 지식인소설의 한계를 뛰어넘어 3·1운동직전의 조선 사회가 가진 삶의 총체적 표현을 지향한다. 「만세전」은 당대 조선 사회의 모든 모순과 추악함이 그것에 대한 모든 미적지근한 저항감과 더불어 총체적으로 묘사된, 작지만 거대한 시대의 벽화이다
「만세전」의 이러한 도약은 <이인화>라는 주인공의 독특한 성격에서 시작된다.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은 주인공은 옷을 사고 이발을 한 후, 술집으로 애인 시즈코(정자)부터 찾아간다. 그는 아내가 죽거나말거나 사실은 무관심하면서 허겁지겁 달려간다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시즈코를 안는다. \'나의 행위는 나의 자율적인 선택에 달려있으며 어떠한 선험적인 도덕도 여기에 간섭할 수 없다\'는 근대적 자아의 각성이 주인공의 위악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주인공의 위악이 「만세전」을 평범한 지식인 소설과 분리시킨다. 세계는 악하지만 나 역시 악하다고 인정할 때 세계와 사물은 좀더 객관적이고 좀더 공평하게 보이게 된다. 근대화되는 세계의 사물은 좀더 객관적이고 좀더 공평하게 보이게 된다. 근대화되는 세계의 비인간성을 감상적으로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보와 타락의 양면성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난다. 「만세전」에서 나타난 이 \'위악의 눈\'은 이후 염상섭 문학의 가장 큰 강점을 이루었고, 그로 인해 염상섭 소설은 오늘날 모더니티의 의미가 다시 운위되는 한국 사회와 문학에서 선구자적 업적으로 재평가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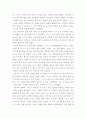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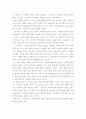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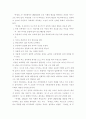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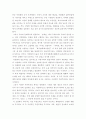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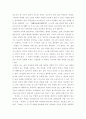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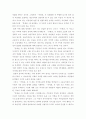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