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면 미국인들은 장기 체재를 하며 마을에 심각한 불안을 조성하는 존재다.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들의 존재는 마법사(자연을 바꾼다는 의미에서)임에는 틀림없지만 미국인들은 자연의 파괴자로 나타난다. 이런 예형과 본형의 관계는 『백년 동안의 고독』의 내용이 타락과 파멸로 치닫는 아포칼립틱 구조를 확인해주는 좋은 예이다. 호세 아르까디오 부엔디아의 시대에 군대와 법, 교회, 제도의 출현이 마콘도에 위기나 전쟁을 야기시키는 예형이라면, 아우렐리아노의 시대에 들어오는 바나나 공장과 기계문명의 출현은 마콘도의 몰락을 실질적으로 재촉시키는 악의 근거로서의 본형이다. 3장에서 마콘도의 주민 전체가 불면증에 걸리고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재앙은, 16장에서 4년 넘게 내리는 비의 직접적인 재앙으로 바뀐다. 마지막 장에서 보이는 “성서적 폭풍”은 백년 동안에 일어난 재앙들(내란, 집단적 망각, 노동자 학살, 홍수와 한발, 개미의 침입) 중 일곱번째 재앙으로서 그것은 『백년 동안의 고독』에 나타나는 모든 재앙들을 종합하고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마콘도의 창시자의 두 아들인 호세 아르까디오 부엔디아와 아우렐리아노는 아버지의 두 속성인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을 각각 대변하는데, 이들은 뒤에 등장하는 여러 남자 주인공들의 예형이 된다. 마지막 주인공인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7세대)에 와서 호세 아르까디오 부엔디아의 특성(성적인 활력과 지혜)은 통합·완성된다. 그것은 최후의 여주인공 아마란따 우르슬라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녀의 이름이 보여주고 있듯이, 그녀는 아마란따(2대조 할머니. 에로티시즘의 화신)와 우르슬라(1대조 할머니, 도덕성의 화신)라고 하는 전세대의 두 인물들의 속성을 한몸에 통합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 전체를 통해서 근친상간의 가능성은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와 아마란따 우르슬라 부부에 의해 결국 실현될 때까지 언제나 기대감으로 남는다. 최초의 근친상간은 호세 아르까디오 부엔디아에 의해 시작되며 세대를 통해 계속 부엔디아 가문을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한다. 그리고 근친상간의 결과로서 백년 동안 주인공들을 끊임없이 위협해왔던 괴물의 출현은 돼지 꼬리 달린 아이의 탄생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멜끼아데스가 쓴 양피지의 비밀은 이 아우렐리아노에 의해 해독된다. 그러면서 그는 오이디푸스적 자기 출생의 비밀과 자기와 성적 교섭을 한 여자는 다름아닌 숙모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부엔디아 가문의 멸망과 마콘도 도시의 사라짐은 실현되는 것이다.
요약해보면 『백년 동안의 고독』에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들의 행동이나 사건들은 바로 이 아우렐리아노라는 한 인물로 수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서 예형론적으로 보면 그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한몸에 실현한 유일한 ‘피구라(Figura)’인 예수처럼 소설 속에서 하나의 ‘피구라’로 등장, 통합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백년 동안의 고독』은 어쩌면 이 유일한 배우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다. 바이블의 모든 사건들이 한 사람의 신, 예수의 등장을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라고 해석하는 것이 예형론적 해석이라면, 마콘도의 창건자로부터 바나나 공장의 기계공인 마우리시오 바빌로니아(마지막 아우렐리아노의 아버지)는 『백년 동안의 고독』에서 유일한 ‘피구라’인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의 출현을 예고하는 부차적인 인물들이다. 그런데 이런 인물들을 뒤에서 움직이고 조종하는 자는 누구인가? 누가 마지막 통합이나 실현의 조건들을 부여하는가? 그는 물론 멜끼아데스로서, 마치 엘리어트의 『황무지』에 등장하는 티레시아스처럼, 부엔디아 가문과 마콘도의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를 위에서 훤히 내려다보고 있다. 그는 젊었다가 늙었다 자유자재로 변모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시공을 초월한 존재이다. 히브리서(7 : 3)를 보면 멜키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로 묘사되어 있다. 그는 전통적으로 예수의 예형으로 간주되어왔는데 그것은 그가 가지고 왔던 빵과 포도주의 선물에 기인한다. 멜키세덱이건 멜끼아데스건 둘 다 “인간의 얼굴로 위장한 성령”으로서 신의 도래를 알리는 주의 천사인 것이다. 멜끼아데스는 마콘도를 방문, “부엔디아 집안의 모든 면모를 말끔히 제거한, 유리로 지은 집들이 가득 찬 위대하고 빛나는 도시”를 예견한다. 그는 어린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를 향해 이런 말을 한다. “나이가 백 살이 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 원고의 내용을 알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소설 끝부분에 나오는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의 출현을 예고하는 말이다. 실상 멜끼아데스는 백년간이나 그의 신성한 계획을 실현해줄 가장 적합한 인물을 찾고 있었던 것이며, 마침내 그런 인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5:11)에는 “멜키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리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바로 멜끼아데스에게 해당되는 말로서, 결국 『백년 동안의 고독』의 이야기 전체는 이 멜끼아데스의 신비를 캐는, 범위를 좁혀서 말하면 양피지의 비밀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수많은 인물들의 편력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소설 맨 마지막 장에서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가 멜끼아데스의 원고를 해독할 때 소설도 끝난다. 이런 점에서 멜끼아데스와 가르시아 마르께스는 동일한 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마콘도의 백년간의 흥망성쇠의 역사가 기록된 멜끼아데스의 원고는 바로 가르시아 마르께스의 소설 『백년 동안의 고독』의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바이블의 중심이 예수의 재림에 있다면 『백년 동안의 고독』의 그것은 사라진 멜끼아데스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기대감에 있다. 왜냐하면 마콘도가 “유리로 지은 집들이 가득 찬 위대하고 빛나는 도시”가 될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사실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의 재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시(顯示)라면 멜끼아데스의 그 집을 완성시키는 것은 결국 독자인 우리들의 몫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계시는 『백년 동안의 고독』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책을 덮을 때 우리에게 다가 올 것이다.
마콘도의 창시자의 두 아들인 호세 아르까디오 부엔디아와 아우렐리아노는 아버지의 두 속성인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을 각각 대변하는데, 이들은 뒤에 등장하는 여러 남자 주인공들의 예형이 된다. 마지막 주인공인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7세대)에 와서 호세 아르까디오 부엔디아의 특성(성적인 활력과 지혜)은 통합·완성된다. 그것은 최후의 여주인공 아마란따 우르슬라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녀의 이름이 보여주고 있듯이, 그녀는 아마란따(2대조 할머니. 에로티시즘의 화신)와 우르슬라(1대조 할머니, 도덕성의 화신)라고 하는 전세대의 두 인물들의 속성을 한몸에 통합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 전체를 통해서 근친상간의 가능성은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와 아마란따 우르슬라 부부에 의해 결국 실현될 때까지 언제나 기대감으로 남는다. 최초의 근친상간은 호세 아르까디오 부엔디아에 의해 시작되며 세대를 통해 계속 부엔디아 가문을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한다. 그리고 근친상간의 결과로서 백년 동안 주인공들을 끊임없이 위협해왔던 괴물의 출현은 돼지 꼬리 달린 아이의 탄생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멜끼아데스가 쓴 양피지의 비밀은 이 아우렐리아노에 의해 해독된다. 그러면서 그는 오이디푸스적 자기 출생의 비밀과 자기와 성적 교섭을 한 여자는 다름아닌 숙모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부엔디아 가문의 멸망과 마콘도 도시의 사라짐은 실현되는 것이다.
요약해보면 『백년 동안의 고독』에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들의 행동이나 사건들은 바로 이 아우렐리아노라는 한 인물로 수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서 예형론적으로 보면 그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한몸에 실현한 유일한 ‘피구라(Figura)’인 예수처럼 소설 속에서 하나의 ‘피구라’로 등장, 통합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백년 동안의 고독』은 어쩌면 이 유일한 배우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다. 바이블의 모든 사건들이 한 사람의 신, 예수의 등장을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라고 해석하는 것이 예형론적 해석이라면, 마콘도의 창건자로부터 바나나 공장의 기계공인 마우리시오 바빌로니아(마지막 아우렐리아노의 아버지)는 『백년 동안의 고독』에서 유일한 ‘피구라’인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의 출현을 예고하는 부차적인 인물들이다. 그런데 이런 인물들을 뒤에서 움직이고 조종하는 자는 누구인가? 누가 마지막 통합이나 실현의 조건들을 부여하는가? 그는 물론 멜끼아데스로서, 마치 엘리어트의 『황무지』에 등장하는 티레시아스처럼, 부엔디아 가문과 마콘도의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를 위에서 훤히 내려다보고 있다. 그는 젊었다가 늙었다 자유자재로 변모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시공을 초월한 존재이다. 히브리서(7 : 3)를 보면 멜키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로 묘사되어 있다. 그는 전통적으로 예수의 예형으로 간주되어왔는데 그것은 그가 가지고 왔던 빵과 포도주의 선물에 기인한다. 멜키세덱이건 멜끼아데스건 둘 다 “인간의 얼굴로 위장한 성령”으로서 신의 도래를 알리는 주의 천사인 것이다. 멜끼아데스는 마콘도를 방문, “부엔디아 집안의 모든 면모를 말끔히 제거한, 유리로 지은 집들이 가득 찬 위대하고 빛나는 도시”를 예견한다. 그는 어린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를 향해 이런 말을 한다. “나이가 백 살이 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 원고의 내용을 알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소설 끝부분에 나오는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의 출현을 예고하는 말이다. 실상 멜끼아데스는 백년간이나 그의 신성한 계획을 실현해줄 가장 적합한 인물을 찾고 있었던 것이며, 마침내 그런 인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5:11)에는 “멜키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리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바로 멜끼아데스에게 해당되는 말로서, 결국 『백년 동안의 고독』의 이야기 전체는 이 멜끼아데스의 신비를 캐는, 범위를 좁혀서 말하면 양피지의 비밀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수많은 인물들의 편력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소설 맨 마지막 장에서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가 멜끼아데스의 원고를 해독할 때 소설도 끝난다. 이런 점에서 멜끼아데스와 가르시아 마르께스는 동일한 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마콘도의 백년간의 흥망성쇠의 역사가 기록된 멜끼아데스의 원고는 바로 가르시아 마르께스의 소설 『백년 동안의 고독』의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바이블의 중심이 예수의 재림에 있다면 『백년 동안의 고독』의 그것은 사라진 멜끼아데스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기대감에 있다. 왜냐하면 마콘도가 “유리로 지은 집들이 가득 찬 위대하고 빛나는 도시”가 될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사실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의 재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시(顯示)라면 멜끼아데스의 그 집을 완성시키는 것은 결국 독자인 우리들의 몫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계시는 『백년 동안의 고독』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책을 덮을 때 우리에게 다가 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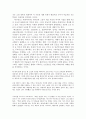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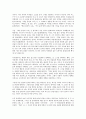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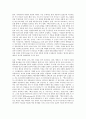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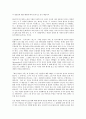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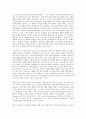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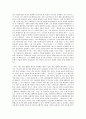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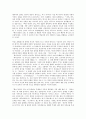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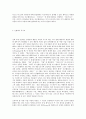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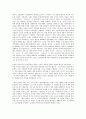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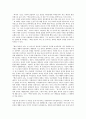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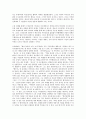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