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연의 재해에 대항할 수 있었던 역량도 분산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장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제후 자신들도 존망의 기로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국은 통일된 제국의 역량을 절실히 갈구하게 되었다. 중앙집권의 강력한 대제국의 역량으로서만이 엄청난 자연재해로부터 백성을 보호할 수 있었다. 춘추시대 초기 귀족적인 경기식 전쟁은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었으며 오로지 전면전(全面戰)을 통해 합병 전쟁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넓은 영토와 많은 국민일수록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했기에 구제 작업에서도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중국의 통일은 이와 같이 자연적인 요인이 배후에서 작용했던 것이다.
춘추시대 초(楚)나라와 수(髓)나라 사이에 충돌이 있었는데 물론 초(楚)는 대국이었고 수(髓)는 소국이었다. 충돌의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이 수(髓)나라 백성은 굶주렸고, 초(楚)나라 백성은 여유가 있었다. 전국시대 양혜왕(梁惠王)은 맹자(孟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황하(黃河) 서쪽에 가뭄이 들면 백성들을 황하 동쪽으로 이주시키면서 양식을 가뭄 지역으로 수송했다. 황하 동쪽에 가뭄이 들어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양혜왕이 맹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자기가 이렇게 백성을 챙기고 있는데 왜 이웃 나라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오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양혜왕(梁惠王)이 맹자에게 했던 말은 그 당시로서는 백성을 끔찍이 생각하는 조치였으므로 이웃 나라 백성들이 자신의 고국을 등지고 이민 오고 싶어할 정도의 덕정(德政)이었다. 이에 대해 맹자는 그 특유의 독설--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론을 펼쳤지만 그러나 역사의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 양혜왕의 푸념은 사실상 일리가 있는 소리였던 것이다.
전쟁이든 수재(水災)나 한발(旱魃)의 구조 활동이든 대규모 동원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할 전국시대(戰國時代)로 접어들면서 군소 국가들은 강대국의 압박에 밀려 하나 둘씩 멸망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판도는 통일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다. 진(秦)나라가 그 당시 나머지 여섯 나라를 차례로 멸하고 중국을 통일하던 시기에 「메뚜기 떼가 전 중국을 뒤덮었다...」(기원전 243년), 「전 중국에 큰 가뭄이 들었다....」(기원전 235년), 「전 중국에 기근이 덮쳤다....」(기원전 230년/ 기원전 228년) 이런 기록이 《사기(史記)》에 보인다.
그러므로 진시황제가 전 중국을 통일한 자신의 공적을 스스로 추켜세워 「각 제후국들의 성곽을 허물었다」라든가 「요새지의 장애물을 없앴다」고 한 것은 전 중국을 통해 각지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식량이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만들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백성들을 기아에서 구출하여 천하를 안정시키는」 그러한 위업을 달성했다는 뜻이다. 《맹자(孟子)》에 숱하게 보이는 전국시대의 참상, 가령 「길거리에는 굶어죽은 시체가 뒹굴고 있으며....」「흉년이 들어 늙은이나 어린이는 골짜기에 버려졌고 젊은이들은 먹거리를 찾아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이러한 기록을 염두에 두고 또 한편 전국시대의 참혹한 전쟁을 떠올려 본다면 진시황제의 자화자찬이 결코 허무맹랑한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로 인해 진시황제의 분서갱유가 정당화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중국이 기원전에 이룩했던 통일은 대규모 동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했던 것이며, 대규모 동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시 필연적으로 중앙집권적 대제국(大帝國)의 출현이 요구되었고, 대제국 출현의 배후에는 그동안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기후(氣候)와 지리적(地理的) 요인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춘추시대 초(楚)나라와 수(髓)나라 사이에 충돌이 있었는데 물론 초(楚)는 대국이었고 수(髓)는 소국이었다. 충돌의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이 수(髓)나라 백성은 굶주렸고, 초(楚)나라 백성은 여유가 있었다. 전국시대 양혜왕(梁惠王)은 맹자(孟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황하(黃河) 서쪽에 가뭄이 들면 백성들을 황하 동쪽으로 이주시키면서 양식을 가뭄 지역으로 수송했다. 황하 동쪽에 가뭄이 들어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양혜왕이 맹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자기가 이렇게 백성을 챙기고 있는데 왜 이웃 나라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오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양혜왕(梁惠王)이 맹자에게 했던 말은 그 당시로서는 백성을 끔찍이 생각하는 조치였으므로 이웃 나라 백성들이 자신의 고국을 등지고 이민 오고 싶어할 정도의 덕정(德政)이었다. 이에 대해 맹자는 그 특유의 독설--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론을 펼쳤지만 그러나 역사의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 양혜왕의 푸념은 사실상 일리가 있는 소리였던 것이다.
전쟁이든 수재(水災)나 한발(旱魃)의 구조 활동이든 대규모 동원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할 전국시대(戰國時代)로 접어들면서 군소 국가들은 강대국의 압박에 밀려 하나 둘씩 멸망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판도는 통일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다. 진(秦)나라가 그 당시 나머지 여섯 나라를 차례로 멸하고 중국을 통일하던 시기에 「메뚜기 떼가 전 중국을 뒤덮었다...」(기원전 243년), 「전 중국에 큰 가뭄이 들었다....」(기원전 235년), 「전 중국에 기근이 덮쳤다....」(기원전 230년/ 기원전 228년) 이런 기록이 《사기(史記)》에 보인다.
그러므로 진시황제가 전 중국을 통일한 자신의 공적을 스스로 추켜세워 「각 제후국들의 성곽을 허물었다」라든가 「요새지의 장애물을 없앴다」고 한 것은 전 중국을 통해 각지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식량이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만들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백성들을 기아에서 구출하여 천하를 안정시키는」 그러한 위업을 달성했다는 뜻이다. 《맹자(孟子)》에 숱하게 보이는 전국시대의 참상, 가령 「길거리에는 굶어죽은 시체가 뒹굴고 있으며....」「흉년이 들어 늙은이나 어린이는 골짜기에 버려졌고 젊은이들은 먹거리를 찾아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이러한 기록을 염두에 두고 또 한편 전국시대의 참혹한 전쟁을 떠올려 본다면 진시황제의 자화자찬이 결코 허무맹랑한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로 인해 진시황제의 분서갱유가 정당화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중국이 기원전에 이룩했던 통일은 대규모 동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했던 것이며, 대규모 동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시 필연적으로 중앙집권적 대제국(大帝國)의 출현이 요구되었고, 대제국 출현의 배후에는 그동안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기후(氣候)와 지리적(地理的) 요인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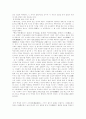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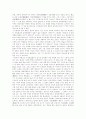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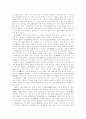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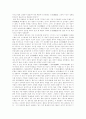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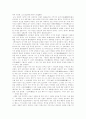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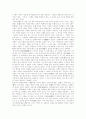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