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오이디푸스왕》에 대하여
2.《맥베스》에 대하여
3.《두아원》에 대하여
Ⅲ. 결 론
1. 서양비극의 특징
2. 중국비극의 특징
Ⅱ. 본 론
1.《오이디푸스왕》에 대하여
2.《맥베스》에 대하여
3.《두아원》에 대하여
Ⅲ. 결 론
1. 서양비극의 특징
2. 중국비극의 특징
본문내용
가지고 있다. 중국인들이 조화를 중시하여 지나친 것을 거부하게 된 것은 孔子의 영향 때문이다. 孔子가 詩經 에서 \'中和\'를 중시한 것이 결국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조화를 중시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래서, 비극에서 더 큰 비극으로 작품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위안이 되는, 작은 기쁨이 되는 小喜를 덧붙여 과분하지 않는 비극으로 끝을 내는 것이다.
서양 비극 : 喜 悲 大悲
중국 비극 : 喜 悲 喜 悲 大悲 小喜
蘇國榮, <我國古典戱曲理論的悲劇觀>, 中國古典悲劇喜劇論集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83) p.35.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주인공이 죽거나 죽지는 않더라도 치명적인 불행을 당하여 회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억울한 죽음의 사연이 밝혀지거나 대립세력에게 징벌을 가하여 원수를 갚게 된다고 해서 갑자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다. 주인공의 불행한 처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비극적인 결말 이후에 덧붙는 정황은 주인공의 불행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보다 관중의 심리를 염두에 두고 설정된 것이라 하겠다.
또 한 가지 중국 비극의 결말 이후에 덧붙는 정황이 비극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다지 상치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유는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주인공과 대립세력간의 갈등이 주류를 이루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인공에게 불행을 가져온 대립세력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한계를 지닌 인간이다. 그뿐만 아니라 악한 행위로 인해 징벌받을 만하고, 징벌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왕이나 판관이 법적 절차를 통해 그 악인을 징벌하거나, 저승의 사자 혹은 주인공의 원혼이 악인을 징벌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악인을 징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서양 비극의 경우는 신이 부여한 운명이나 자신의 성격, 사회적 상황에 의해 비극을 맞이하게 되므로 처벌할 대상이 없는 셈이다. 즉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신을 징벌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며, 성격의 문제로 인해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거나 사회적 상황에 의해 주인공이 불행하게 되었을 때, 징벌할 대상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양 비극에서 주인공의 파멸이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된 데에는 이러한 점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서양 비극에서는 주인공의 \'과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였는데, 중국 비극의 경우는 주인공의 과실이 불행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주인공이 아무런 과실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불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 비극에서 이처럼 주인공의 과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은 것은 대립세력의 악행과 선명하게 대비시키기 위한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인공이 선량하고 과실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악한 인물에 의해 불행을 당하게 될 때, 관중이 느끼는 동정과 연민의 정도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주인공의 죽음과 동시에 결말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설령 원귀가 되었을 지라도 그 한을 풀어주고자 하는 결말을 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서양 비극 : 喜 悲 大悲
중국 비극 : 喜 悲 喜 悲 大悲 小喜
蘇國榮, <我國古典戱曲理論的悲劇觀>, 中國古典悲劇喜劇論集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83) p.35.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주인공이 죽거나 죽지는 않더라도 치명적인 불행을 당하여 회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억울한 죽음의 사연이 밝혀지거나 대립세력에게 징벌을 가하여 원수를 갚게 된다고 해서 갑자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다. 주인공의 불행한 처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비극적인 결말 이후에 덧붙는 정황은 주인공의 불행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보다 관중의 심리를 염두에 두고 설정된 것이라 하겠다.
또 한 가지 중국 비극의 결말 이후에 덧붙는 정황이 비극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다지 상치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유는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주인공과 대립세력간의 갈등이 주류를 이루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인공에게 불행을 가져온 대립세력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한계를 지닌 인간이다. 그뿐만 아니라 악한 행위로 인해 징벌받을 만하고, 징벌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왕이나 판관이 법적 절차를 통해 그 악인을 징벌하거나, 저승의 사자 혹은 주인공의 원혼이 악인을 징벌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악인을 징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서양 비극의 경우는 신이 부여한 운명이나 자신의 성격, 사회적 상황에 의해 비극을 맞이하게 되므로 처벌할 대상이 없는 셈이다. 즉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신을 징벌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며, 성격의 문제로 인해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거나 사회적 상황에 의해 주인공이 불행하게 되었을 때, 징벌할 대상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양 비극에서 주인공의 파멸이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된 데에는 이러한 점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서양 비극에서는 주인공의 \'과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였는데, 중국 비극의 경우는 주인공의 과실이 불행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주인공이 아무런 과실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불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 비극에서 이처럼 주인공의 과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은 것은 대립세력의 악행과 선명하게 대비시키기 위한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인공이 선량하고 과실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악한 인물에 의해 불행을 당하게 될 때, 관중이 느끼는 동정과 연민의 정도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주인공의 죽음과 동시에 결말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설령 원귀가 되었을 지라도 그 한을 풀어주고자 하는 결말을 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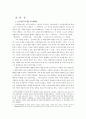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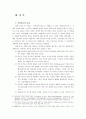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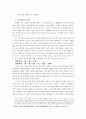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