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무거운 물/죽음의 물
2. 치유와 소생의 물
Ⅲ. 결론
Ⅳ. 참고자료
Ⅱ.본론
1. 무거운 물/죽음의 물
2. 치유와 소생의 물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지워진 천상의 세계이다.
그 해에는 눈이 많이 나리었다. 나이 어린
소년은 초가집에 살고 있었다.
스와니江이랑 요단강이랑 어디메 있다는
이야길 들은 젓이 있었다.
눈이 않이 나려 쌓이었다.
바람이 일면 심심하여지면 먼 고장만을
생각하게 되었던 눈더미 눈더미 앞으로
한 사람이 그림처럼 앞질러 갔다.
<스와니 江이랑 요단江이랑>-전문
이 시의 공간적인 배경은 눈이 많이 냐려 쌓인 초가집이다. 여기에는 \'나이 어린 소년\'이 살고 있는데 이 아이는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눈\'에 갖는 친화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와는 반대로 \'눈이 많이 나려 쌓이는 것\'은 소년을 \'심심하여지\'게 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나이 어린 소년\', \'초가집\'이 불러내는 연약한 정서에 내려 쌓이는 눈은 외부와의 단절감, 그로인한 외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람\'이 가세하면서 아이가 처해있는 현실의 공간은 더욱 차갑게 얼어 붙어 \'눈더미\'의 장벽을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단절감은 소년으로 하여금 들어앉아 꿈꿀수 있는 내밀의 공간을 형성하여 \'먼 고장\'으로 상상력을 확대시킨다. 그 곳은 아이가 알고 있는 가장 먼 거리인 \'스와니 강\'이며, 기독교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로 삼고 있는 \'요단강\'으로, 지상적 삶의 맨 끝부분과 천상적 삶의 출발지점이 닿아 있는 세계이다. 차갑게 얼어붙은 현실적 한계를 부드러운 흐름으로 녹여 내고 싶은 소년의 바램은 현실에서 가장 먼 속이 하늘과 닿아 있다는 어린아이다운 순수한 인식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숭고한 가치 지향의 세계를 형성한다.
예수는 어떻게 살아갔으며
어떻게 죽었을까
죽을 때엔 뭐라고 하였을까
흘러가는 요단의 물결과
하늘나라가 그의 고향이었을까 철따라
옮아다니는 고운 소릴 내릴 줄 아는
새들이었을까
저물어가는 잔잔한 물결이었을까
<고향>-전문
이 땅에서 예수가 이룬 삶의 궤적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의문형을 사용하여 되물음으로써 다시 한 번 그의 행적을 환기시킨다. 지상적은 것들을 소유하는데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자유롭게 떠돌 수 있었던 예수의 행보는 강물의 흐름과 일치된다. 세속적 삶의 뿌리가 되는 고향조차 \'물결\', \'새\'와 같이 매우 유동적인 이미지로 그려져 있어서 지상적인 삶에 정착하지 않았던 예수의 자유로운 영혼을 표상한다. 이 때의 물은 \'하늘나라\'로 흘러드는 \'요단의 물결\'로, 세속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영혼을 맑게 정화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재생의 이미지를 환기하여 원죄를 지고 태어난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는 예수와 동일시 된다. 여기에 천상과 지상을 옮겨 다니는 \'새\'의 이미지가 결합하여 세속의 삶을 초월하는 신성한 경지를 이룬다. 그것은 세속의 모든 때가 씻겨져 영혼의 정결함을 이루어 \'저물어가는 잔잔한 물결\'로 반짝이는 아름다운 세계이다.
Ⅲ.결론
김종삼은 1953년 \'신세계\'에서 시 <園丁>을 발표하면서 시작활동을 시작하여 1984년 지병으로 세상을 뜨기까지 30여 년 간 179여 편의 시를 남겼다. 다작의 시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는 생애 내내 시를 썼고 과거체가 주를 이루는 묘사, 설화성, 여백의 미, 의도적인 시행의 혼돈을 기한 전 후 행의 울림에 의한 잔상효과, 절제미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김종삼시에 있어서의 미학이 주장되어졌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김종삼 시의 매력 중 시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물의 이미지에 대하여 논하고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았다.
김종삼의 시적 출발은 \'죽음의식\'이라는 전제하에, 총체적으로 그의 시가 죽음의 공간과 이것으로부터의 탈피·치유라는 양가성을 지닌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물의 양가성과 연결시켜 보았다. 물은 투명하고 유동하는 생명력의 원천임과 동시에 검고 끈적해지기 쉬운 물질이기도 하다. 깊이 침잠하는 물은 폭력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죽음의 의미를 담아내며 이것을 희석하고 정화하면서 자정작용을 일으켜 생의 의지를 발산하기도 한다. 본 글에서는 \'죽음\'으로부터 \'소생과 치유의 의지\'가 시에서 어떻게 물의 이미지를 통해 환원되어지는지 상술함으로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Ⅳ.참고자료
이가림 역, 물과 꿈, 문예출판사, 1990
김성춘, 김종삼 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7
이혜주,김종삼 시의 이미지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7
김종삼 시에 나타난
물의 이미지
과목명: 작가작품론
담당교수:
학과:
학년:
학번:
이름:
그 해에는 눈이 많이 나리었다. 나이 어린
소년은 초가집에 살고 있었다.
스와니江이랑 요단강이랑 어디메 있다는
이야길 들은 젓이 있었다.
눈이 않이 나려 쌓이었다.
바람이 일면 심심하여지면 먼 고장만을
생각하게 되었던 눈더미 눈더미 앞으로
한 사람이 그림처럼 앞질러 갔다.
<스와니 江이랑 요단江이랑>-전문
이 시의 공간적인 배경은 눈이 많이 냐려 쌓인 초가집이다. 여기에는 \'나이 어린 소년\'이 살고 있는데 이 아이는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눈\'에 갖는 친화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와는 반대로 \'눈이 많이 나려 쌓이는 것\'은 소년을 \'심심하여지\'게 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나이 어린 소년\', \'초가집\'이 불러내는 연약한 정서에 내려 쌓이는 눈은 외부와의 단절감, 그로인한 외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람\'이 가세하면서 아이가 처해있는 현실의 공간은 더욱 차갑게 얼어 붙어 \'눈더미\'의 장벽을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단절감은 소년으로 하여금 들어앉아 꿈꿀수 있는 내밀의 공간을 형성하여 \'먼 고장\'으로 상상력을 확대시킨다. 그 곳은 아이가 알고 있는 가장 먼 거리인 \'스와니 강\'이며, 기독교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로 삼고 있는 \'요단강\'으로, 지상적 삶의 맨 끝부분과 천상적 삶의 출발지점이 닿아 있는 세계이다. 차갑게 얼어붙은 현실적 한계를 부드러운 흐름으로 녹여 내고 싶은 소년의 바램은 현실에서 가장 먼 속이 하늘과 닿아 있다는 어린아이다운 순수한 인식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숭고한 가치 지향의 세계를 형성한다.
예수는 어떻게 살아갔으며
어떻게 죽었을까
죽을 때엔 뭐라고 하였을까
흘러가는 요단의 물결과
하늘나라가 그의 고향이었을까 철따라
옮아다니는 고운 소릴 내릴 줄 아는
새들이었을까
저물어가는 잔잔한 물결이었을까
<고향>-전문
이 땅에서 예수가 이룬 삶의 궤적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의문형을 사용하여 되물음으로써 다시 한 번 그의 행적을 환기시킨다. 지상적은 것들을 소유하는데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자유롭게 떠돌 수 있었던 예수의 행보는 강물의 흐름과 일치된다. 세속적 삶의 뿌리가 되는 고향조차 \'물결\', \'새\'와 같이 매우 유동적인 이미지로 그려져 있어서 지상적인 삶에 정착하지 않았던 예수의 자유로운 영혼을 표상한다. 이 때의 물은 \'하늘나라\'로 흘러드는 \'요단의 물결\'로, 세속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영혼을 맑게 정화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재생의 이미지를 환기하여 원죄를 지고 태어난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는 예수와 동일시 된다. 여기에 천상과 지상을 옮겨 다니는 \'새\'의 이미지가 결합하여 세속의 삶을 초월하는 신성한 경지를 이룬다. 그것은 세속의 모든 때가 씻겨져 영혼의 정결함을 이루어 \'저물어가는 잔잔한 물결\'로 반짝이는 아름다운 세계이다.
Ⅲ.결론
김종삼은 1953년 \'신세계\'에서 시 <園丁>을 발표하면서 시작활동을 시작하여 1984년 지병으로 세상을 뜨기까지 30여 년 간 179여 편의 시를 남겼다. 다작의 시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는 생애 내내 시를 썼고 과거체가 주를 이루는 묘사, 설화성, 여백의 미, 의도적인 시행의 혼돈을 기한 전 후 행의 울림에 의한 잔상효과, 절제미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김종삼시에 있어서의 미학이 주장되어졌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김종삼 시의 매력 중 시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물의 이미지에 대하여 논하고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았다.
김종삼의 시적 출발은 \'죽음의식\'이라는 전제하에, 총체적으로 그의 시가 죽음의 공간과 이것으로부터의 탈피·치유라는 양가성을 지닌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물의 양가성과 연결시켜 보았다. 물은 투명하고 유동하는 생명력의 원천임과 동시에 검고 끈적해지기 쉬운 물질이기도 하다. 깊이 침잠하는 물은 폭력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죽음의 의미를 담아내며 이것을 희석하고 정화하면서 자정작용을 일으켜 생의 의지를 발산하기도 한다. 본 글에서는 \'죽음\'으로부터 \'소생과 치유의 의지\'가 시에서 어떻게 물의 이미지를 통해 환원되어지는지 상술함으로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Ⅳ.참고자료
이가림 역, 물과 꿈, 문예출판사, 1990
김성춘, 김종삼 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7
이혜주,김종삼 시의 이미지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7
김종삼 시에 나타난
물의 이미지
과목명: 작가작품론
담당교수:
학과:
학년:
학번: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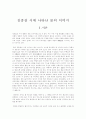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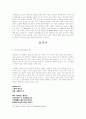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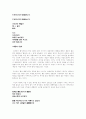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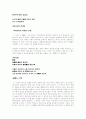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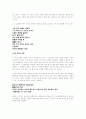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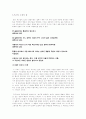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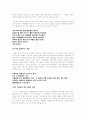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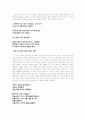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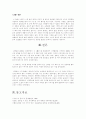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