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극적 세계인식
2. 죽음 지향과 구원의 모색
Ⅲ. 결론
Ⅱ. 본론
1. 비극적 세계인식
2. 죽음 지향과 구원의 모색
Ⅲ. 결론
본문내용
절대적 공간을 환유한다.
하지만, 김종삼은 이러한 비극적 인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음악으로 대표되는 예술에 대한 경사로 구원을 모색하게 된다. 결국 음악은 그의 내면에 일찍부터 자리잡고 있었던 결핍과 동경의 과정에 비극적인 현실을 견디는 힘이며 구원의 계시로 존재하게 된다.
連山 上空에 뜬
구름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무슨 소리가 난다
아지 못할 單一惡器이기도 하고
평화스런 和音이기도 하다
어떤 때엔 天上으로
어떤 때엔 地上으로 바보가 된 나에게도
무슨 신호처럼 보내져 오곤 했다
― 소리 전문
작품 소리에선 \'구름 속에서 무슨 소리\'가 어떤 악기의 소리나 화음으로 들려온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소리는 화자에게 단순하게 소리가 아니라 어떤 초월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계시처럼 들리고 있다. 김종삼은 이러한 음악을 통해 현실 삶의 피폐함과 폭력성을 견디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종삼이 예술의 여러 양식 중에 특히 음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그의 시세계는 불협화음의 현실 세계에서 협화음의 이상 세계를 꿈꾸고 염원했다고 볼 수 있다.
희미한
風琴소리가
툭 툭 끊어지고
있었다
그동안 무엇을 하였느냐는 물음에 대해
다른아닌 人間을 찾아다니며 물 몇 桶 길어다 준 일밖에 없다고
머나먼 廣野의 한복판 얕은
하늘 밑으로
영롱한 날빛으로
하여금 따우에선
― 물桶 전문
김종삼의 시적 면모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이 작품은 그의 인간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 작품을 통해서 보면 김종삼의 죽음 지향 의식은 역설적으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되새겨 자문하게 만드는 역할도 한다. 화자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느냐’는 물음에 대해 ‘人間을 찾아다니며 물桶 길어다 준 일밖에 없다’고 대답한다. 이는 짐짓 소박하고 겸손한 대답이지만, 현실 세계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애써 자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김종삼의 내면 의식은 부정적인 현실과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의 조건에서 발화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작품에 이르러서는 김종삼의 시선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어려운 인간에게 맞추어져 있다. 그는 이처럼 소외된 사람들 속에서 뜻밖에도 삶의 인간애를 확인한다. 여기에서 김종삼은 현실 세계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애써 찾고 있으며, 그 인식이야말로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 세계의 폭력성과 피폐함을 견디는 힘이 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논의했던 김종삼 시의 내면 의식의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종삼의 내면 의식은 운명적 수락의 양상을 띠고 있는 죄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아우의 때 이른 죽음을 연원으로 하는 그의 죄의식은, 이후 순결한 영혼을 가진 아이들도 자라나면 결국 죄를 짓는다는 생각고 맞물리면서, 하루 빨리 죽음을 감내하는 것이 죄를 덜 짓게 된다는 죽음 지향 의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에 의하면 죽음은 삶의 끝이지만, 동시에 삶의 굴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더럽혀짐의 소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김종삼에게 있어 죽음은 현실 세계의 폭력으로부터 영원한 안식과 구원을 얻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
김종삼은 또한 현실의 결핍을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환치시키면서, 동시에 예술에 대한 관심과 경사로 보상받고자 한다. 특히 음악은 그의 내면 의식 속에서 비극적인 현실을 견디는 힘이며 구원의 계시로 존재하게 된다.
지금까지 본고는 김종삼의 시세계를 통해 김종삼 시의 내면 의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김종삼은 한국 현대시사에서 존재의 한 순간을 아름답게 현현시키는 드문 영역을 보여준 시인의 한 사람이다.
하지만, 김종삼은 이러한 비극적 인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음악으로 대표되는 예술에 대한 경사로 구원을 모색하게 된다. 결국 음악은 그의 내면에 일찍부터 자리잡고 있었던 결핍과 동경의 과정에 비극적인 현실을 견디는 힘이며 구원의 계시로 존재하게 된다.
連山 上空에 뜬
구름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무슨 소리가 난다
아지 못할 單一惡器이기도 하고
평화스런 和音이기도 하다
어떤 때엔 天上으로
어떤 때엔 地上으로 바보가 된 나에게도
무슨 신호처럼 보내져 오곤 했다
― 소리 전문
작품 소리에선 \'구름 속에서 무슨 소리\'가 어떤 악기의 소리나 화음으로 들려온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소리는 화자에게 단순하게 소리가 아니라 어떤 초월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계시처럼 들리고 있다. 김종삼은 이러한 음악을 통해 현실 삶의 피폐함과 폭력성을 견디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종삼이 예술의 여러 양식 중에 특히 음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그의 시세계는 불협화음의 현실 세계에서 협화음의 이상 세계를 꿈꾸고 염원했다고 볼 수 있다.
희미한
風琴소리가
툭 툭 끊어지고
있었다
그동안 무엇을 하였느냐는 물음에 대해
다른아닌 人間을 찾아다니며 물 몇 桶 길어다 준 일밖에 없다고
머나먼 廣野의 한복판 얕은
하늘 밑으로
영롱한 날빛으로
하여금 따우에선
― 물桶 전문
김종삼의 시적 면모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이 작품은 그의 인간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 작품을 통해서 보면 김종삼의 죽음 지향 의식은 역설적으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되새겨 자문하게 만드는 역할도 한다. 화자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느냐’는 물음에 대해 ‘人間을 찾아다니며 물桶 길어다 준 일밖에 없다’고 대답한다. 이는 짐짓 소박하고 겸손한 대답이지만, 현실 세계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애써 자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김종삼의 내면 의식은 부정적인 현실과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의 조건에서 발화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작품에 이르러서는 김종삼의 시선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어려운 인간에게 맞추어져 있다. 그는 이처럼 소외된 사람들 속에서 뜻밖에도 삶의 인간애를 확인한다. 여기에서 김종삼은 현실 세계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애써 찾고 있으며, 그 인식이야말로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 세계의 폭력성과 피폐함을 견디는 힘이 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논의했던 김종삼 시의 내면 의식의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종삼의 내면 의식은 운명적 수락의 양상을 띠고 있는 죄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아우의 때 이른 죽음을 연원으로 하는 그의 죄의식은, 이후 순결한 영혼을 가진 아이들도 자라나면 결국 죄를 짓는다는 생각고 맞물리면서, 하루 빨리 죽음을 감내하는 것이 죄를 덜 짓게 된다는 죽음 지향 의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에 의하면 죽음은 삶의 끝이지만, 동시에 삶의 굴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더럽혀짐의 소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김종삼에게 있어 죽음은 현실 세계의 폭력으로부터 영원한 안식과 구원을 얻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
김종삼은 또한 현실의 결핍을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환치시키면서, 동시에 예술에 대한 관심과 경사로 보상받고자 한다. 특히 음악은 그의 내면 의식 속에서 비극적인 현실을 견디는 힘이며 구원의 계시로 존재하게 된다.
지금까지 본고는 김종삼의 시세계를 통해 김종삼 시의 내면 의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김종삼은 한국 현대시사에서 존재의 한 순간을 아름답게 현현시키는 드문 영역을 보여준 시인의 한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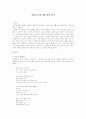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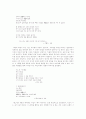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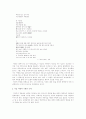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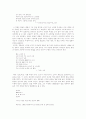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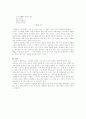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