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자백과 시인
2.공범자의 진술
3.통역관이 한 진술
4.임종의 공술
5.순간적인 절규
6.생생한 고소
7.동기, 의사 혹은 심신의 상태에 대한 진술
8.공문서, 상업장부, 사진
9.증언녹취서 전심에서의 증언 각서
10.한국형사소송법상의 전문증거
2.공범자의 진술
3.통역관이 한 진술
4.임종의 공술
5.순간적인 절규
6.생생한 고소
7.동기, 의사 혹은 심신의 상태에 대한 진술
8.공문서, 상업장부, 사진
9.증언녹취서 전심에서의 증언 각서
10.한국형사소송법상의 전문증거
본문내용
극히 엄격하게 협의로 해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례시하자면, 정신착란, 소환할 수 없는 우는 소환이 상당히 곤난한 지역(휴전선 이북 우는 외국)에 현재하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만일,「기타사유」를 불당히 확장해석한다며는, 모처럼 전문증거법을 채용하므로서 실체적진실발견에 이바지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근본이념은 그 뿌리서부터 뽑혀져 고사하게 될 운명에 이를 것이다.
_ 다음「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증거로서 채용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단서 역시 주의깊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믿어도 좋다는 환경하에서 이루워 졌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는 한 전문증거는 단연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_ 이상 논한 제삼백십육조는 전문증거법에 대한 규정으로서 형사소송법의 압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항이며 증거법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전문증거 자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별견하자면 전술한 바와 여히 한국와 일본은 영미법의 보통법상 인정하는 전문증거를 전반적으로 받어드린 것이 아니라, 고래로 전래된 전문증거법칙상의 핵심되는 부분만 원칙으로 규정화한 것이 명백하다. 물론 전면적으로 전문증거법원칙을 받어드린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에 일대혁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보수적이며 점진적인 개혁밖에 꾀할 수 없는 현실앞에서는 부가피하다고 하겠다. 연이나, 부분적이나마, 전문증거의 핵심을 정면으로 받어드리면서 그 례외로서 인정되는 영미법상의 전문증거법에 대한 례외를 대부분 방치하고 부문에 부한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곤난하다. 전게한 바와 여히 전문증거법에는 허다한 례외가 있는 것이다. 전문증거의 원칙은 비록 그 핵심만 받어드렸을 지언정, 례외만큼은 가능한 한 많이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 례외가 한국과 일본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며는 당연히 대부분의 전문증거는 증거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혐의는 충분하면서도 증거가 없으므로서 불득이 무죄를 언도하지 않으면 안될 궁지에 도달하는 실례가 많을 게다. 이러한 사태는 실례를 기다림이 없이 명약관화하다.
_ 그렇다면 이에 대치하여 내세울 것은 전술한 바.「원진술자가……기타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모라치므로서 법정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말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법률가로서 일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과연 여사한 경우에「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의아스럽다.
_
_ 다음「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증거로서 채용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단서 역시 주의깊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믿어도 좋다는 환경하에서 이루워 졌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는 한 전문증거는 단연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_ 이상 논한 제삼백십육조는 전문증거법에 대한 규정으로서 형사소송법의 압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항이며 증거법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전문증거 자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별견하자면 전술한 바와 여히 한국와 일본은 영미법의 보통법상 인정하는 전문증거를 전반적으로 받어드린 것이 아니라, 고래로 전래된 전문증거법칙상의 핵심되는 부분만 원칙으로 규정화한 것이 명백하다. 물론 전면적으로 전문증거법원칙을 받어드린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에 일대혁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보수적이며 점진적인 개혁밖에 꾀할 수 없는 현실앞에서는 부가피하다고 하겠다. 연이나, 부분적이나마, 전문증거의 핵심을 정면으로 받어드리면서 그 례외로서 인정되는 영미법상의 전문증거법에 대한 례외를 대부분 방치하고 부문에 부한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곤난하다. 전게한 바와 여히 전문증거법에는 허다한 례외가 있는 것이다. 전문증거의 원칙은 비록 그 핵심만 받어드렸을 지언정, 례외만큼은 가능한 한 많이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 례외가 한국과 일본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며는 당연히 대부분의 전문증거는 증거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혐의는 충분하면서도 증거가 없으므로서 불득이 무죄를 언도하지 않으면 안될 궁지에 도달하는 실례가 많을 게다. 이러한 사태는 실례를 기다림이 없이 명약관화하다.
_ 그렇다면 이에 대치하여 내세울 것은 전술한 바.「원진술자가……기타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모라치므로서 법정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말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법률가로서 일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과연 여사한 경우에「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의아스럽다.
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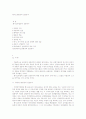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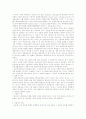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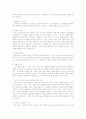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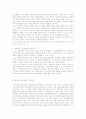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