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대이다. 샤워기가 싸이코와 여자 사이에 놓여 있어 여자가 거의 눈도 뜨지 못한다. 갇혀 있다. 마치 새장 안의 새가 날아가고 싶어 파닥거리듯, 또는 이미 박제되어 버린듯 여자도 자신의 제한적이고 개인적인 공간에 갇혀 파닥거리는 듯한 수동적인 느낌을 준다. 샤워실 내의 벽, 여자의 살갗이 모두 하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또한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더해준다. 갇힌 공간인 샤워실은 여자를 마치 박제된 새로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여자가 새장 안의 새, 또는 박제된 새와 같이 표현되었다는 것은, 이 시퀀스 직후에 나오는 장면에서 싸이코가 살인을 마치고 방을 나가면서, 벽에 걸려 있던 새의 액자를 팔로 쳐서 떨어뜨리는 행동으로부터도 암시된다. 감독은 이 둘의 \'움직임의 극명한 대조\'라는 영화적 기교를 통하여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느낌이 극대화를 노린 것이다.
싸이코의 살인이 절제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른 영화의 살인 장면과의 비교를 통해 자명하게 드러난다. 영화 \'친구\'에서의 살인 장면을 살펴 보면, 일단 장엄하고 서정적인, 죽음을 슬프게 느끼도록 만드는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살인이 시작된다. 살인자는 칼을 찌르면서 괴로워하며 소리를 지른다. 칼을 찌르는 행위 또한 자신의 감정을 가누지 못해 이리저리 괴로워하며 찌르는 모습이 역력하다. 반면 싸이코는 그와 정반대이다. 자신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 슬퍼서 이미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마치 정신을 잃어가는 사람처럼 계속 소리지르며 칼을 푹푹 찔러댄다. 옆의 사진을 보아도 알 수 있듯, 싸이코는 그와 정반대이다. 싸이코는 자신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 전혀 슬프거나 자신을 힘들게 만들지 않는다. 그는 이미 자신이 다른 사람, 즉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친구의 장면과는 달리 신경을 자극하는 배경음악도 이 움직임에 잔인한 느낌을 더한다. 싸이코가 그 어떠한 괴로워하는 감정도 없이 기계적으로 칼을 내리꽂는 모습을 통해 더 고차원적인 공포를 유도한 것이다.
샤워씬 내에서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유난히 눈에 걸리는 장면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주인공들의 움직임의 방향과 샤워 물줄기가 쏟아지는 방향의 관계이다. 여자의 움직임은 항상 물줄기의 방향과 일치하는 반면, 싸이코의 움직임은 항상 물줄기의 방향과 수직으로 만난다. 아래의 사진 비교를 통해 볼 수 있는 물줄기의 방향과의 차이는, 이 시퀀스에서 계속 발견된다. 이는 여자의 움직임이 물의 흐름과 같이 흐르는 것과 같이 정신 세계가 정상적인 세계이며, 싸이코의 정신 세계는 이와 반대로 일반적인 질서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정신 세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기교를 통해 관객들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공들의 정신 세계를 반영한 움직임의 선을 봄으로 인해, 감독이 의도한 느낌을 전달받고 있는 것이다.
5 샤워신이 전체 플롯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당시(1960) 컬러 영화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코>를 흑백 영화로 만든 이유를 히치콕은 단 하나, \'피\' 때문이라고 했다. 시뻘건 피가 화면에 가득 찬다면 그는 그걸 죄다 편집해 버렸을 거라는 것이 그의 어이없는 답변이었다.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런 시뻘건 피가 아닌 흑백 영화에서의 피는 어째서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까. 새하얀 샤워실의 벽면과 욕조는 그렇게 엄청난 난도질의 후에도 거의 깨끗하다. 하얀 벽의 경우에는 핏자국이 전혀 없다. 피는 그렇다고 해도 어째서 그는 그렇게 많은 난도질의 장면 가운데 직접적으로 칼이 여자의 몸에 꽂히는 장면은커녕, 어설프게 칼이 빗겨가는 장면이나 보이도록 한 것일까?
그는 누구나 보여줄 수 있는 피의 향연 따위를 통한 잔인함은 과감히 내다버린 것이다. 그는 누구나 보여줄 수 있는 시뻘건 피와 같은 1차적 시각적 정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만이 구사할 수 있는 자신만의 영상 언어를 통해 관객들을 공포와 혼란으로 경악시키길 바랬던 것이다. 그는 시뻘건 피의 색을 흑백 영화 속에서 지워버렸고, 그나마의 검은 피조차 화면에 그다지 담아내지 않았다. 칼로 난도질하는 장면이지만, 칼이 직접적으로 여자의 몸 속에 꽂히는 장면 따위는 나오지 않는다. 심지어 그는 배우들의 움직임마저도 그의 연출 아래 묶어버렸다. 싸이코의 난도질은 마치 공장에서 기계가 물품을 찍어내듯,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하게 계속된다. 여자는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마치 새장 안의 새처럼 갇혀버린 채 파닥거리기만 할 뿐이다. 이러한 연기 역시 그의 연출에 의해 재단되어 영상언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낸다. 직접 칼에 찔려 들어가는 장면은 화면에 보여지지 않았고, 모든 것은 관객의 상상 속에서 창조되어 관객을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20초 정도의 짧은 시퀀스.\'한 싸이코가 한 여자를 칼로 난도질해 죽인다\'라는 아무런 특별할 것 없는 짧은 시퀀스 안에, 히치콕은 그가 말하고자 했던 그의 언어로, 너무나 많은 것을 말했다. \'공포\'와 \'혼란\', 이 두개의 키워드를 위해 그가 동원했던 수많은 기교적인 영상 언어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서, 영상 언어라는 것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과, 영상 언어의 강력한 힘을 새삼 느껴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베른하르트 옌드리케 지음, 홍준기 옮김, <앨프레드 히치콕>, 한길사 1997
슬라보이 지젝 지음, 김소연 옮김, <항상 라캉에 대해 알고 싶었지만 감히 히치콕에게 물어보지 못한 모든 것>, 새물결 2001
프랑수아 트뤼포 지음, 곽한주, 이채훈 옮김, <히치콕과의 대화>, 한나래 1994
엘리너 설리번 지음, 이동인 옮김, <히치콕 서스펜스 걸작선> 고려원미디어 1992
히치콕의 영화이야기 http://my.dreamwiz.com/movie53
히치콕 100주년 기념 싸이트 http://members.tripod.co.kr/~hitchcock
서스펜스를 위한 히치콕 http://myhome.hanafos.com/~psycock/index
영화의 이해(현암사)
싸이코의 살인이 절제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른 영화의 살인 장면과의 비교를 통해 자명하게 드러난다. 영화 \'친구\'에서의 살인 장면을 살펴 보면, 일단 장엄하고 서정적인, 죽음을 슬프게 느끼도록 만드는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살인이 시작된다. 살인자는 칼을 찌르면서 괴로워하며 소리를 지른다. 칼을 찌르는 행위 또한 자신의 감정을 가누지 못해 이리저리 괴로워하며 찌르는 모습이 역력하다. 반면 싸이코는 그와 정반대이다. 자신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 슬퍼서 이미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마치 정신을 잃어가는 사람처럼 계속 소리지르며 칼을 푹푹 찔러댄다. 옆의 사진을 보아도 알 수 있듯, 싸이코는 그와 정반대이다. 싸이코는 자신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 전혀 슬프거나 자신을 힘들게 만들지 않는다. 그는 이미 자신이 다른 사람, 즉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친구의 장면과는 달리 신경을 자극하는 배경음악도 이 움직임에 잔인한 느낌을 더한다. 싸이코가 그 어떠한 괴로워하는 감정도 없이 기계적으로 칼을 내리꽂는 모습을 통해 더 고차원적인 공포를 유도한 것이다.
샤워씬 내에서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유난히 눈에 걸리는 장면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주인공들의 움직임의 방향과 샤워 물줄기가 쏟아지는 방향의 관계이다. 여자의 움직임은 항상 물줄기의 방향과 일치하는 반면, 싸이코의 움직임은 항상 물줄기의 방향과 수직으로 만난다. 아래의 사진 비교를 통해 볼 수 있는 물줄기의 방향과의 차이는, 이 시퀀스에서 계속 발견된다. 이는 여자의 움직임이 물의 흐름과 같이 흐르는 것과 같이 정신 세계가 정상적인 세계이며, 싸이코의 정신 세계는 이와 반대로 일반적인 질서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정신 세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기교를 통해 관객들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공들의 정신 세계를 반영한 움직임의 선을 봄으로 인해, 감독이 의도한 느낌을 전달받고 있는 것이다.
5 샤워신이 전체 플롯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당시(1960) 컬러 영화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코>를 흑백 영화로 만든 이유를 히치콕은 단 하나, \'피\' 때문이라고 했다. 시뻘건 피가 화면에 가득 찬다면 그는 그걸 죄다 편집해 버렸을 거라는 것이 그의 어이없는 답변이었다.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런 시뻘건 피가 아닌 흑백 영화에서의 피는 어째서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까. 새하얀 샤워실의 벽면과 욕조는 그렇게 엄청난 난도질의 후에도 거의 깨끗하다. 하얀 벽의 경우에는 핏자국이 전혀 없다. 피는 그렇다고 해도 어째서 그는 그렇게 많은 난도질의 장면 가운데 직접적으로 칼이 여자의 몸에 꽂히는 장면은커녕, 어설프게 칼이 빗겨가는 장면이나 보이도록 한 것일까?
그는 누구나 보여줄 수 있는 피의 향연 따위를 통한 잔인함은 과감히 내다버린 것이다. 그는 누구나 보여줄 수 있는 시뻘건 피와 같은 1차적 시각적 정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만이 구사할 수 있는 자신만의 영상 언어를 통해 관객들을 공포와 혼란으로 경악시키길 바랬던 것이다. 그는 시뻘건 피의 색을 흑백 영화 속에서 지워버렸고, 그나마의 검은 피조차 화면에 그다지 담아내지 않았다. 칼로 난도질하는 장면이지만, 칼이 직접적으로 여자의 몸 속에 꽂히는 장면 따위는 나오지 않는다. 심지어 그는 배우들의 움직임마저도 그의 연출 아래 묶어버렸다. 싸이코의 난도질은 마치 공장에서 기계가 물품을 찍어내듯,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하게 계속된다. 여자는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마치 새장 안의 새처럼 갇혀버린 채 파닥거리기만 할 뿐이다. 이러한 연기 역시 그의 연출에 의해 재단되어 영상언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낸다. 직접 칼에 찔려 들어가는 장면은 화면에 보여지지 않았고, 모든 것은 관객의 상상 속에서 창조되어 관객을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20초 정도의 짧은 시퀀스.\'한 싸이코가 한 여자를 칼로 난도질해 죽인다\'라는 아무런 특별할 것 없는 짧은 시퀀스 안에, 히치콕은 그가 말하고자 했던 그의 언어로, 너무나 많은 것을 말했다. \'공포\'와 \'혼란\', 이 두개의 키워드를 위해 그가 동원했던 수많은 기교적인 영상 언어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서, 영상 언어라는 것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과, 영상 언어의 강력한 힘을 새삼 느껴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베른하르트 옌드리케 지음, 홍준기 옮김, <앨프레드 히치콕>, 한길사 1997
슬라보이 지젝 지음, 김소연 옮김, <항상 라캉에 대해 알고 싶었지만 감히 히치콕에게 물어보지 못한 모든 것>, 새물결 2001
프랑수아 트뤼포 지음, 곽한주, 이채훈 옮김, <히치콕과의 대화>, 한나래 1994
엘리너 설리번 지음, 이동인 옮김, <히치콕 서스펜스 걸작선> 고려원미디어 1992
히치콕의 영화이야기 http://my.dreamwiz.com/movie53
히치콕 100주년 기념 싸이트 http://members.tripod.co.kr/~hitchcock
서스펜스를 위한 히치콕 http://myhome.hanafos.com/~psycock/index
영화의 이해(현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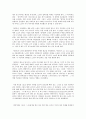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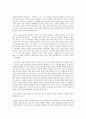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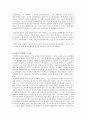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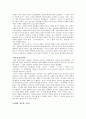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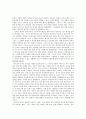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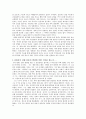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