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진시황 암살기도 (권 86, 자객열전 : 형가)
Ⅱ. 농민기의 (권 48, 진섭세가)
Ⅲ. 구6국 세력의 봉기 (권 7, 항우본기)
Ⅳ. 진시황흥망론 (권 6, 진시황본기 부 가의의 <과진론>)
Ⅱ. 농민기의 (권 48, 진섭세가)
Ⅲ. 구6국 세력의 봉기 (권 7, 항우본기)
Ⅳ. 진시황흥망론 (권 6, 진시황본기 부 가의의 <과진론>)
본문내용
서 양자강을 건너면 그의 향리인 강동(江東)지방이다. 이때 오강의 정장은 항우에게 강동으로 갈 것을 권했다. 항우는 부형(父兄)들에게 면목이 없다며 추적하는 한군과의 난전 속에 스스로 목을 쳤다. 이때 항우는 32세, 한왕 즉위 5년 12월(B.C. 202)의 일이었다. 몰려든 한병에 의해 그의 시신은 잘려져 나갔고 한왕 유방은 그 시신을 얻은 자를 각각 제후로 봉했다. 유체(遺體)는 정중히 장사지내고 항우의 일족들도 죽이지 않았다.
(8) 항우에 대한 평가
태사공이 항우를 평가하길 「항우는 빌붙을만한 한 척의 땅도 없이 시골에서 일어나 3년 만에 5국의 군대를 거느리고 진을 멸한 후 천하를 나누어 왕후들을 봉하였으며, 패왕을 칭해 천하를 호령하였다. 비록 그 자리를 끝내 지키지는 못했지만, 근고(近古)이래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그는 자신의 공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모만을 믿고 옛 선례를 따르지 않았으며 무력으로 천하를 경영하였다. 그런데 최후의 순간에 자신을 망하게 한 것이 하늘이라 탓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였다.
Ⅳ. 秦始皇興亡論 (卷 6, 秦始皇本紀 附 賈誼의 <過秦論>)
진의 땅은 사방이 산과 황하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였다. 목공(穆公) 이래 진시황에 이르는 20여 군은 항상 제후의 웅자가 되었다. 이는 대대로 현군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지세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시황은 자신에 만족하여 남의 의견을 묻지 않았으며, 잘못을 범하여도 고치는 일이 없었다. 2세는 이것을 본받아 고치지 않고 폭정으로 그 화를 더욱 무겁게 하였다. 또한 진에 기휘(忌諱)의 금령(禁令)이 많아 충언이 입을 떠나기 전에 처형당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진은 강성할 때는 법을 번잡하게 만들고 형을 엄하게 집행하여 천하가 공포에 떨었으며, 쇠약해지자 백성들이 원망하고 해내(海內)가 반기를 들었다. 그들은 나무를 잘라 무기로 삼고 장대에 깃발을 꽂은데 불과하였지만, 천하가 구름같이 몰려와 향응하였고, 식량을 짊어지고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이어서 산동의 호걸들이 마침내 각처에서 봉기하여 진족(秦族)을 멸하였다. 이는 진이 인의(仁義)의 정치를 펴지 못하고 공벌(攻伐)과 수성(守成)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때문이다. 당시 진은 위세를 잘 지키고, 창업의 공을 다졌어야 마땅하였으며, 안위(安危)의 근본은 실로 여기에 있었다. 물론 겸병에 몰두할 때는 사술과 무력을 앞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공을 이룬 후 그것을 안정시킬 때는 인의를 따르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도, 진은 그 통치방법을 바꾸지 않았다. 그리하여 지지자가 없이 홀로 고독하게 천하를 영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멸망이 그렇게 빨리 온 것이다.
진 2세 황제가 즉위하였을 때 천하는 그를 관망하였지만, 그는 위엄과 덕망으로 천하에 군림하지 못하였다. 그는 또다시 아방궁을 짓기 시작하였고, 형벌을 번잡하게 하고 처형을 엄격히 하였다. 관리의 행정은 극히 가혹하고, 상벌은 부당하였으며, 부세(賦稅)는 절도 없이 가중되었다. 또한 백성들의 곤궁함이 극에 달해도 황제는 거두어 구휼하지 않았다. 이에 군경(君卿) 이하 서민에 이르는 모든 사람이 불안한 마음을 품고, 곤궁한 처지에 빠져 모두 자신의 지위를 불안해하였기 때문에 민심이 쉽게 동요한 것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요체는 민심을 안정시키는데, 2세 황제는 기운 것을 바로잡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큰 과오를 범했다.
<참고문헌>
① 정하현(鄭夏鉉),『역사와 인간의 대응』,「項羽( 232-202 B.C)와 項羽集團의 분석」 한울사, 1985
② 니시지마 사다오,『진한제국』, 廣濟堂印刷株式會社, 1998
③ 진순신,『진시황』, 한국경제신문사, 1996
(8) 항우에 대한 평가
태사공이 항우를 평가하길 「항우는 빌붙을만한 한 척의 땅도 없이 시골에서 일어나 3년 만에 5국의 군대를 거느리고 진을 멸한 후 천하를 나누어 왕후들을 봉하였으며, 패왕을 칭해 천하를 호령하였다. 비록 그 자리를 끝내 지키지는 못했지만, 근고(近古)이래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그는 자신의 공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모만을 믿고 옛 선례를 따르지 않았으며 무력으로 천하를 경영하였다. 그런데 최후의 순간에 자신을 망하게 한 것이 하늘이라 탓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였다.
Ⅳ. 秦始皇興亡論 (卷 6, 秦始皇本紀 附 賈誼의 <過秦論>)
진의 땅은 사방이 산과 황하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였다. 목공(穆公) 이래 진시황에 이르는 20여 군은 항상 제후의 웅자가 되었다. 이는 대대로 현군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지세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시황은 자신에 만족하여 남의 의견을 묻지 않았으며, 잘못을 범하여도 고치는 일이 없었다. 2세는 이것을 본받아 고치지 않고 폭정으로 그 화를 더욱 무겁게 하였다. 또한 진에 기휘(忌諱)의 금령(禁令)이 많아 충언이 입을 떠나기 전에 처형당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진은 강성할 때는 법을 번잡하게 만들고 형을 엄하게 집행하여 천하가 공포에 떨었으며, 쇠약해지자 백성들이 원망하고 해내(海內)가 반기를 들었다. 그들은 나무를 잘라 무기로 삼고 장대에 깃발을 꽂은데 불과하였지만, 천하가 구름같이 몰려와 향응하였고, 식량을 짊어지고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이어서 산동의 호걸들이 마침내 각처에서 봉기하여 진족(秦族)을 멸하였다. 이는 진이 인의(仁義)의 정치를 펴지 못하고 공벌(攻伐)과 수성(守成)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때문이다. 당시 진은 위세를 잘 지키고, 창업의 공을 다졌어야 마땅하였으며, 안위(安危)의 근본은 실로 여기에 있었다. 물론 겸병에 몰두할 때는 사술과 무력을 앞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공을 이룬 후 그것을 안정시킬 때는 인의를 따르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도, 진은 그 통치방법을 바꾸지 않았다. 그리하여 지지자가 없이 홀로 고독하게 천하를 영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멸망이 그렇게 빨리 온 것이다.
진 2세 황제가 즉위하였을 때 천하는 그를 관망하였지만, 그는 위엄과 덕망으로 천하에 군림하지 못하였다. 그는 또다시 아방궁을 짓기 시작하였고, 형벌을 번잡하게 하고 처형을 엄격히 하였다. 관리의 행정은 극히 가혹하고, 상벌은 부당하였으며, 부세(賦稅)는 절도 없이 가중되었다. 또한 백성들의 곤궁함이 극에 달해도 황제는 거두어 구휼하지 않았다. 이에 군경(君卿) 이하 서민에 이르는 모든 사람이 불안한 마음을 품고, 곤궁한 처지에 빠져 모두 자신의 지위를 불안해하였기 때문에 민심이 쉽게 동요한 것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요체는 민심을 안정시키는데, 2세 황제는 기운 것을 바로잡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큰 과오를 범했다.
<참고문헌>
① 정하현(鄭夏鉉),『역사와 인간의 대응』,「項羽( 232-202 B.C)와 項羽集團의 분석」 한울사, 1985
② 니시지마 사다오,『진한제국』, 廣濟堂印刷株式會社, 1998
③ 진순신,『진시황』, 한국경제신문사,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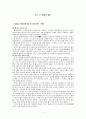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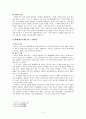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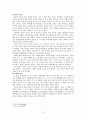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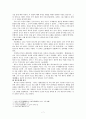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