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중생 중에 여래지(如來智) 여래안(如來眼)을 갖춘 여래가 단좌(端坐)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부증불감경(不增不減經)》에서는 중생계와 법계(法界)에는 증감이 없으며, 이 양자는 동일한 세계라고 한다. 단지 그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중생은 사견(邪見)을 가지게 되고 생사윤회의 바다에 침몰하고 있다고 하여, 여래장은 밖으로는 번뇌로 가려 있지만 안으로는 여래의 청정법, 상주불변의 법성(法性)이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승만경(勝經)》도 여래장의 기본경전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여래장 사상이 집성된 것이 《보성론(寶性論)》인데, 여기에서는 여래장의 세 의미로서 ① 여래 법신의 편재(遍在), ② 진여(眞如:진리)의 무차별성, ③ 종성(種姓:家系 동질성)의 존재를 열거하고 있다. 중국에서 특히 널리 알려진 《불성론(佛性論)》은 이 《보성론》의 개작 내지 이에 의거하여 쓴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대승의 《열반경(涅槃經)》에서 여래장을 불성의 의미로 해석하여, 일체의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一切衆生悉有佛性]고 한 말에 의해 중국에서는 여래장이라는 말보다 불성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열반경》은 일천제(一闡提:대승의 법을 비방하는 자, 세속의 욕망을 가진 자)에는 불성이 없다고 술하고 있어서 약간의 불일치가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그런자의 성불은 인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쇠붙이 와석(瓦石) 등의 비정(非情:중생 有情의 반의어로서 의식이 없는 일체의 무생물)에도 불성이 있다고 주장되었다. 유식(唯識)계통의 법상종(法相宗)이나 선종에서는 각각 오성분별(五性分別:無性 不定性 및 성문 연각 보살의 定性, 즉 각기 그 본성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 견성성불(見性成佛:불성 및 자기의 본성을 깨우침으로써 성불한다는 것, 대개 성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을 주장하여 여래장 불성을 보편화하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천태종(天台宗)의 지의(智)는 색(色:물질) 심(心)의 평등관에 근거하여 그 보편화를 개척하였으며, 길장(吉藏)은 초목(草木)에도 불성이 있다고 하여 최초로 초목성불을 주장하였다. 그 후 중국 및 한국 등지에서는 비정불성론이 일반화되었다.
상기한 여러 경론 외에도 여래장 사상을 다룬 것으로 《앙굴마라경(央掘魔羅經)》 《대법고경(大法鼓經)》 및 《금광명경(金光明經)》 《능가경(楞伽經)》 등이 있다. 특히 《능가경》은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과 함께 여래장과 알라야식[阿賴耶識]과의 관계를 논함으로써 유식설(唯識說)과의 융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 용수 , 龍樹]
인도의 불교학자.
본명 : 나가르주나(나가:용, 아가르주나:나무 이름)
별칭 : 제21의 서가(書家), 8종(八宗)의 조사(祖師)
국적 : 인도
활동분야 : 종교
출생지 : 남인도
주요저서 : 《중론》(4권)
원이름 나가르주나(나가:용, 아가르주나:나무 이름). 남인도 출생. 북인도로 가서 당시 인도의 사상(思想)을 공부하고, 불교 특히 신흥 대승불교(大乘佛敎)사상을 연구, 그 기초를 확립하였다. 때문에 제21의 서가(書家), 8종(八宗)의 조사(祖師)라고 일컫는다.
《중론(中論)》에서 전개한 공(空)의 사상은 그 이후의 모든 불교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즉, 실체(實體:自性)를 세우고, 실체적인 원리를 상정(想定)하기 위한 바람직한 자세를, 철두철미한 비판을 가하면서, 일체의 것이 다른 것[他]과의 의존 상대 상관 상의(相依)의 관계[緣起] 위에서만 비로소 성립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상관관계는 긍정적 부정적 모순적 상태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느 것에서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공의 상태에 이를 수 없는 반면, 구극(究極)의 절대적 입장[眞諦 第一義諦]은 우리의 일상적 진리[俗諦 즉, 世俗諦]로만 성립할 수 있으며, 이를 초월해서는 논의의 대상이나 표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중도적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후세에 그의 학파를 가리켜 중관파(中觀派)라고 불렀다.
주요 저서에 《중론》(4권) 외에 《회쟁론(廻諍論)》 《광파론(廣破論)》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 《공칠십론(空七十論)》 등이 있으며, 《대지도론(大智度論)》(100권) 《십이문론(十二門論)》 등은 그의 저작설에 의문점이 있다.
[ 법륜 , 法輪 , Dharma cakra]
석가모니의 가르침[敎法].
범륜(梵輪)이라고도 한다. 석가가 설법하는 것을 법륜을 돌린다[轉法輪]고 한다. 법을 전륜왕(轉輪王)의 수레바퀴 모양의 고대 인도의 무기인 윤보(輪寶)에 비유한 것으로, 세속의 왕자로서의 전륜왕이 윤보를 돌려 천하를 통일하는 것과 같이, 정신계의 왕자로서의 석가는 법륜을 돌려 삼계(三界)를 구제한다. 또한 윤을 법의 뛰어난 점에 비유한 세 가지 의미로 설명한다. 그 한 가지는 원만(圓滿)의 뜻으로, 석가의 교법은 원만하여 결함이 없는 것을 윤의 원만한 모양에 비유하며, 둘째는 타파(打破)의 뜻으로, 석가의 교법은 중생의 망견(妄見)을 타파하는 것을 윤을 돌려 어떤 물건을 부숴뜨리는 것에 비유한 말이며, 셋째는 전전(展轉)의 뜻으로, 석가의 교법이 전전(轉轉)하여 어느 곳에나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 것에 비유한 말이다. 이러한 법륜은 만자(卍字)와 함께 불법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불상이 조상(彫像)되기 전 조각이나 회화에서 보리수(菩提樹) 불탑 등과 같이 부처의 형상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 해탈 , 解脫]
불교에서 인간의 속세적(俗世的)인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상태.
인간의 근본적 아집(我執)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인도사상(印度思想) 불교는 이것을 종교와 인생의 궁극 목적으로 생각하였다. 즉 범부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의 번뇌 또는 과거의 업(業)에 속박되어 있으며, 이로부터의 해방이 곧 구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구원은 타율적으로 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 즉 반야(般若)를 증득(證得)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데 특징이 있다. 결국 번뇌의 속박을 떠나 삼계(三界:欲界 色界 無色界)를 탈각(脫却)하여 무애자재(無自在)의 깨달음을 얻는 것을 가리킨다.
이와 함께 《승만경(勝經)》도 여래장의 기본경전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여래장 사상이 집성된 것이 《보성론(寶性論)》인데, 여기에서는 여래장의 세 의미로서 ① 여래 법신의 편재(遍在), ② 진여(眞如:진리)의 무차별성, ③ 종성(種姓:家系 동질성)의 존재를 열거하고 있다. 중국에서 특히 널리 알려진 《불성론(佛性論)》은 이 《보성론》의 개작 내지 이에 의거하여 쓴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대승의 《열반경(涅槃經)》에서 여래장을 불성의 의미로 해석하여, 일체의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一切衆生悉有佛性]고 한 말에 의해 중국에서는 여래장이라는 말보다 불성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열반경》은 일천제(一闡提:대승의 법을 비방하는 자, 세속의 욕망을 가진 자)에는 불성이 없다고 술하고 있어서 약간의 불일치가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그런자의 성불은 인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쇠붙이 와석(瓦石) 등의 비정(非情:중생 有情의 반의어로서 의식이 없는 일체의 무생물)에도 불성이 있다고 주장되었다. 유식(唯識)계통의 법상종(法相宗)이나 선종에서는 각각 오성분별(五性分別:無性 不定性 및 성문 연각 보살의 定性, 즉 각기 그 본성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 견성성불(見性成佛:불성 및 자기의 본성을 깨우침으로써 성불한다는 것, 대개 성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을 주장하여 여래장 불성을 보편화하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천태종(天台宗)의 지의(智)는 색(色:물질) 심(心)의 평등관에 근거하여 그 보편화를 개척하였으며, 길장(吉藏)은 초목(草木)에도 불성이 있다고 하여 최초로 초목성불을 주장하였다. 그 후 중국 및 한국 등지에서는 비정불성론이 일반화되었다.
상기한 여러 경론 외에도 여래장 사상을 다룬 것으로 《앙굴마라경(央掘魔羅經)》 《대법고경(大法鼓經)》 및 《금광명경(金光明經)》 《능가경(楞伽經)》 등이 있다. 특히 《능가경》은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과 함께 여래장과 알라야식[阿賴耶識]과의 관계를 논함으로써 유식설(唯識說)과의 융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 용수 , 龍樹]
인도의 불교학자.
본명 : 나가르주나(나가:용, 아가르주나:나무 이름)
별칭 : 제21의 서가(書家), 8종(八宗)의 조사(祖師)
국적 : 인도
활동분야 : 종교
출생지 : 남인도
주요저서 : 《중론》(4권)
원이름 나가르주나(나가:용, 아가르주나:나무 이름). 남인도 출생. 북인도로 가서 당시 인도의 사상(思想)을 공부하고, 불교 특히 신흥 대승불교(大乘佛敎)사상을 연구, 그 기초를 확립하였다. 때문에 제21의 서가(書家), 8종(八宗)의 조사(祖師)라고 일컫는다.
《중론(中論)》에서 전개한 공(空)의 사상은 그 이후의 모든 불교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즉, 실체(實體:自性)를 세우고, 실체적인 원리를 상정(想定)하기 위한 바람직한 자세를, 철두철미한 비판을 가하면서, 일체의 것이 다른 것[他]과의 의존 상대 상관 상의(相依)의 관계[緣起] 위에서만 비로소 성립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상관관계는 긍정적 부정적 모순적 상태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느 것에서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공의 상태에 이를 수 없는 반면, 구극(究極)의 절대적 입장[眞諦 第一義諦]은 우리의 일상적 진리[俗諦 즉, 世俗諦]로만 성립할 수 있으며, 이를 초월해서는 논의의 대상이나 표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중도적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후세에 그의 학파를 가리켜 중관파(中觀派)라고 불렀다.
주요 저서에 《중론》(4권) 외에 《회쟁론(廻諍論)》 《광파론(廣破論)》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 《공칠십론(空七十論)》 등이 있으며, 《대지도론(大智度論)》(100권) 《십이문론(十二門論)》 등은 그의 저작설에 의문점이 있다.
[ 법륜 , 法輪 , Dharma cakra]
석가모니의 가르침[敎法].
범륜(梵輪)이라고도 한다. 석가가 설법하는 것을 법륜을 돌린다[轉法輪]고 한다. 법을 전륜왕(轉輪王)의 수레바퀴 모양의 고대 인도의 무기인 윤보(輪寶)에 비유한 것으로, 세속의 왕자로서의 전륜왕이 윤보를 돌려 천하를 통일하는 것과 같이, 정신계의 왕자로서의 석가는 법륜을 돌려 삼계(三界)를 구제한다. 또한 윤을 법의 뛰어난 점에 비유한 세 가지 의미로 설명한다. 그 한 가지는 원만(圓滿)의 뜻으로, 석가의 교법은 원만하여 결함이 없는 것을 윤의 원만한 모양에 비유하며, 둘째는 타파(打破)의 뜻으로, 석가의 교법은 중생의 망견(妄見)을 타파하는 것을 윤을 돌려 어떤 물건을 부숴뜨리는 것에 비유한 말이며, 셋째는 전전(展轉)의 뜻으로, 석가의 교법이 전전(轉轉)하여 어느 곳에나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 것에 비유한 말이다. 이러한 법륜은 만자(卍字)와 함께 불법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불상이 조상(彫像)되기 전 조각이나 회화에서 보리수(菩提樹) 불탑 등과 같이 부처의 형상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 해탈 , 解脫]
불교에서 인간의 속세적(俗世的)인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상태.
인간의 근본적 아집(我執)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인도사상(印度思想) 불교는 이것을 종교와 인생의 궁극 목적으로 생각하였다. 즉 범부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의 번뇌 또는 과거의 업(業)에 속박되어 있으며, 이로부터의 해방이 곧 구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구원은 타율적으로 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 즉 반야(般若)를 증득(證得)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데 특징이 있다. 결국 번뇌의 속박을 떠나 삼계(三界:欲界 色界 無色界)를 탈각(脫却)하여 무애자재(無自在)의 깨달음을 얻는 것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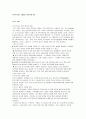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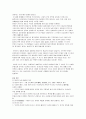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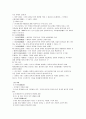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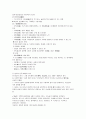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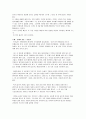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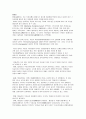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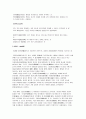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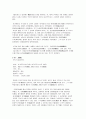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