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一. 서론
二. 본론
1. 축조(築造) 배경
-백제 국경선에 관하여
2. 축성(築城)기법과 그 변화
3. 도성(都城)과 산성(山城)
4. 백제성의 사례(事例)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
-웅진성(雄鎭城)
-사비성(泗泌城)
三. 결론
※ 부록
1) 충남소재 성 관련자료
2) 관련지도
二. 본론
1. 축조(築造) 배경
-백제 국경선에 관하여
2. 축성(築城)기법과 그 변화
3. 도성(都城)과 산성(山城)
4. 백제성의 사례(事例)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
-웅진성(雄鎭城)
-사비성(泗泌城)
三. 결론
※ 부록
1) 충남소재 성 관련자료
2) 관련지도
본문내용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군창지 소재 테뫼형산성은 다시 조선시대에 동서 두 구역으로 분할 축조되었다. 축조시기는 동성왕대(527~528)로 대체적으로 보고 있다. 부소산성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는 군창지로 알려져 있는 네 동의 건물지이다. 이 포곡식산성은 판축과 쌍석성벽을 가미한 축성법을 채택한 것 같고 사비성 서쪽에 토루가 존재한다.
문지는 동서남북 4개문이 부설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성은 들쑥날쑥한 곳이 있지만 남라성만 있으면 대체로 원형에 가까우며 둘레는 약 8km이다. 성벽은 단순한 성토방법으로 축성한 곳도 있으며 판축기법으로 축성하기도 하고 쌍성석축을 한 곳도 있다. 지형에 따라 높고 낮음이 다른 기법을 인용하고 있다. 나성의 축조연대는 백제창왕 13년(567)의 명문사리총의 출토로 나성은 이보다 앞선 시기에 즉, 사비천도 이전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소산성 동쪽 500m지점에 있는 청산성은 나성과 상호 연계되어 있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청산성은 나성보다 이른 시기에 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지적도 있고 또 지표조사결과 2중성이나 3중성으로 파악되고 있다.
왕궁지는 나성내 중앙북단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좌북조남의 북위도성제와 관련이 있으며 고구려의 도성제와도 상호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백제 웅진성이나 하남위례성도 같은 성제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성내는 동서남북과 중앙으로 구성된 오부제도로 통치되었다. 사비도성은 웅진성과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몽촌토성 그리고 고구려식의 평지성과 산성이 결합하는 도성구조를 계승하고 있어 그 원류는 고구려식에 있다고 본다. 이것을 보아 백제는 남조문화의 영향도 컸지만 북조의 문화를 보다 더 많이 수용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三. 결론
우리나라에 성을 축조한 시대는 삼국이 성립한 당시에 비로소 개시한 것을 성 자체에서 구할 수 있고 삼국의 국경지대에 특히 방어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다했다고 보는 것이며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성은 그리 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본병이 임진왜란때에 익산 울산지대에 축성한 것을 보면 성전후에 성문을 두고 문지에는 반드시 곡성을 두어 적이 성내를 관찰하지 못하도록 되었고 일단 성이 점령되려 할 적에는 후문으로 빠져 나가게 되고 공격시에는 용이하게 진출하게끔 고지에서 저지로 통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성은 산에 계곡을 끼고 축성하여 출입구가 수구에 있는 것이다. 백제가 삼국 중 『삼국사기』에 기재된 성수만 보더라도 단연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백제판도내의 성을 살펴 보더라도 주군에는 다수의 유명무명의 성이 산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부여를 왕도로 정한 후에 광포가 동서와 남북이 약 4km의 면적을 가졌으며 그 성내에는 궁성과 육좌평의 관위촌을 에워싼 재성이 있고 여타지에는 오부를 두어 서민이 거주하도록 되었다는 기록과 현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뒷받침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도성을 외침에서 방비하던 남·동·북에 석성을 굳히고 서방은 구룡평의 광활한 평원임에서 도성의 서쪽에 군주둔지였던 군수리 등이 있는 것을 알 것이다.
지방에 오방령의 군정부를 두고 관하에는 주군단위의 석축성과 혹은 토축성이 요충지와 비요충지에 두었다는 것과 대성과 대성간에는 연락을 취하던 "시루메"라는 명칭이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지방성과 도성과는 무성의 빛과 연기 같은 것으로 명령과 보도를 한 것 같다. 그리고 이 백제성들이 소재한 지점은 반드시 수도와 육로가 통하는 연선의 2km 내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백제가 고구려와 신라에서 가압하는 데서는 침략에서 벗어나려는 축성술이 특이할만한 우수성을 보유하였고 그 축성술은 백제가 망한 후에도 일본에까지 전파하여 오늘에도 대야성의 성태가 남아있고 그 성의 위치를 택하는 지대나 축성의 수법 등이 충청남도·전라도에 산재한 백제성과 흡사한 것을 일본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백제인의 문화가 얼마나 넘쳐흘러서 일본에 유출된 것인지 가히 짐작할 만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논문
홍사준, 「백제성지연구 - 축성을 중심으로」
성주탁, 「백제도성축조의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성주탁, 「백제산성연구 - 충남 논산군 운산면 소재 황산성을 중심으로」
성주탁, 「백제 말기 국경선에 대한 고찰」
성주탁, 「백제 사비도성 삼척」
최몽룡, 「몽촌토성과 하남위례성」
윤무병, 「산성·왕성·사비도성」
차용열, 「백제의 축성기법-판축토루의 조사를 중심으로」
안승주, 「백제 도성(웅진성)에 대하여」
문지는 동서남북 4개문이 부설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성은 들쑥날쑥한 곳이 있지만 남라성만 있으면 대체로 원형에 가까우며 둘레는 약 8km이다. 성벽은 단순한 성토방법으로 축성한 곳도 있으며 판축기법으로 축성하기도 하고 쌍성석축을 한 곳도 있다. 지형에 따라 높고 낮음이 다른 기법을 인용하고 있다. 나성의 축조연대는 백제창왕 13년(567)의 명문사리총의 출토로 나성은 이보다 앞선 시기에 즉, 사비천도 이전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소산성 동쪽 500m지점에 있는 청산성은 나성과 상호 연계되어 있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청산성은 나성보다 이른 시기에 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지적도 있고 또 지표조사결과 2중성이나 3중성으로 파악되고 있다.
왕궁지는 나성내 중앙북단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좌북조남의 북위도성제와 관련이 있으며 고구려의 도성제와도 상호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백제 웅진성이나 하남위례성도 같은 성제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성내는 동서남북과 중앙으로 구성된 오부제도로 통치되었다. 사비도성은 웅진성과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몽촌토성 그리고 고구려식의 평지성과 산성이 결합하는 도성구조를 계승하고 있어 그 원류는 고구려식에 있다고 본다. 이것을 보아 백제는 남조문화의 영향도 컸지만 북조의 문화를 보다 더 많이 수용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三. 결론
우리나라에 성을 축조한 시대는 삼국이 성립한 당시에 비로소 개시한 것을 성 자체에서 구할 수 있고 삼국의 국경지대에 특히 방어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다했다고 보는 것이며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성은 그리 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본병이 임진왜란때에 익산 울산지대에 축성한 것을 보면 성전후에 성문을 두고 문지에는 반드시 곡성을 두어 적이 성내를 관찰하지 못하도록 되었고 일단 성이 점령되려 할 적에는 후문으로 빠져 나가게 되고 공격시에는 용이하게 진출하게끔 고지에서 저지로 통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성은 산에 계곡을 끼고 축성하여 출입구가 수구에 있는 것이다. 백제가 삼국 중 『삼국사기』에 기재된 성수만 보더라도 단연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백제판도내의 성을 살펴 보더라도 주군에는 다수의 유명무명의 성이 산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부여를 왕도로 정한 후에 광포가 동서와 남북이 약 4km의 면적을 가졌으며 그 성내에는 궁성과 육좌평의 관위촌을 에워싼 재성이 있고 여타지에는 오부를 두어 서민이 거주하도록 되었다는 기록과 현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뒷받침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도성을 외침에서 방비하던 남·동·북에 석성을 굳히고 서방은 구룡평의 광활한 평원임에서 도성의 서쪽에 군주둔지였던 군수리 등이 있는 것을 알 것이다.
지방에 오방령의 군정부를 두고 관하에는 주군단위의 석축성과 혹은 토축성이 요충지와 비요충지에 두었다는 것과 대성과 대성간에는 연락을 취하던 "시루메"라는 명칭이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지방성과 도성과는 무성의 빛과 연기 같은 것으로 명령과 보도를 한 것 같다. 그리고 이 백제성들이 소재한 지점은 반드시 수도와 육로가 통하는 연선의 2km 내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백제가 고구려와 신라에서 가압하는 데서는 침략에서 벗어나려는 축성술이 특이할만한 우수성을 보유하였고 그 축성술은 백제가 망한 후에도 일본에까지 전파하여 오늘에도 대야성의 성태가 남아있고 그 성의 위치를 택하는 지대나 축성의 수법 등이 충청남도·전라도에 산재한 백제성과 흡사한 것을 일본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백제인의 문화가 얼마나 넘쳐흘러서 일본에 유출된 것인지 가히 짐작할 만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논문
홍사준, 「백제성지연구 - 축성을 중심으로」
성주탁, 「백제도성축조의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성주탁, 「백제산성연구 - 충남 논산군 운산면 소재 황산성을 중심으로」
성주탁, 「백제 말기 국경선에 대한 고찰」
성주탁, 「백제 사비도성 삼척」
최몽룡, 「몽촌토성과 하남위례성」
윤무병, 「산성·왕성·사비도성」
차용열, 「백제의 축성기법-판축토루의 조사를 중심으로」
안승주, 「백제 도성(웅진성)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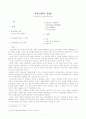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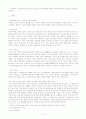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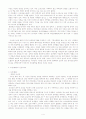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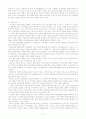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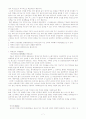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