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삼담배 <麗蔘烟>을 수출용으로 내놓았으나 그 아이디어를 중국,홍콩,미국 등지에 빼앗겨 국제경쟁에서 지고 말았다.
담배는 어른들의 기호품으로 옛날부터 권위의식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조선시대 장죽은 양반들만 사용하였으며 평민들은 짧은 곰방대를 사용해야만 했다. 만일 길다란 담뱃대로 담배를 피우다가 양반에게 적발되면 볼기를 맞았다. 술은 어른 앞에서 공손히 마실 수 있었으나 담배만은 어른 앞에서 절대로 피우면 안되었다. 요즘도 젊은애들이 어른에게 담뱃불을 빌리려다가 혼쭐이 나는 것을 간혹 목격할 수 있다. 그만큼 담배는 상하가 엄격하며 권위의 상징물이 된다. 사랑방에서 할아버지가 재떨이에 담뱃재 터는 소리를 요란하게 내고 큰 기침을 하는 것은 집안의 큰어른이 중심을 잡고 있음을 상징한다.
어른 앞에서 담배를 못 피우는 유래에 대한 설화는 두 가지가 채록되어 있다. 충남 대덕군에서 채록된 것을 보면,조정에서 신하들이 국사를 논의하다가 의논이 막히면 담배만 자꾸 태우게 되는데 그 담배연기가 높은 자리에 계신 임금님께로 자꾸 가게 되니 그것을 참다못한 임금님이 높은 분이 있는 데서는 담배를 삼가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 경기도 화성에 전하는 설화는,문종대왕이 집현전 학사들과 담론하다가 곤룡포 자락을 담뱃불에 태우게 된 뒤 앞으로는 담배를 조심해 피우자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담배의 유래에 관한 재미있는 설화도 몇 편이 있는데 그 중 충남 공주군에서 채록된 것을 보면,어떤 남자를 몹시 사랑하는 어떤 기생이 있었는데 상사병으로 죽었다.그 기생은 살아서 나누지 못한 사랑을 죽어서 입이라도 맞추어 보기를 소원하였다.그 뒤 그 기생의 무덤에는 향기로운 풀이 한 포기 돋아났고 그것이 바로 담배의 시초다. 그래서 담배는 입으로만 피울 수 있다는 이야긴데, 담배를 피우면서 기생과 입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 더욱 감미롭고 향긋한지고.
담배가 처음 전래된 때에는 남녀노소,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서로 어울려 피웠다. 신하들도 임금 앞에서 격의없이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담배는 남미 페루가 원산지로, 임진왜란때 일본군에게 조총술을 가르쳤던 포르투칼인을 통해 들어왔거나, 중국 북경을 통해 오갔던 상인들의 손으로 전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에는 담파고, 담바고로 불렸는데 영남지방의 민요에 [담바고 타령]이 있어 오늘날까지 전한다.
우리나라 담배에 관한 첫 기록은 [지봉유설]에 들어있다. 담배가 전래되었던 초기에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어울려 피웠다는 것이 오늘날과 다른 점이다. 그러다가 조회석상에서 신하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본 광해왕(1608-1623)이 한 마디 싫은 소리를 하는 바람에 윗사람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담배 예절이 굳어졌다고 한다. \"연기가 맵습니다. 앞으로 내 앞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후부터 지위가 높거나 연령이 많은 사람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관습이 생겨났다. 정조는 애연가로 유명한데, 담배를 예찬하는 시를 지을 정도였다.
더울 때 피우면 더위가 물러가고
추울 때 피우면 추위를 막아주고
식사 후에 피우면 소화를 도와주고
잠이 오지 않을 때 피우면 잠이 오며
화장실에서 피우면 냄새를 없애주누나.
당시에는 궁중에서 궁녀들이 소일거리로 피우는 것을 인정할 정도로 널리 애용되었다. 특히 여자 흡연자 수가 남자들의 흡연을 웃돌았다고 한다. 또한 옛날 양반 마님들의 나들이에는 반드시 담뱃대와 담배쌈지를 든 연비(煙婢)가 뒤따랐다. 고종때 유행했던 [담바귀타령]을 보면 처녀가 담배를 피우고 바람난 대목이 나온다. 이를 보면 여성 흡연이 연소층에까지 퍼져있었음을 알 수 있다.
空超와 담배
이 시대를 살다간 수많은 시인,작가, 묵객들은 저마다 기상천외한 기행과 호방한 일화들을 남기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초 吳相淳시인의 無定處, 無所有의 삶은 무절제한 탐욕에 사로잡힌 세속인들에게 매서운 화살촉처럼 가슴을 꿰뚫는 경고를 준다. 삶과 죽음의 일체를 空으로 돌리고 한 조각 뜬 구름처럼 漂泊을 즐기던 그의 시인적 삶은 우리 문단에서는 放浪과 參禪과 愛煙의 전설적 인물로 회자되고 있다.
그가 타계한 지난 63년 6월 3일, 지금의 한국프레스센터 건너편인 세종문화회관별관(구 국회의사당)에서 영결식을 끝내고 수유리 장지로 향하는 행렬은 그야말로 전에도 후에도 볼 수 없었던 감동의 물결이 아닐 수 없었다. 영정에는 잠들 때 외엔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담배연기가 피어오르고 만장을 든 여학생들과 가사를 걸친 승려들의 독경, 문인 음악가 화가로 이어지는 이 땅의 모든 예술가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합세하는 이채로운 광경을 연출해내었다. 그때 연도에서 이 행렬을 지켜보던 한 외국인이 \"한국이 이처럼 문화국가인 줄을 몰랐다\"고 한 감탄은 우리에게 긍지를 주었다.
공초 시인은 하루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모든 것을 청산하고 정적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했고 다시 하루가 시작되면 그는 \'반갑고 기쁘고 고마운\' 마음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맞이하고 있었다. 불교에 심취하던 시절의 명찰 순례와 고승들과의 고담준론, 한때는 모던하고 진보적인 청년교사로서 영어에 능통했으나 언제부턴가 삭발한 채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리를 걱정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 방황과 표랑의 생활에 안위하게 되었다. 그의 기인적 행각은 樹州 변영로 등과 술을 마시고 대낮에 벌거벗은 채 소를 타고 큰 거리로 진출을 시도하는가 하면, 기르던 고양이가 죽자 친구들에게 부음을 띄우고 무덤을 만들어 곡을 하면서 \'천지가 哭을 한다\'는 시를 지은 것이 후에 \"짝 잃은 거위를 곡하노라\"로 발표되고 있다. 한 손으로는 세수하고 한 손으로는 담배를 피우면서 밤낮없이 자욱한 담배연기 속에서, 50년대 중반부터는 서울 명동의 청동다방에 칩거하여 195권의 [청동문학]을 남긴 것은 그만의 남다른 문학적 성취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배연기는 스러져 어디로 가나\'라는 화두아래 월탄 박종화는 \'늙지 않는 공초, 늙을 수 없는 공초, 늙어서도 아니될 공초\'를 쓰고 있으며``````````
---- 1999년 6월 4일 대한매일 논설위원 \'李世基칼럼\' 에서 -----
담배는 어른들의 기호품으로 옛날부터 권위의식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조선시대 장죽은 양반들만 사용하였으며 평민들은 짧은 곰방대를 사용해야만 했다. 만일 길다란 담뱃대로 담배를 피우다가 양반에게 적발되면 볼기를 맞았다. 술은 어른 앞에서 공손히 마실 수 있었으나 담배만은 어른 앞에서 절대로 피우면 안되었다. 요즘도 젊은애들이 어른에게 담뱃불을 빌리려다가 혼쭐이 나는 것을 간혹 목격할 수 있다. 그만큼 담배는 상하가 엄격하며 권위의 상징물이 된다. 사랑방에서 할아버지가 재떨이에 담뱃재 터는 소리를 요란하게 내고 큰 기침을 하는 것은 집안의 큰어른이 중심을 잡고 있음을 상징한다.
어른 앞에서 담배를 못 피우는 유래에 대한 설화는 두 가지가 채록되어 있다. 충남 대덕군에서 채록된 것을 보면,조정에서 신하들이 국사를 논의하다가 의논이 막히면 담배만 자꾸 태우게 되는데 그 담배연기가 높은 자리에 계신 임금님께로 자꾸 가게 되니 그것을 참다못한 임금님이 높은 분이 있는 데서는 담배를 삼가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 경기도 화성에 전하는 설화는,문종대왕이 집현전 학사들과 담론하다가 곤룡포 자락을 담뱃불에 태우게 된 뒤 앞으로는 담배를 조심해 피우자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담배의 유래에 관한 재미있는 설화도 몇 편이 있는데 그 중 충남 공주군에서 채록된 것을 보면,어떤 남자를 몹시 사랑하는 어떤 기생이 있었는데 상사병으로 죽었다.그 기생은 살아서 나누지 못한 사랑을 죽어서 입이라도 맞추어 보기를 소원하였다.그 뒤 그 기생의 무덤에는 향기로운 풀이 한 포기 돋아났고 그것이 바로 담배의 시초다. 그래서 담배는 입으로만 피울 수 있다는 이야긴데, 담배를 피우면서 기생과 입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 더욱 감미롭고 향긋한지고.
담배가 처음 전래된 때에는 남녀노소,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서로 어울려 피웠다. 신하들도 임금 앞에서 격의없이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담배는 남미 페루가 원산지로, 임진왜란때 일본군에게 조총술을 가르쳤던 포르투칼인을 통해 들어왔거나, 중국 북경을 통해 오갔던 상인들의 손으로 전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에는 담파고, 담바고로 불렸는데 영남지방의 민요에 [담바고 타령]이 있어 오늘날까지 전한다.
우리나라 담배에 관한 첫 기록은 [지봉유설]에 들어있다. 담배가 전래되었던 초기에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어울려 피웠다는 것이 오늘날과 다른 점이다. 그러다가 조회석상에서 신하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본 광해왕(1608-1623)이 한 마디 싫은 소리를 하는 바람에 윗사람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담배 예절이 굳어졌다고 한다. \"연기가 맵습니다. 앞으로 내 앞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후부터 지위가 높거나 연령이 많은 사람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관습이 생겨났다. 정조는 애연가로 유명한데, 담배를 예찬하는 시를 지을 정도였다.
더울 때 피우면 더위가 물러가고
추울 때 피우면 추위를 막아주고
식사 후에 피우면 소화를 도와주고
잠이 오지 않을 때 피우면 잠이 오며
화장실에서 피우면 냄새를 없애주누나.
당시에는 궁중에서 궁녀들이 소일거리로 피우는 것을 인정할 정도로 널리 애용되었다. 특히 여자 흡연자 수가 남자들의 흡연을 웃돌았다고 한다. 또한 옛날 양반 마님들의 나들이에는 반드시 담뱃대와 담배쌈지를 든 연비(煙婢)가 뒤따랐다. 고종때 유행했던 [담바귀타령]을 보면 처녀가 담배를 피우고 바람난 대목이 나온다. 이를 보면 여성 흡연이 연소층에까지 퍼져있었음을 알 수 있다.
空超와 담배
이 시대를 살다간 수많은 시인,작가, 묵객들은 저마다 기상천외한 기행과 호방한 일화들을 남기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초 吳相淳시인의 無定處, 無所有의 삶은 무절제한 탐욕에 사로잡힌 세속인들에게 매서운 화살촉처럼 가슴을 꿰뚫는 경고를 준다. 삶과 죽음의 일체를 空으로 돌리고 한 조각 뜬 구름처럼 漂泊을 즐기던 그의 시인적 삶은 우리 문단에서는 放浪과 參禪과 愛煙의 전설적 인물로 회자되고 있다.
그가 타계한 지난 63년 6월 3일, 지금의 한국프레스센터 건너편인 세종문화회관별관(구 국회의사당)에서 영결식을 끝내고 수유리 장지로 향하는 행렬은 그야말로 전에도 후에도 볼 수 없었던 감동의 물결이 아닐 수 없었다. 영정에는 잠들 때 외엔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담배연기가 피어오르고 만장을 든 여학생들과 가사를 걸친 승려들의 독경, 문인 음악가 화가로 이어지는 이 땅의 모든 예술가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합세하는 이채로운 광경을 연출해내었다. 그때 연도에서 이 행렬을 지켜보던 한 외국인이 \"한국이 이처럼 문화국가인 줄을 몰랐다\"고 한 감탄은 우리에게 긍지를 주었다.
공초 시인은 하루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모든 것을 청산하고 정적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했고 다시 하루가 시작되면 그는 \'반갑고 기쁘고 고마운\' 마음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맞이하고 있었다. 불교에 심취하던 시절의 명찰 순례와 고승들과의 고담준론, 한때는 모던하고 진보적인 청년교사로서 영어에 능통했으나 언제부턴가 삭발한 채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리를 걱정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 방황과 표랑의 생활에 안위하게 되었다. 그의 기인적 행각은 樹州 변영로 등과 술을 마시고 대낮에 벌거벗은 채 소를 타고 큰 거리로 진출을 시도하는가 하면, 기르던 고양이가 죽자 친구들에게 부음을 띄우고 무덤을 만들어 곡을 하면서 \'천지가 哭을 한다\'는 시를 지은 것이 후에 \"짝 잃은 거위를 곡하노라\"로 발표되고 있다. 한 손으로는 세수하고 한 손으로는 담배를 피우면서 밤낮없이 자욱한 담배연기 속에서, 50년대 중반부터는 서울 명동의 청동다방에 칩거하여 195권의 [청동문학]을 남긴 것은 그만의 남다른 문학적 성취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배연기는 스러져 어디로 가나\'라는 화두아래 월탄 박종화는 \'늙지 않는 공초, 늙을 수 없는 공초, 늙어서도 아니될 공초\'를 쓰고 있으며``````````
---- 1999년 6월 4일 대한매일 논설위원 \'李世基칼럼\' 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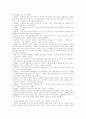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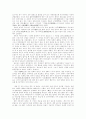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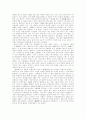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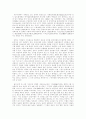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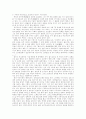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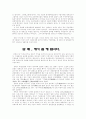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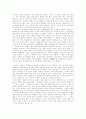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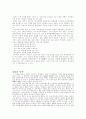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