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화랑의 지도자인 구참공(瞿璇公)이 어느날 산에 놀러 갔다가 혜공이 산길에 죽어 쓰러져서, 그 시체가 부어 터지고 살이 썩어 구더기가 난 것을 보고, 오래동안 슬피 탄식했다. 말고삐를 돌려서 성에 들어오니 혜공이 술에 몹시 취해서 저자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있었다.
매번 절의 우물 속에 들어가면 몇 달씩 나오지 않는 독특한 수행을 했다. 우물에서 나올 때면 푸른 옷을 입은 신동(神童)이 먼저 솟아 나왔기에 절의 스님들은 혜공이 우물에서 나올 때를 미리 알았다. 또한 혜공이 우물에서 나와도 옷은 젖지 않았다. 이 우물은 스님의 이름을 따서 \'혜공 우물\'(惠空井)이라 했다.
신인종(神印宗)의 시조 명랑(明朗)이 금강사를 창건하고 낙성 법회를 열었다. (선덕여왕 4년 635년 명랑이 당나라에서 귀국했던 무렵의 일이다.) 대부분의 고승들이 다 모였으나 오직 혜공만 보이지 않았다. 이에 명랑이 향을 피고 정성껏 기도를 했더니 조금 후에 혜공이 왔다. 바깥에는 심한 비가 오고 있었으나, 그의 옷은 젖지 않았고, 발에도 진흙이 묻지 않았다. 혜공은 명랑에게 \"간절하게 초청하길래 왔소이다\" 라고 했다. 명랑의 기도와 혜공의 감응이 있었던 것이다.
어느날 혜공은 새끼를 꼬아서 영묘사(靈廟寺)에 들고 가서 금당(金堂; 대웅전)과 좌우의 경루(經樓)와 남문(南門)의 복도를 둘러 묶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새끼줄을 풀기를 당부했다. 사흘 뒤 절에 불이 났으나 새끼로 묶은 곳은 화재를 면할 수 있었다. 영묘사는 선덕여왕이 즉위 4년에 창건한 원찰이다. 그 무렵 활리역(活里驛)의 역졸(驛卒)인 지귀(志鬼; 의지의 화신)라는 젊은이가 여왕을 짝사랑하다 상사병에 걸렸다. 이 소문을 들은 여왕은 그를 만나기로 하고 영묘사로 불렀다. 절에 달려간 지귀는 탑 아래서 여왕을 기다리다 지쳐서 깊은 잠에 빠져 들고 말클다. 여왕은 끼고 있던 팔찌를 뽑아서 잠든 지귀의 가슴에 놓아두고 떠났다. 깨어난 지귀는 안타까움에 마음 속에 불길이 일더니, 목탑을 불태워버렸다. 그러나 혜공이 금줄을 친 곳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처럼 혜공은 신기한 행적이 많았다. 그가 죽을 때는 공중에 떠서 세상을 마쳤다. 또한 사리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한다.
혜공은 만년에 항사사[오어사]에 살았다. 원효는 여러 가지 주석을 저술하고 있었으므로, 혜공에게 가서 묻고 혹은 서로 장난도 했다. (아마 진덕여왕 때일 것이며, 원효가 30대 초-중반일 때일 것이다.) 미친 듯이 거침없이(猖狂, 無碍) 살던 혜공은 원효와 상식을 몰고 다니는 장난도 했던 것이다. 어느날 둘은 개울을 따라가면서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 먹고, 돌 위에 똥을 쌌다. 혜공이 그것을 가리키며 농담을 하기를 \"汝屎吾魚\"라 했다. 이에 이 절을 \'오어사\'라고 했다.
\"汝屎 吾魚\"는 해석이 다양하다. ⑴ 김상현 - \"너는 똥을 누고, 나는 물고기를 누었다.\"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이 되고, 젖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된다. 같은 물고기를 먹고도 똥을 눈 이도 있고, 다시 살아있는 물고기를 눈 이도 있다. 글을 제대로 읽어라, 세상을 제대로 보아라. 그런 충고일 것이다.
정의행 - 민중에게 친근한 벗으로 접근하여 민중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중의 눈 높이로 내려가야 한다. 민중과 어울려 술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춘 무애행(無碍行, 猖狂)도 그런 노력이다. 술을 먹다 보면 고기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고기를 먹었지만, 다시 똥 대신 물고기를 눈다. 즉 물고기를 살려 준 것이다. 그렇다면 술을 마신 것도 사실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이다. 혜숙의 경우도 구참공과 고기를 먹었지만, 하나도 먹지 않았다는 설화가 있다. (종일 옷을 입었지만, 실오라기 하나 걸친 것 없고, 밥을 먹었지만 쌀 한톨 씹은 적이 없다!) 다만 백성들의 고민을 함께 하는 좋은 친구(善知識)가 되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선택한 것. 이들의 무애행에 대비되는 것은 원광이나 자장처럼 왕권과 결합하여 황룡사같은 큰 절에 머무르면서 고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들은 결코 민중 속으로 다가갈 수 없다. 민중과 격리시키는 그런 권위와 위엄을 깨뜨린 것이 바로 혜공의 무애행이며, 물고기의 설화도 바로 그런 무애행의 하나이다. 원효가 무애행을 이렇게 배웠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의 해석 때문에, 혜공이 눈 똥은 변해서 물고기가 되어 물 속을 헤엄쳐 갔지만, 원효가 눈 똥은 그냥 똥으로만 있었다는 설화가 생겨나게 된다. 아마 혜공의 신통력을 강조한 설화일 것이다.)
⑵ \"그대가 눈 똥은 내가 잡은 물고기일 것이오.\" 이것이 문법상 맞는 해석일 것이다. 이것은 구참공과 혜숙 대사가 사냥했던 일화와 비슷하다. 화랑의 지도자였던 구참공은 일상적으로 사냥을 했고, 사냥한 짐승을 구워서 먹었다. 그에게 짐승은 단지 잡아먹을 것(고기)에 불과했다. 혜숙은 자기 다리의 살을 베어서 짐승의 고기와 비교한다. 그 차이는 뭔가? 결국 생명체의 살이라는 점에서 같은 것이다. 그러나 지배층은 언제나 \"죽이는 것을 좋아하고\", \"남을 해쳐서 자기 몸만 기를 뿐\"이었다. 백성과 사냥 대상인 짐승의 차이는 뭔가? 혜숙은 전쟁을 반대하고 백성의 편에 선 사람이었던 것 같다.
물고기 이야기 - 원효는 단지 물고기를 먹는 대상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혜공은 원효가 눈 똥이 바로 종전에 잡은 물고기,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일깨워 준다. 물고기를 똥으로 만들어 버리는 인간의 추악한 이기심, 혹은 권력욕.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만이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백성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약했던 신라가 3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백성들의 단결을 이끌어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중 계열의 승려들의 역할은 컸다.
혜공은 무애행을 했으며, 신통력을 발휘한 승려이다. 더불어 학식에도 깊이가 있었다. 원효는 많은 점에서 혜공을 닮아 있다.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신을 낮추어 백성의 곁으로 다가간 혜공, 그는 이름 그대로 지혜(惠; 사랑)와 비운 마음(空;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 지혜를 감추고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을 것이다.(和光同塵)
화랑의 지도자인 구참공(瞿璇公)이 어느날 산에 놀러 갔다가 혜공이 산길에 죽어 쓰러져서, 그 시체가 부어 터지고 살이 썩어 구더기가 난 것을 보고, 오래동안 슬피 탄식했다. 말고삐를 돌려서 성에 들어오니 혜공이 술에 몹시 취해서 저자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있었다.
매번 절의 우물 속에 들어가면 몇 달씩 나오지 않는 독특한 수행을 했다. 우물에서 나올 때면 푸른 옷을 입은 신동(神童)이 먼저 솟아 나왔기에 절의 스님들은 혜공이 우물에서 나올 때를 미리 알았다. 또한 혜공이 우물에서 나와도 옷은 젖지 않았다. 이 우물은 스님의 이름을 따서 \'혜공 우물\'(惠空井)이라 했다.
신인종(神印宗)의 시조 명랑(明朗)이 금강사를 창건하고 낙성 법회를 열었다. (선덕여왕 4년 635년 명랑이 당나라에서 귀국했던 무렵의 일이다.) 대부분의 고승들이 다 모였으나 오직 혜공만 보이지 않았다. 이에 명랑이 향을 피고 정성껏 기도를 했더니 조금 후에 혜공이 왔다. 바깥에는 심한 비가 오고 있었으나, 그의 옷은 젖지 않았고, 발에도 진흙이 묻지 않았다. 혜공은 명랑에게 \"간절하게 초청하길래 왔소이다\" 라고 했다. 명랑의 기도와 혜공의 감응이 있었던 것이다.
어느날 혜공은 새끼를 꼬아서 영묘사(靈廟寺)에 들고 가서 금당(金堂; 대웅전)과 좌우의 경루(經樓)와 남문(南門)의 복도를 둘러 묶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새끼줄을 풀기를 당부했다. 사흘 뒤 절에 불이 났으나 새끼로 묶은 곳은 화재를 면할 수 있었다. 영묘사는 선덕여왕이 즉위 4년에 창건한 원찰이다. 그 무렵 활리역(活里驛)의 역졸(驛卒)인 지귀(志鬼; 의지의 화신)라는 젊은이가 여왕을 짝사랑하다 상사병에 걸렸다. 이 소문을 들은 여왕은 그를 만나기로 하고 영묘사로 불렀다. 절에 달려간 지귀는 탑 아래서 여왕을 기다리다 지쳐서 깊은 잠에 빠져 들고 말클다. 여왕은 끼고 있던 팔찌를 뽑아서 잠든 지귀의 가슴에 놓아두고 떠났다. 깨어난 지귀는 안타까움에 마음 속에 불길이 일더니, 목탑을 불태워버렸다. 그러나 혜공이 금줄을 친 곳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처럼 혜공은 신기한 행적이 많았다. 그가 죽을 때는 공중에 떠서 세상을 마쳤다. 또한 사리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한다.
혜공은 만년에 항사사[오어사]에 살았다. 원효는 여러 가지 주석을 저술하고 있었으므로, 혜공에게 가서 묻고 혹은 서로 장난도 했다. (아마 진덕여왕 때일 것이며, 원효가 30대 초-중반일 때일 것이다.) 미친 듯이 거침없이(猖狂, 無碍) 살던 혜공은 원효와 상식을 몰고 다니는 장난도 했던 것이다. 어느날 둘은 개울을 따라가면서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 먹고, 돌 위에 똥을 쌌다. 혜공이 그것을 가리키며 농담을 하기를 \"汝屎吾魚\"라 했다. 이에 이 절을 \'오어사\'라고 했다.
\"汝屎 吾魚\"는 해석이 다양하다. ⑴ 김상현 - \"너는 똥을 누고, 나는 물고기를 누었다.\"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이 되고, 젖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된다. 같은 물고기를 먹고도 똥을 눈 이도 있고, 다시 살아있는 물고기를 눈 이도 있다. 글을 제대로 읽어라, 세상을 제대로 보아라. 그런 충고일 것이다.
정의행 - 민중에게 친근한 벗으로 접근하여 민중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중의 눈 높이로 내려가야 한다. 민중과 어울려 술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춘 무애행(無碍行, 猖狂)도 그런 노력이다. 술을 먹다 보면 고기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고기를 먹었지만, 다시 똥 대신 물고기를 눈다. 즉 물고기를 살려 준 것이다. 그렇다면 술을 마신 것도 사실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이다. 혜숙의 경우도 구참공과 고기를 먹었지만, 하나도 먹지 않았다는 설화가 있다. (종일 옷을 입었지만, 실오라기 하나 걸친 것 없고, 밥을 먹었지만 쌀 한톨 씹은 적이 없다!) 다만 백성들의 고민을 함께 하는 좋은 친구(善知識)가 되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선택한 것. 이들의 무애행에 대비되는 것은 원광이나 자장처럼 왕권과 결합하여 황룡사같은 큰 절에 머무르면서 고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들은 결코 민중 속으로 다가갈 수 없다. 민중과 격리시키는 그런 권위와 위엄을 깨뜨린 것이 바로 혜공의 무애행이며, 물고기의 설화도 바로 그런 무애행의 하나이다. 원효가 무애행을 이렇게 배웠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의 해석 때문에, 혜공이 눈 똥은 변해서 물고기가 되어 물 속을 헤엄쳐 갔지만, 원효가 눈 똥은 그냥 똥으로만 있었다는 설화가 생겨나게 된다. 아마 혜공의 신통력을 강조한 설화일 것이다.)
⑵ \"그대가 눈 똥은 내가 잡은 물고기일 것이오.\" 이것이 문법상 맞는 해석일 것이다. 이것은 구참공과 혜숙 대사가 사냥했던 일화와 비슷하다. 화랑의 지도자였던 구참공은 일상적으로 사냥을 했고, 사냥한 짐승을 구워서 먹었다. 그에게 짐승은 단지 잡아먹을 것(고기)에 불과했다. 혜숙은 자기 다리의 살을 베어서 짐승의 고기와 비교한다. 그 차이는 뭔가? 결국 생명체의 살이라는 점에서 같은 것이다. 그러나 지배층은 언제나 \"죽이는 것을 좋아하고\", \"남을 해쳐서 자기 몸만 기를 뿐\"이었다. 백성과 사냥 대상인 짐승의 차이는 뭔가? 혜숙은 전쟁을 반대하고 백성의 편에 선 사람이었던 것 같다.
물고기 이야기 - 원효는 단지 물고기를 먹는 대상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혜공은 원효가 눈 똥이 바로 종전에 잡은 물고기,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일깨워 준다. 물고기를 똥으로 만들어 버리는 인간의 추악한 이기심, 혹은 권력욕.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만이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백성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약했던 신라가 3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백성들의 단결을 이끌어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중 계열의 승려들의 역할은 컸다.
혜공은 무애행을 했으며, 신통력을 발휘한 승려이다. 더불어 학식에도 깊이가 있었다. 원효는 많은 점에서 혜공을 닮아 있다.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신을 낮추어 백성의 곁으로 다가간 혜공, 그는 이름 그대로 지혜(惠; 사랑)와 비운 마음(空;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 지혜를 감추고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을 것이다.(和光同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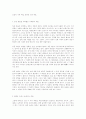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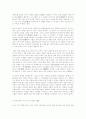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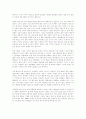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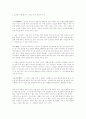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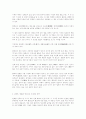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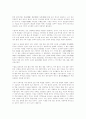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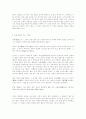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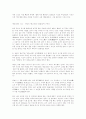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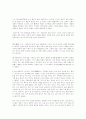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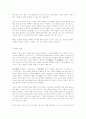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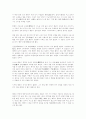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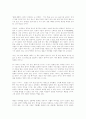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