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대자대비한 보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세에서 자비로써 중생을 구제하는 관음보살은 관세음(觀世音), 광세음(光世音), 관자재(觀自在)보살이라고도 한다. 초기 대승불교 경전에서부터 나오지만 특히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보문품에는 대자대비(大慈大悲)의 보살로 위난을 만났을 때 그 이름을 외우기만 하면 중생의 성품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로 대세지보살과 함께 아미타불을 왼쪽에서 협시하는 보살로서 머리의 보관에 아미타화불을 새기고 손에는 보병이나 연꽃을 들고 있는 도상으로 표현된다. 또한 화엄경에 의하면 보타락가산(補陀落迦山)에 거주한다고 한다.
이 보살은 관음신앙이 발달함에 따라 여러 가지의 변화관음으로 나타나는데 11면관음(十一面觀音), 천수관음(千手觀音), 불공견색관음(不空 索觀音), 여의륜관음(如意輪觀音)을 비롯하여 여성형인 준제관음(准提觀音) 그리고 마두관음(馬頭觀音)과 같은 분노형도 나오게 되었다.
석굴암 11면 관음보살
이밖에 수월관음(양류관음), 백의관음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엽의관음(葉衣觀音), 다라존관음(多羅尊觀音) 등 특수한 이름을 가진 여러 관음을 모은 33관음도 있다.
관음보살은 대승불교에서 가장 널리 신앙되었고 대중에게도 가장 친숙했던 보살로 인도나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불교문화 지역에 조각이나 회화 유품으로 많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말기부터 관음신앙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단독상과 아미타삼존의 협시로서의 예가 있는데 그중에서 경상북도 선산 출토의 금동관음보살상과 부여 규암면 출토의 금동관음보살상 등이 단독상으로서 유명하다.
한국의 인장
한국 인장의 역사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예는 단군신화의 기록에 나오는「천부인(天符印) 삼방설(印方說)」-하늘로부터 3개의 \'인\'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이다. 만약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만육천년이나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일찍 인장을 사용한 민족이 된다. 하지만 실존하는 유물이나 사료가 부족하여 하나의 \'설\'이나 상징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것은 아주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918년부터 수년간에 걸쳐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토성리에서 낙랑(BC 108∼AD 313)의 봉니인 200영 점이 발굴된 사례가 있으며,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의 제 7대 차대왕(次大王)이 무도하여 국정을 어지러피므로 살해되니 중신들이 의논하여 8대 신대왕(新大王)을 맞아들이고 무릎을 끓고 국새를 올리며 말하기를......」 이라는 기록이 있어 고구려의 건국과 동시에 \'한\'나라로부터 인을 받아 \'국새(國璽)\'로 사용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신라의 인장으로는 안압지에서 출토된 목인(木印)이 있지만 글자의 내용은 판독되지 않고 있다
▲ 낙랑군 출토 봉니 ▲ 낙랑군 출토 인(印
고려시대의 인장은 요 금에서 금인을 보내왔으며, 원의 침략이후 \'부마국왕선명정동행서성\'이란 인을 보내와 이를 국새로 사용하였고 공민왕 때에 이르러 \'고려국왕지인\'을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고려 의종 때(1146-1170) \'인부랑(印符郞)\'이란 관직을 두어 관인을 관장하게 하였음을 보아 인장을 광범하게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고려의 관인은 조선 건국이후 모두 폐기하여 현존하는 것이 없고 현존하는 고려인은 모두 사인으로 청동 또는 청자로 만들었으며 그 형태는 방형, 원형, 8각 등 다양하다. 이 시대의 인장은 문자가 아니거나 자획을 여러 번 구부려 판독이 불가능한 것이 많다.
◀ 고려시대의 청동인장 (12∼13세기)
조선의
인장은 대개 고려의 전통을 이어 받아 구리나 철로 주조한 것이며 \'상서사(尙瑞司)\'라는 부서를 두어 새보(璽寶)를 맡아 관리하게 하였고 세종 때는 이를 \'상서원\'으로 개편하여 관인을 제작하게 하였다. 또한 명에서 내려온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은 대명관계 문서에만 사용하고 강희언으로 하여 〈제천목민영창후사(體天牧民永昌後嗣)〉이라 전서로 쓰게 하여 이를 국내용으로 사용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인의 사용 체계가 문란해짐에 따라 관인을 다시 주조하였고 정조 때에 이르러 국새의 모인을 사용하게 된다.
▲ 정조 금보 ▲ 용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금보
1897년의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국새를 사용하게 되는데 대한국새(외교문서), 황제어새(皇帝御璽-포상), 제고지보(制誥之寶-관리임용), 칙명지보(勅命之寶-통신문서), 대원수보(大元帥寶-군통수), 내각지인, 내각총리대신장 의 8개의 국새를 순금으로 주조하였다. 이들 국새는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제합병되면서 일제가 약탈해 간 것을 1946년 1월 13일 되찾았지만, 6.25전란 중에 5개가 분실되고 현재는 \'대원수보\', \'제고지보\', \'칙명지보\' 3가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때 제작된 국새는 모두 정방형이며 거북형상을 하고 있다.
▲ 칙명지보 ▲ 대원수보 ▲ 제고지보
조선시대의 관리들이 통상적인 결재에 사용하였던 인장으로 \'수결인(手決 印)\'이 있는데 이는 산적한 서류들을 결재하는데 일일이 붓으로 결재를 하는 것보다 빠르고 편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때 특이한 점은 붉은 색이 아니라 반드시 검은 색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조선시대의 서민들은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인장을 사용할 수 없었기에 타인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이름을 초서나 행서 등으로 쓴 화압을 사용하였는데, 오늘날에 널리 쓰이고 있는 사인(signature)과 같은 형식으로 사용되었다. 또 중인이나 양반의 부인들은 성만 있을 뿐 이름이 없었기에 화압대신 『△△△처(妻) 본가성씨(本價姓氏)』라는 내용이 새겨진 사각인을 사용했다
◀ 홍상한(洪像漢-1701∼1769) 의 화압
이름의 글자 중에서 「像」자를 택해서 초서(草書) 한 것으로 획을 간략히 하였으나 글자를 알아볼 수 있다.
▲ 현재의 대한민국 국새 ▲ 국새의 인영
http://www.bulguksa.or.kr/0409/index.html
http://www.chonhyang.com/
http://www.buddhapia.com
http://www.donga.com
이처럼 현세에서 자비로써 중생을 구제하는 관음보살은 관세음(觀世音), 광세음(光世音), 관자재(觀自在)보살이라고도 한다. 초기 대승불교 경전에서부터 나오지만 특히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보문품에는 대자대비(大慈大悲)의 보살로 위난을 만났을 때 그 이름을 외우기만 하면 중생의 성품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로 대세지보살과 함께 아미타불을 왼쪽에서 협시하는 보살로서 머리의 보관에 아미타화불을 새기고 손에는 보병이나 연꽃을 들고 있는 도상으로 표현된다. 또한 화엄경에 의하면 보타락가산(補陀落迦山)에 거주한다고 한다.
이 보살은 관음신앙이 발달함에 따라 여러 가지의 변화관음으로 나타나는데 11면관음(十一面觀音), 천수관음(千手觀音), 불공견색관음(不空 索觀音), 여의륜관음(如意輪觀音)을 비롯하여 여성형인 준제관음(准提觀音) 그리고 마두관음(馬頭觀音)과 같은 분노형도 나오게 되었다.
석굴암 11면 관음보살
이밖에 수월관음(양류관음), 백의관음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엽의관음(葉衣觀音), 다라존관음(多羅尊觀音) 등 특수한 이름을 가진 여러 관음을 모은 33관음도 있다.
관음보살은 대승불교에서 가장 널리 신앙되었고 대중에게도 가장 친숙했던 보살로 인도나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불교문화 지역에 조각이나 회화 유품으로 많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말기부터 관음신앙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단독상과 아미타삼존의 협시로서의 예가 있는데 그중에서 경상북도 선산 출토의 금동관음보살상과 부여 규암면 출토의 금동관음보살상 등이 단독상으로서 유명하다.
한국의 인장
한국 인장의 역사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예는 단군신화의 기록에 나오는「천부인(天符印) 삼방설(印方說)」-하늘로부터 3개의 \'인\'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이다. 만약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만육천년이나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일찍 인장을 사용한 민족이 된다. 하지만 실존하는 유물이나 사료가 부족하여 하나의 \'설\'이나 상징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것은 아주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918년부터 수년간에 걸쳐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토성리에서 낙랑(BC 108∼AD 313)의 봉니인 200영 점이 발굴된 사례가 있으며,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의 제 7대 차대왕(次大王)이 무도하여 국정을 어지러피므로 살해되니 중신들이 의논하여 8대 신대왕(新大王)을 맞아들이고 무릎을 끓고 국새를 올리며 말하기를......」 이라는 기록이 있어 고구려의 건국과 동시에 \'한\'나라로부터 인을 받아 \'국새(國璽)\'로 사용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신라의 인장으로는 안압지에서 출토된 목인(木印)이 있지만 글자의 내용은 판독되지 않고 있다
▲ 낙랑군 출토 봉니 ▲ 낙랑군 출토 인(印
고려시대의 인장은 요 금에서 금인을 보내왔으며, 원의 침략이후 \'부마국왕선명정동행서성\'이란 인을 보내와 이를 국새로 사용하였고 공민왕 때에 이르러 \'고려국왕지인\'을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고려 의종 때(1146-1170) \'인부랑(印符郞)\'이란 관직을 두어 관인을 관장하게 하였음을 보아 인장을 광범하게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고려의 관인은 조선 건국이후 모두 폐기하여 현존하는 것이 없고 현존하는 고려인은 모두 사인으로 청동 또는 청자로 만들었으며 그 형태는 방형, 원형, 8각 등 다양하다. 이 시대의 인장은 문자가 아니거나 자획을 여러 번 구부려 판독이 불가능한 것이 많다.
◀ 고려시대의 청동인장 (12∼13세기)
조선의
인장은 대개 고려의 전통을 이어 받아 구리나 철로 주조한 것이며 \'상서사(尙瑞司)\'라는 부서를 두어 새보(璽寶)를 맡아 관리하게 하였고 세종 때는 이를 \'상서원\'으로 개편하여 관인을 제작하게 하였다. 또한 명에서 내려온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은 대명관계 문서에만 사용하고 강희언으로 하여 〈제천목민영창후사(體天牧民永昌後嗣)〉이라 전서로 쓰게 하여 이를 국내용으로 사용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인의 사용 체계가 문란해짐에 따라 관인을 다시 주조하였고 정조 때에 이르러 국새의 모인을 사용하게 된다.
▲ 정조 금보 ▲ 용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금보
1897년의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국새를 사용하게 되는데 대한국새(외교문서), 황제어새(皇帝御璽-포상), 제고지보(制誥之寶-관리임용), 칙명지보(勅命之寶-통신문서), 대원수보(大元帥寶-군통수), 내각지인, 내각총리대신장 의 8개의 국새를 순금으로 주조하였다. 이들 국새는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제합병되면서 일제가 약탈해 간 것을 1946년 1월 13일 되찾았지만, 6.25전란 중에 5개가 분실되고 현재는 \'대원수보\', \'제고지보\', \'칙명지보\' 3가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때 제작된 국새는 모두 정방형이며 거북형상을 하고 있다.
▲ 칙명지보 ▲ 대원수보 ▲ 제고지보
조선시대의 관리들이 통상적인 결재에 사용하였던 인장으로 \'수결인(手決 印)\'이 있는데 이는 산적한 서류들을 결재하는데 일일이 붓으로 결재를 하는 것보다 빠르고 편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때 특이한 점은 붉은 색이 아니라 반드시 검은 색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조선시대의 서민들은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인장을 사용할 수 없었기에 타인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이름을 초서나 행서 등으로 쓴 화압을 사용하였는데, 오늘날에 널리 쓰이고 있는 사인(signature)과 같은 형식으로 사용되었다. 또 중인이나 양반의 부인들은 성만 있을 뿐 이름이 없었기에 화압대신 『△△△처(妻) 본가성씨(本價姓氏)』라는 내용이 새겨진 사각인을 사용했다
◀ 홍상한(洪像漢-1701∼1769) 의 화압
이름의 글자 중에서 「像」자를 택해서 초서(草書) 한 것으로 획을 간략히 하였으나 글자를 알아볼 수 있다.
▲ 현재의 대한민국 국새 ▲ 국새의 인영
http://www.bulguksa.or.kr/0409/index.html
http://www.chonhyang.com/
http://www.buddhapia.com
http://www.donga.com
키워드
추천자료
 조선후기 조각보에 대해서
조선후기 조각보에 대해서 광고를 보고 그 광고의 장점을 찾고, 스크랩 해오세요
광고를 보고 그 광고의 장점을 찾고, 스크랩 해오세요 일제 시기 조선의 변사들과 극장 풍경
일제 시기 조선의 변사들과 극장 풍경 우리나라 기업교육의 ISD이론모형의 실천원리와 격차분석
우리나라 기업교육의 ISD이론모형의 실천원리와 격차분석 미국 수행평가 연구방향에 대한 분석적 고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미국 수행평가 연구방향에 대한 분석적 고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6시그마]기업에서의 6 시그마
[6시그마]기업에서의 6 시그마 테이블 세팅(Table setting)의 이해 - 필요요소, 기본절차, 서양의 테이블 배너, 스타일별 세팅
테이블 세팅(Table setting)의 이해 - 필요요소, 기본절차, 서양의 테이블 배너, 스타일별 세팅 [방송통신융합][방송통신융합서비스][방송환경]방송통신융합의 의미, 방송통신융합의 모델, ...
[방송통신융합][방송통신융합서비스][방송환경]방송통신융합의 의미, 방송통신융합의 모델, ... 민속춤교육 수업자료(학습자료), 통일교육 수업자료(학습자료), 인성교육 수업자료(학습자료)...
민속춤교육 수업자료(학습자료), 통일교육 수업자료(학습자료), 인성교육 수업자료(학습자료)... [인텔리전트빌딩][인텔리전트빌딩의 설계][인텔리전트빌딩의 이점]인텔리전트빌딩의 정의, 인...
[인텔리전트빌딩][인텔리전트빌딩의 설계][인텔리전트빌딩의 이점]인텔리전트빌딩의 정의, 인... BBQ 중국 진출 전략
BBQ 중국 진출 전략 빈폴(Bean Pole) vs 폴로(Polo) 4p 분석
빈폴(Bean Pole) vs 폴로(Polo) 4p 분석 고객유치와 유지를 위한 현대 마케팅의 주요 기법(코즈마케팅
고객유치와 유지를 위한 현대 마케팅의 주요 기법(코즈마케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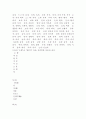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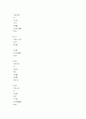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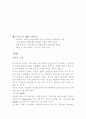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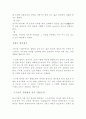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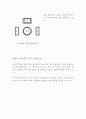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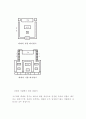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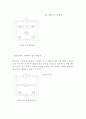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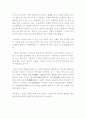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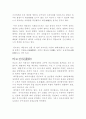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