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급증하게 될 국가의 財政需要를 무리없이 조달할 수 있는 租稅法體系가 마련되어야 하는데,이를 위해서는 租稅의 衡平과 이를 토대로 하는 擔稅能力의 원칙이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날 稅法秩序를 지배하는 근본원리로서 租稅의 平等과 擔稅能力의 원칙은 많은 稅法學者들에 의하여 憲法上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것은 과거 \"稅法은 고작해야 복잡한 용어의 나열과 약간의 貸借對照表上의 稅務會計로 이루어지는 技術法\"이라는 인식으로부터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 독일 租稅法 學界의 원로학자인 Tipke는 社會的 法治國家에서의 稅法秩序를 正義의 秩序(Steue-rrechtsordnung als Gerechtigkeitsordnung)로 정의하고, 정의의 요구가 지켜지지 않는 國家의 課稅權은 單純한 財政的 자의 내지 財政的 無政府主義일 뿐임을 강조하고 있다.주23) 이것은 결국 오늘날 점증하는 국가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에 상응하는 국민의 租稅負擔을 고려해 볼 때 租稅負擔의 衡平을 保障할 수 있는 기준의 확립없이는 市場經濟秩序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내에서 전반적인 사회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행 우리憲法은 租稅와 관련하여 제59조에서 租稅法律主義를 선언하고 제38조에서는 納稅의 義務를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히[111]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 納稅의 義務\" 보다는 \"經濟的인 擔稅能力에 따라 法律이 정하는 納稅의 義務를 負擔한다\"는 규정형식이 보다 租稅의 平等이라는 憲法原理를 구현하는 데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추가적인 표현이 없다고 하더라도 憲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일반적인 平等條項과 관련하여 憲法의 統一的인 해석을 통해서 租稅의 平等原則이 부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擔稅能力에 따르는 納稅의 義務를 憲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租稅立法을 담당하는 立法權者에게 되도록이면 直接稅 내지 所得稅 위주의 租稅體系를 구축하고 擔稅能力의 原則을 稅法에 일괄되고 체계적으로 실현하는 憲法的 과제를 담당하도록 한다는데 그 의미가 주어진다.
주23) Tipke/Lang, Steuerrecht. Ein systematischer Grundriss, 12. Aufl., S. 24ff.
3. 環境保護를 위한 經濟秩序
_ 오늘날 世界秩序의 또다른 이데올로기로서 등장하고 있는 環境保護의 문제도 經濟秩序 形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市場經濟秩序에서의 개인과 기업의 왕성한 經濟活動은 필연적으로 自然環境의 侵害로 이어지게 되었지만 經濟活動에 있어서 환경이라는 요소는 케인즈 經濟理論이나 新自由主義 經濟學에 있어서도 역시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미 Kenneth Galbraith는 그의 저서를 통하여 \"新古典主義 經濟學의 신봉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도 갑자기 현안으로 부각된 環境保護의 문제에 전혀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였다\"고 솔직히 시인하고있다.주24)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특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環境經濟學(Umweltokomie)에서는 環境과 經濟에 대한 많은 연구성과를 집적시키고 있다. 또한 각국의 憲法典에도 環境權 내지 국가의 環境保護義務가 규정되게 되었고, 우리憲法도 제35조에서 環境權 條項을 두고 있다. 그러나 憲法의 체계상 국민의 기본권 목록에 규정된 環境權이 憲法上의 經濟秩序와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다. 그러므로 環境保護와 經濟秩序의 관련성을 보다 강조할 수[112] 있는 체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統一憲法의 經濟秩序 條項에 環境保護의 필요성을 어떠한 형태로든 결합하는 길이다. 이는 독일의 통일과정에 있어서도 소위 環境保護를 國家目的 條項(Staatszielbestimmung)으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논쟁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주25) 물론 독일에 있어서도 環境保護를 위한 國家目的條項을 신설하는 憲法改正의 노력이 좌절되었고 貨幣, 經濟, 社會單一體 形成을 위한 條約과 統一條約이 각각 제16조와 제34조에서 環境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나, 결국 經濟와의 관련성은 언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독일과는 달리 環境問題에 대한 대비책을 게을리 함으로써 오늘날 세계적인 環境쇼크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統一憲法上 어떠한 형태로든지 經濟秩序와 環境과의 관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현행 憲法 제119조에 새로운 項을 설치하여 \"個人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는 環境保護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형식이 제안될 수 있다. 이와 같은 經濟와 環境에 관한 根本條項을 통하여 經濟政策의 수립 집행권자는 環境保護의 요소를 經濟活動의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인식하고 經濟活動의 주체들은 자신의 活動에 가해지는 법적제약을 보다 책임있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주24) Galbraith, Wirtschaft fur Staat und Gesellschaft, 1974, S. 129.
주25) 獨逸의 聯邦議會는 1990년 9월 21일 聯邦議會 법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國家環境保護義務를 基本法 제20a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토론하였다. 물론 學者나 政黨間에는 이 條項을 기존의 基本法 제20조 제1항에 추가할 것인가 혹은 제20a조항의 신설을 통하여 규정할 것인가의 여부와 그 구체적인 문안의 내용에 관하여 상당한 異見이 있었으나, 聯邦議會의 법사위는 기본법 제20a조항을 신설하여 \"인간의 자연적 생존기반은 國家의 保護下에 있다. 상세한 內容은 法律로 정한다\"(Die naturlichen Lebensgrundla-gen stehen unter dem Schutz des Staates. Das nahere regeln die Gesetze.)는 문안을 권고하였다. Vgl. Augsburg, Staatsziel Umweltschutz und die Vereinigung Deutschlands, ZRP 1991, S.9(11) ; Busse, Das vertragliche Werk der deutschen Einheit und die Anderungen von Verfassungsrecht, DOV 1991, S.345(353).
주23) Tipke/Lang, Steuerrecht. Ein systematischer Grundriss, 12. Aufl., S. 24ff.
3. 環境保護를 위한 經濟秩序
_ 오늘날 世界秩序의 또다른 이데올로기로서 등장하고 있는 環境保護의 문제도 經濟秩序 形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市場經濟秩序에서의 개인과 기업의 왕성한 經濟活動은 필연적으로 自然環境의 侵害로 이어지게 되었지만 經濟活動에 있어서 환경이라는 요소는 케인즈 經濟理論이나 新自由主義 經濟學에 있어서도 역시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미 Kenneth Galbraith는 그의 저서를 통하여 \"新古典主義 經濟學의 신봉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도 갑자기 현안으로 부각된 環境保護의 문제에 전혀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였다\"고 솔직히 시인하고있다.주24)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특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環境經濟學(Umweltokomie)에서는 環境과 經濟에 대한 많은 연구성과를 집적시키고 있다. 또한 각국의 憲法典에도 環境權 내지 국가의 環境保護義務가 규정되게 되었고, 우리憲法도 제35조에서 環境權 條項을 두고 있다. 그러나 憲法의 체계상 국민의 기본권 목록에 규정된 環境權이 憲法上의 經濟秩序와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다. 그러므로 環境保護와 經濟秩序의 관련성을 보다 강조할 수[112] 있는 체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統一憲法의 經濟秩序 條項에 環境保護의 필요성을 어떠한 형태로든 결합하는 길이다. 이는 독일의 통일과정에 있어서도 소위 環境保護를 國家目的 條項(Staatszielbestimmung)으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논쟁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주25) 물론 독일에 있어서도 環境保護를 위한 國家目的條項을 신설하는 憲法改正의 노력이 좌절되었고 貨幣, 經濟, 社會單一體 形成을 위한 條約과 統一條約이 각각 제16조와 제34조에서 環境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나, 결국 經濟와의 관련성은 언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독일과는 달리 環境問題에 대한 대비책을 게을리 함으로써 오늘날 세계적인 環境쇼크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統一憲法上 어떠한 형태로든지 經濟秩序와 環境과의 관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현행 憲法 제119조에 새로운 項을 설치하여 \"個人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는 環境保護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형식이 제안될 수 있다. 이와 같은 經濟와 環境에 관한 根本條項을 통하여 經濟政策의 수립 집행권자는 環境保護의 요소를 經濟活動의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인식하고 經濟活動의 주체들은 자신의 活動에 가해지는 법적제약을 보다 책임있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주24) Galbraith, Wirtschaft fur Staat und Gesellschaft, 1974, S. 129.
주25) 獨逸의 聯邦議會는 1990년 9월 21일 聯邦議會 법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國家環境保護義務를 基本法 제20a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토론하였다. 물론 學者나 政黨間에는 이 條項을 기존의 基本法 제20조 제1항에 추가할 것인가 혹은 제20a조항의 신설을 통하여 규정할 것인가의 여부와 그 구체적인 문안의 내용에 관하여 상당한 異見이 있었으나, 聯邦議會의 법사위는 기본법 제20a조항을 신설하여 \"인간의 자연적 생존기반은 國家의 保護下에 있다. 상세한 內容은 法律로 정한다\"(Die naturlichen Lebensgrundla-gen stehen unter dem Schutz des Staates. Das nahere regeln die Gesetze.)는 문안을 권고하였다. Vgl. Augsburg, Staatsziel Umweltschutz und die Vereinigung Deutschlands, ZRP 1991, S.9(11) ; Busse, Das vertragliche Werk der deutschen Einheit und die Anderungen von Verfassungsrecht, DOV 1991, S.345(353).
추천자료
 남북한의 언어문제에 따른 고찰
남북한의 언어문제에 따른 고찰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협력 활성화방안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협력 활성화방안 [남북통일정책][통일][통일정책][남북통일][한반도통일][대북정책][남북관계]남북통일정책 전...
[남북통일정책][통일][통일정책][남북통일][한반도통일][대북정책][남북관계]남북통일정책 전... [통일교육]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의 방법, 학교통일교육의 실제, 통일교육의 문제점, 통...
[통일교육]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의 방법, 학교통일교육의 실제, 통일교육의 문제점, 통... 통일 후 예견되는 여성문제와 여성부의 역할
통일 후 예견되는 여성문제와 여성부의 역할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북한의 경제문제와 남북경제협력
북한의 경제문제와 남북경제협력 [남북협력][남북한협력][남북한공동협력][남북공동협력][북한]남북한의 공동 보훈협력, 남북...
[남북협력][남북한협력][남북한공동협력][남북공동협력][북한]남북한의 공동 보훈협력, 남북... 한반도 통일, 비용인가 투자인가 _ 독일의 경제통일사례를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 비용인가 투자인가 _ 독일의 경제통일사례를 중심으로 [대학 통일교육]대학 통일교육의 의의,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 대학 통일교육의 변화, 대학 ...
[대학 통일교육]대학 통일교육의 의의,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 대학 통일교육의 변화, 대학 ... 통일후언어문제해결방안
통일후언어문제해결방안 [통일외교정책] 남북 관계 보고서 - 평화통일의 진정성을 중심으로
[통일외교정책] 남북 관계 보고서 - 평화통일의 진정성을 중심으로 세계의정치와경제2공통)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
세계의정치와경제2공통)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 [세계의정치와경제 -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
[세계의정치와경제 -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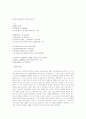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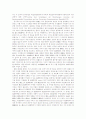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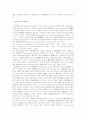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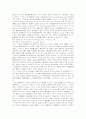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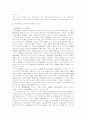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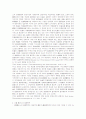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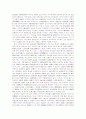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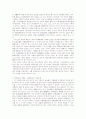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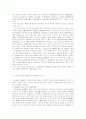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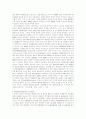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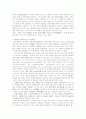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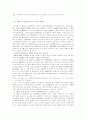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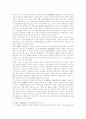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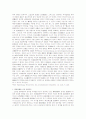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