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현대와 탈현대
2. 기호의 정치경제학
3. 시뮬레이션 : 진위를 넘어서
4. 시뮬레이션 : 하이퍼 리얼
5. 매스미디어의 허울과 역설
2. 기호의 정치경제학
3. 시뮬레이션 : 진위를 넘어서
4. 시뮬레이션 : 하이퍼 리얼
5. 매스미디어의 허울과 역설
본문내용
인 상대주의로 머물러 있다. 이 점은 보드리야르와 1960년대 프랑스의 상황주의자들(Situationalists)의 사회관을 비교해 보면 명백히 드러난다. 마르크스의 상품의 물신주의라는 개념을 문화적 조작이라는 관점으로 재해석하려는 최근의 시도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제 등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학파가 제기한 문화산업에 대한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급진적 문화비평가인 드보르(Guy Debord)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의 상황주의 운동이다. 드보르에 따르면, 오늘날의 소피자본주의사회는 증폭되는 선전, 광고, 여흥 프로 등으로 특징되는 스펙터클의 사회(society of the spectacle)이며, 이러한 사회의 인간 관계는 미디어와 이미지가 매개하는 왜곡되고 소외된 사회적 관계라는 것이다. 스펙터클의 사회는 상품의 물신주의 원칙이 그 절정에 달하게 되어, 이 단계의 소비자들은 이제 물질적 상품을 구매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상징적 이미지를 구매하기 때문에 진리와 허위가 전도되는 심각한 소외와 억압이 팽배해 있다고 보았다.
보드리야르는 자신이 상황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핵심이념을 거부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드보르를 비롯한 상황주의자들이 오늘날과 같은 소비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발전된 상품형식의 교환가치나 사용가치가 아니라 문화적 이미지라는 주장과 스펙터클의 사회에 있어서는 상징적 이미지나 기호 그 자체가 상품으로 구매된다는 주장은 수용하되, 드보르 등이 오늘의 사회적 삶을 실재의 이미지로 분열되고, 진리와 허위가 전도된 소외된 삶이라 함으로써 어떤 궁극적 근원에 대한 향수에 집착해 있는 점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보드리야르는 이와 같은 근원주의와 로고스 중심주의에 대하여 철저한 거부감을 가진 니체적 허무주의 사상가이며, 특히 그는 초실재(hyper real)적인 시뮬레이션이 주도하는 탈현대적 사유의 세계에 있어서는 실재와 이미지 그리고 진리와 허위를 구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요컨대 드보르 등이 진리와 허위가 전도된 오늘의 삶이 소외된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서구의 전통적 소외극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진보적 발전의 역사에 대한 근원주의적이고 그래서 로고스 중심주의적인 향수에 집착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보드리야르는 오늘 우리시대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포부나 그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치 하이데거와 이체가 서구문화의 철학적 유산에 대하여 철저하고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이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려는 시도 그 자체가 서구 형이상학의 전통에 각인되어 있는 진보적 계몽의 논리에 빠진다는 이유 때문에, 비판하면서도 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하이데거와 니체 특유의 허무주의처럼, 보드리야르의 기호의 정치경제학을 비롯한 오늘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들도 모든 유형의 근원에의 동경, 궁극적 의미의 추고, 총체적 인식의 가능성, 위계적 가치, 역사의 발전 및 진보적 계몽 같은 것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불신하면서도 그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까지도 단호하게 거부하는 허무주의에 매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현실이 포스트모던의 징후를 보이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검증\'작업보다는, 문화적 대중주의, 다원성과 다양성 그리고 지역적 미소설화에 대한 관심과 같은 긍정적 잠재력을 살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모든 규범체계를 성상파괴적으로 비판하고 부정하면서도 그 어떠한 대안의 제시도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 특유의 종말론적 색조와 허무주의를 여하히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본격적인 성찰이 보다 절박한 우리의 당면 과제라고 본다.
하나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제 등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학파가 제기한 문화산업에 대한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급진적 문화비평가인 드보르(Guy Debord)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의 상황주의 운동이다. 드보르에 따르면, 오늘날의 소피자본주의사회는 증폭되는 선전, 광고, 여흥 프로 등으로 특징되는 스펙터클의 사회(society of the spectacle)이며, 이러한 사회의 인간 관계는 미디어와 이미지가 매개하는 왜곡되고 소외된 사회적 관계라는 것이다. 스펙터클의 사회는 상품의 물신주의 원칙이 그 절정에 달하게 되어, 이 단계의 소비자들은 이제 물질적 상품을 구매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상징적 이미지를 구매하기 때문에 진리와 허위가 전도되는 심각한 소외와 억압이 팽배해 있다고 보았다.
보드리야르는 자신이 상황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핵심이념을 거부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드보르를 비롯한 상황주의자들이 오늘날과 같은 소비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발전된 상품형식의 교환가치나 사용가치가 아니라 문화적 이미지라는 주장과 스펙터클의 사회에 있어서는 상징적 이미지나 기호 그 자체가 상품으로 구매된다는 주장은 수용하되, 드보르 등이 오늘의 사회적 삶을 실재의 이미지로 분열되고, 진리와 허위가 전도된 소외된 삶이라 함으로써 어떤 궁극적 근원에 대한 향수에 집착해 있는 점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보드리야르는 이와 같은 근원주의와 로고스 중심주의에 대하여 철저한 거부감을 가진 니체적 허무주의 사상가이며, 특히 그는 초실재(hyper real)적인 시뮬레이션이 주도하는 탈현대적 사유의 세계에 있어서는 실재와 이미지 그리고 진리와 허위를 구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요컨대 드보르 등이 진리와 허위가 전도된 오늘의 삶이 소외된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서구의 전통적 소외극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진보적 발전의 역사에 대한 근원주의적이고 그래서 로고스 중심주의적인 향수에 집착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보드리야르는 오늘 우리시대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포부나 그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치 하이데거와 이체가 서구문화의 철학적 유산에 대하여 철저하고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이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려는 시도 그 자체가 서구 형이상학의 전통에 각인되어 있는 진보적 계몽의 논리에 빠진다는 이유 때문에, 비판하면서도 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하이데거와 니체 특유의 허무주의처럼, 보드리야르의 기호의 정치경제학을 비롯한 오늘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들도 모든 유형의 근원에의 동경, 궁극적 의미의 추고, 총체적 인식의 가능성, 위계적 가치, 역사의 발전 및 진보적 계몽 같은 것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불신하면서도 그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까지도 단호하게 거부하는 허무주의에 매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현실이 포스트모던의 징후를 보이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검증\'작업보다는, 문화적 대중주의, 다원성과 다양성 그리고 지역적 미소설화에 대한 관심과 같은 긍정적 잠재력을 살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모든 규범체계를 성상파괴적으로 비판하고 부정하면서도 그 어떠한 대안의 제시도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 특유의 종말론적 색조와 허무주의를 여하히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본격적인 성찰이 보다 절박한 우리의 당면 과제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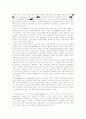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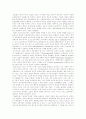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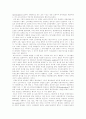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