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제 설
[이] 독일민법의 제정역사
[삼] 독일민법 제249조 및 제254조의 입법과정
[사] 결 논(우리 민법의 규정과의 비교)
[이] 독일민법의 제정역사
[삼] 독일민법 제249조 및 제254조의 입법과정
[사] 결 논(우리 민법의 규정과의 비교)
본문내용
주지의 사실이다(詳細는拙稿, \"손해배상의 범위 및 方法에 관한 독일 日本 및 우리나라 民法의 比較\" : 方順元先生 古稀기념논문집 p71 이하참조). 그런데 이 점에 관하여 우리 民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견해에 따라서 우리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의 손해라는 개념이 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있다), 일본의 판례와 같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도 우리 민법 제393조는 독일의 위 相當因果關係說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比較法的으로 보아 전혀 잘못된 것임은 위拙稿 p71 이하참조).
_ 다음으로 횡적인 문제에 관하여 보면 우리 民法이나 독일 民法은 그 결과에 있어서는 거의 마찬가지의 결론에 이르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兩者의 경우에 모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결국 債務者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_ 즉,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은 원칙은 채무불이행이나 不法行爲의 구별없이 양자에 모두 적용이 되고 (독일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이 民法의 總則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자에 모두 적용되는 결과로 되고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이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393조가 민법 제763조에 의하여 不法行爲의 경우에도 준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이 배상책임을 제한함에 있어서 行爲者의 故意 過失에 의한 구별을 兩國이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_ 다만 주의하여야 할 것은 실무상 위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독일 民法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피해자에게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독일 民法 제249조에 따라서) 예외로서 특별한 손해는 피해자의 과실로 특별한 사정을 加害者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만 加害者가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에 반하여 (즉,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고 이를 被害者의 과실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가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우리 民法의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칙으로 통상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손해는 예외적으로 加害者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즉, 특별손해를 가해자가 알았다는 것은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詳細에 대하여는拙稿 \"損害賠償과 特別事情\" 民法判例硏究 第七編 p56 이하 참조)
_ 다음으로 횡적인 문제에 관하여 보면 우리 民法이나 독일 民法은 그 결과에 있어서는 거의 마찬가지의 결론에 이르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兩者의 경우에 모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결국 債務者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_ 즉,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은 원칙은 채무불이행이나 不法行爲의 구별없이 양자에 모두 적용이 되고 (독일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이 民法의 總則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자에 모두 적용되는 결과로 되고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이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393조가 민법 제763조에 의하여 不法行爲의 경우에도 준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이 배상책임을 제한함에 있어서 行爲者의 故意 過失에 의한 구별을 兩國이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_ 다만 주의하여야 할 것은 실무상 위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독일 民法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피해자에게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독일 民法 제249조에 따라서) 예외로서 특별한 손해는 피해자의 과실로 특별한 사정을 加害者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만 加害者가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에 반하여 (즉,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고 이를 被害者의 과실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가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우리 民法의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칙으로 통상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손해는 예외적으로 加害者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즉, 특별손해를 가해자가 알았다는 것은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詳細에 대하여는拙稿 \"損害賠償과 特別事情\" 民法判例硏究 第七編 p56 이하 참조)
키워드
추천자료
 이행보조자책임에 관한 고찰
이행보조자책임에 관한 고찰 공법상의 계약에 대한 민법규정의 적용
공법상의 계약에 대한 민법규정의 적용 비스마르크와 사회복지(독일의 사회복지)
비스마르크와 사회복지(독일의 사회복지) 독일어 문장의 기본통사구조, 독일어 문장의 통사적 형태, 독일어 결속초점구문의 통사적 특...
독일어 문장의 기본통사구조, 독일어 문장의 통사적 형태, 독일어 결속초점구문의 통사적 특... 스포츠 사고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스포츠 사고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공단의 기능과 역할방안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공단의 기능과 역할방안에 관한 연구 민간경비원 강제력 행사의 법적 근거 (한국과 독일의 비교를 중심으로) ppt
민간경비원 강제력 행사의 법적 근거 (한국과 독일의 비교를 중심으로) ppt 각국별 부동산중개업 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각국별 부동산중개업 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미국 영국 독일의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 제도 분석
한국 미국 영국 독일의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 제도 분석 [민법, 관습법, 가족법, 물권법, 상속법, 부양의무, 신의칙, 민법사례]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민법, 관습법, 가족법, 물권법, 상속법, 부양의무, 신의칙, 민법사례]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독일과 이탈리아(이태리)의 파시즘, 독일과 이탈리아(이태리)의 정당조직, 독일과 이탈리아(...
독일과 이탈리아(이태리)의 파시즘, 독일과 이탈리아(이태리)의 정당조직, 독일과 이탈리아(...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 승진기회, 구조조정,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 공공부문, 매...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 승진기회, 구조조정,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 공공부문, 매... [민법, 유교윤리, 친자법, 물권법, 관습법, 신의칙, 부양당사자, 민법사례]민법과 유교윤리, ...
[민법, 유교윤리, 친자법, 물권법, 관습법, 신의칙, 부양당사자, 민법사례]민법과 유교윤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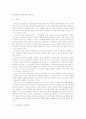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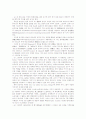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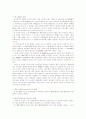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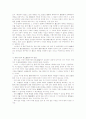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