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본문내용
즉 이것은 법률해석자의 현실상황에 대한 시각이 그 내용을 결정한 것을 의미한다.
주135) 이에 관한 자세한 것은 졸고, 근로기준법 제38조 \"使用者의 歸責事由\"에 관한 기초법학적 재구성, 「변호사」제24집(1994), 55면 이하 참조.
_ \"로서\"존재, 즉 役割存在로 표현되는 규범은 언어적 현상을 대자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현실에 대한 관계에 기초한다. 즉 역할존재로 표현되는 規範이 어떠한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현실에 의해서 비로소 규정된다. 예컨대, \"사용자로서의 귀책사유\"라는 말에는 사용자의 行爲事象이 집약되어 있고,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면 사용자가 책임 있게 행위하여야 할 있을 수 있는 그의 모든 행위들의 가능태로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사용자 자신의 개인적 의미에서 실체화되어 있는 이익추구와 그에 대한 타인(근로자를 포함한 전체사회)의 행동기대와의 일정한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가 언급되고 현실화되는 몇 가지의 본질적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사용자로서의 귀책사유\"를 확정하려는 경우, 우리는 사용자 자신의 이익추구와 타인의 행동기대와의 관계가 접촉하는 상황이 나타날 때마다 그 상황에 의하여 먼저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先理解, 즉 사용자로서 행위하는 것이 뜻하는 바의 것을 확정해야 하고 그 다음 세부적인 해석, 즉 이러한 구체적 상황에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해야 한다. 법률규범은 일정한 유형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그 적용대상은 무한히 다양하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법률적용에는 그 때마다에 다양한 사회적 양상들이 새로이 해석되고 새롭게 구성된다. 그래서 언어적 표현이 똑같은 동일한 법규범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게다가 법률에 흠결이 있으면, 그 부분은 판례에 의해서 천착되고 판결집과 주석서에 포함된 새로운 법원칙으로 채워진다. 이러한 법원칙과 새로운 해석의 권위는 사회적 사태 그 자체에 기초하고 있다. 법률은 법률준수자를 고려하고 그의 社會的 役割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법률의 해석은 법률을 적용받는 자의 社會的 役割의 소재연(Sein)의[54] 해석에 구속된다.주136)
주136) Philipps(주134), 34면.
_ 언어와 현실의 창조적 결합을 시동하게 하는 \"로서\"존재적 표현은 현실에 대한 법률의 계속적인 순응을 언어와 사태의 민활한 중매자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기능은 고정된 개념적 추론을 능가하는 법창조적 작용이다. 이것은 법률이 올바른 판결의 기초를 늘 형성할 수 있기 위하여 적응해야만 하는 지속적인 변동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중요하다.
_ 법률에 있어서 \"로서\"존재의 표현에는 이미 본질적 상황 속의 행위가 함께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 그 자체에 대한 이해는 역할담당자가 처해 있는 주위상황과 함께 항상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법주체에 대한 존재론적 파악은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해석을 운반하는 수레로서 기여할 수 있다. 이리하여 새로운 정신은 설령 그것이 법률의 어의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내게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판결에서 법의 개념적 추론의 고유한 과정이 표현될 수 있도록 추론의 전제로서 법주체의 현실적 상황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Ⅶ. 結 語
_ 이제 法構造決定因子의 觀點에서 우리는 前近代法에서 近代法 그리고 現代法으로의 履行을 이념형적으로 파악한다면, 그것은 身分法에서 契約法으로 그리고 役割法으로의 發展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법의 발전 역사는 개인과 공동체의 변증법적 통합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法構造의 변증법적 통합과정은 이 편에 실재하고 있는 공동체의 객관적 여건과 저 편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理想, 즉 개인의 자유를 양극으로 하는 선상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장구한 역사적 과정이다. 근대 이전의 법이 身分이라는 극단적으로 봉건사회의 객관적 질서만을 근거로 법효과를 경직적으로 강요하였는 데 반하여, 전근대법의 反(Antithese)으로 나타난 근대법은 개인의 自由라는 극단적으로 주관적인 상황, 즉 의사에만 기초한 법적 효과를 그가 처해 있는 객관적 여건과 관계없이 개인에게 형식적으로 강요한 것이다. 이제 현대법은 공동체의 객관적 여건 위에 자유를 추구하는 구체적 개인과 단체를 법적 평가 안으로 끌어들여 이[55] 상과 현실을 법질서 속에서 구체화한다.주137)
주137) 身分法으로서의 前近代法에서 契約法으로서의 近代法 그리고 役割法으로서의 現代法으로의 발전을 변증법적 도식으로 표현해 보면 아래와 같이 된다.
_ 현대법의 구조결정요소로서 社會的 役割은 공동체의 여건과 개인의 자유를 매개하는 규범의 다발로서 이해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현대법을 운명적으로 폐쇄된 身分法도 그리고 강자에게만 열려 있는 契約法도 아닌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열린 役割法으로 이해한다. 열린 役割法으로서 현대법에서 사회적 신분과 개인의 자유는 社會的 役割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한다. 현대법의 성패는 社會的 役割이 개인과 공동체의 변증법적 관계를 얼마나 조화롭게 규율하느냐에 달려 있다.
_ 勞動法의 理想은 기업적 노동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사회공동체를 유기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어쩌면 모순적일 수 있는 두 개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법은 기업적 노동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삶이 복잡하게 분화되어 감에 따라 더욱더 많은 行動典型들을 일정한 社會的 役割形態로서 개인 이전에 갖추어서 확보해야 할 것이며, 또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조건이 조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확보된 일정한 행동전형과 지위를 선택케 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법은 사회공동체의 차원에서는 공동체의 유기적 구성을 위한 틀로서, 구성원 개인의 차원에서는 개인의 선택자유를 확보하는 社會的 役割의 법으로서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은 現代産業社會의 노동법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주135) 이에 관한 자세한 것은 졸고, 근로기준법 제38조 \"使用者의 歸責事由\"에 관한 기초법학적 재구성, 「변호사」제24집(1994), 55면 이하 참조.
_ \"로서\"존재, 즉 役割存在로 표현되는 규범은 언어적 현상을 대자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현실에 대한 관계에 기초한다. 즉 역할존재로 표현되는 規範이 어떠한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현실에 의해서 비로소 규정된다. 예컨대, \"사용자로서의 귀책사유\"라는 말에는 사용자의 行爲事象이 집약되어 있고,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면 사용자가 책임 있게 행위하여야 할 있을 수 있는 그의 모든 행위들의 가능태로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사용자 자신의 개인적 의미에서 실체화되어 있는 이익추구와 그에 대한 타인(근로자를 포함한 전체사회)의 행동기대와의 일정한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가 언급되고 현실화되는 몇 가지의 본질적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사용자로서의 귀책사유\"를 확정하려는 경우, 우리는 사용자 자신의 이익추구와 타인의 행동기대와의 관계가 접촉하는 상황이 나타날 때마다 그 상황에 의하여 먼저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先理解, 즉 사용자로서 행위하는 것이 뜻하는 바의 것을 확정해야 하고 그 다음 세부적인 해석, 즉 이러한 구체적 상황에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해야 한다. 법률규범은 일정한 유형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그 적용대상은 무한히 다양하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법률적용에는 그 때마다에 다양한 사회적 양상들이 새로이 해석되고 새롭게 구성된다. 그래서 언어적 표현이 똑같은 동일한 법규범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게다가 법률에 흠결이 있으면, 그 부분은 판례에 의해서 천착되고 판결집과 주석서에 포함된 새로운 법원칙으로 채워진다. 이러한 법원칙과 새로운 해석의 권위는 사회적 사태 그 자체에 기초하고 있다. 법률은 법률준수자를 고려하고 그의 社會的 役割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법률의 해석은 법률을 적용받는 자의 社會的 役割의 소재연(Sein)의[54] 해석에 구속된다.주136)
주136) Philipps(주134), 34면.
_ 언어와 현실의 창조적 결합을 시동하게 하는 \"로서\"존재적 표현은 현실에 대한 법률의 계속적인 순응을 언어와 사태의 민활한 중매자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기능은 고정된 개념적 추론을 능가하는 법창조적 작용이다. 이것은 법률이 올바른 판결의 기초를 늘 형성할 수 있기 위하여 적응해야만 하는 지속적인 변동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중요하다.
_ 법률에 있어서 \"로서\"존재의 표현에는 이미 본질적 상황 속의 행위가 함께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 그 자체에 대한 이해는 역할담당자가 처해 있는 주위상황과 함께 항상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법주체에 대한 존재론적 파악은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해석을 운반하는 수레로서 기여할 수 있다. 이리하여 새로운 정신은 설령 그것이 법률의 어의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내게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판결에서 법의 개념적 추론의 고유한 과정이 표현될 수 있도록 추론의 전제로서 법주체의 현실적 상황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Ⅶ. 結 語
_ 이제 法構造決定因子의 觀點에서 우리는 前近代法에서 近代法 그리고 現代法으로의 履行을 이념형적으로 파악한다면, 그것은 身分法에서 契約法으로 그리고 役割法으로의 發展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법의 발전 역사는 개인과 공동체의 변증법적 통합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法構造의 변증법적 통합과정은 이 편에 실재하고 있는 공동체의 객관적 여건과 저 편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理想, 즉 개인의 자유를 양극으로 하는 선상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장구한 역사적 과정이다. 근대 이전의 법이 身分이라는 극단적으로 봉건사회의 객관적 질서만을 근거로 법효과를 경직적으로 강요하였는 데 반하여, 전근대법의 反(Antithese)으로 나타난 근대법은 개인의 自由라는 극단적으로 주관적인 상황, 즉 의사에만 기초한 법적 효과를 그가 처해 있는 객관적 여건과 관계없이 개인에게 형식적으로 강요한 것이다. 이제 현대법은 공동체의 객관적 여건 위에 자유를 추구하는 구체적 개인과 단체를 법적 평가 안으로 끌어들여 이[55] 상과 현실을 법질서 속에서 구체화한다.주137)
주137) 身分法으로서의 前近代法에서 契約法으로서의 近代法 그리고 役割法으로서의 現代法으로의 발전을 변증법적 도식으로 표현해 보면 아래와 같이 된다.
_ 현대법의 구조결정요소로서 社會的 役割은 공동체의 여건과 개인의 자유를 매개하는 규범의 다발로서 이해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현대법을 운명적으로 폐쇄된 身分法도 그리고 강자에게만 열려 있는 契約法도 아닌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열린 役割法으로 이해한다. 열린 役割法으로서 현대법에서 사회적 신분과 개인의 자유는 社會的 役割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한다. 현대법의 성패는 社會的 役割이 개인과 공동체의 변증법적 관계를 얼마나 조화롭게 규율하느냐에 달려 있다.
_ 勞動法의 理想은 기업적 노동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사회공동체를 유기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어쩌면 모순적일 수 있는 두 개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법은 기업적 노동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삶이 복잡하게 분화되어 감에 따라 더욱더 많은 行動典型들을 일정한 社會的 役割形態로서 개인 이전에 갖추어서 확보해야 할 것이며, 또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조건이 조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확보된 일정한 행동전형과 지위를 선택케 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법은 사회공동체의 차원에서는 공동체의 유기적 구성을 위한 틀로서, 구성원 개인의 차원에서는 개인의 선택자유를 확보하는 社會的 役割의 법으로서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은 現代産業社會의 노동법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추천자료
 [자연과학] 경제개방하에서의 금융의 역할
[자연과학] 경제개방하에서의 금융의 역할 호주 제도 폐지에 대한 찬 ․반 논쟁 나의 견해
호주 제도 폐지에 대한 찬 ․반 논쟁 나의 견해 청소년 신앙교육을 위한 기독교 가정의 역할
청소년 신앙교육을 위한 기독교 가정의 역할 [가정생활복지론]돌봄노동의 국가분담 이유와 가정문제 예방의 중요성 및 가정의 행복에 대한...
[가정생활복지론]돌봄노동의 국가분담 이유와 가정문제 예방의 중요성 및 가정의 행복에 대한... [진로상담의이해]직업에 대한 나의 생각 -직업의미, 직업본질, 직업역할-
[진로상담의이해]직업에 대한 나의 생각 -직업의미, 직업본질, 직업역할- [시각][시지각][미술교육]시각(시지각)의 기능, 시각(시지각)과 미술교육에 대한 인식, 시각(...
[시각][시지각][미술교육]시각(시지각)의 기능, 시각(시지각)과 미술교육에 대한 인식, 시각(... * 생물학적 측면과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특성에 대해 기술하고 이러한 인간 이해를 ...
* 생물학적 측면과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특성에 대해 기술하고 이러한 인간 이해를 ... 사회복지법 생존권에 대해 논하시오
사회복지법 생존권에 대해 논하시오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 4C)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논의(평가의 필요성, 평가의...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 4C)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논의(평가의 필요성, 평가의... 사회복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사회복지사로서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준...
사회복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사회복지사로서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준... 육아휴직제도의 고용지원역할 분석 (육아휴직에 대한 이해, 육아휴직제도 활용현황 및 직장복...
육아휴직제도의 고용지원역할 분석 (육아휴직에 대한 이해, 육아휴직제도 활용현황 및 직장복... [사회복지실천론] 종결단계에서 평가의 중요성과 평가방법 및 유형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
[사회복지실천론] 종결단계에서 평가의 중요성과 평가방법 및 유형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네가지 교수-학습방법을 정리하고 과정적 교수법에 기초한 수업과정 및 ...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네가지 교수-학습방법을 정리하고 과정적 교수법에 기초한 수업과정 및 ... 간호에 대한 여성학적 관점(여성건강에 관한 간호학적 의미, 간호사와 여성의 관계, 여성건강...
간호에 대한 여성학적 관점(여성건강에 관한 간호학적 의미, 간호사와 여성의 관계, 여성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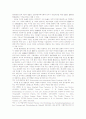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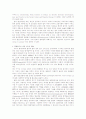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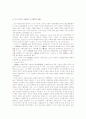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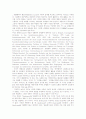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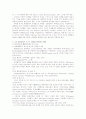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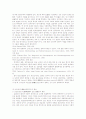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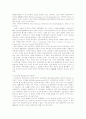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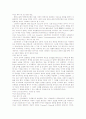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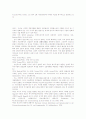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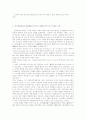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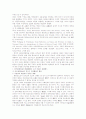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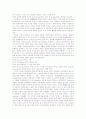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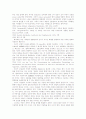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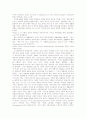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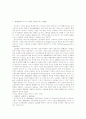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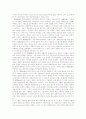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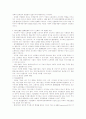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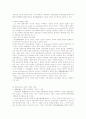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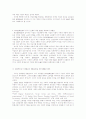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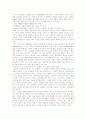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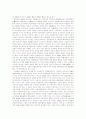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