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본문내용
에 기초한 신화와 제의들이 있었다. 농경이 시작되자 식물과 인간생존의 유사성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청동기 시대가 되자, 주기와 수학적 질서를 갖는 천체가 존재법칙과 질서의 준거점이 되었다. 이때부터 신의 명령을 받는 사제들에게 절대적 도덕적 권위가 주어졌다.
다음은 다시 읽기 역겨운 유럽 예찬이다. 우주의 주기에서 나온 국왕살해의 의식이 전세계로 퍼져나갈 때, 이미 야만적 희생의식이 번성하고 있었던 열대의 인도에서는 이전 희생의식의 발전이 가속화했지만, 식인의식이 없었던 수렵의 유럽에서는 신을 죽여 번성을 비는 신화나 제의가 발전하지 않았다. (카이사르와 타키투스가 보고하고, 저자 자신이 인용한 인신희생의 사례들은 무시하고 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개인의 사냥기술에 의존하던 사람들이라 개인을 존중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영적 지도자는 주로 샤먼이었는데, 이들도 사회적으로 임명된 사제가 아니라, 개인적 영적 체험을 통하여 힘을 부여받은 개인들이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샤먼 전통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신석기 청동기 문화가 도입될 때도 \"융합(fusion)이 아니라 상호작용(process of interaction)\"이 일어났다고 한다. 사정은 기독교 전파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기독교는 사제 개인의 영적 경험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들의 권력은 개인의 위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서,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저 높은 곳에서 온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제 조직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저자는 그 이후 인간의 신화가 펼쳐졌다고 보고, 다음 책(<신의 가면 IV: 창조신화>)에서 이것을 다루겠다고 예고한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12, 13세기에 만개했던 아서왕 이야기에서 그 단초를 찾는다. 여기서 인간은 타고난(native!) 덕 때문에 삶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또 베풀 수 있기 때문이다. 성배(聖杯)를 찾는 모험은 개인적 경험을 쌓는 모험이며, 여기서는 옛 켈트인의 신화가 중세의 옷을 입고 나온다. 저자는 특히 아서왕 로망스에 나타나는 사랑을 강조한다. 이것은 성례의 요구에 맞서는 개인의 심오한 경험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이교도적 과거와 중세의 성기(盛期) 사이에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동양적인(oriental type) 영적 전제(專制)\" 하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주장한다. (여기서도 레반트는 동양이 되어 있다.) 저자는 단테와 동시대인인 기독교 신비사상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1260년경-1327년경)를 인용하면서, 그리고 그 사상의 형상화인 (문을 열 수 있게 되어 있는) 마리아상을 소개하면서 글을 마친다. 기독교 신화에 대한 그의 독법은 시적인 것이었다. 반면에 교황의 독법은 이성적인 것이었다. 후자는 신화를 과학과 역사로 타락시키는 것이다. 신화적 이미지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험을 매개하는 것으로서 읽어야 하는데 말이다.
저자는 마지막에 \'결론\'이라는 짤막한 장을 덧붙이고 있다. 거기에는 \'신화의 4가지 핵심적인 기능\'이 소개되는데, 종교학 개론이나 신화학 책에 나오는 (너무 엄숙하고, 그래서 좀 따분한) 말 같아서 옮기고 싶지 않다. (\"존재의 신비 앞에서의 경외감\", 혹은 \"영적 풍요와 자각으로 안내\" 같이 내 체질에 맞지 않는 표현들로 되어 있다. 어디 가서 멋있게 강의\'해야만\' 하는 사람은 찾아 읽고 외워둘 만하다.) 다만 저자가 이 부분에서도 유럽을 높이고 동양을 폄하하고 있다는 것만 다시 지적하고자 한다. 심지어 \"히틀러가 약 5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것은 사방에서 공포를 불러일으켰지만, 스탈린이 2천5백만 명의 러시아인을 학살한 것은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주장까지 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 혹은 독일인들은 \'겨우\' 5백만 명 죽는 데도 알아채고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레반트적인\' 소련에서는 무려 그 5배가 죽는 데도 아무도 몰랐거나, 그것을 당연시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유럽적 정신과 동양적 정신의 비교인지 모르겠다. 이 말에는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 언급하기 곤란할 지경인데, 저자는 여기서 자신이 주장하는 \'유럽정신\'에 대한 반대 증거로 쓰일 만한 사례를 이상한 방식으로 역이용하고 있다.
아마도 원래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으니 나중에 나타난 것이겠지만, 저자는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유럽 중심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나도 점차 뒤로 갈수록 그런 점을 자주 지적하고 비꼬게 되었다. 저자에 대한 대체로 존경하는 감정으로 시작한 글이 이상하게 끝맺게 되어 나도 별로 좋은 기분이 아니다. 저자가 동양을 어떤 때는 청동기적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레반트적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길게 반론하고 싶지 않다. 그냥, 최소한 중국에서는 \"천체를 관찰하는\" 사제의 질서가 사회를 지배한 적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이 말들이 어떤 억압적 정치관행을 암시하는 것이라면 서양에서도 (적어도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는) 마찬가지였다는 것만 지적해두자.
저자가 동양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은 그릇된 것이지만, 그의 전체적인 큰 그림은 종교사의 흐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그의 엄청난 지식은 우리에게 큰 득을 줄 만한 것들이다. 부문별로 좀더 전문적인 책들을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 내가 공부가 부족하니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도 일단 이 책에 나온 정도면 최소한 여러 분야에 대한 낯익히기는 되겠다. 우선은 부족한대로 이 정도에서 만족하기로 하자.
우리 선생님 중 한 분의 말씀이, 한국에서 인문학을 하는 사람은 마을의 땜쟁이와 같단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다음에 일하는 것은 바랄 수가 없으니 아무 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임시변통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글에서 우리 동료, 후배 \'땜쟁이\'들에게 연장통을 하나 마련해주려 했다. 이 \'연장통\'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상당히 유용한 연장들이, 그것도 꽤 여러 개 들어 있다. 이것들로 당분간은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 터이니, 더 좋은 연장은 그 후에 각자 알아서 구할 일이다. 여기까지 읽어온 독자의 끈기와 학구열에 칭찬을 보내며, \'1부\'를 마친다.
다음은 다시 읽기 역겨운 유럽 예찬이다. 우주의 주기에서 나온 국왕살해의 의식이 전세계로 퍼져나갈 때, 이미 야만적 희생의식이 번성하고 있었던 열대의 인도에서는 이전 희생의식의 발전이 가속화했지만, 식인의식이 없었던 수렵의 유럽에서는 신을 죽여 번성을 비는 신화나 제의가 발전하지 않았다. (카이사르와 타키투스가 보고하고, 저자 자신이 인용한 인신희생의 사례들은 무시하고 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개인의 사냥기술에 의존하던 사람들이라 개인을 존중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영적 지도자는 주로 샤먼이었는데, 이들도 사회적으로 임명된 사제가 아니라, 개인적 영적 체험을 통하여 힘을 부여받은 개인들이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샤먼 전통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신석기 청동기 문화가 도입될 때도 \"융합(fusion)이 아니라 상호작용(process of interaction)\"이 일어났다고 한다. 사정은 기독교 전파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기독교는 사제 개인의 영적 경험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들의 권력은 개인의 위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서,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저 높은 곳에서 온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제 조직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저자는 그 이후 인간의 신화가 펼쳐졌다고 보고, 다음 책(<신의 가면 IV: 창조신화>)에서 이것을 다루겠다고 예고한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12, 13세기에 만개했던 아서왕 이야기에서 그 단초를 찾는다. 여기서 인간은 타고난(native!) 덕 때문에 삶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또 베풀 수 있기 때문이다. 성배(聖杯)를 찾는 모험은 개인적 경험을 쌓는 모험이며, 여기서는 옛 켈트인의 신화가 중세의 옷을 입고 나온다. 저자는 특히 아서왕 로망스에 나타나는 사랑을 강조한다. 이것은 성례의 요구에 맞서는 개인의 심오한 경험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이교도적 과거와 중세의 성기(盛期) 사이에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동양적인(oriental type) 영적 전제(專制)\" 하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주장한다. (여기서도 레반트는 동양이 되어 있다.) 저자는 단테와 동시대인인 기독교 신비사상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1260년경-1327년경)를 인용하면서, 그리고 그 사상의 형상화인 (문을 열 수 있게 되어 있는) 마리아상을 소개하면서 글을 마친다. 기독교 신화에 대한 그의 독법은 시적인 것이었다. 반면에 교황의 독법은 이성적인 것이었다. 후자는 신화를 과학과 역사로 타락시키는 것이다. 신화적 이미지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험을 매개하는 것으로서 읽어야 하는데 말이다.
저자는 마지막에 \'결론\'이라는 짤막한 장을 덧붙이고 있다. 거기에는 \'신화의 4가지 핵심적인 기능\'이 소개되는데, 종교학 개론이나 신화학 책에 나오는 (너무 엄숙하고, 그래서 좀 따분한) 말 같아서 옮기고 싶지 않다. (\"존재의 신비 앞에서의 경외감\", 혹은 \"영적 풍요와 자각으로 안내\" 같이 내 체질에 맞지 않는 표현들로 되어 있다. 어디 가서 멋있게 강의\'해야만\' 하는 사람은 찾아 읽고 외워둘 만하다.) 다만 저자가 이 부분에서도 유럽을 높이고 동양을 폄하하고 있다는 것만 다시 지적하고자 한다. 심지어 \"히틀러가 약 5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것은 사방에서 공포를 불러일으켰지만, 스탈린이 2천5백만 명의 러시아인을 학살한 것은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주장까지 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 혹은 독일인들은 \'겨우\' 5백만 명 죽는 데도 알아채고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레반트적인\' 소련에서는 무려 그 5배가 죽는 데도 아무도 몰랐거나, 그것을 당연시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유럽적 정신과 동양적 정신의 비교인지 모르겠다. 이 말에는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 언급하기 곤란할 지경인데, 저자는 여기서 자신이 주장하는 \'유럽정신\'에 대한 반대 증거로 쓰일 만한 사례를 이상한 방식으로 역이용하고 있다.
아마도 원래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으니 나중에 나타난 것이겠지만, 저자는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유럽 중심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나도 점차 뒤로 갈수록 그런 점을 자주 지적하고 비꼬게 되었다. 저자에 대한 대체로 존경하는 감정으로 시작한 글이 이상하게 끝맺게 되어 나도 별로 좋은 기분이 아니다. 저자가 동양을 어떤 때는 청동기적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레반트적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길게 반론하고 싶지 않다. 그냥, 최소한 중국에서는 \"천체를 관찰하는\" 사제의 질서가 사회를 지배한 적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이 말들이 어떤 억압적 정치관행을 암시하는 것이라면 서양에서도 (적어도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는) 마찬가지였다는 것만 지적해두자.
저자가 동양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은 그릇된 것이지만, 그의 전체적인 큰 그림은 종교사의 흐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그의 엄청난 지식은 우리에게 큰 득을 줄 만한 것들이다. 부문별로 좀더 전문적인 책들을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 내가 공부가 부족하니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도 일단 이 책에 나온 정도면 최소한 여러 분야에 대한 낯익히기는 되겠다. 우선은 부족한대로 이 정도에서 만족하기로 하자.
우리 선생님 중 한 분의 말씀이, 한국에서 인문학을 하는 사람은 마을의 땜쟁이와 같단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다음에 일하는 것은 바랄 수가 없으니 아무 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임시변통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글에서 우리 동료, 후배 \'땜쟁이\'들에게 연장통을 하나 마련해주려 했다. 이 \'연장통\'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상당히 유용한 연장들이, 그것도 꽤 여러 개 들어 있다. 이것들로 당분간은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 터이니, 더 좋은 연장은 그 후에 각자 알아서 구할 일이다. 여기까지 읽어온 독자의 끈기와 학구열에 칭찬을 보내며, \'1부\'를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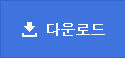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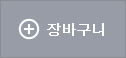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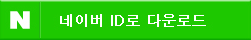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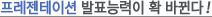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