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고 저만큼의 담장에 후원으로 들어가는 문과 창경궁과 통하는 문이 있다. 이는 1900년대 왜사람들이 조성한 것이며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다. 낙선재 일곽은 분명히 궁내건물이면서도 지극히 여염집과 같은 분위기를 지녔다는 특색이 있다. 지극한 사랑도 배어 있다.
모양에 따라 이름이 각기 다른 기와들
문창이란 사람이 드나드는 출입구 역할 뿐만 아니라 실내외의 환기나 채광 또는 건물의 미적 장식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 우리의 전통 문창살 무늬는 다양한 모양새와 질감으로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중국의 것은 투박하고 단조로우며, 일본의 것은 살이 가늘고 약할 뿐만 아니라 간격이 자자해서 깊은 맛이 없다.
낙선재의 막새도 최근의 것이긴 하지만, 참 아름답다.
낙선재는 누마루 구조도 매우 여성적이다. 작은 돌을 불규칙하게 붙인 아궁이벽도 눈길을 끌고 있다.
낙선재 석복헌은 행객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자형 평면이다. 석복헌 마당에는 작고 둥근 연못이 있는데, 잘못 앉은 것 같다. 우리 전통가옥에는 마당 한가운데 연못을 파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수강재 건물은 창건연대가 석복헌보다 앞선다.
뒤쪽으로 돌아가면 5단 화계를 둔 후원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 화계는 조선 왕궁 화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화계란 글자 그대로 계단식 화단이다. 우리 나라 지형은 산과 구릉이 많아서 사대부 집에도 화계를 둔 곳이 많다. 그래서 후원의 화계는 담장을 넘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동산과 이어진다. 이렇듯 화계는 자연과 인공의 절묘한 조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궁궐에서는 화계를 가꾸는 동산바치를 따로 두었는데, 요즘의 정원사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여기서 잠깐 기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
기와의 역사는 중국의 고사고에 하나라 때 곤오 씨가 기와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우리 나라는 물적 증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함녕원년삼월조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원전 1세기경 낙랑시대의 막새기와가 최초다. 그러다가 구당서에 고구려는 왕궁과 사찰에만 기와를 덮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로 미루어 일반인들이 기와집에서 생활한 것은 삼국통일 이후로 추정된다.
기와는 모양에 따라 이름이 각각 다르고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붕에 씌워 기와등과 골을 만들어내는 숫기와와 암기와다. 흔히 와당으로 불리는 막새는 지붕의 추녀 끝을 막음하는 조각기와다. 기와의 예술 기능은 추녀 끝을 막음하고 있는 수막새와 암막새가 맡는다.
막새에는 연꽃, 장초, 보상화, 귀면, 금수 등 다양한 무늬가 새겨져 있다. 궁궐 전각의 막새 문양은 용이나 봉황 또는 수, 희자 문양이 눈에 띈다. 그외에도 용마루의 양쪽 끝에 높게 장식된 치미, 각 마루 뜰에 벽사의 의미로 사용되는 귀면와, 마루 밑의 기왓골을 막는 착고기와, 서까래를 치장하고 부식을 방지하는 서까래기와, 처마 양쪽 가장자리의 사래목을 보호해주는 사래기와 토수 등은 눈맛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다.
석복헌과 수강재
석복헌은 낙선재의 옆집이다. 낙선재보다 규모가 약간 더 작은데, 특히 중행랑채가 있어서 안채 마당은 더욱 아담하다. 그러나 크기에 정성과 맛이 비례하는 것은 아닌 듯, 작은 집에 깃든 정성과 기술은 매우 감칠맛이 있다. 여러 문의 창살에서 풍기는 여성적인 분위기가 물씬하다. 안방에서 행랑채로 내려가면서 높이도 낮아지는데 그 방들을 잇는 쪽 마루가 있고, 쪽마루 가에는 난간까지 둘렀다. 층을 이룬 것은 각방의 주인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추측된다.
석복헌에서 다시 동쪽으로 담장문을 하나 더 들어서면 수강재이다. 수강재는 이름에 목숨수(壽) 편안할강(康) 자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왕실의 영친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살던 집이라 짐작된다.
모양에 따라 이름이 각기 다른 기와들
문창이란 사람이 드나드는 출입구 역할 뿐만 아니라 실내외의 환기나 채광 또는 건물의 미적 장식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 우리의 전통 문창살 무늬는 다양한 모양새와 질감으로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중국의 것은 투박하고 단조로우며, 일본의 것은 살이 가늘고 약할 뿐만 아니라 간격이 자자해서 깊은 맛이 없다.
낙선재의 막새도 최근의 것이긴 하지만, 참 아름답다.
낙선재는 누마루 구조도 매우 여성적이다. 작은 돌을 불규칙하게 붙인 아궁이벽도 눈길을 끌고 있다.
낙선재 석복헌은 행객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자형 평면이다. 석복헌 마당에는 작고 둥근 연못이 있는데, 잘못 앉은 것 같다. 우리 전통가옥에는 마당 한가운데 연못을 파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수강재 건물은 창건연대가 석복헌보다 앞선다.
뒤쪽으로 돌아가면 5단 화계를 둔 후원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 화계는 조선 왕궁 화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화계란 글자 그대로 계단식 화단이다. 우리 나라 지형은 산과 구릉이 많아서 사대부 집에도 화계를 둔 곳이 많다. 그래서 후원의 화계는 담장을 넘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동산과 이어진다. 이렇듯 화계는 자연과 인공의 절묘한 조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궁궐에서는 화계를 가꾸는 동산바치를 따로 두었는데, 요즘의 정원사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여기서 잠깐 기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
기와의 역사는 중국의 고사고에 하나라 때 곤오 씨가 기와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우리 나라는 물적 증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함녕원년삼월조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원전 1세기경 낙랑시대의 막새기와가 최초다. 그러다가 구당서에 고구려는 왕궁과 사찰에만 기와를 덮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로 미루어 일반인들이 기와집에서 생활한 것은 삼국통일 이후로 추정된다.
기와는 모양에 따라 이름이 각각 다르고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붕에 씌워 기와등과 골을 만들어내는 숫기와와 암기와다. 흔히 와당으로 불리는 막새는 지붕의 추녀 끝을 막음하는 조각기와다. 기와의 예술 기능은 추녀 끝을 막음하고 있는 수막새와 암막새가 맡는다.
막새에는 연꽃, 장초, 보상화, 귀면, 금수 등 다양한 무늬가 새겨져 있다. 궁궐 전각의 막새 문양은 용이나 봉황 또는 수, 희자 문양이 눈에 띈다. 그외에도 용마루의 양쪽 끝에 높게 장식된 치미, 각 마루 뜰에 벽사의 의미로 사용되는 귀면와, 마루 밑의 기왓골을 막는 착고기와, 서까래를 치장하고 부식을 방지하는 서까래기와, 처마 양쪽 가장자리의 사래목을 보호해주는 사래기와 토수 등은 눈맛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다.
석복헌과 수강재
석복헌은 낙선재의 옆집이다. 낙선재보다 규모가 약간 더 작은데, 특히 중행랑채가 있어서 안채 마당은 더욱 아담하다. 그러나 크기에 정성과 맛이 비례하는 것은 아닌 듯, 작은 집에 깃든 정성과 기술은 매우 감칠맛이 있다. 여러 문의 창살에서 풍기는 여성적인 분위기가 물씬하다. 안방에서 행랑채로 내려가면서 높이도 낮아지는데 그 방들을 잇는 쪽 마루가 있고, 쪽마루 가에는 난간까지 둘렀다. 층을 이룬 것은 각방의 주인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추측된다.
석복헌에서 다시 동쪽으로 담장문을 하나 더 들어서면 수강재이다. 수강재는 이름에 목숨수(壽) 편안할강(康) 자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왕실의 영친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살던 집이라 짐작된다.
추천자료
 건설공학개론(건축구조의 역사)
건설공학개론(건축구조의 역사) 사찰건축의 전반적 개관
사찰건축의 전반적 개관 친환경 건축
친환경 건축 [한국전통문양][한국전통태극문양][태극문양]한국전통문양의 개념, 한국전통문양이 종류와 의...
[한국전통문양][한국전통태극문양][태극문양]한국전통문양의 개념, 한국전통문양이 종류와 의... [건축][건축설계][미스 반 데 로에][안도 다다오]건축의 정의, 건축의 구조, 건축의 구조조건...
[건축][건축설계][미스 반 데 로에][안도 다다오]건축의 정의, 건축의 구조, 건축의 구조조건... 토속건축물
토속건축물 [교회건축][교회건축의 역사][교회건축의 특징][예술공예운동][롱샹교회][교회건축의 사례]교...
[교회건축][교회건축의 역사][교회건축의 특징][예술공예운동][롱샹교회][교회건축의 사례]교... [불교건축][불교건축의 양식][불교건축의 상징체계][불교건축의 탑][불교건축의 사원]불교건...
[불교건축][불교건축의 양식][불교건축의 상징체계][불교건축의 탑][불교건축의 사원]불교건... [생태건축][생태건축과 지붕][생태건축과 태양에너지][생태건축의 사례]생태건축의 의의, 생...
[생태건축][생태건축과 지붕][생태건축과 태양에너지][생태건축의 사례]생태건축의 의의, 생... [생태건축][생태건축의 배경][생태건축의 요건][생태건축의 사례][생태건축의 발전방향]생태...
[생태건축][생태건축의 배경][생태건축의 요건][생태건축의 사례][생태건축의 발전방향]생태... [생태건축][생태건축의 미래경쟁력][생태건축의 사례][생태건축의 추진방향]생태건축의 정의,...
[생태건축][생태건축의 미래경쟁력][생태건축의 사례][생태건축의 추진방향]생태건축의 정의,... [극장건축][무대설계][극장][건축][극장건축의 의의][극장건축의 역사][극장건축의 기본계획]...
[극장건축][무대설계][극장][건축][극장건축의 의의][극장건축의 역사][극장건축의 기본계획]... [건축][건축의 설계도면][건축의 아트리움][해체주의][자연][건축과교육][건축의 문제점]건축...
[건축][건축의 설계도면][건축의 아트리움][해체주의][자연][건축과교육][건축의 문제점]건축... 중국의 건축
중국의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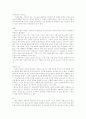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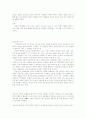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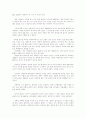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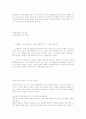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