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Ⅰ. 신라 중고기 미륵신앙의 성격
Ⅱ. 진표의 미륵신앙
1. 진표의 행적
2. 미륵신앙과 이상사회론
맺음말
Ⅰ. 신라 중고기 미륵신앙의 성격
Ⅱ. 진표의 미륵신앙
1. 진표의 행적
2. 미륵신앙과 이상사회론
맺음말
본문내용
한다.
) 허흥식,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86, 586쪽.
그 후 미륵사 개탑과 관련한 이 기록은 후백제 견훤의 미륵신앙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료로 인용되어 왔다.
) 조인성, 「미륵신앙과 신라사회」 『진단학보』 82, 1996, 44쪽;추만호, 「신라말 사상계의 동향」 『신라말 고려초의 정치사회변동』, 한국고대사연구회, 1994, 47쪽.
견훤은 아들 神劍에 의해 935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금산사에 유폐된 바 있다.
) 『三國史記』 권50, 열전10 견훤조.
이 간단한 기록에 주목하여 견훤이 금산사에 자주 왕래했을 것이며 따라서 진표의 미륵신앙과 어떠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 이기백, 앞의 책, 274쪽.
이 같은 추측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견훤이 불만 농민들을 끌어들이려는 의도에서 금산사를 중시했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 조인성, 「신라말 농민반란의 배경에 대한 一試論」 『신라말 고려초의 정치사회변동』, 한국고대사연구회, 1994, 33쪽.
미륵신앙에 기반을 둔 반신라적인 이상국가의 건설이라는 진표의 소망을 견훤이 나름대로 실현했던 셈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 조인성, 「미륵신앙과 신라사회」, 47쪽.
견훤이 금산사 및 미륵사와 어떤 형태의 인연이 있었다면 그가 미륵신앙에 관심을 가졌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가 금산사에 잠시 유폐되었다는 매우 간단한 기록만으로 그가 금산사에 자주 왕래했을 것이고, 그러기에 진표의 미륵신앙을 계승하여 반신라적인 이상국가의 건설이라는 진표의 소망을 실현한 셈이라고까지 해석하는 데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백제 부흥세력과의 연결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진표의 이러한 성향은 실천위주의 법상종 성립의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이는 중고기 신라 미륵신앙의 특징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진표의 점찰교법은 속리산 법주사의 永深에게 계승되고, 永深의 그것은 팔공산 동화사의 心地에게로 전해졌다. 心地는 헌덕왕의 아들로 15세에 출가하여 팔공산에 살면서 부지런히 정진했다. 속리산의 영심이 진표의 불골간자를 이어받아 법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참회 수행에 참여했다. 눈이 내리는 마당에서 예배하기도 하고, 팔꿈치와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릴 때까지 수행하여 마침내 永深으로부터 간자를 전해받아 팔공산으로 돌아갔다.
) 『三國遺事』 권4, 義解5 心地繼祖.
심지가 영심으로부터 불골간자를 얻어서 진표의 점찰교법을 계승했다는 이 기록을 \"진표의 미륵신앙이 신라 변방에서 그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는 이도 있다.
) 이기백, 앞의 책, 275쪽.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心地의 종교적 열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해석만을 무리하게 한 것으로 본다.
그가 활동한 사찰은 금산사·법주사·발연사 등으로 지방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三國遺事』 卷4, 義解 關東楓岳鉢淵藪石記, \"師受敎法已 欲創金山寺 下山而來 至大淵津 忽有龍王 出獻玉袈裟 將八萬眷屬 侍往金山藪 四方子來 不日成之 復感慈氏從兜率 駕雲而下 與師受戒法 師勸檀緣 鑄成彌勒丈六像 復 下降受戒威儀之相於金堂南壁 於甲辰六月九日鑄成 丙午五月一日 安置金堂 是歲大曆元年也 師出金山 向俗離山 路逢駕牛乘車者 其牛等向師前 膝而泣 乘車人下問 何故此牛等見和尙泣耶 和尙從何而來 師曰我是金山藪眞表僧 予曾入邊山不思議房 於彌勒地藏兩聖前 親受戒法眞 欲覓創寺鎭長修道之處 故來爾 此牛等外愚內明 知我受戒法 爲重法故 膝而泣 其人聞已 乃曰畜生尙有如是信心 況我爲人 豈無心乎 卽以手執鎌 自斷頭髮 師以悲心 更爲祝髮受戒 行至俗離山洞裏 見吉祥草所生處而識之 還向溟州海邊 徐行次 有魚鼈 等類 出海向師前 綴身如陸 師踏而入海 唱念戒法還出 行至高城郡 入皆骨山 始創鉢淵藪 開占察法會.\"
이러한 미륵신앙활동과 그 영향력으로 인해 진표는 경덕왕으로부터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경덕왕이 그를 궁중으로 맞아들여 보살계를 받고 많은 보시를 한 것은 그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에서 나왔을 것이다. 물론 진표의 미륵신앙은 전제군주인 경덕왕에게도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비쳤을 것이다. 신라 말기의 국왕들이 지방호족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선종에 대해 그러하였듯이, 이 또한 진표의 신앙운동을 회유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는 참회와 실천, 그리고 신비사상으로써 지방사회의 민중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중대라는 신라 절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반된 그의 교화는 귀족사회의 부패 속에서 민중을 각성시킨 점에서 주목된다. 그의 점찰간자를 통한 신앙생활의 확인이나 극단의 미륵신앙은 합리성보다는 감성에 휩쓸리기 쉬운 지방의 민중들에게 호소력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태현을 중심으로 하는 법상종 승려들이
) 법상종 승려들의 미륵 관계 저술목록은 대부분 미륵상생경에 대한 주석서다.
경주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가졌지만 중대 이후 중앙세력의 와해와 함께 몰락한 것과는 달리, 진표는 지방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이를 토대로 850년 이후 중앙세력의 붕괴 과정에 휩쓸리지 않고 종파로서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맺음말
이상에서 중고기와 8세기를 중심으로 활동한 진표를 통해 이 시기의 미륵신앙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중고기 신라인들은 불교수용과 거의 동시에 알려진 미륵을 현실과 거리가 먼 상생이나 하생으로보다는 곧바로 현실로 끌어들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미륵을 통해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보다 나은 삶과 새 희망의 상징으로서의 미륵을 신앙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미륵을 자신들과 같은 時·空間으로 끌어온 것이다. 이것은 당시 현실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진표는 구체적 신앙활동을 통해 미륵신앙을 弘布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상국가에 대한 인식은 신앙적인 차원에 머물렀으며, 현실적인 운동으로는 발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진표의 미륵신앙이나 이상사회론은 중대에 활동한 다른 법상종 승려의 미륵신앙이나 이상사회에 대한 연구를 병행할 때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법상종은 미륵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미륵과 미타 또는 미륵과 지장을 병용하지만 주된 신앙이 미륵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둔다.
) 허흥식,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86, 586쪽.
그 후 미륵사 개탑과 관련한 이 기록은 후백제 견훤의 미륵신앙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료로 인용되어 왔다.
) 조인성, 「미륵신앙과 신라사회」 『진단학보』 82, 1996, 44쪽;추만호, 「신라말 사상계의 동향」 『신라말 고려초의 정치사회변동』, 한국고대사연구회, 1994, 47쪽.
견훤은 아들 神劍에 의해 935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금산사에 유폐된 바 있다.
) 『三國史記』 권50, 열전10 견훤조.
이 간단한 기록에 주목하여 견훤이 금산사에 자주 왕래했을 것이며 따라서 진표의 미륵신앙과 어떠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 이기백, 앞의 책, 274쪽.
이 같은 추측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견훤이 불만 농민들을 끌어들이려는 의도에서 금산사를 중시했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 조인성, 「신라말 농민반란의 배경에 대한 一試論」 『신라말 고려초의 정치사회변동』, 한국고대사연구회, 1994, 33쪽.
미륵신앙에 기반을 둔 반신라적인 이상국가의 건설이라는 진표의 소망을 견훤이 나름대로 실현했던 셈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 조인성, 「미륵신앙과 신라사회」, 47쪽.
견훤이 금산사 및 미륵사와 어떤 형태의 인연이 있었다면 그가 미륵신앙에 관심을 가졌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가 금산사에 잠시 유폐되었다는 매우 간단한 기록만으로 그가 금산사에 자주 왕래했을 것이고, 그러기에 진표의 미륵신앙을 계승하여 반신라적인 이상국가의 건설이라는 진표의 소망을 실현한 셈이라고까지 해석하는 데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백제 부흥세력과의 연결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진표의 이러한 성향은 실천위주의 법상종 성립의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이는 중고기 신라 미륵신앙의 특징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진표의 점찰교법은 속리산 법주사의 永深에게 계승되고, 永深의 그것은 팔공산 동화사의 心地에게로 전해졌다. 心地는 헌덕왕의 아들로 15세에 출가하여 팔공산에 살면서 부지런히 정진했다. 속리산의 영심이 진표의 불골간자를 이어받아 법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참회 수행에 참여했다. 눈이 내리는 마당에서 예배하기도 하고, 팔꿈치와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릴 때까지 수행하여 마침내 永深으로부터 간자를 전해받아 팔공산으로 돌아갔다.
) 『三國遺事』 권4, 義解5 心地繼祖.
심지가 영심으로부터 불골간자를 얻어서 진표의 점찰교법을 계승했다는 이 기록을 \"진표의 미륵신앙이 신라 변방에서 그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는 이도 있다.
) 이기백, 앞의 책, 275쪽.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心地의 종교적 열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해석만을 무리하게 한 것으로 본다.
그가 활동한 사찰은 금산사·법주사·발연사 등으로 지방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三國遺事』 卷4, 義解 關東楓岳鉢淵藪石記, \"師受敎法已 欲創金山寺 下山而來 至大淵津 忽有龍王 出獻玉袈裟 將八萬眷屬 侍往金山藪 四方子來 不日成之 復感慈氏從兜率 駕雲而下 與師受戒法 師勸檀緣 鑄成彌勒丈六像 復 下降受戒威儀之相於金堂南壁 於甲辰六月九日鑄成 丙午五月一日 安置金堂 是歲大曆元年也 師出金山 向俗離山 路逢駕牛乘車者 其牛等向師前 膝而泣 乘車人下問 何故此牛等見和尙泣耶 和尙從何而來 師曰我是金山藪眞表僧 予曾入邊山不思議房 於彌勒地藏兩聖前 親受戒法眞 欲覓創寺鎭長修道之處 故來爾 此牛等外愚內明 知我受戒法 爲重法故 膝而泣 其人聞已 乃曰畜生尙有如是信心 況我爲人 豈無心乎 卽以手執鎌 自斷頭髮 師以悲心 更爲祝髮受戒 行至俗離山洞裏 見吉祥草所生處而識之 還向溟州海邊 徐行次 有魚鼈 等類 出海向師前 綴身如陸 師踏而入海 唱念戒法還出 行至高城郡 入皆骨山 始創鉢淵藪 開占察法會.\"
이러한 미륵신앙활동과 그 영향력으로 인해 진표는 경덕왕으로부터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경덕왕이 그를 궁중으로 맞아들여 보살계를 받고 많은 보시를 한 것은 그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에서 나왔을 것이다. 물론 진표의 미륵신앙은 전제군주인 경덕왕에게도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비쳤을 것이다. 신라 말기의 국왕들이 지방호족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선종에 대해 그러하였듯이, 이 또한 진표의 신앙운동을 회유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는 참회와 실천, 그리고 신비사상으로써 지방사회의 민중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중대라는 신라 절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반된 그의 교화는 귀족사회의 부패 속에서 민중을 각성시킨 점에서 주목된다. 그의 점찰간자를 통한 신앙생활의 확인이나 극단의 미륵신앙은 합리성보다는 감성에 휩쓸리기 쉬운 지방의 민중들에게 호소력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태현을 중심으로 하는 법상종 승려들이
) 법상종 승려들의 미륵 관계 저술목록은 대부분 미륵상생경에 대한 주석서다.
경주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가졌지만 중대 이후 중앙세력의 와해와 함께 몰락한 것과는 달리, 진표는 지방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이를 토대로 850년 이후 중앙세력의 붕괴 과정에 휩쓸리지 않고 종파로서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맺음말
이상에서 중고기와 8세기를 중심으로 활동한 진표를 통해 이 시기의 미륵신앙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중고기 신라인들은 불교수용과 거의 동시에 알려진 미륵을 현실과 거리가 먼 상생이나 하생으로보다는 곧바로 현실로 끌어들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미륵을 통해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보다 나은 삶과 새 희망의 상징으로서의 미륵을 신앙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미륵을 자신들과 같은 時·空間으로 끌어온 것이다. 이것은 당시 현실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진표는 구체적 신앙활동을 통해 미륵신앙을 弘布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상국가에 대한 인식은 신앙적인 차원에 머물렀으며, 현실적인 운동으로는 발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진표의 미륵신앙이나 이상사회론은 중대에 활동한 다른 법상종 승려의 미륵신앙이나 이상사회에 대한 연구를 병행할 때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법상종은 미륵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미륵과 미타 또는 미륵과 지장을 병용하지만 주된 신앙이 미륵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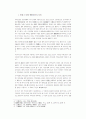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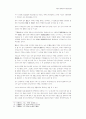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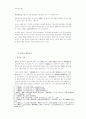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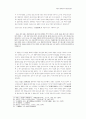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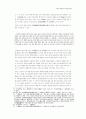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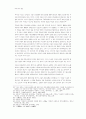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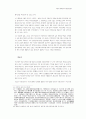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