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의 굿과 무당
1. 한국 무당의 유형
2. 한국 굿의 종류
3. 지역에 따른 굿의 실태
동해안 굿
1. 동해안 굿의 일반적인 성격
1) 무당의 유형
2) 굿주기
3) 굿경비의 종류
2. 계원리별신굿의 굿거리
1) 계원리별신굿의 개관
2) 계원리별신굿의 절차
1. 한국 무당의 유형
2. 한국 굿의 종류
3. 지역에 따른 굿의 실태
동해안 굿
1. 동해안 굿의 일반적인 성격
1) 무당의 유형
2) 굿주기
3) 굿경비의 종류
2. 계원리별신굿의 굿거리
1) 계원리별신굿의 개관
2) 계원리별신굿의 절차
본문내용
소외되었던 할머니들도 참여한다.
(8) 성주굿
무녀가 푸너리 춤을 추고 청배무가를 부르고 난 뒤, 성주신이 집을 짓고 집을 꾸미는 내력을 중심으로 연행하면서 마을 전체와 개인들에 대한 축원들을 수시로 삽입하여 무가를 구연한다. 무녀는 성주신에 대한 설화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서 무가를 서사적인 창으로 노래하거나 구송조 또는 이야기조로 구연하며, 여러 가지 마임과 춤을 뒤섞어서 생동감 있게 엮어간다. 무녀는 성주신 설화를 일인극 배우처럼 공연하며 관객들을 연행 속으로 편입시켜, 참여한 이들이 다 함께 만들고 즐기는 축제를 만들어간다.
(9) 지신굿
전체적으로 축원무가로 구연되고 있으며 특별한 행위나 내용이 있는 굿거리가 아니다. 축원무가는 각 굿거리에 관용적으로 구연되며 여러 가지 사용 목적에 맞추어 각각의 내용들과 그리고 형식들로 미리 준비되어 있으며,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게 즉흥적으로 선택되어 구연된다.
(10) 심청굿
심청굿은 판소리 심청가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장편 서사무가인데, 연행 도중에 삽입된 맹인놀이는 무극(巫劇)이다. 구송(口誦)이나 노래하는 도중에 사실적인 형태의 연기로 감정 표현을 하기도 하며, 극적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심청굿은 눈을 밝게 하고 안질(眼疾)을 예방한다는 주술적 목적을 지닌 굿거리이고, 또 효를 주제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신굿의 주관적인 노인층들로부터 상당한 인기가 있는 굿거리이다.
(11) 천황굿
이 굿거리는 성황신을 위한 굿거리이며, 이는 바로 마을 수호신을 위한 굿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별신굿에서는 이 굿을 가정의 화목을 비는 굿 또는 가장(家長)의 건승을 비는 굿으로 받아들인다.
(12) 놋동우굿
이 굿거리는 각 방위의 장군님들을 모셔서 비는 굿으로서 \'군웅(軍雄)거리\' 또는 \'장수(將帥)거리\'라고도 한다. 이 굿거리는 축원무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축원의 내용은 군에 간 자녀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의 대·소사와 주민들과 자손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축원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는 축원굿이다. 모든 굿거리에 이와 같은 여러 내용의 축원이 있으며, 이러한 축원들은 마을 전체의 축원에서부터 개인적인 축원까지 제한이 없다. 또한 이런 다양한 축원의 내용들은 그 굿거리의 중심 내용과도 엄격한 연관성을 갖지 않는 자유로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축원의 대부분은 연행의 순서에 의해 고정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각 굿거리에 있어서 축원은 각 굿거리의 대상신격의 특별한 신통력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행해지며, 각 굿거리의 모든 대상신들은 각각 이러한 여러 내용의 축원들을 모두 들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굿을 하는 주민들에게 있음을 말한다.
(13) 손님굿
손님굿은 \'손님풀이\'라는 서사무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굿거리의 끝 부분에서 무극인 \'말놀이\'가 연행되는데, 이 말놀이는 거리굿이나 원님놀이처럼 완전한 독립성을 갖춘 무극이 아니라, 손님굿이라는 서사무가의 마지막 부분을 연극으로 만든 것이다. 이 \'말놀이\'는 마마신을 배송(拜送)하는 제의적인 행위가 무녀의 재담과 익살맞은 행위들이 뒤섞여서 연극화 된 것이다. 이 말놀이를 통하여 마마신을 배송하고 축원하는 것으로 손님굿은 끝난다.
(14) 제면굿
일명 걸립(乞粒)거리\'라고 하며 \'계면굿\'이러고도 한다. 이 굿거리는 사설 내용이 무당이 걸립을 하며 축원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조신(巫祖神)을 모시는 굿거리라고 할 수 있으며, 굿 진행 중의 특별한 행위인 제면떡을 곡식 종자(씨)라고 하며 팔고 나누어주는 장면에서는 풍요와 풍어를 가져다주는 생산신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15) 용왕굿
용왕굿은 풍어와 뱃길의 안전을 비는 굿으로서, 동해안 별신굿에서는 가장 중요한 굿거리의 하나로 취급된다. 굿 진행 도중에 마을의 선주들이 모두 나와 앉아서 무녀의 축원을 받는다. 마을 주민들이 수시로 나와서 제물대의 오른쪽에 걸려있는 용선(龍船)에 돈을 넣고 절을 한다. 선주들은 무녀가 시키는대로 각자의 제물을 준비해서 제물대 앞에 바치고 정성껏 절을 한다. 무녀는 무가를 구연하는 중간 중간에 주민대표와 마을 주민들로부터 건네 받은 명단을 일일이 불러가며 축원을 한다.
(16) 뱃노래·꽃노래
용왕굿에 이어서 망자(亡者)를 용선에 태워 보내는 \'뱃노래(용선가)\'를 함께 부른다. 뱃노래는 무당들과 주민들이 서서 용선 줄을 잡고서는 당겼다 놓으면서 염불들을 합창하며 연행한다.
(17) 등노래
등노래 역시 꽃노래와 마찬가지로 춤으로 진행되는 굿거리이며, 굿당에 걸어 놓은 8각의 대형 흑애등을 들고 추는 춤이다. 이 굿거리에서는 무녀가 등(燈)을 만드는 과정 등을 노래하면서 주민들의 머리나 등에 흑애등을 비벼대고는 돈을 걷는다. 그리고 나서 등을 들고 춤사위로 등을 공중으로 던지거나 돌리며 춤을 춘다. 이 굿거리의 등춤 역시 무용화된 제의 행위 즉 상징적이고 화려한 볼거리로서의 무용공연이다.
(18) 범굿
범굿(일명 호탈굿)은 호랑이로 인한 호환(虎患)을 방지하기 위한 주술적인 모의(模擬) 행위로 구성된 무극이며 양중들에 의하여 연행된다. 호랑이가 없어진 지금에도 이 범굿이 연행되는 이유는 범굿의 내용이 마을의 모든 우환을 예방하려고 하는 마을 주민들의 주술적인 기원(祈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범굿은 해가 지고 난 뒤에 햇불 조명 아래에서 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연행되는 굿거리이다. 범굿은 종이로 만든 호랑이 가죽을 덮어쓴 양중과 포수로 분장한 양중이 연행하는 극으로 꾸며져 있으며, 당주 무당에 의해 그 내용과 의미가 굿 진행 도중에 수시로 설명되면서 주술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19) 대거리
대거리(일명 거리굿)는 굿당에 따라온 잡귀들을 위한 굿으로 각 귀신들의 흉내를 내면서 이들을 대접해서 보내는 형식으로 연행된다. 별신굿의 마지막 굿거리이며 여러 굿거리에 초대된 존신(尊神)들과는 달리 아직 대접받지 못한 잡귀 또는 거리귀신을 불러다 대접해서 보냄으로써 별신굿의 공연 전 과정이 마무리된다.
<참고문헌>
하효길외 4인, 한국의 굿, 민속원, 2003년
(8) 성주굿
무녀가 푸너리 춤을 추고 청배무가를 부르고 난 뒤, 성주신이 집을 짓고 집을 꾸미는 내력을 중심으로 연행하면서 마을 전체와 개인들에 대한 축원들을 수시로 삽입하여 무가를 구연한다. 무녀는 성주신에 대한 설화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서 무가를 서사적인 창으로 노래하거나 구송조 또는 이야기조로 구연하며, 여러 가지 마임과 춤을 뒤섞어서 생동감 있게 엮어간다. 무녀는 성주신 설화를 일인극 배우처럼 공연하며 관객들을 연행 속으로 편입시켜, 참여한 이들이 다 함께 만들고 즐기는 축제를 만들어간다.
(9) 지신굿
전체적으로 축원무가로 구연되고 있으며 특별한 행위나 내용이 있는 굿거리가 아니다. 축원무가는 각 굿거리에 관용적으로 구연되며 여러 가지 사용 목적에 맞추어 각각의 내용들과 그리고 형식들로 미리 준비되어 있으며,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게 즉흥적으로 선택되어 구연된다.
(10) 심청굿
심청굿은 판소리 심청가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장편 서사무가인데, 연행 도중에 삽입된 맹인놀이는 무극(巫劇)이다. 구송(口誦)이나 노래하는 도중에 사실적인 형태의 연기로 감정 표현을 하기도 하며, 극적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심청굿은 눈을 밝게 하고 안질(眼疾)을 예방한다는 주술적 목적을 지닌 굿거리이고, 또 효를 주제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신굿의 주관적인 노인층들로부터 상당한 인기가 있는 굿거리이다.
(11) 천황굿
이 굿거리는 성황신을 위한 굿거리이며, 이는 바로 마을 수호신을 위한 굿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별신굿에서는 이 굿을 가정의 화목을 비는 굿 또는 가장(家長)의 건승을 비는 굿으로 받아들인다.
(12) 놋동우굿
이 굿거리는 각 방위의 장군님들을 모셔서 비는 굿으로서 \'군웅(軍雄)거리\' 또는 \'장수(將帥)거리\'라고도 한다. 이 굿거리는 축원무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축원의 내용은 군에 간 자녀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의 대·소사와 주민들과 자손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축원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는 축원굿이다. 모든 굿거리에 이와 같은 여러 내용의 축원이 있으며, 이러한 축원들은 마을 전체의 축원에서부터 개인적인 축원까지 제한이 없다. 또한 이런 다양한 축원의 내용들은 그 굿거리의 중심 내용과도 엄격한 연관성을 갖지 않는 자유로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축원의 대부분은 연행의 순서에 의해 고정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각 굿거리에 있어서 축원은 각 굿거리의 대상신격의 특별한 신통력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행해지며, 각 굿거리의 모든 대상신들은 각각 이러한 여러 내용의 축원들을 모두 들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굿을 하는 주민들에게 있음을 말한다.
(13) 손님굿
손님굿은 \'손님풀이\'라는 서사무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굿거리의 끝 부분에서 무극인 \'말놀이\'가 연행되는데, 이 말놀이는 거리굿이나 원님놀이처럼 완전한 독립성을 갖춘 무극이 아니라, 손님굿이라는 서사무가의 마지막 부분을 연극으로 만든 것이다. 이 \'말놀이\'는 마마신을 배송(拜送)하는 제의적인 행위가 무녀의 재담과 익살맞은 행위들이 뒤섞여서 연극화 된 것이다. 이 말놀이를 통하여 마마신을 배송하고 축원하는 것으로 손님굿은 끝난다.
(14) 제면굿
일명 걸립(乞粒)거리\'라고 하며 \'계면굿\'이러고도 한다. 이 굿거리는 사설 내용이 무당이 걸립을 하며 축원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조신(巫祖神)을 모시는 굿거리라고 할 수 있으며, 굿 진행 중의 특별한 행위인 제면떡을 곡식 종자(씨)라고 하며 팔고 나누어주는 장면에서는 풍요와 풍어를 가져다주는 생산신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15) 용왕굿
용왕굿은 풍어와 뱃길의 안전을 비는 굿으로서, 동해안 별신굿에서는 가장 중요한 굿거리의 하나로 취급된다. 굿 진행 도중에 마을의 선주들이 모두 나와 앉아서 무녀의 축원을 받는다. 마을 주민들이 수시로 나와서 제물대의 오른쪽에 걸려있는 용선(龍船)에 돈을 넣고 절을 한다. 선주들은 무녀가 시키는대로 각자의 제물을 준비해서 제물대 앞에 바치고 정성껏 절을 한다. 무녀는 무가를 구연하는 중간 중간에 주민대표와 마을 주민들로부터 건네 받은 명단을 일일이 불러가며 축원을 한다.
(16) 뱃노래·꽃노래
용왕굿에 이어서 망자(亡者)를 용선에 태워 보내는 \'뱃노래(용선가)\'를 함께 부른다. 뱃노래는 무당들과 주민들이 서서 용선 줄을 잡고서는 당겼다 놓으면서 염불들을 합창하며 연행한다.
(17) 등노래
등노래 역시 꽃노래와 마찬가지로 춤으로 진행되는 굿거리이며, 굿당에 걸어 놓은 8각의 대형 흑애등을 들고 추는 춤이다. 이 굿거리에서는 무녀가 등(燈)을 만드는 과정 등을 노래하면서 주민들의 머리나 등에 흑애등을 비벼대고는 돈을 걷는다. 그리고 나서 등을 들고 춤사위로 등을 공중으로 던지거나 돌리며 춤을 춘다. 이 굿거리의 등춤 역시 무용화된 제의 행위 즉 상징적이고 화려한 볼거리로서의 무용공연이다.
(18) 범굿
범굿(일명 호탈굿)은 호랑이로 인한 호환(虎患)을 방지하기 위한 주술적인 모의(模擬) 행위로 구성된 무극이며 양중들에 의하여 연행된다. 호랑이가 없어진 지금에도 이 범굿이 연행되는 이유는 범굿의 내용이 마을의 모든 우환을 예방하려고 하는 마을 주민들의 주술적인 기원(祈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범굿은 해가 지고 난 뒤에 햇불 조명 아래에서 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연행되는 굿거리이다. 범굿은 종이로 만든 호랑이 가죽을 덮어쓴 양중과 포수로 분장한 양중이 연행하는 극으로 꾸며져 있으며, 당주 무당에 의해 그 내용과 의미가 굿 진행 도중에 수시로 설명되면서 주술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19) 대거리
대거리(일명 거리굿)는 굿당에 따라온 잡귀들을 위한 굿으로 각 귀신들의 흉내를 내면서 이들을 대접해서 보내는 형식으로 연행된다. 별신굿의 마지막 굿거리이며 여러 굿거리에 초대된 존신(尊神)들과는 달리 아직 대접받지 못한 잡귀 또는 거리귀신을 불러다 대접해서 보냄으로써 별신굿의 공연 전 과정이 마무리된다.
<참고문헌>
하효길외 4인, 한국의 굿, 민속원, 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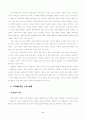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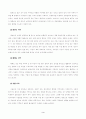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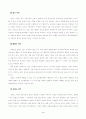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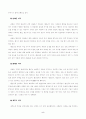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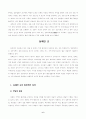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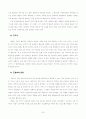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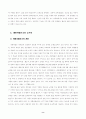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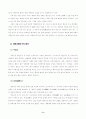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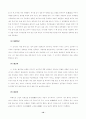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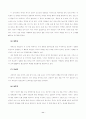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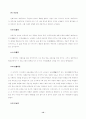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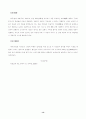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