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있다.
\'삼장\'은 창작가요인데도 \'제\'자를 쓰지 않았다. \'제\'->짓다
(\'고려사절요\' 권 21 충렬왕 14년 4월조)
이데 덧붙이자면 충선왕이 원에 머물다가 고려로 돌아오자 풍악을 베풀고 학생들이 가요를 올렸다는 기록에는 \'제\'를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있던 가요를 단순히 가져다가 올렸기 때문이다.
(\'고려사절요\' 권23 충선왕 5년 6월조)
이처럼 새로운 가요를 창작할 적에는\'제\'를 분명히 사용했음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새로운
가요에는 \'신곡\'이란 말로 표현했으며, 기존의 노래는 \'가요(歌謠)\'란 단어로 표기했다. 삼장이 창작가요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더 들자면 \'三藏\'의 국문표기 형식이 교대창 형식이며, 후렴구를 사용했다는 점, 표현양식이 서술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작자 유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추정케 하는 \'삼장\'과는 달리 \'쌍화점\'에는 작자를 추정케 할 자료가 \'삼장\' 관련 문헌 이외는 전혀 없다. \'삼장\'과 \'쌍화점\'의 창작시기가 동일하고, 또 \'삼장\'이 \'쌍화점\'의 발췌한 한역이라면 \'삼장\'의 작자가 바로 \'쌍화점\'의 작자와 같은 차원에서 동일하게 취급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작자 유무의 추정도 어렵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삼장\'에 대한 부대기록을 토대로 할 때 \'삼장\'은 물론, \'쌍화점\'의 확실한 창작연대와 작자를 밝힐 수가 없다. 그러므로 창작시기나 창작자의 고구를 통한 두 작품의 관계 확인의 가능성은 거의 찾을 수 없게 된다.
\'삼자\'과 \'쌍화점\'의 관계확인. \'삼장\'이 독립된 원가로 보는 견해.
-최정여
\'쌍화점\' 제 2연의 三藏사句는 여사 악지에 \'삼장\', \'사룡\'이라 하여 독립된 가요였음을 알 수 있고 또 역가에 있는 가음과 일치된 것으로 보아 타 가요와의 합성물이, 즉 \'쌍화점\'임을 인지할 수 있다.(최정여 \'고려의 속악가사논고\', \'청주대논문집\' 제 4집, 청주대학 1963,P9.그는 또 같은 책 P43에서 \"고려 속악가사는 결국 민요로 형성되었다 하겠으며, 따라서 속악가사 중 동일구 그것들은 \'삼장\'이 독립되어 속악가사로 사용되었듯이 본래 삼국이래 내려오면서 사용되었던 단형이 속악가사로 애창되어 온 것들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민요 중에서 想이 유사한 것을 배열하여 놓으면 \'서경별곡\'....등의 류와 근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소악부 직역시 부분은 독립된 원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정과정\', \'정읍사\', \'만전춘\'도 본래 단형에다 후렴 혹은 합성으로서 악절에 부합시킨 것이 아닐까 한다.\"라는 유사한 주장을 폈다.)
->이러한 논지는 \'삼장\'과 \'쌍화점\'이 지닌 구조적 특성에서 보면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쌍화점이 처음부터 악장으로 전부 사용되었는 데도 \'삼장\' 내용 부분만 편의상 발췌한역하여 \'고려사\' 악지 등에 수록됐다면 그것을 발췌한역한 타당한 동기를 찾거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밝히기는 어렵다. 또 이와 함께 \'악장가사\'의 가요 명칭도 \'쌍화점\'보다는
\'삼장\'으로 명명했어야 하리라 본다. 왜냐하면 편찬 연대로 보아 \'고려사\' 악지가 \'악장가사\'보다 앞서며 또 정사이기 때문이다.
\'고려사\'악지가 역사적 사실에 중점을 두었고 \'악장가사\'가 편찬 당시의 내용과 명칭을 중히 여겼다면, \'고려사\'악지와 \'고려사절요\'등의 기록은 고려의 시대성과 사서로서의 최소한의 조건을 고려하여 처음 사용된 당시의 가요 \'삼장\'만을 한역하여 기록했을 것이고, 이와 달리 \'악장가사\'에는 편찬 때 악장으로 사용된 가요 내용 전부와 그 실상을 그대로 악보에 실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최동원
\'정석가\'의 끝 연이 꼭 같은 가사로 되어 있다는 점은 혹시 이 부분이 당시에 유포되어 있던 독립된 노래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면서 속가 중 \'쌍화점\', \'서경별곡\', \'만전춘\'등 가사 현전 작품의 직역부분은 독립된 원가일 가능성이 짙다고 보았다.(최동원, \'고려속요의 향유계층과 그 성격\', \'고려시대의 가요문학\',새문사,1992, p2-98)
->\'고려사\' 악지에 해시(解時)되어 실려 있는 \'삼장\'은 \'쌍화점\'의 제 2연과 같지만 당시에 널리 불려지던 독립된 노래일 가능성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삼장\'은 \'쌍화점\'의 일부 한역이 아니고 독립된 원가의 한역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삼장\'이 독립원가라면 지금까지 논의되어진 바와 같이 두 작품의 창작시기와 창작자는 불확실하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삼장\'이 원래는 민요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민요는 그 창작시기의 불확실성가 창작자의 확인이 어려운 것이 그 특징이기 때문이다.
사회·역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삼장\'은 민간전승 민요였지만, 뒤에 상승문화재의 한 형태로 궁중악이 된 것이라 본다. 그래서 \'고려사\'악지에 기록으로 남겨졌으나 그 근원이 민요였기 때문에 확실한 창작시기와 창작자가 남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민요였던 삼장은 궁중악으로 승화되었지만 민간에서 구비전승되는 이원전승체계를 유지했다.
결국 속가 \'삼장\'의 내용에 다른 내용이 합쳐지면서 이것이 현전의 \'쌍화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쌍화점\'은 독립원가였던 \'삼장\'이 모태가 되어 형성된 민요로서 다른 3개 연은 \'삼장\'의 형식구조에 맞게 맞추어 읊어진 나열식 가요이며, 그 창작시기는 \'삼장\'의 형성 이후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연마다 생성된 시기는 다르다.
\'쌍화점\' 1·3·4연의 내용은 충렬왕대와는 거리가 생기며 행위 추체격인 회회아비가 만두집을 개설한 시기가 고려 후기이며, \'쌍화\'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충혜왕 4년에야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쌍화점\'은 민요 \'삼장\'이 유행되던 당시의 시대상이 배경이 되어 4연 형식의 연장체 가요로 일반 민중에 의해서 확대 발전하면서 형성된 가요라 할 수 있다.
쌍화점 2연
三藏寺애 블 혀라 가고신딪
그뎔 社主ㅣ 내손모글 주여이다
이말싶미 이 뎔밧긔 나명들명
다로러거디러
죠교맛간 삿기上座ㅣ 네 마리라 호리라
더러둥셩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긔 자리예 나도 자라 가리라
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긔잔딪까티 아거츠니 업다
\'삼장\'은 창작가요인데도 \'제\'자를 쓰지 않았다. \'제\'->짓다
(\'고려사절요\' 권 21 충렬왕 14년 4월조)
이데 덧붙이자면 충선왕이 원에 머물다가 고려로 돌아오자 풍악을 베풀고 학생들이 가요를 올렸다는 기록에는 \'제\'를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있던 가요를 단순히 가져다가 올렸기 때문이다.
(\'고려사절요\' 권23 충선왕 5년 6월조)
이처럼 새로운 가요를 창작할 적에는\'제\'를 분명히 사용했음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새로운
가요에는 \'신곡\'이란 말로 표현했으며, 기존의 노래는 \'가요(歌謠)\'란 단어로 표기했다. 삼장이 창작가요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더 들자면 \'三藏\'의 국문표기 형식이 교대창 형식이며, 후렴구를 사용했다는 점, 표현양식이 서술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작자 유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추정케 하는 \'삼장\'과는 달리 \'쌍화점\'에는 작자를 추정케 할 자료가 \'삼장\' 관련 문헌 이외는 전혀 없다. \'삼장\'과 \'쌍화점\'의 창작시기가 동일하고, 또 \'삼장\'이 \'쌍화점\'의 발췌한 한역이라면 \'삼장\'의 작자가 바로 \'쌍화점\'의 작자와 같은 차원에서 동일하게 취급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작자 유무의 추정도 어렵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삼장\'에 대한 부대기록을 토대로 할 때 \'삼장\'은 물론, \'쌍화점\'의 확실한 창작연대와 작자를 밝힐 수가 없다. 그러므로 창작시기나 창작자의 고구를 통한 두 작품의 관계 확인의 가능성은 거의 찾을 수 없게 된다.
\'삼자\'과 \'쌍화점\'의 관계확인. \'삼장\'이 독립된 원가로 보는 견해.
-최정여
\'쌍화점\' 제 2연의 三藏사句는 여사 악지에 \'삼장\', \'사룡\'이라 하여 독립된 가요였음을 알 수 있고 또 역가에 있는 가음과 일치된 것으로 보아 타 가요와의 합성물이, 즉 \'쌍화점\'임을 인지할 수 있다.(최정여 \'고려의 속악가사논고\', \'청주대논문집\' 제 4집, 청주대학 1963,P9.그는 또 같은 책 P43에서 \"고려 속악가사는 결국 민요로 형성되었다 하겠으며, 따라서 속악가사 중 동일구 그것들은 \'삼장\'이 독립되어 속악가사로 사용되었듯이 본래 삼국이래 내려오면서 사용되었던 단형이 속악가사로 애창되어 온 것들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민요 중에서 想이 유사한 것을 배열하여 놓으면 \'서경별곡\'....등의 류와 근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소악부 직역시 부분은 독립된 원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정과정\', \'정읍사\', \'만전춘\'도 본래 단형에다 후렴 혹은 합성으로서 악절에 부합시킨 것이 아닐까 한다.\"라는 유사한 주장을 폈다.)
->이러한 논지는 \'삼장\'과 \'쌍화점\'이 지닌 구조적 특성에서 보면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쌍화점이 처음부터 악장으로 전부 사용되었는 데도 \'삼장\' 내용 부분만 편의상 발췌한역하여 \'고려사\' 악지 등에 수록됐다면 그것을 발췌한역한 타당한 동기를 찾거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밝히기는 어렵다. 또 이와 함께 \'악장가사\'의 가요 명칭도 \'쌍화점\'보다는
\'삼장\'으로 명명했어야 하리라 본다. 왜냐하면 편찬 연대로 보아 \'고려사\' 악지가 \'악장가사\'보다 앞서며 또 정사이기 때문이다.
\'고려사\'악지가 역사적 사실에 중점을 두었고 \'악장가사\'가 편찬 당시의 내용과 명칭을 중히 여겼다면, \'고려사\'악지와 \'고려사절요\'등의 기록은 고려의 시대성과 사서로서의 최소한의 조건을 고려하여 처음 사용된 당시의 가요 \'삼장\'만을 한역하여 기록했을 것이고, 이와 달리 \'악장가사\'에는 편찬 때 악장으로 사용된 가요 내용 전부와 그 실상을 그대로 악보에 실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최동원
\'정석가\'의 끝 연이 꼭 같은 가사로 되어 있다는 점은 혹시 이 부분이 당시에 유포되어 있던 독립된 노래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면서 속가 중 \'쌍화점\', \'서경별곡\', \'만전춘\'등 가사 현전 작품의 직역부분은 독립된 원가일 가능성이 짙다고 보았다.(최동원, \'고려속요의 향유계층과 그 성격\', \'고려시대의 가요문학\',새문사,1992, p2-98)
->\'고려사\' 악지에 해시(解時)되어 실려 있는 \'삼장\'은 \'쌍화점\'의 제 2연과 같지만 당시에 널리 불려지던 독립된 노래일 가능성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삼장\'은 \'쌍화점\'의 일부 한역이 아니고 독립된 원가의 한역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삼장\'이 독립원가라면 지금까지 논의되어진 바와 같이 두 작품의 창작시기와 창작자는 불확실하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삼장\'이 원래는 민요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민요는 그 창작시기의 불확실성가 창작자의 확인이 어려운 것이 그 특징이기 때문이다.
사회·역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삼장\'은 민간전승 민요였지만, 뒤에 상승문화재의 한 형태로 궁중악이 된 것이라 본다. 그래서 \'고려사\'악지에 기록으로 남겨졌으나 그 근원이 민요였기 때문에 확실한 창작시기와 창작자가 남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민요였던 삼장은 궁중악으로 승화되었지만 민간에서 구비전승되는 이원전승체계를 유지했다.
결국 속가 \'삼장\'의 내용에 다른 내용이 합쳐지면서 이것이 현전의 \'쌍화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쌍화점\'은 독립원가였던 \'삼장\'이 모태가 되어 형성된 민요로서 다른 3개 연은 \'삼장\'의 형식구조에 맞게 맞추어 읊어진 나열식 가요이며, 그 창작시기는 \'삼장\'의 형성 이후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연마다 생성된 시기는 다르다.
\'쌍화점\' 1·3·4연의 내용은 충렬왕대와는 거리가 생기며 행위 추체격인 회회아비가 만두집을 개설한 시기가 고려 후기이며, \'쌍화\'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충혜왕 4년에야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쌍화점\'은 민요 \'삼장\'이 유행되던 당시의 시대상이 배경이 되어 4연 형식의 연장체 가요로 일반 민중에 의해서 확대 발전하면서 형성된 가요라 할 수 있다.
쌍화점 2연
三藏寺애 블 혀라 가고신딪
그뎔 社主ㅣ 내손모글 주여이다
이말싶미 이 뎔밧긔 나명들명
다로러거디러
죠교맛간 삿기上座ㅣ 네 마리라 호리라
더러둥셩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긔 자리예 나도 자라 가리라
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긔잔딪까티 아거츠니 업다
추천자료
 진화론적 인식론 대 초월론적 인식론
진화론적 인식론 대 초월론적 인식론 현대 교회와 평신도
현대 교회와 평신도 정철 윤선도
정철 윤선도 벤처기업 [사회과학]
벤처기업 [사회과학]  [분석/조사] 한국의 음식 문화
[분석/조사] 한국의 음식 문화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 2010년 1학기 한국현대문학의 이해와 감상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0년 1학기 한국현대문학의 이해와 감상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신약 정경론
신약 정경론 2012년 1학기 한국현대문학의 이해와 감상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2년 1학기 한국현대문학의 이해와 감상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공통수학 방정식과 부등식
공통수학 방정식과 부등식 건축공학,볼트의 종류에 따른 구조적 특성,배럴 볼트 (barrel vault=tunnel vault),교차 볼트...
건축공학,볼트의 종류에 따른 구조적 특성,배럴 볼트 (barrel vault=tunnel vault),교차 볼트... 2013년 1학기 한국현대문학의 이해와 감상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3년 1학기 한국현대문학의 이해와 감상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한국전통음식의 개요 (전통음식 정의. 한국전통음식 특징, 우수성, 종류, 한국전통음식의 상...
한국전통음식의 개요 (전통음식 정의. 한국전통음식 특징, 우수성, 종류, 한국전통음식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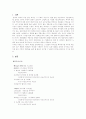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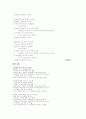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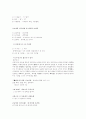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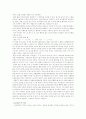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