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었다
송진마저 말라버린 몸통을 보면
뿌리가 아플 때도 되었는데
너의 고달픔 짐작도 못 하고 회원들은
시멘트로 밑둥을 싸 바르로
주사까지 놓으면서
그냥 서 있으라고 한다
아무리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도
늙음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
오래간만에 털썩 주저앉아 너도
한 번 쉬고 싶을 것이다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기에
몇백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너의 졸음을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백여 년 동안 뜨고 있던
푸른 눈을 감으며
끝내 서서 잠드는구나
가지마다 붉게 시드는
늙은 소나무
- 김광규, <늙은 소나무>
우리는 자연에서 태어났고 죽어서는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간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연과 인간을 마치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고 공존하기는커녕 자연을 정복한다고 말하고 또 무자비하게 자연을 파괴해왔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는 늘 “그냥 서 있으라고 한다”. 인간의 또 다른 이기심이다. “시멘트로 밑둥을 싸 바르고/ 주사를”놓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위선이다.
다음으로 생명의 존귀함을 노래함으로써 생명보존의 필요성을 노래해 보여주고 있는 시다.
한 마리의 새가
공중을 높이 날기 위해서는
바람 속에 부대끼며 뿌려야 할
수많은 열량들이 가슴속에
늘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보라, 나뭇가지 위에 앉은 새들은
노래로써 그들의 평화를 구가하지만
그 조그만 몸의 내부의 장기들은
모터처럼 계속 움직이면서
순간의 비상 이륙을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오 하얀 달걀처럼 따스한 네 몸이
품어야 하는
깃털 속의 슬픈 두근거림이여.
- 이수익, <새>
하늘을 날고 있는 작은 새를 바라보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렇게 일상적인 현상도, 생명에 대한 애정의 마음으로다가 가 미시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 생명의 준열함과 진지함이 구체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새의 비상을 기계적 메커니즘만으로 규명하려는 사람에게 위의 시는 상식의 차원을 벗어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새의 비상을 신비로운 생명현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에겐 눈이 밝아오는 발견의 세계, 신비로움과 외경의 세계를 만나게 해 줄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생태 환경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감에 따라 생태환경시 역시 다양한 면모를 보이면서 주요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달은 지구 생태계를 파괴시켜 인간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윤리 도덕의 상실은 인간의 정신 생태계를 파괴시켜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 시에 등장하기 시작한 생태 환경시는 이런 현실인식과 시대적 소명에서 촉발된 것이라 할 것이다. 환경 오염과 생태 파괴가 곧바로 지상의 섭리와 질서를 부정함으로써 생명 자체가 부정되는 현실은 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지금, 한국시에 등장하기 시작한 ‘생태 환경시’들은 오염되고 파괴되어가는 생태와 환경 속에서 생명을 지켜가려는 노력들을 해오고 있다.
한국의 생태환경시는 주로 환경 오염 문제를 제재로 하고 있는데, 환경 파괴, 환경 오염 등을 제재로 하고 있는 시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환경 오염으로 인한 산성비, 수질 오염, 대기 오염 문제 등을 다룬 시들이 많다. 그리고, 이들 시편들은 환경 문제의 구체적 세부를 투시함으로써 인식에 도달하고자 한다. 한국 생태환경시는 극복해야할 심각한 위기의 현실로 생태 환경의 문제를 상정함으로써, 한국시의 상상력과 감수성의 진폭을 확충해가고 있다.
그러나, 환경 사고나 핵 문제, 생태문제 등 수 많은 생태 환경의 현실이 산적되어 있다. 생태 환경 문제는 한국시가 수용해가야 할 방대한 미개척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송진마저 말라버린 몸통을 보면
뿌리가 아플 때도 되었는데
너의 고달픔 짐작도 못 하고 회원들은
시멘트로 밑둥을 싸 바르로
주사까지 놓으면서
그냥 서 있으라고 한다
아무리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도
늙음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
오래간만에 털썩 주저앉아 너도
한 번 쉬고 싶을 것이다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기에
몇백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너의 졸음을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백여 년 동안 뜨고 있던
푸른 눈을 감으며
끝내 서서 잠드는구나
가지마다 붉게 시드는
늙은 소나무
- 김광규, <늙은 소나무>
우리는 자연에서 태어났고 죽어서는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간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연과 인간을 마치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고 공존하기는커녕 자연을 정복한다고 말하고 또 무자비하게 자연을 파괴해왔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는 늘 “그냥 서 있으라고 한다”. 인간의 또 다른 이기심이다. “시멘트로 밑둥을 싸 바르고/ 주사를”놓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위선이다.
다음으로 생명의 존귀함을 노래함으로써 생명보존의 필요성을 노래해 보여주고 있는 시다.
한 마리의 새가
공중을 높이 날기 위해서는
바람 속에 부대끼며 뿌려야 할
수많은 열량들이 가슴속에
늘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보라, 나뭇가지 위에 앉은 새들은
노래로써 그들의 평화를 구가하지만
그 조그만 몸의 내부의 장기들은
모터처럼 계속 움직이면서
순간의 비상 이륙을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오 하얀 달걀처럼 따스한 네 몸이
품어야 하는
깃털 속의 슬픈 두근거림이여.
- 이수익, <새>
하늘을 날고 있는 작은 새를 바라보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렇게 일상적인 현상도, 생명에 대한 애정의 마음으로다가 가 미시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 생명의 준열함과 진지함이 구체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새의 비상을 기계적 메커니즘만으로 규명하려는 사람에게 위의 시는 상식의 차원을 벗어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새의 비상을 신비로운 생명현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에겐 눈이 밝아오는 발견의 세계, 신비로움과 외경의 세계를 만나게 해 줄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생태 환경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감에 따라 생태환경시 역시 다양한 면모를 보이면서 주요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달은 지구 생태계를 파괴시켜 인간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윤리 도덕의 상실은 인간의 정신 생태계를 파괴시켜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 시에 등장하기 시작한 생태 환경시는 이런 현실인식과 시대적 소명에서 촉발된 것이라 할 것이다. 환경 오염과 생태 파괴가 곧바로 지상의 섭리와 질서를 부정함으로써 생명 자체가 부정되는 현실은 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지금, 한국시에 등장하기 시작한 ‘생태 환경시’들은 오염되고 파괴되어가는 생태와 환경 속에서 생명을 지켜가려는 노력들을 해오고 있다.
한국의 생태환경시는 주로 환경 오염 문제를 제재로 하고 있는데, 환경 파괴, 환경 오염 등을 제재로 하고 있는 시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환경 오염으로 인한 산성비, 수질 오염, 대기 오염 문제 등을 다룬 시들이 많다. 그리고, 이들 시편들은 환경 문제의 구체적 세부를 투시함으로써 인식에 도달하고자 한다. 한국 생태환경시는 극복해야할 심각한 위기의 현실로 생태 환경의 문제를 상정함으로써, 한국시의 상상력과 감수성의 진폭을 확충해가고 있다.
그러나, 환경 사고나 핵 문제, 생태문제 등 수 많은 생태 환경의 현실이 산적되어 있다. 생태 환경 문제는 한국시가 수용해가야 할 방대한 미개척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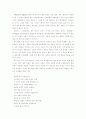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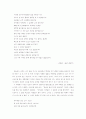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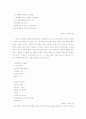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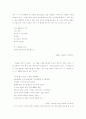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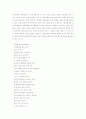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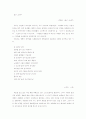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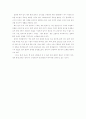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