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향가의 장르 규정 및 발생 요인
3.향가의 전개 과정 및 성격
4.향가의 쇠퇴 및 시가사적 위치-결론을 대신하여
2.향가의 장르 규정 및 발생 요인
3.향가의 전개 과정 및 성격
4.향가의 쇠퇴 및 시가사적 위치-결론을 대신하여
본문내용
가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특징은 노래를 어떤 힘을 가진 존재로 파악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노래를 통해 내면의 강한 열망을 토로하고 표출하며 그것의 실현을 갈구했다는 점이다. 향유층은 전 계층에 두루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창작층은 좀 달랐을 것이다. 귀족 계층에 한정되어 창작되지는 않았을 터이나 정형성을 갖추고 있었고, 노래 자체를 숭앙의 대상으로 여긴 것으로 보아 누구나 쉽게 창작하고 불렀던 형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상의 문제로 들어가 보면, 개인적인 소망의 표출, 또는 풍월도 사상, 불교 사상 등이 두루 내포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가의 전반적 성격 논의에 있어 신앙성과 문학성을 이분화시키지 말고, 그 상관관계를 잘 살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향가를 현대의 문학적 관점이 아니라, 당대의 실상에 따라 서정시화의 초기적 과정 그 나름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관점
) 김종규, 위의 책, 244쪽.
이 필요함을 말한다. 김종규가 제시한 다음의 도표
) 도표와 이에 대한 설명은 김종규의 논의를 따른 것임.
를 통해 생각해 보면, 향가 장르가 가지는 특성에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A
O
B
무속가에서 현저하게 큰 비중을 차지한 신앙적 영험력을 추구하는 내용적 측면은 A에서 비롯되어 갈수록 점차 약화되다가 교차점 O를 지나서 서정시가의 수준에 오면 향가의 신앙성이라는 내용적 측면을 형성하는 주축을 이루며 강하한다. 상대적으로 무속가에서 미미한 비중을 보인 표현적 측면은 B에서 출발하여 강화되다가 O를 지나서 서정시가의 수준에 오면 향가의 시적 표현을 위주로 한 형식적 측면을 형성하는 주축을 이루며 상승하는 것이다. 향가는 서정시임에도 불구하고 교차점 O를 통과한 지 얼마되지 않는 원형적 성향의 서정시가이기 때문에 작품의 해석에 양면성이 나타나는 등 難點을 지닌다.
4. 향가의 쇠퇴와 시가사적 위치-결론을 대신하여
향가의 쇠퇴 시기는 <한림별곡>이 출현하던 고종(1213-1259) 이후부터 충렬왕 시대로 보볼 수 있다.
) 김정주, 위의 책, 79쪽.
그 이유는 \"天下一家 翰墨同文 胡彼此之有間\"
) 崔滋, 『補閑集』券中 \"천하가 한 집안이라 글쓰기는 같은 글로 쓰는데 어찌 피차에 간격을 두겠는가\"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최자의 『보한집』이 1254년에 완성되었으며, 고려시대 진각국사 혜심(1178-1234)이 남긴 『무의자집』에 실려 있는 <기사뇌가>가 바로 이 때 나왔고,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1206-1289)의 생년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유사』이후에는 향찰에 의해 기록된 문헌이 없다. 또 일연은 난해한 어구에 모두 주를 달아 이해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향가에 대해서는 단 한군데에 주를 달았을 뿐이다.
) 『삼국유사』권5, 광덕엄장조. 惱叱古音(鄕言云報言也)
이는 고려 충렬왕 시대까지 향찰이 널리 사용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김종규는 향가가 쇠퇴한 외적 요인으로 신문왕 시대에 국자감이 설치된 이래, 신라 하대로 내려올수록 한문문학이 일반화된 것에서 찾는다. 한문문학의 일반화에 따라 향가 담당층의 이탈 현상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향가가 소외되어 가는 형국이 전개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김정주는 향가문학이 고려에 와서 쇠퇴하게 된 원인의 첫번째로 향찰을 상층민들은 비속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두 번째는 한시의 성행과 그 영향 때문이라고 보았다. 우수한 향가 문학이 고려 중기로 접어들면서 \"天下一家 翰墨同文 胡彼此之有間\"이라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점차 한문 문화권으로 흡수 동화되어 존재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중, 첫 번째는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향가의 창작과 향유가 노래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기록의 유무에 관계없이 성행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라 때의 향가는 \'삼대목\'이라는 책으로 묶어냈으므로 기록물로 당시에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려초기에도 향가가 성행했는데, 이들 향가가 모두 기록물로 정착되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향가가 기록을 전제로 하여 불리어진 것도 아니다. 따라서 향찰 표기를 비속하다고 여겨 작품이 생산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시의 성행 및 한문 문화권으로의 동화는 향가 쇠퇴의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한편, 시의 내적인 측면에 주목한 김종규의 논의도 주목된다. 그는 <모죽지랑가> 이후 <제망매가>와 <찬기파랑가>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서정성을 지닌 향가의 시적 표현의 수준이 <안민가>이후 후대 향가로 갈수록 저하되어 감을 살피고, 후기로 갈수록 \'향가 형태의 파격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 김종규, 위의 책, 245-246쪽. <안민가>에서는 그 상하 주체관계가 \'하향식 주체관계\' 및 \'중개역의 화자화\'라는 변화를 보였다. <도천수대비가>에서는 \'주체 제시의 장간 혼효\', <우적가>와 <처용가>에서는 \'상하주체의 위상 전도\'와 \'상위주체의 화자화\'라는 변화가 나타났다.
\'향가 형태의 파격화\'는 향가의 형태적 제약을 탈피하고 보다 새로운 서정시의 장르를 지향할 여지를 내포한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새로운 서정시 지향의 형태 파격화에 상응하는 시적 표현의 발달이 동반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모순이 향가 쇠퇴의 내적 요인인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형태의 발전과 표현의 정체라는 양자간의 모순이 새로운 서정시의 장르 창출을 통해 돌파해 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 김종규, 위의 책, 246쪽.
우리 시가사에 있어서 향가가 차지하는 의의는 첫째, 하나의 장르 체계가 처음으로 정립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후대인들이 연구에 의해 한 체계로 묶은 것이 아니라 당대인들의 분명한 인식 하에 정립된 최초의 시가 장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둘째, 전대의 의식가나 무속가적 특징과 서정시로서의 특징이 내면적으로 혼효된 양상을 보여주어 한 장르이면서도 선조들의 시에 대한 의식의 흐름을 살필 수 있다. 셋째, 우리말에 대한 자부심과 언어에 대한 문학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히도록 함으로써 후대의 서정시 발달에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마지막으로, 향가의 전반적 성격 논의에 있어 신앙성과 문학성을 이분화시키지 말고, 그 상관관계를 잘 살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향가를 현대의 문학적 관점이 아니라, 당대의 실상에 따라 서정시화의 초기적 과정 그 나름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관점
) 김종규, 위의 책, 244쪽.
이 필요함을 말한다. 김종규가 제시한 다음의 도표
) 도표와 이에 대한 설명은 김종규의 논의를 따른 것임.
를 통해 생각해 보면, 향가 장르가 가지는 특성에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A
O
B
무속가에서 현저하게 큰 비중을 차지한 신앙적 영험력을 추구하는 내용적 측면은 A에서 비롯되어 갈수록 점차 약화되다가 교차점 O를 지나서 서정시가의 수준에 오면 향가의 신앙성이라는 내용적 측면을 형성하는 주축을 이루며 강하한다. 상대적으로 무속가에서 미미한 비중을 보인 표현적 측면은 B에서 출발하여 강화되다가 O를 지나서 서정시가의 수준에 오면 향가의 시적 표현을 위주로 한 형식적 측면을 형성하는 주축을 이루며 상승하는 것이다. 향가는 서정시임에도 불구하고 교차점 O를 통과한 지 얼마되지 않는 원형적 성향의 서정시가이기 때문에 작품의 해석에 양면성이 나타나는 등 難點을 지닌다.
4. 향가의 쇠퇴와 시가사적 위치-결론을 대신하여
향가의 쇠퇴 시기는 <한림별곡>이 출현하던 고종(1213-1259) 이후부터 충렬왕 시대로 보볼 수 있다.
) 김정주, 위의 책, 79쪽.
그 이유는 \"天下一家 翰墨同文 胡彼此之有間\"
) 崔滋, 『補閑集』券中 \"천하가 한 집안이라 글쓰기는 같은 글로 쓰는데 어찌 피차에 간격을 두겠는가\"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최자의 『보한집』이 1254년에 완성되었으며, 고려시대 진각국사 혜심(1178-1234)이 남긴 『무의자집』에 실려 있는 <기사뇌가>가 바로 이 때 나왔고,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1206-1289)의 생년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유사』이후에는 향찰에 의해 기록된 문헌이 없다. 또 일연은 난해한 어구에 모두 주를 달아 이해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향가에 대해서는 단 한군데에 주를 달았을 뿐이다.
) 『삼국유사』권5, 광덕엄장조. 惱叱古音(鄕言云報言也)
이는 고려 충렬왕 시대까지 향찰이 널리 사용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김종규는 향가가 쇠퇴한 외적 요인으로 신문왕 시대에 국자감이 설치된 이래, 신라 하대로 내려올수록 한문문학이 일반화된 것에서 찾는다. 한문문학의 일반화에 따라 향가 담당층의 이탈 현상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향가가 소외되어 가는 형국이 전개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김정주는 향가문학이 고려에 와서 쇠퇴하게 된 원인의 첫번째로 향찰을 상층민들은 비속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두 번째는 한시의 성행과 그 영향 때문이라고 보았다. 우수한 향가 문학이 고려 중기로 접어들면서 \"天下一家 翰墨同文 胡彼此之有間\"이라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점차 한문 문화권으로 흡수 동화되어 존재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중, 첫 번째는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향가의 창작과 향유가 노래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기록의 유무에 관계없이 성행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라 때의 향가는 \'삼대목\'이라는 책으로 묶어냈으므로 기록물로 당시에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려초기에도 향가가 성행했는데, 이들 향가가 모두 기록물로 정착되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향가가 기록을 전제로 하여 불리어진 것도 아니다. 따라서 향찰 표기를 비속하다고 여겨 작품이 생산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시의 성행 및 한문 문화권으로의 동화는 향가 쇠퇴의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한편, 시의 내적인 측면에 주목한 김종규의 논의도 주목된다. 그는 <모죽지랑가> 이후 <제망매가>와 <찬기파랑가>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서정성을 지닌 향가의 시적 표현의 수준이 <안민가>이후 후대 향가로 갈수록 저하되어 감을 살피고, 후기로 갈수록 \'향가 형태의 파격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 김종규, 위의 책, 245-246쪽. <안민가>에서는 그 상하 주체관계가 \'하향식 주체관계\' 및 \'중개역의 화자화\'라는 변화를 보였다. <도천수대비가>에서는 \'주체 제시의 장간 혼효\', <우적가>와 <처용가>에서는 \'상하주체의 위상 전도\'와 \'상위주체의 화자화\'라는 변화가 나타났다.
\'향가 형태의 파격화\'는 향가의 형태적 제약을 탈피하고 보다 새로운 서정시의 장르를 지향할 여지를 내포한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새로운 서정시 지향의 형태 파격화에 상응하는 시적 표현의 발달이 동반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모순이 향가 쇠퇴의 내적 요인인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형태의 발전과 표현의 정체라는 양자간의 모순이 새로운 서정시의 장르 창출을 통해 돌파해 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 김종규, 위의 책, 246쪽.
우리 시가사에 있어서 향가가 차지하는 의의는 첫째, 하나의 장르 체계가 처음으로 정립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후대인들이 연구에 의해 한 체계로 묶은 것이 아니라 당대인들의 분명한 인식 하에 정립된 최초의 시가 장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둘째, 전대의 의식가나 무속가적 특징과 서정시로서의 특징이 내면적으로 혼효된 양상을 보여주어 한 장르이면서도 선조들의 시에 대한 의식의 흐름을 살필 수 있다. 셋째, 우리말에 대한 자부심과 언어에 대한 문학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히도록 함으로써 후대의 서정시 발달에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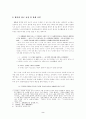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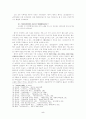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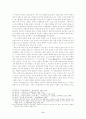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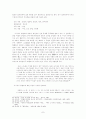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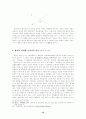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