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김일성 사후 북한−중국 관계 평가
1. 김정일 권력승계에 대한 중국의 선도적지지
2. 외교적 공조관계 과시와 변화 징후
3. 대북한 경제적 지원의 지속
4. 북중군사동맹조약의 유지
Ⅲ. 북한의 대중국 체제유지 정책 변화전망
1. 정치체제의 유사성 확보
2. 미중마찰의 적극 활용
3. 경제적 의존심화와 자율성 확보의 조화
Ⅳ. 결 론
Ⅱ. 김일성 사후 북한−중국 관계 평가
1. 김정일 권력승계에 대한 중국의 선도적지지
2. 외교적 공조관계 과시와 변화 징후
3. 대북한 경제적 지원의 지속
4. 북중군사동맹조약의 유지
Ⅲ. 북한의 대중국 체제유지 정책 변화전망
1. 정치체제의 유사성 확보
2. 미중마찰의 적극 활용
3. 경제적 의존심화와 자율성 확보의 조화
Ⅳ. 결 론
본문내용
524,780
541,107
610,450
696,570
일 본
283,54
257,393
223,993
222,894
507,567
480,287
C I S
171,018
65,200
193,725
227,100
364,743
292,300
이 란
100,000
120,000
115,000
140,000
220,000
260,000
홍 콩
39,800
48,622
124,300
106,988
164,100
155,610
독 일
72,008
87,160
48,050
52,803
120,058
139,963
출처 대한무역진흥공사, \'9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1993, p. 13.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탈냉전이후 중국은 북한의 최대교역대상국이고 북한의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1년의 23.6%에서 1992년에는 28.2%로 증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대중국 경제적 의존을 탈피하기 위하여 경제적 차원에서 두 가지 체제유지정책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 첫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형태의 경제관계를 최대한 연장하는 정책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마찰을 이용하여 냉전시대 중국의 대북한 지원관행을 유지하는 것이다. 중미마찰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95년 7월 중국 천진 동북아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대북한 식량 및 유류지원\'문제와 관련하여 \"식량공급방식은 전체의 1/3은 무상, 1/3은 우대가격, 1/3은 유상으로 달러결제하고, 유류지원방식은 92년 이후 파이프 라인 공급을 중단하고 경화결제를 요구했으나 능력부족으로 소량의 구상무역 형식으로 지원\"할 것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이러한 정책이 중국측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둘째, 일본 및 미국과 수교협상으로 유입될 외자를 담보로 중국측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북한경제에 대한 중국의 선점적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중국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체제유지정책은 미중마찰이 심화되는 문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Ⅳ. 결 론
김일성 사망 이후 1년여가 지난 싯점에서 북한의 체제유지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할때 김일성 사망이전 보다 크게 나빠진 것이 없다고 평가된다. 대내적으로 김일성의 사망 이후 우려되었던 권력투쟁과 같은 국내정치의 불안정이 아직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핵카드를 활용한 대서방 모험외교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둠으로써 거의 50억 달러에 달하는 경수로 핵발전소 건설을 보장받았으며 북미수교, 북일수교문제를 진일보시킴으로써 서방자본을 통한 경제난 극복에 대한 기대를 증가시켰다. 남북관계에서도 한미간의 특수한 관계와 한국국민의 민족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정치적 위상의 손상없이 식량을 지원 받는 등 주도권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대외정책에서는 러시아와의 군사적 동맹관계를 연장하지 못한 손실이외에 크게 나빠진 것이 없다. 94년 10월 21일 미국 북한간 합의를 통하여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하는데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우리측에 의한 흡수통일에 대한 위기감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체제유지환경이 다소 유리한 국면으로 반전된데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역할이 컷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등 서방측이 북한의 핵카드에 군사적제제를 포함한 강제적 제재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중국이라는 동맹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많은 동북아안보전문가들은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중국간 마찰심화가 장기화되는 것을 예외로 한다면 탈냉전이후 진행되어온 양국관계 변화추세가 북중관계를 규정해 나갈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향후 북한의 대중정책은 과도기에 있는 양국의 체제정비방향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김일성 사후 정비중인 북한체제가 노동당 일당지배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은 가운데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중국이 \'정치반우, 경제반좌\'의 원칙속에 신권위주의를 지향한다면 단기적으로 화평연변에 공동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정치군사적 유대가 일정기간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개혁속도가 빨라진다면 북한의 대중생존외교는 상당한 곤경에 처할 것이다. 역으로 중국이 등소평 사후에 보수파가 집권한다면 북한과 중국은 미국을 공동으로 경계하는 인식의 공감대속에 상당기간 우호관계를 회복, 유지할 것이다. 북한의 중장기 대중국 체제유지외교는 중국의 국내정치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관계의 개선, 한중관계의 발전 추이를 지켜볼때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냉전시대, 중소분쟁기간만큼의 수준으로 제고되는 것을 거의 기대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심화는 북한의 체제유지환경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훼손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제유지를 위하여 북한의 신체제는 다음 몇가지 방향으로 대중국정책을 이끌어 나가려 할 것이다.
첫째, 체제의 유사성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체제의 이질성 심화가 북 중관계 유지를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중국과 체제의 유사성을 증대하는 가시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중국이 권유하는 개혁·개방을 적극 수용할 가능성이 많다.
둘째, 중국의 세계전략에 적극 동조할 것이다. 단극적 세계질서 형성을 경계하는 가운데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동북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국가전략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동북아지역의 다자안보협의체 구성, 군비축소회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셋째,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심화를 탈피하기 위한 외교적 대비를 강화할 것이다. 중국이 경제적 현실주의를 원칙으로 북한에게 강요하는 환경을 구조적으로 탈피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등 서방에 대한 경제·외교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넷째, 미중마찰을 장기화할 경우, 미국과 중국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중소분쟁시기에 축적된 외교적 기교를 활용하여 미국 중국간 마찰을 활용하여 중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다.
541,107
610,450
696,570
일 본
283,54
257,393
223,993
222,894
507,567
480,287
C I S
171,018
65,200
193,725
227,100
364,743
292,300
이 란
100,000
120,000
115,000
140,000
220,000
260,000
홍 콩
39,800
48,622
124,300
106,988
164,100
155,610
독 일
72,008
87,160
48,050
52,803
120,058
139,963
출처 대한무역진흥공사, \'9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1993, p. 13.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탈냉전이후 중국은 북한의 최대교역대상국이고 북한의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1년의 23.6%에서 1992년에는 28.2%로 증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대중국 경제적 의존을 탈피하기 위하여 경제적 차원에서 두 가지 체제유지정책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 첫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형태의 경제관계를 최대한 연장하는 정책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마찰을 이용하여 냉전시대 중국의 대북한 지원관행을 유지하는 것이다. 중미마찰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95년 7월 중국 천진 동북아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대북한 식량 및 유류지원\'문제와 관련하여 \"식량공급방식은 전체의 1/3은 무상, 1/3은 우대가격, 1/3은 유상으로 달러결제하고, 유류지원방식은 92년 이후 파이프 라인 공급을 중단하고 경화결제를 요구했으나 능력부족으로 소량의 구상무역 형식으로 지원\"할 것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이러한 정책이 중국측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둘째, 일본 및 미국과 수교협상으로 유입될 외자를 담보로 중국측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북한경제에 대한 중국의 선점적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중국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체제유지정책은 미중마찰이 심화되는 문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Ⅳ. 결 론
김일성 사망 이후 1년여가 지난 싯점에서 북한의 체제유지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할때 김일성 사망이전 보다 크게 나빠진 것이 없다고 평가된다. 대내적으로 김일성의 사망 이후 우려되었던 권력투쟁과 같은 국내정치의 불안정이 아직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핵카드를 활용한 대서방 모험외교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둠으로써 거의 50억 달러에 달하는 경수로 핵발전소 건설을 보장받았으며 북미수교, 북일수교문제를 진일보시킴으로써 서방자본을 통한 경제난 극복에 대한 기대를 증가시켰다. 남북관계에서도 한미간의 특수한 관계와 한국국민의 민족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정치적 위상의 손상없이 식량을 지원 받는 등 주도권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대외정책에서는 러시아와의 군사적 동맹관계를 연장하지 못한 손실이외에 크게 나빠진 것이 없다. 94년 10월 21일 미국 북한간 합의를 통하여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하는데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우리측에 의한 흡수통일에 대한 위기감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체제유지환경이 다소 유리한 국면으로 반전된데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역할이 컷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등 서방측이 북한의 핵카드에 군사적제제를 포함한 강제적 제재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중국이라는 동맹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많은 동북아안보전문가들은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중국간 마찰심화가 장기화되는 것을 예외로 한다면 탈냉전이후 진행되어온 양국관계 변화추세가 북중관계를 규정해 나갈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향후 북한의 대중정책은 과도기에 있는 양국의 체제정비방향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김일성 사후 정비중인 북한체제가 노동당 일당지배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은 가운데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중국이 \'정치반우, 경제반좌\'의 원칙속에 신권위주의를 지향한다면 단기적으로 화평연변에 공동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정치군사적 유대가 일정기간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개혁속도가 빨라진다면 북한의 대중생존외교는 상당한 곤경에 처할 것이다. 역으로 중국이 등소평 사후에 보수파가 집권한다면 북한과 중국은 미국을 공동으로 경계하는 인식의 공감대속에 상당기간 우호관계를 회복, 유지할 것이다. 북한의 중장기 대중국 체제유지외교는 중국의 국내정치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관계의 개선, 한중관계의 발전 추이를 지켜볼때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냉전시대, 중소분쟁기간만큼의 수준으로 제고되는 것을 거의 기대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심화는 북한의 체제유지환경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훼손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제유지를 위하여 북한의 신체제는 다음 몇가지 방향으로 대중국정책을 이끌어 나가려 할 것이다.
첫째, 체제의 유사성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체제의 이질성 심화가 북 중관계 유지를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중국과 체제의 유사성을 증대하는 가시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중국이 권유하는 개혁·개방을 적극 수용할 가능성이 많다.
둘째, 중국의 세계전략에 적극 동조할 것이다. 단극적 세계질서 형성을 경계하는 가운데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동북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국가전략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동북아지역의 다자안보협의체 구성, 군비축소회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셋째,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심화를 탈피하기 위한 외교적 대비를 강화할 것이다. 중국이 경제적 현실주의를 원칙으로 북한에게 강요하는 환경을 구조적으로 탈피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등 서방에 대한 경제·외교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넷째, 미중마찰을 장기화할 경우, 미국과 중국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중소분쟁시기에 축적된 외교적 기교를 활용하여 미국 중국간 마찰을 활용하여 중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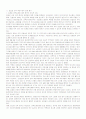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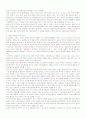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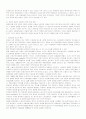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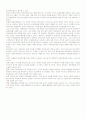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