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침묵과 느림 속에서 긴장감을 유지하는 요소들
2.1. 무대 지시문
2.2. 대사
2.3. 음향
2.4. 이야기
2.5. 몇 가지 장치들
3.결론
2. 본론
침묵과 느림 속에서 긴장감을 유지하는 요소들
2.1. 무대 지시문
2.2. 대사
2.3. 음향
2.4. 이야기
2.5. 몇 가지 장치들
3.결론
본문내용
지 비극적이고 긴장되었던 이야기를 풀어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힘들고 비참한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극속에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추상적 구조의 말과 장수 아기 인형은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이고 비극적이고 리얼한 극속에서 이 인형은 보는 이에게 웃음과 긴장의 해소를 가져 오는 것이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의 마지막에 그려지는 장면이 십장생도라는 것은 그들이 자연으로 회귀했고 우리 현실과는 다른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한의 승화도 마찬가지로 현실의 세계를 떠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의인화 되어 나타나는 짐승들의 모습과 무대에 올라와 있는 \'십장생도의 모든 인물\'은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십장생도의 인물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인물이 되어있는 것은 가족이 넘어간 비탈이 현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또 한 사람 남정네 등성이를 김매면서 넘어온다 놀란 짐승들 처음에는 멍청하게 보고만 있다가 키들키들 웃기 시작하고 마침내 깔깔거리고 손뼉치면서 맞는다 네 사람 서로 마주 보며 끄덕거리며 달내네 네 식구 이번에는 오던 쪽으로 돌아앉아 김을 매면서 비탈을 올라간다 어허 얼씨구 절씨구 나가신다 하늘님이 내리신 탈 받아쓰고 나가신다 독사뱀도 잡아먹고 나가신다 비탈 마루를 넘어갈 때 네 식구 한꺼번에 고개를 돌려 관중들 쪽을 보고 나서 비탈을 천천히 노을 속을 내려가 머리까지 사라진다 짐승들 춤추며 그들을 쫓아 비탈을 넘어간다
이때 무대에는 十長生圖(십장생도)의 모든 인물이 나와있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 최인훈, 앞의 책, 161쪽~162쪽
장수와 생명을 상징하는 십장생도의 세계에서는 할말 하지 못하고 문둥이처럼 살아가고 피하기위해서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춘다. 손뼉도 치고 큰소리고 깔깔거리며 웃는다. 계속 비극적이었던 분위기가 긴장이 풀어지며 웃음의 마당이 된다. 무거웠던 현실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의인화된 동물과 십장생도의 인물들과 한바탕 춤과 노래를 풀어낸다. 계속 되던 무거운 분위기와 슬픈 긴장을 모두 해소시켜 버리는 장면이다. 의인화된 동물과 십장생도의 인물들은 현실에서의 탈출을 상징함과 동시에 관객과 독자에게도 극의 긴장감을 벗어버리고 웃음을 주는 것이다. \'옛날 옛적에 훠어이 훠이\'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와서 모든 비극적 상황을 희극으로 바꾸어 극적 긴장감을 해소시키는 장치인 것이다.
마지막에 등장인물들이 관중들 쪽을 돌아보는 것과 노을 속에서 머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의미 있다. 관중들에게 자신들의 선택을 보여주며 또 다른 선택을 남겨두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독자들과 관객들은 많은 것들 중에 선택을 해야한다. 현실과 이상, 소외 받고 말 못하는 현실 속에서 어떤 이상을 선택하고 어떤 세계를 선택해야 할지 여운을 남겨두는 것이다. 이 작품이 던지는 화두인 것이다. 이 작품은 눈물과 웃음, 긴장과 해소, 그리고 마지막에 독자와 관객에게 던지는 화두까지 단 한가지도 놓치지 않고 있다.
3.결론
최인훈은 대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희곡 장르에서 대사보다 더 많은 침묵과 느린 동작들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낯선 시도는 공연된 연극에 대해 좋은 평을 듣기 힘들었다. 그리고 희곡에서의 그러한 시도조차 좋지 않은 지시문이라는 평을 들었다. 살펴본 두 희곡 작품 모두 긴 지시문과 적은 대사들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지만 그것은 앞선 평처럼 좋지 않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비록 시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지시문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또한 느린 대사와 말더듬이를 등장시켜 극 전체의 흐름이 조금 느린 듯 했지만 그 와중에도 음향과 조명등으로 긴장을 유지했다. 또한 오히려 긴박한 상황에서 그 느림과 침묵은 더욱 긴장을 가중시키는 효과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구전되던 이야기와 설화를 끌어다가 우리 민족의 한과 그 승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부분에서도 여러 장치를 통해 독자와 관객에게 조금 더 강하게 다가서고 있었다.
\'옛날 옛적에 훠어이 훠이\'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용마를 타고 올라가는 장수아기와 부부에게 \'다시는 오지말아 훠어이 훠이\'라고 가락을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그 장면으로 막이 내린다.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를 새 쫓아내듯 \'훠어이 훠이\'라고 부르며 쫓아낸다. 이 작품에서는 \'옛날 옛적에\'가 붙어있지만 과연 오늘날 우리는 메시아가 왔을 때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오늘날은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은 시대일까?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가 핀다. 진달래 산천에 소외받는 이들의 큰 소리로 웃음소리가 퍼질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만들 수 있을까? 불합리한 현실에 안주하고 그것을 한으로 간직하고 살 것인지 용기를 가지고 삶을 선택해 이상향으로 갈지는 자신이 선택하기에 달린 것이다. 지금은 예전보다는 현실에 대항하기가 조금은 쉬워진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최인훈은 보는 이들에게 그것을 묻고 싶었을 지도 모른다.
. . . 옛날 사람들은, \'힘\'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앎\'같은 것은 자기밖에 있어서 자기들은 그것을 맞아들이거나 마다하거나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요. 운명을 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운명은 내적인 것입니까?
內的도 外的도 아닙니다. 우리가 극복한 자연과 일을 내적 운명이라 부르고, 이기지 못한 것을 외적 운명, 또는 그저 운명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기지 못한 자연의 이야기군요.
이기지 못한 우리 마음의 이야기지요.
마음의?
마음은 자연입니다.
무섭고 슬픈 얘깁니다.
그것이 극입니다.
- 최인훈, 1978.5 극단 창고극장 [옛날 옛적에 훠어이 훠이] 공연 팜플렛 가운데서
이 두 작품을 비교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는 동안에 정말 제대로 만들어지기 힘든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다. 칼날을 들고 달리는 바람과 흐느끼는 듯한 바람은 어떻게 다른걸까. 그렇지만 정말 뛰어난 연출가와 배우들을 만나서 상연이 된다면 이 작품은 그야말로 대단한 작품이 될 것이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의 마지막에 그려지는 장면이 십장생도라는 것은 그들이 자연으로 회귀했고 우리 현실과는 다른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한의 승화도 마찬가지로 현실의 세계를 떠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의인화 되어 나타나는 짐승들의 모습과 무대에 올라와 있는 \'십장생도의 모든 인물\'은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십장생도의 인물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인물이 되어있는 것은 가족이 넘어간 비탈이 현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또 한 사람 남정네 등성이를 김매면서 넘어온다 놀란 짐승들 처음에는 멍청하게 보고만 있다가 키들키들 웃기 시작하고 마침내 깔깔거리고 손뼉치면서 맞는다 네 사람 서로 마주 보며 끄덕거리며 달내네 네 식구 이번에는 오던 쪽으로 돌아앉아 김을 매면서 비탈을 올라간다 어허 얼씨구 절씨구 나가신다 하늘님이 내리신 탈 받아쓰고 나가신다 독사뱀도 잡아먹고 나가신다 비탈 마루를 넘어갈 때 네 식구 한꺼번에 고개를 돌려 관중들 쪽을 보고 나서 비탈을 천천히 노을 속을 내려가 머리까지 사라진다 짐승들 춤추며 그들을 쫓아 비탈을 넘어간다
이때 무대에는 十長生圖(십장생도)의 모든 인물이 나와있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 최인훈, 앞의 책, 161쪽~162쪽
장수와 생명을 상징하는 십장생도의 세계에서는 할말 하지 못하고 문둥이처럼 살아가고 피하기위해서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춘다. 손뼉도 치고 큰소리고 깔깔거리며 웃는다. 계속 비극적이었던 분위기가 긴장이 풀어지며 웃음의 마당이 된다. 무거웠던 현실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의인화된 동물과 십장생도의 인물들과 한바탕 춤과 노래를 풀어낸다. 계속 되던 무거운 분위기와 슬픈 긴장을 모두 해소시켜 버리는 장면이다. 의인화된 동물과 십장생도의 인물들은 현실에서의 탈출을 상징함과 동시에 관객과 독자에게도 극의 긴장감을 벗어버리고 웃음을 주는 것이다. \'옛날 옛적에 훠어이 훠이\'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와서 모든 비극적 상황을 희극으로 바꾸어 극적 긴장감을 해소시키는 장치인 것이다.
마지막에 등장인물들이 관중들 쪽을 돌아보는 것과 노을 속에서 머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의미 있다. 관중들에게 자신들의 선택을 보여주며 또 다른 선택을 남겨두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독자들과 관객들은 많은 것들 중에 선택을 해야한다. 현실과 이상, 소외 받고 말 못하는 현실 속에서 어떤 이상을 선택하고 어떤 세계를 선택해야 할지 여운을 남겨두는 것이다. 이 작품이 던지는 화두인 것이다. 이 작품은 눈물과 웃음, 긴장과 해소, 그리고 마지막에 독자와 관객에게 던지는 화두까지 단 한가지도 놓치지 않고 있다.
3.결론
최인훈은 대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희곡 장르에서 대사보다 더 많은 침묵과 느린 동작들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낯선 시도는 공연된 연극에 대해 좋은 평을 듣기 힘들었다. 그리고 희곡에서의 그러한 시도조차 좋지 않은 지시문이라는 평을 들었다. 살펴본 두 희곡 작품 모두 긴 지시문과 적은 대사들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지만 그것은 앞선 평처럼 좋지 않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비록 시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지시문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또한 느린 대사와 말더듬이를 등장시켜 극 전체의 흐름이 조금 느린 듯 했지만 그 와중에도 음향과 조명등으로 긴장을 유지했다. 또한 오히려 긴박한 상황에서 그 느림과 침묵은 더욱 긴장을 가중시키는 효과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구전되던 이야기와 설화를 끌어다가 우리 민족의 한과 그 승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부분에서도 여러 장치를 통해 독자와 관객에게 조금 더 강하게 다가서고 있었다.
\'옛날 옛적에 훠어이 훠이\'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용마를 타고 올라가는 장수아기와 부부에게 \'다시는 오지말아 훠어이 훠이\'라고 가락을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그 장면으로 막이 내린다.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를 새 쫓아내듯 \'훠어이 훠이\'라고 부르며 쫓아낸다. 이 작품에서는 \'옛날 옛적에\'가 붙어있지만 과연 오늘날 우리는 메시아가 왔을 때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오늘날은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은 시대일까?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가 핀다. 진달래 산천에 소외받는 이들의 큰 소리로 웃음소리가 퍼질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만들 수 있을까? 불합리한 현실에 안주하고 그것을 한으로 간직하고 살 것인지 용기를 가지고 삶을 선택해 이상향으로 갈지는 자신이 선택하기에 달린 것이다. 지금은 예전보다는 현실에 대항하기가 조금은 쉬워진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최인훈은 보는 이들에게 그것을 묻고 싶었을 지도 모른다.
. . . 옛날 사람들은, \'힘\'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앎\'같은 것은 자기밖에 있어서 자기들은 그것을 맞아들이거나 마다하거나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요. 운명을 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운명은 내적인 것입니까?
內的도 外的도 아닙니다. 우리가 극복한 자연과 일을 내적 운명이라 부르고, 이기지 못한 것을 외적 운명, 또는 그저 운명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기지 못한 자연의 이야기군요.
이기지 못한 우리 마음의 이야기지요.
마음의?
마음은 자연입니다.
무섭고 슬픈 얘깁니다.
그것이 극입니다.
- 최인훈, 1978.5 극단 창고극장 [옛날 옛적에 훠어이 훠이] 공연 팜플렛 가운데서
이 두 작품을 비교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는 동안에 정말 제대로 만들어지기 힘든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다. 칼날을 들고 달리는 바람과 흐느끼는 듯한 바람은 어떻게 다른걸까. 그렇지만 정말 뛰어난 연출가와 배우들을 만나서 상연이 된다면 이 작품은 그야말로 대단한 작품이 될 것이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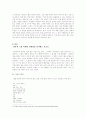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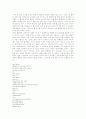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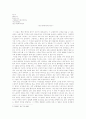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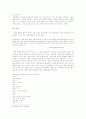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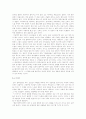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