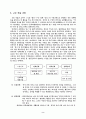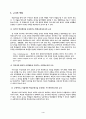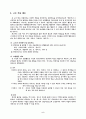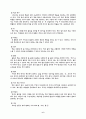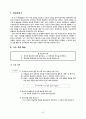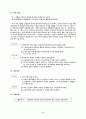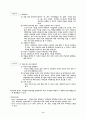목차
1. 교수-학습 목표
2. 교수-학습 대상
3. 교수-학습 과정
4. 교수-학습 방법
5. 교사의 역할
6. 교수-학습 재료
7. 학습분위기
8. 교수-학습 활동
참고자료
2. 교수-학습 대상
3. 교수-학습 과정
4. 교수-학습 방법
5. 교사의 역할
6. 교수-학습 재료
7. 학습분위기
8. 교수-학습 활동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지 덕을 모두 갖추게 되고 신체의 모든 기관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건강해진다고 믿었다고 한다. 한편 오훈채를 준비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고추장에다 파를 찍어 먹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오훈채와 동일한 맛과 색이 포함되기 때문이었다. 파의 뿌리는 희고 줄기는 검으며, 이파리는 푸르고 새로 돋는 순은 노랗다. 그것을 붉은 고추장에 찍어 먹기 때문에 오방색을 모두 갖추게 된다. 또 파의 맛은 맵고 쓰며, 그 순은 달다. 거기에 초고추장을 찍어 먹으면 신맛과 짠맛이 더해져 오미를 모두 갖추게 되는 것이다.
메밀의 경우에도 오색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 그 잎은 파랗고, 꽃은 희고, 줄기는 붉으며, 열매는 검고, 뿌리는 노랗다. 이 때문에 오색을 갖춘 오방지영물(五方之靈物)이라고 하였으며 메밀로 만든 묵을 먹으면 예뻐지고 아들을 낳는 다는 속설이 전해졌다고 한다. 오훈채와 메밀묵처럼 오행의 원리가 적용된 예는 ‘다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다식(茶食)은 예로부터 오색의 아름다운 빛깔로 잔칫상을 장식해 왔으며, 그 색상만으로도 일상의 음식과 충분히 구별되어 무병장수의 기원과 함께 경사스러움을 나타냈다.
다식을 만들 때는 한가지만 만들지 않고 적어도 삼색 이상 마련하여 함께 어울려 담는다. 흰색의 녹말 다식,
분홍색의 오미자 다식, 노란색의 송화 다식, 푸른색의 승검초나 청태다식 그리고 검정 색의 흑임자 다식을 마련하여 오색을 이루게 하고 색상과 함께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게 했다. 한국음식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김치도 오색과 오미를 갖춘 음식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김치는‘백채(白菜)’라고도 했었는데 이는 원래 배추의 흰색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김치는 주재료가 배추의 백색에 배추겉잎이나 파 등의 푸른색이 더해지고 고춧가루의 붉은 색 배추속잎과 생강, 마늘 같은 황색 계열의 색이 더해진다. 그리고 검은 색은 녹각이나 젓갈, 양념류에 의해 더해지며 이로써 오색(五色)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김치는 맛에서도 맵고(辛), 달고(甘), 시고(酸), 짜고(鹹), 쓴(苦) 오미(五味)를 갖추고 있는데, 일단 유산 발효식품으로 독특한 신맛이 있다. 여기에 고추의 매운맛, 양념과 과일 그리고 고추 자체의 단맛, 소금의 짠맛, 여러 가지 채소들의 쓴맛이 어우러져 오행의 조화를 이루고 오묘한 맛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인들은 오색과 오미를 갖춘 음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이상적인 음식으로 생각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색고명
간의 식욕을 자극하는 요소는 시각이 87%이고 미각은 겨우 1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만큼 색상이 음식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음식은 원재료의 색상이 화려하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 열을 가해 익히고, 갈고, 발효시키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식이 선명한 색상을 지니지는 못하였다. 이에 음식을 화려한 색상으로 장식하고, 그 시각적인 효과로 미각을 돋구기 위해 사용된 것이 오색고명이다. 고명의 색상 활용은 인류의 보편적인 음식문화로, 외국의 요리에 곁들여진 녹색의 채소와 원색의 과일들은 한국 음식의 고명과 동일한 목적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음식에서 고명이란 모양과 맛을 더하기 위하여 음식 위에 뿌리거나 얹는 것의 총칭으로 이들의 색상이 대략 다섯 가지 색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색고명'이라는 말을 써왔다. 이때 다섯 가지 색상은 음양오행에서 비롯된 오채(五彩)와 동일하지만 청색만은 야채의 짙은 녹색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이것은 파란색이 식욕을 감퇴시킨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녹색이 '청산(靑山)'의 경우에서처럼 '청(靑)'의 넓은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색 고명 중에서 빨간색과 녹색은 일반적으로 가장 식욕을 자극하는 색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명 자체의 색상이 식욕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이들의 색상이 음식 주재료의 색상과 명도 혹은 채도의 대비를 이루어 음식의 맛을 돋구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단청
단청의 색상은 오방정색과 간색을 주로 하며, 이 색 개념은 앞의 글에서 설명하였듯이 '음양오행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단청은 사신 사상과도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현무도>
볼 때 고구려의 고분벽화 사신도는 가장 오래된 단청의 유래가 된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단청의 배색은 이른바 상록 하단의 원칙으로 광선을 강하게 받는 기둥부분에는 붉은 색을 칠하고, 아래로 향한 추녀나 천장에는 녹청색으로 처리하여 장식의 명도를 높이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단청은 건물의 내외가 모두 선명하고 색조화에 일정한 법칙이 있다. 그리고 색의 계열은 건물의 성격과 단청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2-6색이 있는 데 장단, 삼청, 황, 양록, 육색, 석간주를 기본으로 일정한 규칙에 의해 석간주 다음 색으로부터 한 계열씩 그 색을 줄였다.
계열색 사이에는 백색의 선으로 무늬와 색조를 선명하게 했으며 위에서와 같이 단청의 색은 이색과 보색의 조화로 구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효과적인 색상변화 효과를 주고 있다.
태극
하늘과 땅이 아직 나누어지기 전에 태극에서 음양(陰陽)이 생겼고, 음양의 조화에서 오행(五行)이 생겼다. 세계의 궁극적 근거가 되는 태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동양철학의 핵심이 되는 문제이다. 한국의 태극문양은 유사 이전의 암각화와 고인돌에도, 고구려 벽화 사신도와 액막이의 부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때의 태극은 하늘이고 우주이며 해와 달(日月)이고, 음양의 화합을 통해 풍년과 다산을 염원한 표상이다. 중국에서 태극문양이 처음 보이기로는 주돈이의 '태극도설'에서부터인데, 그 연대는 송나라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
태극은 가위바위보 놀이와 마찬가지로 먼저와 나중이 없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무한성을 나타낸다. 적·청·황색의 삼태극이 상징하는 하늘·땅·사람은 각각이면서 하나이고, 그 가치 또한 동등하다. 태극의 음(陰)과 양(陽)이 화합하여 완전한 원형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땅·사람이 모여 우주가 된다. 그러므로 태극과 삼태극은 모두 우주를 상징한다.
메밀의 경우에도 오색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 그 잎은 파랗고, 꽃은 희고, 줄기는 붉으며, 열매는 검고, 뿌리는 노랗다. 이 때문에 오색을 갖춘 오방지영물(五方之靈物)이라고 하였으며 메밀로 만든 묵을 먹으면 예뻐지고 아들을 낳는 다는 속설이 전해졌다고 한다. 오훈채와 메밀묵처럼 오행의 원리가 적용된 예는 ‘다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다식(茶食)은 예로부터 오색의 아름다운 빛깔로 잔칫상을 장식해 왔으며, 그 색상만으로도 일상의 음식과 충분히 구별되어 무병장수의 기원과 함께 경사스러움을 나타냈다.
다식을 만들 때는 한가지만 만들지 않고 적어도 삼색 이상 마련하여 함께 어울려 담는다. 흰색의 녹말 다식,
분홍색의 오미자 다식, 노란색의 송화 다식, 푸른색의 승검초나 청태다식 그리고 검정 색의 흑임자 다식을 마련하여 오색을 이루게 하고 색상과 함께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게 했다. 한국음식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김치도 오색과 오미를 갖춘 음식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김치는‘백채(白菜)’라고도 했었는데 이는 원래 배추의 흰색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김치는 주재료가 배추의 백색에 배추겉잎이나 파 등의 푸른색이 더해지고 고춧가루의 붉은 색 배추속잎과 생강, 마늘 같은 황색 계열의 색이 더해진다. 그리고 검은 색은 녹각이나 젓갈, 양념류에 의해 더해지며 이로써 오색(五色)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김치는 맛에서도 맵고(辛), 달고(甘), 시고(酸), 짜고(鹹), 쓴(苦) 오미(五味)를 갖추고 있는데, 일단 유산 발효식품으로 독특한 신맛이 있다. 여기에 고추의 매운맛, 양념과 과일 그리고 고추 자체의 단맛, 소금의 짠맛, 여러 가지 채소들의 쓴맛이 어우러져 오행의 조화를 이루고 오묘한 맛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인들은 오색과 오미를 갖춘 음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이상적인 음식으로 생각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색고명
간의 식욕을 자극하는 요소는 시각이 87%이고 미각은 겨우 1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만큼 색상이 음식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음식은 원재료의 색상이 화려하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 열을 가해 익히고, 갈고, 발효시키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식이 선명한 색상을 지니지는 못하였다. 이에 음식을 화려한 색상으로 장식하고, 그 시각적인 효과로 미각을 돋구기 위해 사용된 것이 오색고명이다. 고명의 색상 활용은 인류의 보편적인 음식문화로, 외국의 요리에 곁들여진 녹색의 채소와 원색의 과일들은 한국 음식의 고명과 동일한 목적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음식에서 고명이란 모양과 맛을 더하기 위하여 음식 위에 뿌리거나 얹는 것의 총칭으로 이들의 색상이 대략 다섯 가지 색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색고명'이라는 말을 써왔다. 이때 다섯 가지 색상은 음양오행에서 비롯된 오채(五彩)와 동일하지만 청색만은 야채의 짙은 녹색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이것은 파란색이 식욕을 감퇴시킨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녹색이 '청산(靑山)'의 경우에서처럼 '청(靑)'의 넓은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색 고명 중에서 빨간색과 녹색은 일반적으로 가장 식욕을 자극하는 색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명 자체의 색상이 식욕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이들의 색상이 음식 주재료의 색상과 명도 혹은 채도의 대비를 이루어 음식의 맛을 돋구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단청
단청의 색상은 오방정색과 간색을 주로 하며, 이 색 개념은 앞의 글에서 설명하였듯이 '음양오행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단청은 사신 사상과도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현무도>
볼 때 고구려의 고분벽화 사신도는 가장 오래된 단청의 유래가 된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단청의 배색은 이른바 상록 하단의 원칙으로 광선을 강하게 받는 기둥부분에는 붉은 색을 칠하고, 아래로 향한 추녀나 천장에는 녹청색으로 처리하여 장식의 명도를 높이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단청은 건물의 내외가 모두 선명하고 색조화에 일정한 법칙이 있다. 그리고 색의 계열은 건물의 성격과 단청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2-6색이 있는 데 장단, 삼청, 황, 양록, 육색, 석간주를 기본으로 일정한 규칙에 의해 석간주 다음 색으로부터 한 계열씩 그 색을 줄였다.
계열색 사이에는 백색의 선으로 무늬와 색조를 선명하게 했으며 위에서와 같이 단청의 색은 이색과 보색의 조화로 구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효과적인 색상변화 효과를 주고 있다.
태극
하늘과 땅이 아직 나누어지기 전에 태극에서 음양(陰陽)이 생겼고, 음양의 조화에서 오행(五行)이 생겼다. 세계의 궁극적 근거가 되는 태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동양철학의 핵심이 되는 문제이다. 한국의 태극문양은 유사 이전의 암각화와 고인돌에도, 고구려 벽화 사신도와 액막이의 부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때의 태극은 하늘이고 우주이며 해와 달(日月)이고, 음양의 화합을 통해 풍년과 다산을 염원한 표상이다. 중국에서 태극문양이 처음 보이기로는 주돈이의 '태극도설'에서부터인데, 그 연대는 송나라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
태극은 가위바위보 놀이와 마찬가지로 먼저와 나중이 없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무한성을 나타낸다. 적·청·황색의 삼태극이 상징하는 하늘·땅·사람은 각각이면서 하나이고, 그 가치 또한 동등하다. 태극의 음(陰)과 양(陽)이 화합하여 완전한 원형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땅·사람이 모여 우주가 된다. 그러므로 태극과 삼태극은 모두 우주를 상징한다.
추천자료
 초등5학년<영양과 몸의 성장>의 교수-학습과정안
초등5학년<영양과 몸의 성장>의 교수-학습과정안 9. 상상하여 나타내기 미술과 교수학습 과정안
9. 상상하여 나타내기 미술과 교수학습 과정안 초등국어교육 시험정리본 (국어교육의 문제점, 초등 국어과 교육의 목표 및 지향점, 국어교육...
초등국어교육 시험정리본 (국어교육의 문제점, 초등 국어과 교육의 목표 및 지향점, 국어교육... [초등] 실과 교수학습 모형(제작 중심,지식 이해 중심, 작업 중심 과정, 프로젝트 등)
[초등] 실과 교수학습 모형(제작 중심,지식 이해 중심, 작업 중심 과정, 프로젝트 등) 초등체육 튐틀 지도안(교수학습과정안)
초등체육 튐틀 지도안(교수학습과정안) 중등(중학교) 영어과(영어교육)의 교육내용, 중등(중학교) 영어과(영어교육)의 학습자중심교...
중등(중학교) 영어과(영어교육)의 교육내용, 중등(중학교) 영어과(영어교육)의 학습자중심교... 초등 다문화교육의 내용과 중요성 및 교수학습방법과 유형
초등 다문화교육의 내용과 중요성 및 교수학습방법과 유형 [초등학교 국어교과][국어교과]초등학교 국어과(국어교육)의 성격과 필요성, 초등학교 국어과...
[초등학교 국어교과][국어교과]초등학교 국어과(국어교육)의 성격과 필요성, 초등학교 국어과... 초등1)국어 <국어과 교수-학습 과정안> - 6.느낌이 솔솔(듣기 말하기 76~79p (3/4)차시) 전체...
초등1)국어 <국어과 교수-학습 과정안> - 6.느낌이 솔솔(듣기 말하기 76~79p (3/4)차시) 전체... 초등1)국어 <국어과 교수-학습 과정안> - 5.생각을 펼쳐요(듣기&#8228;말하기 64~67p (4/...
초등1)국어 <국어과 교수-학습 과정안> - 5.생각을 펼쳐요(듣기&#8228;말하기 64~67p (4/... 초등6) <실과 교수-학습 과정안 {세안} 수학 104-105 (수익 116-117) (5/8)차시> 6. 동물 기...
초등6) <실과 교수-학습 과정안 {세안} 수학 104-105 (수익 116-117) (5/8)차시> 6. 동물 기... 초등 과학 5학년) <교수-학습 과정안> 4. 태양계와 별
초등 과학 5학년) <교수-학습 과정안> 4. 태양계와 별  <영양과교수학습지도안, 수업계획안> (초등5) 단원 : 편식 관리 / 편식없는 건강한 어린이 (...
<영양과교수학습지도안, 수업계획안> (초등5) 단원 : 편식 관리 / 편식없는 건강한 어린이 (... 초등1) <(즐거운 생활)과 교수-학습 과정안> 단원(차시) : 9.야! 신나는 여름 방학이다 (1/14...
초등1) <(즐거운 생활)과 교수-학습 과정안> 단원(차시) : 9.야! 신나는 여름 방학이다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