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원시 신앙과 무속 신앙의 차이
우리 집과 마을의 지킴이
가신신앙
동신신앙
독경신앙
무속신앙
자연물신앙
영웅신앙
특징
우리 집과 마을의 지킴이
가신신앙
동신신앙
독경신앙
무속신앙
자연물신앙
영웅신앙
특징
본문내용
영웅신앙(英雄神仰)·자연물신앙(自然物信仰) 외에 사귀신앙(邪鬼信仰)·풍수신앙(風水神仰)·점복(占卜)·예조(豫兆)·금기(禁忌) 등이 있다.
설명
민간인에 의해 생활을 통해서 전승되고 있는 자연적 종교현상.
종류
민간에서 전승되는 민간신앙의 종류에는 가신신앙(家神信仰)·동신신앙(洞神神仰)·무속신앙(巫俗信仰)·독경신앙(讀經神仰)·영웅신앙(英雄神仰)·자연물신앙(自然物信仰) 외에 사귀신앙(邪鬼信仰)·풍수신앙(風水神仰)·점복(占卜)·예조(豫兆)·금기(禁忌) 등이 있다.
가신신앙
공간적으로 대개 가내(家內)에 있는 신적 존재(神的存在)에 대한 신앙이다. 따라서 가신신앙은 곧 가정 단위의 신앙이며, 그 담당자는 주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것은 무격(巫覡)들의 무의(巫儀)처럼 전업사제자적(專業司祭者的)인 기능이나 그 나름의 신학(神學)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남성가장들이 주재하는 유교제례(儒敎祭禮)처럼 논리성이나 이념성·형식성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가신신앙은 가장 정적이고 소박하며 실제적인 민간신앙의 하나이다. 각 가신의 기능과 봉안형태·장소·의례의 형태를 보면, 성주신은 집안에서 제일 높은 최고신으로 가내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신이다. 집의 중심이 되는 대청의 양주(樑柱) 밑이나 기둥의 상부에 백지를 접어서 실타래로 묶거나 백지를 막걸리로 축여서 반구형(半球形)이 되게 갖다 붙이고 이것을 성주신의 신체(神體)로 믿는다. 성주신에 대한 제의는 집을 신축하거나 이사했을 때, 이 신을 새로 봉안하는 의식이 있고, 매년 봄과 가을에 하는 안택 고사가 있다. 또 차례나 재수굿에서도 성주신에게 기원한다. 그리고 후손을 보살펴준다고 믿는 조상신(祖上神)은 일정한 신체는 없으나, 차례 때 조상상(祖上床)을 차려 제를 올리고 햇곡식이 나면 성주신과 함께 천신한다. 이 외에 아이를 점지해 주는 일을 하는 삼신과 부엌의 조왕신, 뒤뜰의 터주신[地神], 장독대의 철륭신, 우물의 정신(井神), 광의 업신, 마구간의 우마신, 대문간의 수문신(守門神), 변소의 뒷간신[厠間神] 등이 있어 집안의 요소마다 보살펴준다고 믿는다.
동신신앙
마을의 수호신을 신당에 모셔놓고 제액초복(除厄招福)을 위해 동민들이 합동으로 제의를 올리는 마을의 공동신앙이다. 이와 같은 마을의 공동제의를 동신제·동제라고 부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락제(部落祭)라고도 한다.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셔진 동신은 명칭상으로 40여 종이지만 계통상으로 분류하면 천신(天神)·일신(日神)·성신(星神)·산신(山神)·수신(樹神)·지신(地神)·수신(水神)·인신(人神) 등이 있다. 이러한 동신신앙 중에서도 보편적인 것은 산신·서낭신·국수신·장군신·용신(龍神)·부군신(府君神) 그리고 장승·솟대 등이다. 대체로 마을 뒷산 중턱에는 산신을 모신 산신당이 있고, 마을로 들어서는 길 옆에 서낭신을 모신 서낭당이 있으며, 그 옆에 장승이나 솟대가 있는 것이 동신신앙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마을 뒷산의 산정에 국수신을 모신 국수당이 있는 마을도 있어서 동신은 대체로 한 마을에 국수신·산신·서낭신·장승·솟대가 복합신앙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독경신앙
독경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신앙의 한 형태인 독경신앙은 불교·도교·무속 등의 사고가 혼합 기록화된 것으로 신장의 위력에 의해 제액과 잡귀를 물리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독경되는 경문으로는 신장경(神將經)·옥추경(玉樞經)·천지팔양경(天地八陽經)·축귀경(逐鬼經)·해원문(解寃文) 등이 있으며, 이 경문에 절대적 주력(呪力)이 있다고 믿는다.
무속신앙
무속은 무당을 주축으로 민간층에서 전승되고 있는 자연적 종교현상이다. 무속에서 신앙되는 신은 민간신앙에서 신앙되는 신들이 종합된다. 무속신앙은 목적에 따라 무신제(巫神祭)·가제(家祭)·동제(洞祭)로 집약되는데, 이 중 무신제는 무당 자신의 굿으로 강신제(降神祭)와 봄·가을에 주기적으로 하는 축신제가 있다. 또 가제는 민가에서 가족의 안녕과 행운을 위해 하는 제의로 생전제의(生前祭儀)와 사후제의(死後祭儀)가 있다. 전자는 기자(祈子)·육아(育兒)·치병(治病)·혼인(婚姻)·가옥신축·이사·행운·기풍(祈豊)·해상안전(海上安全)·풍어(豊漁) 등을 기원하는 것이고, 후자는 상가정화(喪家淨化), 익사자·객사자 내지 망인(亡人) 천도(薦度) 등의 제의이다. 그리고 동제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마을을 수호하는 동신에게 해가 바뀔 때마다 봄과 가을에 날을 잡아 제를 올리는 주기적 제의이다. 내륙지역에서는 주로 제액·기풍제의를 행하고, 해안지역에서는 제액과 풍어제의를 행한다.
영웅신앙
영웅신앙은 영웅의 영혼을 신으로 신앙하는 것으로, 왕신(王神)·장군신(將軍神)·대감신(大監神)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왕신으로 단군(檀君)이나 공민왕(恭愍王)이 숭배되고 있고, 장군신으로는 임경업(林慶業)·최영(崔瑩)·관우(關羽) 등이 숭배되는데, 이러한 영웅신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신당에 봉안되어 매년 동신제를 지내게 된다.
자연물신앙
자연물신앙은 산이나 나무·암석·강·바다 등의 자연 무생물과 구렁이·호랑이·말·곰 및 까치 등의 자연 생물을 신성시하여 신앙하는 것이다. 자연물을 신성하게 보는 데는 2가지 속성이 있다. 이는 일상적인 것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는 것과 쉽게 멸하지 않는다는 영원성이 그것이다. 나무나 산·암석의 경우 일반적인 것들과 구별되어 절묘하고 큰 거목이나 거석, 큰 산이 신앙의 대상이 되고, 강이나 바다도 일반적으로 흔한 냇물이나 연해(沿海)가 아니고 큰 강이나 큰 바다가 신앙의 대상이 된다. 또 해와 달 등 무생물의 영원성과 인간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사는 생물들에 대한 영원성 부여가 신성의 기준이 되고 있다.
특징
한국 민간신앙의 특징은 ①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신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② 개인신앙이 아닌 공동체의 신앙형태를 지니며 ③ 외래종교와의 끊임없는 상접(相接)을 통해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았으며 ④ 구체적인 생사길흉화복에 집착하고 있고 ⑤ 비윤리적 측면이나 감정적 요소가 적지않게 나타나며 ⑥ 사회적 모순이나 사회적 제도에 대한 원한과 한많은 인생의 복수심을 해결하는 등 사회적 통합기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설명
민간인에 의해 생활을 통해서 전승되고 있는 자연적 종교현상.
종류
민간에서 전승되는 민간신앙의 종류에는 가신신앙(家神信仰)·동신신앙(洞神神仰)·무속신앙(巫俗信仰)·독경신앙(讀經神仰)·영웅신앙(英雄神仰)·자연물신앙(自然物信仰) 외에 사귀신앙(邪鬼信仰)·풍수신앙(風水神仰)·점복(占卜)·예조(豫兆)·금기(禁忌) 등이 있다.
가신신앙
공간적으로 대개 가내(家內)에 있는 신적 존재(神的存在)에 대한 신앙이다. 따라서 가신신앙은 곧 가정 단위의 신앙이며, 그 담당자는 주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것은 무격(巫覡)들의 무의(巫儀)처럼 전업사제자적(專業司祭者的)인 기능이나 그 나름의 신학(神學)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남성가장들이 주재하는 유교제례(儒敎祭禮)처럼 논리성이나 이념성·형식성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가신신앙은 가장 정적이고 소박하며 실제적인 민간신앙의 하나이다. 각 가신의 기능과 봉안형태·장소·의례의 형태를 보면, 성주신은 집안에서 제일 높은 최고신으로 가내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신이다. 집의 중심이 되는 대청의 양주(樑柱) 밑이나 기둥의 상부에 백지를 접어서 실타래로 묶거나 백지를 막걸리로 축여서 반구형(半球形)이 되게 갖다 붙이고 이것을 성주신의 신체(神體)로 믿는다. 성주신에 대한 제의는 집을 신축하거나 이사했을 때, 이 신을 새로 봉안하는 의식이 있고, 매년 봄과 가을에 하는 안택 고사가 있다. 또 차례나 재수굿에서도 성주신에게 기원한다. 그리고 후손을 보살펴준다고 믿는 조상신(祖上神)은 일정한 신체는 없으나, 차례 때 조상상(祖上床)을 차려 제를 올리고 햇곡식이 나면 성주신과 함께 천신한다. 이 외에 아이를 점지해 주는 일을 하는 삼신과 부엌의 조왕신, 뒤뜰의 터주신[地神], 장독대의 철륭신, 우물의 정신(井神), 광의 업신, 마구간의 우마신, 대문간의 수문신(守門神), 변소의 뒷간신[厠間神] 등이 있어 집안의 요소마다 보살펴준다고 믿는다.
동신신앙
마을의 수호신을 신당에 모셔놓고 제액초복(除厄招福)을 위해 동민들이 합동으로 제의를 올리는 마을의 공동신앙이다. 이와 같은 마을의 공동제의를 동신제·동제라고 부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락제(部落祭)라고도 한다.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셔진 동신은 명칭상으로 40여 종이지만 계통상으로 분류하면 천신(天神)·일신(日神)·성신(星神)·산신(山神)·수신(樹神)·지신(地神)·수신(水神)·인신(人神) 등이 있다. 이러한 동신신앙 중에서도 보편적인 것은 산신·서낭신·국수신·장군신·용신(龍神)·부군신(府君神) 그리고 장승·솟대 등이다. 대체로 마을 뒷산 중턱에는 산신을 모신 산신당이 있고, 마을로 들어서는 길 옆에 서낭신을 모신 서낭당이 있으며, 그 옆에 장승이나 솟대가 있는 것이 동신신앙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마을 뒷산의 산정에 국수신을 모신 국수당이 있는 마을도 있어서 동신은 대체로 한 마을에 국수신·산신·서낭신·장승·솟대가 복합신앙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독경신앙
독경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신앙의 한 형태인 독경신앙은 불교·도교·무속 등의 사고가 혼합 기록화된 것으로 신장의 위력에 의해 제액과 잡귀를 물리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독경되는 경문으로는 신장경(神將經)·옥추경(玉樞經)·천지팔양경(天地八陽經)·축귀경(逐鬼經)·해원문(解寃文) 등이 있으며, 이 경문에 절대적 주력(呪力)이 있다고 믿는다.
무속신앙
무속은 무당을 주축으로 민간층에서 전승되고 있는 자연적 종교현상이다. 무속에서 신앙되는 신은 민간신앙에서 신앙되는 신들이 종합된다. 무속신앙은 목적에 따라 무신제(巫神祭)·가제(家祭)·동제(洞祭)로 집약되는데, 이 중 무신제는 무당 자신의 굿으로 강신제(降神祭)와 봄·가을에 주기적으로 하는 축신제가 있다. 또 가제는 민가에서 가족의 안녕과 행운을 위해 하는 제의로 생전제의(生前祭儀)와 사후제의(死後祭儀)가 있다. 전자는 기자(祈子)·육아(育兒)·치병(治病)·혼인(婚姻)·가옥신축·이사·행운·기풍(祈豊)·해상안전(海上安全)·풍어(豊漁) 등을 기원하는 것이고, 후자는 상가정화(喪家淨化), 익사자·객사자 내지 망인(亡人) 천도(薦度) 등의 제의이다. 그리고 동제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마을을 수호하는 동신에게 해가 바뀔 때마다 봄과 가을에 날을 잡아 제를 올리는 주기적 제의이다. 내륙지역에서는 주로 제액·기풍제의를 행하고, 해안지역에서는 제액과 풍어제의를 행한다.
영웅신앙
영웅신앙은 영웅의 영혼을 신으로 신앙하는 것으로, 왕신(王神)·장군신(將軍神)·대감신(大監神)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왕신으로 단군(檀君)이나 공민왕(恭愍王)이 숭배되고 있고, 장군신으로는 임경업(林慶業)·최영(崔瑩)·관우(關羽) 등이 숭배되는데, 이러한 영웅신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신당에 봉안되어 매년 동신제를 지내게 된다.
자연물신앙
자연물신앙은 산이나 나무·암석·강·바다 등의 자연 무생물과 구렁이·호랑이·말·곰 및 까치 등의 자연 생물을 신성시하여 신앙하는 것이다. 자연물을 신성하게 보는 데는 2가지 속성이 있다. 이는 일상적인 것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는 것과 쉽게 멸하지 않는다는 영원성이 그것이다. 나무나 산·암석의 경우 일반적인 것들과 구별되어 절묘하고 큰 거목이나 거석, 큰 산이 신앙의 대상이 되고, 강이나 바다도 일반적으로 흔한 냇물이나 연해(沿海)가 아니고 큰 강이나 큰 바다가 신앙의 대상이 된다. 또 해와 달 등 무생물의 영원성과 인간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사는 생물들에 대한 영원성 부여가 신성의 기준이 되고 있다.
특징
한국 민간신앙의 특징은 ①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신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② 개인신앙이 아닌 공동체의 신앙형태를 지니며 ③ 외래종교와의 끊임없는 상접(相接)을 통해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았으며 ④ 구체적인 생사길흉화복에 집착하고 있고 ⑤ 비윤리적 측면이나 감정적 요소가 적지않게 나타나며 ⑥ 사회적 모순이나 사회적 제도에 대한 원한과 한많은 인생의 복수심을 해결하는 등 사회적 통합기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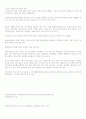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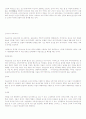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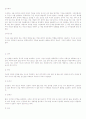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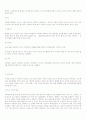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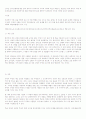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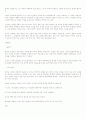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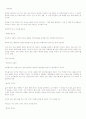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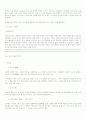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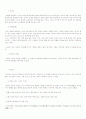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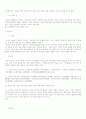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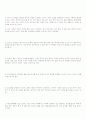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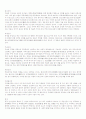









소개글